본문내용
국의 경우 사회협약적 모델과 상확증적 협력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연구 자율성은 인정하고 있어도 과학기술 자체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은 전략적 육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정치인의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는 인식으로 과학기술 자체의 가지적 측면과 과학기술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점을 개선을 위해서 과학의 대중화로 R&D예산의 증액은 도움이 된다. 또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폭과 깊다. 기초과학 투자와 기초과학 교육을 내실화하여 나가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적 효용의 논리에 압도되어 공익적 가치의 재배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즉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정치와 과학의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발전도 과학이 발전되는 과정이 기초를 이루며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과학도 정치와 더불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개선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자료[정책자료 2007-04]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2007.081 - 47 (47 pages)
3. 결론
하이젠베르크의 원칙은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 또는 불확정성 원리로 그가 존경하는 보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리고 괴테가 바라보는 자연의 상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과 밖은 다르지 않고 부분을 단순하게 모으면 전체가 된다고 말한다. 원칙 속에서 작은 틀을 주면서 크게 보았던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데 일조하였지만, 방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와 과학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집어서 말한다. 즉 나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정치와 과학이 일조하였을 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지없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손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사로잡을 수 없는 큰일이 생긴다. 한 나라의 정치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와 과학의 공존은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하이젠베르크의 집요한 과학연구로 독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망명이 아니라 독일에서 계속 과학 연구를 하여 큰 발전을 하도록 하는 우라늄을 개발했다. 이것일 결국 전쟁이라는 곳에 사용되어 더 큰 이슈가 되어버렸지만, 그는 상을 받으면서 독일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래갔다. 이러한 독일의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과 연구하는 삶에 독일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말했던 과학자의 윤리와 철학은 인간 삶의 풍요 및 발전과 양립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론은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우라늄을 들어 설명하면 양립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라늄으로 통해서 전쟁에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핵의 원료가 되었던 이것은 많은 학살의 주범이 되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핵미사일 한방으로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생겼다. 전쟁의 빠른 종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핵으로 인하여 남은 것은 다른 나라의 광복이었지만, 거기에 남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까지도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윤리와 철학에 위반되어 버렸던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았지만, 결국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자의 윤리가 철학을 생각하여 인간의 삶이 편해지기도 하였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졌다. 이것도 과학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속을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첨단기술이 발달되면서 과학자는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이 늘 따라다닌다. 과학의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돕는다면 인간의 삶은 윤택하고 좋을 것이다. 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인간을 직업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감성까지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이젠베르크는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과학을 연구했다. 자신의 윤리 정신이 존속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밝힌 이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인간, 정치라는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인간이다. 독일인 하이젠베르크를 보면서 독일이 먼저 생각났다. 인본주의를 저버린 정치적인 성향으로 과학까지 자신 위주로 사용해 버린 독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여긴다. 즉, 과학과 인간의 존립은 과학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인간 위에 과학이 존재하여야 한다.
“과학은 특정 조건에서 누가하였든 같은 실험적 결과를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잘 짜인 수학적인 계산이 제시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잘 다가오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은 과학의 실험적 근거가 결정적인 근거인지와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실험결과와 이론의 해석에서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학적 논쟁은 과학의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과학의 객관성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이 진보하는 이유가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과학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메디닷컴 과학이 정치와 멀어져야 하는 이, 2020년 7월 21일,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직접인용 (미주)
3. 결론
하이젠베르크의 원칙은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 또는 불확정성 원리로 그가 존경하는 보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리고 괴테가 바라보는 자연의 상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과 밖은 다르지 않고 부분을 단순하게 모으면 전체가 된다고 말한다. 원칙 속에서 작은 틀을 주면서 크게 보았던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데 일조하였지만, 방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와 과학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집어서 말한다. 즉 나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정치와 과학이 일조하였을 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지없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손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사로잡을 수 없는 큰일이 생긴다. 한 나라의 정치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와 과학의 공존은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하이젠베르크의 집요한 과학연구로 독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망명이 아니라 독일에서 계속 과학 연구를 하여 큰 발전을 하도록 하는 우라늄을 개발했다. 이것일 결국 전쟁이라는 곳에 사용되어 더 큰 이슈가 되어버렸지만, 그는 상을 받으면서 독일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래갔다. 이러한 독일의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과 연구하는 삶에 독일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말했던 과학자의 윤리와 철학은 인간 삶의 풍요 및 발전과 양립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론은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우라늄을 들어 설명하면 양립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라늄으로 통해서 전쟁에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핵의 원료가 되었던 이것은 많은 학살의 주범이 되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핵미사일 한방으로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생겼다. 전쟁의 빠른 종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핵으로 인하여 남은 것은 다른 나라의 광복이었지만, 거기에 남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까지도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윤리와 철학에 위반되어 버렸던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았지만, 결국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자의 윤리가 철학을 생각하여 인간의 삶이 편해지기도 하였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졌다. 이것도 과학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속을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첨단기술이 발달되면서 과학자는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이 늘 따라다닌다. 과학의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돕는다면 인간의 삶은 윤택하고 좋을 것이다. 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인간을 직업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감성까지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이젠베르크는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과학을 연구했다. 자신의 윤리 정신이 존속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밝힌 이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인간, 정치라는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인간이다. 독일인 하이젠베르크를 보면서 독일이 먼저 생각났다. 인본주의를 저버린 정치적인 성향으로 과학까지 자신 위주로 사용해 버린 독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여긴다. 즉, 과학과 인간의 존립은 과학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인간 위에 과학이 존재하여야 한다.
“과학은 특정 조건에서 누가하였든 같은 실험적 결과를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잘 짜인 수학적인 계산이 제시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잘 다가오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은 과학의 실험적 근거가 결정적인 근거인지와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실험결과와 이론의 해석에서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학적 논쟁은 과학의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과학의 객관성을 지켜주는 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이 진보하는 이유가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과학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메디닷컴 과학이 정치와 멀어져야 하는 이, 2020년 7월 21일,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직접인용 (미주)
추천자료
 [인문과학] 동서양 고전
[인문과학] 동서양 고전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의 일대기.
하이젠베르크의 일대기.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 독후감 - 부분과 전체 목차별 줄거리 요약 및 부분과 전체 읽고나서 느낀점
부분과 전체 독후감 - 부분과 전체 목차별 줄거리 요약 및 부분과 전체 읽고나서 느낀점 부분과 전체 내용요약과 가장 기억에 남는내용 및 부분과 전체 읽고 느낀점 - 부분과 전체 독...
부분과 전체 내용요약과 가장 기억에 남는내용 및 부분과 전체 읽고 느낀점 - 부분과 전체 독... 부분과 전체 독후감,서평 (부분과 전체 책 내용요약과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가장 인상깊었...
부분과 전체 독후감,서평 (부분과 전체 책 내용요약과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가장 인상깊었... 부분과 전체 독후감 - 부분과 전체 핵심내용 요약 /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와 나의생각 정리 ...
부분과 전체 독후감 - 부분과 전체 핵심내용 요약 /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와 나의생각 정리 ... A+ 부분과 전체 - 하이젠베르크 독후감[서울대 필독서 100선]
A+ 부분과 전체 - 하이젠베르크 독후감[서울대 필독서 1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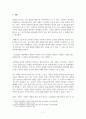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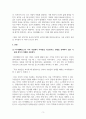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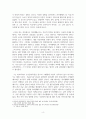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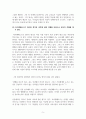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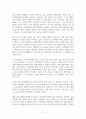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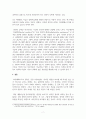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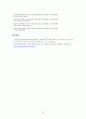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