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사설시조 감상
3. 맺음말
2. 사설시조 감상
3. 맺음말
본문내용
, 양반사대부의 향락, 애정, 탈속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이었던 평시조와는 달리,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창작하여 평민들의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현재, 양반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평시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 극소수의 계층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해져오고 있는 양은 적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었고 더 많은 부분 그 시대의 모습을 닮고 있는 것이 사설시조가 아닐까? 본고에서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유하였던 해학, 풍자, 그리고 사랑을 중점적으로 사설시조 속에 나타난 인간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설시조 감상
인간사 새옹지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전하고 있는 많은 사설시조들을 통해 해학과 풍자의 묘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겪었던 혹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 웃음을 이용한 방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인간사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랑. 사랑으로 인한 기다림, 사랑 다짐에서부터 애욕을 드러내기 까지 다양한 사랑에 관한 내용 또한 사설시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청구영언을 통해 전해 오고 있는 사설시조 중 10편을 선정하여 해학, 풍자, 사랑의 세 분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2.1. 해학
541
窓 내고샤 窓을 내고쟈 이 내 가슴에 窓 내고쟈
고모장지 셰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몰져귀 목 걸새 크나 큰 쟝도리로 닥바가 이내 가슴에 窓 내고쟈
잇다감 하 답답 제면 여다져 볼가 노라
창(窓)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둑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볼가 하노라.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가 가슴에 창을 만들어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열고 닫음이 가능한 창의 특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창’이라는 소재 선택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알 수 있다. 미닫이 문과 비슷한 장지의 종류를 나열하는가 하면, 그 창문의 일부인 돌쩌귀와 배목, 걸쇠를 이어 나열한다. 인간이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안으로, 창을 내겠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과 나열법을 통해 해학을 느낄 수 있다.
545
白華山 上上頭에 落落長松 휘여진 柯枝 우희
부헝 放氣 殊常 옹도라지 길
2. 사설시조 감상
인간사 새옹지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전하고 있는 많은 사설시조들을 통해 해학과 풍자의 묘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겪었던 혹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 웃음을 이용한 방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인간사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랑. 사랑으로 인한 기다림, 사랑 다짐에서부터 애욕을 드러내기 까지 다양한 사랑에 관한 내용 또한 사설시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청구영언을 통해 전해 오고 있는 사설시조 중 10편을 선정하여 해학, 풍자, 사랑의 세 분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2.1. 해학
541
窓 내고샤 窓을 내고쟈 이 내 가슴에 窓 내고쟈
고모장지 셰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몰져귀 목 걸새 크나 큰 쟝도리로 닥바가 이내 가슴에 窓 내고쟈
잇다감 하 답답 제면 여다져 볼가 노라
창(窓)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둑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볼가 하노라.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가 가슴에 창을 만들어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열고 닫음이 가능한 창의 특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창’이라는 소재 선택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알 수 있다. 미닫이 문과 비슷한 장지의 종류를 나열하는가 하면, 그 창문의 일부인 돌쩌귀와 배목, 걸쇠를 이어 나열한다. 인간이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안으로, 창을 내겠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과 나열법을 통해 해학을 느낄 수 있다.
545
白華山 上上頭에 落落長松 휘여진 柯枝 우희
부헝 放氣 殊常 옹도라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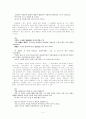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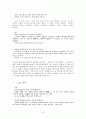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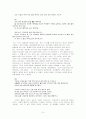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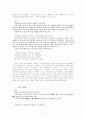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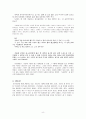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