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바다는 분노의 모든 은유, 발광과 격노의 모든 동물적 상징을 받아들이고, 사자(獅子)의 갈기를 흔들어댄다. “발자끄”의 작중 인물 저주받은 아이 에띠엔느는 대담하게 물러가는 물결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적의의 바다에 도전하기도 하며, 되돌아오는 바다를 도망치면서 조롱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싸움은 이러한 아이의 유희를 상징하고, 물결에 명령하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잠재적 스윈번 콤플렉스, 즉 육지 사람으로서의 스윈번 콤플렉스를 육성하는 것이다. 에띠엔느와 ‘대양’ 사이에는 난폭함의 직접적이고 가역적인 전달인 ‘노여워하는 공감’이 존재한다. 바다는 동물적인 분노, 인간적인 분노를 지니고 있다. 노여움은 인간이 사물에 대해 취하는 가장 직접적인 타협이다. 최초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노여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허한 이미지를 낳지는 않는다. 난폭한 물은 우주적 분노의 최소의 도식 가운데 하나이다. ‘스윈번 콤플렉스’ 속에는 마조히즘적 요소가 많다. 난폭한 물의 심리적 콤플렉스에 ‘크세르크세스 콤플렉스’라는 뚜렷하게 사디즘적인 콤플렉스를 결부시킬 수 있다. 휴식 속에서 참으로 온화한 물은 마침내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 때 폭풍몰이꾼은 샘물을 채찍질한다. 원소가 분노하여 우주적인 것이 되고, 폭풍은 울부짖고, 벼락은 폭발하며, 물은 대지를 침수시킨다. 폭풍몰이꾼은 우주적 행위를 이룩하는 것이다. 바다에의 저항이 인간에 대한 저항에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의 저항에 화를 내며 물러가는 바다의 이미지는 읽는 이에게 아무런 비평을 야기시키지 못한다.
어떤 인간적 행위가 인간의 환경과 들판의 환경에 있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넓은 목장의 작은 냇물을 뛰어넘는 아이는 모험을 꿈꾸고, 힘과 도약과 대담함을 꿈꿀 줄 아는 것이다. 작은 냇물을 본다는 것은 먼 몽상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몽상에 활력을 준다.
<에필로그> 물의 말
물은 유동하는 언어, 원활한 언어, 리듬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다른 리듬에 균일한 물을 주는 언어, 계속하며 또 계속되는 언어의 주인이다. 소리를 보다 잘 재창조해내기 위해서는 한층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만들려는 의지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상력을 연구하기 위한 참다운 영역은 문학작품이고, 말이며, 글이다. 활짝 꽃 핀, 생명에 넘쳐있는 말, 과거가 완성시켜버리지 않은, 옛사람들도 아름답다고는 알지 못했던 말, 국어의 신비적 보석인 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강’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 ‘강변’이라는 말의 시각적 영상으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흘러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나뭇잎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말한 바와 같이 눈을 깜박거리며 빛과 물의 거울을 떨게 하는 물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떠는 것이 들리는 것이다. 유음의 음소를 갖는 모든 말을 모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물의 풍경을 가질 수 있고, 물의 심적 경향이나 물의 말을 통해 표현되는 시적풍경은 자연스럽게 유음을 발견한다. 물의 웃음은 메마름을 지니지 않는다. 샘은 물이 되어가는 언어이고, 아름답고 순박하며 신선한 샘물소리를 들을 때, 물은 입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생각된다. 유동성은 언어의 한 원리이며, 언어는 물로 부풀어 있어야 한다.
물은 간접적인 목소리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충실한 ‘목소리의 거울’이다. 자연의 소리 속에 의성어의 비슷한 반복과 떨어지는 물이 노래하는 티티새의 억양을 주지 않는 다면, 자연스런 목소리를 시적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냇물이나 강이나 폭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어떤 화법을 지닌다.
바다는 분노의 모든 은유, 발광과 격노의 모든 동물적 상징을 받아들이고, 사자(獅子)의 갈기를 흔들어댄다. “발자끄”의 작중 인물 저주받은 아이 에띠엔느는 대담하게 물러가는 물결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적의의 바다에 도전하기도 하며, 되돌아오는 바다를 도망치면서 조롱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싸움은 이러한 아이의 유희를 상징하고, 물결에 명령하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잠재적 스윈번 콤플렉스, 즉 육지 사람으로서의 스윈번 콤플렉스를 육성하는 것이다. 에띠엔느와 ‘대양’ 사이에는 난폭함의 직접적이고 가역적인 전달인 ‘노여워하는 공감’이 존재한다. 바다는 동물적인 분노, 인간적인 분노를 지니고 있다. 노여움은 인간이 사물에 대해 취하는 가장 직접적인 타협이다. 최초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노여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허한 이미지를 낳지는 않는다. 난폭한 물은 우주적 분노의 최소의 도식 가운데 하나이다. ‘스윈번 콤플렉스’ 속에는 마조히즘적 요소가 많다. 난폭한 물의 심리적 콤플렉스에 ‘크세르크세스 콤플렉스’라는 뚜렷하게 사디즘적인 콤플렉스를 결부시킬 수 있다. 휴식 속에서 참으로 온화한 물은 마침내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 때 폭풍몰이꾼은 샘물을 채찍질한다. 원소가 분노하여 우주적인 것이 되고, 폭풍은 울부짖고, 벼락은 폭발하며, 물은 대지를 침수시킨다. 폭풍몰이꾼은 우주적 행위를 이룩하는 것이다. 바다에의 저항이 인간에 대한 저항에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의 저항에 화를 내며 물러가는 바다의 이미지는 읽는 이에게 아무런 비평을 야기시키지 못한다.
어떤 인간적 행위가 인간의 환경과 들판의 환경에 있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넓은 목장의 작은 냇물을 뛰어넘는 아이는 모험을 꿈꾸고, 힘과 도약과 대담함을 꿈꿀 줄 아는 것이다. 작은 냇물을 본다는 것은 먼 몽상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몽상에 활력을 준다.
<에필로그> 물의 말
물은 유동하는 언어, 원활한 언어, 리듬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다른 리듬에 균일한 물을 주는 언어, 계속하며 또 계속되는 언어의 주인이다. 소리를 보다 잘 재창조해내기 위해서는 한층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만들려는 의지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상력을 연구하기 위한 참다운 영역은 문학작품이고, 말이며, 글이다. 활짝 꽃 핀, 생명에 넘쳐있는 말, 과거가 완성시켜버리지 않은, 옛사람들도 아름답다고는 알지 못했던 말, 국어의 신비적 보석인 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강’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 ‘강변’이라는 말의 시각적 영상으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흘러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나뭇잎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말한 바와 같이 눈을 깜박거리며 빛과 물의 거울을 떨게 하는 물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떠는 것이 들리는 것이다. 유음의 음소를 갖는 모든 말을 모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물의 풍경을 가질 수 있고, 물의 심적 경향이나 물의 말을 통해 표현되는 시적풍경은 자연스럽게 유음을 발견한다. 물의 웃음은 메마름을 지니지 않는다. 샘은 물이 되어가는 언어이고, 아름답고 순박하며 신선한 샘물소리를 들을 때, 물은 입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생각된다. 유동성은 언어의 한 원리이며, 언어는 물로 부풀어 있어야 한다.
물은 간접적인 목소리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충실한 ‘목소리의 거울’이다. 자연의 소리 속에 의성어의 비슷한 반복과 떨어지는 물이 노래하는 티티새의 억양을 주지 않는 다면, 자연스런 목소리를 시적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냇물이나 강이나 폭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어떤 화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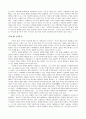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