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칼 만하임의 삶과 철학
2. 칼 만하임의 '세대문제'
3. 만하임의 인식론
4.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5.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6. 참고자료
2. 칼 만하임의 '세대문제'
3. 만하임의 인식론
4.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5.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든다. 첫째, 마르크스는 인간개인이 사회적 諸關係의 총체라고 보았다. 둘째,. 인식을 실천적 행위, 즉 感性的 活動으로 해석한다. 셋째, 인식은 상대적, 부분적 진실의 축적을 통하여 절대적 진실로 나아가는 무한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개념으로 부터 인식주체의 주관적 요인이 나온다. 이때 이 주관적 요인은 관념적인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이때, 주관적 요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나 계급적. 집단적 이해관계 등으로서 인식과정에 있어서 주체의 능동적 역할, 심리적 상태, 태도 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해 주체의 인식과정, 혹은 그 결과에 가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주관적 요인의 인정에 따라 인식의 절대적 타당성은 보류된다. 인식과 인식의 결과인 진실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부분적 진실만이 가능하게 된다. 부분적 진실들을 계속 모아서 축적함으로서 풍부하고 철저한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실을 얻을 수 있다.
아담샤프는 만하임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견해와 태도가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진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개인을 사회관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식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인식주체가 대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인식의 사회적 제약성의 강조로 특정 지울 수 있다. 베르너슈라크의 인식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은, 인식론이란 한편으로는 인식(Knowing)하는, 혹은 지각(Perceining)하는 주체와 또 한편으로는 그 주체가 인식이나 지각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객체의 세계, 그 양자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때 고전적 인식론자들은 주체를 고립적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추상적 인간(단수)이 아니라 구체적 인간들(복수)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영향요소들에 의해 모습 지워지고 세대와 세대,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명하고도 특수한 존재로 교육받아 온 인간들인 것이다.
인식의 산물인 지식은 물리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의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물리적 현실에 대한 지식의 수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물리적이며 형식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사회적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구체화되고 충족되는 영속적 의식, 즉 특정한 사회질서 속에서 살며, 그 맥락 속에서 모든 사회적 사태를 파악하는 인간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치판단이라고 비판하더라도 가치평가는 이미 모든 인지행위에 선행한다. 나아가서 현상의 요소들에 공통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전에 품은 가치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치체계는 사회에 따라 다르며, 새로운 출생자들의 사회화 과정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특징적인 가치개념을 그러한 선택과 ‘질서지움’(ordering)의 원리를 불어넣는다. 따라서, 선행하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주목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론이 필요하다. 볘르너 슈타크는 ‘지식의 사회적 조건’, ‘앎과 삶의 상호관계’의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는데, 결국 물리적 지식은 선행하는 사회적 가치평가에 따라 인식주체가 현상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하임은 인식과정을 단순한 사유와 논리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취급해버린 고전적 인식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화의 기반으로 실천적 개념의 社會的 條件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원을 밝히기 전에는 이해될 수 없는 사유방식이 있으며, 지식사회학은 歷史的.社會的 상황의 구체적 관련성에서의 思惟를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처럼 그 자체로 완전한 정신현상을 부정하고 思惟와 歷史的으로 주어진 준거틀을 관련시키는 ‘인식론의 혁명’은 그가 해석한 歷史主義에서 유래한다.
그의 역사주의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서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규정과 범주들도 다른 개념과 더불어 知性史의 전개과정에서 의미상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존재론적으로 결정된다.”고 부르던 특정 유형의 지식-역사적, 정치적 및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적 현상에 관한 지식-들로 그의 접근 영역을 한정시킨다. 이 歷史主義는 그 자체 世界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식이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때, 이것은 세계관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世界의 역동성을 전제하고 그러한 변동 속에서 그것을 질서지워주는 원리, 혹은 변동의 가장 심오한 내재 구조를 파악하려 할
아담샤프는 만하임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견해와 태도가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진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개인을 사회관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식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인식주체가 대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인식의 사회적 제약성의 강조로 특정 지울 수 있다. 베르너슈라크의 인식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은, 인식론이란 한편으로는 인식(Knowing)하는, 혹은 지각(Perceining)하는 주체와 또 한편으로는 그 주체가 인식이나 지각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객체의 세계, 그 양자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때 고전적 인식론자들은 주체를 고립적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추상적 인간(단수)이 아니라 구체적 인간들(복수)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영향요소들에 의해 모습 지워지고 세대와 세대,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명하고도 특수한 존재로 교육받아 온 인간들인 것이다.
인식의 산물인 지식은 물리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의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물리적 현실에 대한 지식의 수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물리적이며 형식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사회적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구체화되고 충족되는 영속적 의식, 즉 특정한 사회질서 속에서 살며, 그 맥락 속에서 모든 사회적 사태를 파악하는 인간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치판단이라고 비판하더라도 가치평가는 이미 모든 인지행위에 선행한다. 나아가서 현상의 요소들에 공통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전에 품은 가치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치체계는 사회에 따라 다르며, 새로운 출생자들의 사회화 과정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특징적인 가치개념을 그러한 선택과 ‘질서지움’(ordering)의 원리를 불어넣는다. 따라서, 선행하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주목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론이 필요하다. 볘르너 슈타크는 ‘지식의 사회적 조건’, ‘앎과 삶의 상호관계’의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는데, 결국 물리적 지식은 선행하는 사회적 가치평가에 따라 인식주체가 현상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하임은 인식과정을 단순한 사유와 논리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취급해버린 고전적 인식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화의 기반으로 실천적 개념의 社會的 條件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원을 밝히기 전에는 이해될 수 없는 사유방식이 있으며, 지식사회학은 歷史的.社會的 상황의 구체적 관련성에서의 思惟를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처럼 그 자체로 완전한 정신현상을 부정하고 思惟와 歷史的으로 주어진 준거틀을 관련시키는 ‘인식론의 혁명’은 그가 해석한 歷史主義에서 유래한다.
그의 역사주의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서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규정과 범주들도 다른 개념과 더불어 知性史의 전개과정에서 의미상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존재론적으로 결정된다.”고 부르던 특정 유형의 지식-역사적, 정치적 및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적 현상에 관한 지식-들로 그의 접근 영역을 한정시킨다. 이 歷史主義는 그 자체 世界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식이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때, 이것은 세계관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世界의 역동성을 전제하고 그러한 변동 속에서 그것을 질서지워주는 원리, 혹은 변동의 가장 심오한 내재 구조를 파악하려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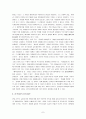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