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관
2. 작품분석 - 현대의 그리스도
3. 긴 호흡, 깊은 사유, 시공을 초월한 시대정신
4.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구원과 희망의 메세지
5.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6. 맺음말
2. 작품분석 - 현대의 그리스도
3. 긴 호흡, 깊은 사유, 시공을 초월한 시대정신
4.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구원과 희망의 메세지
5.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6. 맺음말
본문내용
토예프스키는 대심문관의 이야기 속에서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실패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해낸다. 기적에 의해 지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환상을 민중들에게 심어주고 기독교와 너무나도 흡사한 비전을 제시하는 파쇼야말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것이다. 사실,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은 대심문관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민중 자신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의 눈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보지 않았던가. 하나 더 지적하자면, 위의 분은 아이들의 등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나옴으로써 <까라마조프..>의 비전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평론가들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아이들과 알료샤가 모여 화해하는 장면을, 시쳇말로 촌티나는, 신파조의 장면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도스토예프스키가 심사숙고 끝에 집어넣은 장면임에 분명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항상 생활고에 쪼들렸기 때문에 부유했던 다른 러시아 작가들처럼 퇴고를 해볼 여유가 없었다. 심지어 인쇄가 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집필한 것을 깨닫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까라마조프..>를 쓸 당시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
그는 분명히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퇴고를 거듭했을 것이다. 알료샤의 스승인 조시마 장로는 알료샤를 속세로 보낸다. 그러나 그 자신도 자신이 떠나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파계의 힌트는 조시마 장로의 형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 한마디 말에 들어있다:\"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한 마디야말로 <까라마조프..>의 주제를 단숨에 설명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버지 까라마조프는 살해당하고, 드미트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극의 길을 걷게 되고, 이반은 병을 얻어 쓰러지고- 이 증오와 광기의 지옥도 속에서도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역설적인 희망은 바로 아이들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수도원에서 다른 신도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독야청청하는 것도 하나의 위대한 삶일 수 있다. 그러나 속세에서 서로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아이들에게서 구원의 희망을 보고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5.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소설의 인물들 이반과 라끼찐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들과 몹시 닮았기 때문이다. 이반은 어떤가 무신론자인 그는 자신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단,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서 말이다. 라끼찐은 기회주의자였다. 내가 라끼찐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라끼찐이 성인들을 깔아 뭉게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소설은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즐거워하지. 난 소설의 이 문장에 몇 번씩 줄을 그었는지 모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반과 라끼찐을 통해 나 자신과 많은 머리만 존재하는 가슴이 없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가혹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알료샤를 닮아야 한다. 그는 이반, 라끼찐 보다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알료샤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것이 알료샤의 행동으로 나타나 주위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 자신의 말로 남들을 훈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묵묵히 행동만을 했다.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말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설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자. 그들은 매우 추악하고 비열하며 비겁하다. 소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조소하기도 하며 욕하기도 하며 꾸짖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비록 소설이 파국으로 끝났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그 추악한 소설 속 인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을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설 속 주인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장치해 놓았다.삶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듯이.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소설 속 알료샤의 한 대사를 보자.물론, 부자보다 가난 한 것이 몇 백배 더 낮지. 도스토예프스키는 불행과 악덕, 범죄 속에 빠져있는 소설 속 인물들에게 다른 선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고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문과도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겸손함과 소설적 기교를 말하고 싶다. 그는 하루키와는 틀리게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진리와 교훈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그것을 자랑하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듯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담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우선 강하게 뇌리에 남는 점은 작가의 대단한 내공이다. 방대한 작품속에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대화들은 정작 아주 짧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펼쳐진 것들이다. 이러한 수많은 장면들과 파편들을 입체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조립할 수 있다는 자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대단히 세밀하면서 지칠줄 모르는 성격과 심리묘사는 다름 사람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돋보인다.
이 책을 읽은 나도 좀 변해야겠다. 계산 적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가장 충실했던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결국에는 이루어냈던 미챠를 닮아야 한다. 소설을 읽은 후에 느끼는 점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미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명작을 남겼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진정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는 분명히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퇴고를 거듭했을 것이다. 알료샤의 스승인 조시마 장로는 알료샤를 속세로 보낸다. 그러나 그 자신도 자신이 떠나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파계의 힌트는 조시마 장로의 형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 한마디 말에 들어있다:\"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한 마디야말로 <까라마조프..>의 주제를 단숨에 설명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버지 까라마조프는 살해당하고, 드미트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극의 길을 걷게 되고, 이반은 병을 얻어 쓰러지고- 이 증오와 광기의 지옥도 속에서도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역설적인 희망은 바로 아이들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렇다. 수도원에서 다른 신도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독야청청하는 것도 하나의 위대한 삶일 수 있다. 그러나 속세에서 서로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아이들에게서 구원의 희망을 보고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5.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소설의 인물들 이반과 라끼찐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들과 몹시 닮았기 때문이다. 이반은 어떤가 무신론자인 그는 자신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단,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서 말이다. 라끼찐은 기회주의자였다. 내가 라끼찐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라끼찐이 성인들을 깔아 뭉게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소설은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즐거워하지. 난 소설의 이 문장에 몇 번씩 줄을 그었는지 모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반과 라끼찐을 통해 나 자신과 많은 머리만 존재하는 가슴이 없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가혹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알료샤를 닮아야 한다. 그는 이반, 라끼찐 보다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알료샤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것이 알료샤의 행동으로 나타나 주위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 자신의 말로 남들을 훈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묵묵히 행동만을 했다.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말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설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자. 그들은 매우 추악하고 비열하며 비겁하다. 소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조소하기도 하며 욕하기도 하며 꾸짖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비록 소설이 파국으로 끝났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그 추악한 소설 속 인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을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설 속 주인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장치해 놓았다.삶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듯이.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인가. 소설 속 알료샤의 한 대사를 보자.물론, 부자보다 가난 한 것이 몇 백배 더 낮지. 도스토예프스키는 불행과 악덕, 범죄 속에 빠져있는 소설 속 인물들에게 다른 선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고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문과도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겸손함과 소설적 기교를 말하고 싶다. 그는 하루키와는 틀리게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진리와 교훈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그것을 자랑하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듯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담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우선 강하게 뇌리에 남는 점은 작가의 대단한 내공이다. 방대한 작품속에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대화들은 정작 아주 짧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펼쳐진 것들이다. 이러한 수많은 장면들과 파편들을 입체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조립할 수 있다는 자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대단히 세밀하면서 지칠줄 모르는 성격과 심리묘사는 다름 사람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돋보인다.
이 책을 읽은 나도 좀 변해야겠다. 계산 적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가장 충실했던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결국에는 이루어냈던 미챠를 닮아야 한다. 소설을 읽은 후에 느끼는 점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미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명작을 남겼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진정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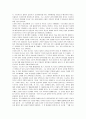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