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었다.
이와 같이 신라방이 생성된 것은 신라인˙구백제인의 개척정신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당의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통적인 이족지배책으로 이들을 한곳에 모여살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신라방은 당이 신라인에게 베푼 특별한 우대일 뿐 아니라 이민족문제를 완화ㆍ조정하는 기미책의 틀 속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신라방이 개설된 시점, 규모, 형태 및 성격을 중국사의 흐름에서 살펴보았다. 신라인의 중국진출은 무엇보다 신라가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한 후, 구백제인의 망명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신라인의 중국내왕을 촉진시킨 바탕은 당으로부터의 우대조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당시 빈번한 사절(使節)ㆍ숙위(宿衛)의 중국 파견은 바로 이를 조명하는 실증적 바탕이 된다. 이때 신라 사절의 서열은 언제나 동반(東畔)의 제1위였다.
신라인의 재당 거류지가 생겨난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새 삶의 터전을 닦으려는 합심된 노력의 소산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장보고라는 인물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당시 우호적이었던 나ㆍ당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파악하려 할 때, 신라방의 기원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후일 것이라는 추측과 조화를 이룬다. 장보고의 역할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방의 기원은 늦어도 현종(玄宗)의 천보(天寶)년 이전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산촌의 법화원은 글자그대로 신라인이 세운 사원임에는 틀림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신라인이 집단적으로 거류하고 있었던 중심자리였다. 이처럼 법화원이 재당 신라인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적어도 10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901년에 세워진 무염원(無染院)의 비문에서 나타난다. 이 비석에는 수십 명의 시주자(施主者)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계림인(鷄林人) 압아(押衙) 김청(金淸)이라는 이름이 주목을 끈다. 이는 당시 큰 역할을 한 시주자인 듯하다.
● 참고문헌
저서
申福龍 譯, 『入唐求法巡禮行記』(정신세계, 1991).
金文經ㆍ金成勳, 『張保皐』(李鎭出版社, 1993).
百有淸, 『圓仁』(吉川弘文館, 1989).
논문
李永澤, 「張保皐海上勢力에 관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1979).
卞 錫, 「9世紀 在唐 新羅坊의 性格에 관한 試論的 考察」(『人文論叢』3, 1992).
那波利貞, 「唐代の敦煌地方に ける朝鮮人の流寓に ぃて」(『文化史學』8910, 1954-56).
이와 같이 신라방이 생성된 것은 신라인˙구백제인의 개척정신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당의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통적인 이족지배책으로 이들을 한곳에 모여살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신라방은 당이 신라인에게 베푼 특별한 우대일 뿐 아니라 이민족문제를 완화ㆍ조정하는 기미책의 틀 속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신라방이 개설된 시점, 규모, 형태 및 성격을 중국사의 흐름에서 살펴보았다. 신라인의 중국진출은 무엇보다 신라가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한 후, 구백제인의 망명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신라인의 중국내왕을 촉진시킨 바탕은 당으로부터의 우대조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당시 빈번한 사절(使節)ㆍ숙위(宿衛)의 중국 파견은 바로 이를 조명하는 실증적 바탕이 된다. 이때 신라 사절의 서열은 언제나 동반(東畔)의 제1위였다.
신라인의 재당 거류지가 생겨난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새 삶의 터전을 닦으려는 합심된 노력의 소산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장보고라는 인물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당시 우호적이었던 나ㆍ당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파악하려 할 때, 신라방의 기원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후일 것이라는 추측과 조화를 이룬다. 장보고의 역할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방의 기원은 늦어도 현종(玄宗)의 천보(天寶)년 이전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산촌의 법화원은 글자그대로 신라인이 세운 사원임에는 틀림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신라인이 집단적으로 거류하고 있었던 중심자리였다. 이처럼 법화원이 재당 신라인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적어도 10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901년에 세워진 무염원(無染院)의 비문에서 나타난다. 이 비석에는 수십 명의 시주자(施主者)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계림인(鷄林人) 압아(押衙) 김청(金淸)이라는 이름이 주목을 끈다. 이는 당시 큰 역할을 한 시주자인 듯하다.
● 참고문헌
저서
申福龍 譯, 『入唐求法巡禮行記』(정신세계, 1991).
金文經ㆍ金成勳, 『張保皐』(李鎭出版社, 1993).
百有淸, 『圓仁』(吉川弘文館, 1989).
논문
李永澤, 「張保皐海上勢力에 관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1979).
卞 錫, 「9世紀 在唐 新羅坊의 性格에 관한 試論的 考察」(『人文論叢』3, 1992).
那波利貞, 「唐代の敦煌地方に ける朝鮮人の流寓に ぃて」(『文化史學』8910, 19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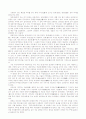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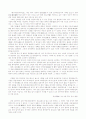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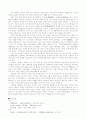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