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떼도적 감상문
1) 극작가 쉴러
2) 원작 분석
3) 공연 감상
2. 슬픔의 노래 감상문
3. 두타 감상문
4. 콘트라베이스 감상문
1) 내용 요약
2) 감상 및 비평
5. 템페스트 감상문
6. 느낌, 극락같은 연극감상문
1) 들어가며
2) 내용 요약
3) 감상 및 비평
1) 극작가 쉴러
2) 원작 분석
3) 공연 감상
2. 슬픔의 노래 감상문
3. 두타 감상문
4. 콘트라베이스 감상문
1) 내용 요약
2) 감상 및 비평
5. 템페스트 감상문
6. 느낌, 극락같은 연극감상문
1) 들어가며
2) 내용 요약
3) 감상 및 비평
본문내용
rlos, 1787』 집필에 착수했다. 그는 이미 상연된 작품에 의해 폭풍노도시대의 대표적 극작가로 군림하였으나, 그의 실생활은 경제난(재계약이 안 됨)과 병(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하였음) 때문에 고난의 생활을 면치 못했다. 1785년 친구 쾨르너(Gottfried Karner)의 호의로 그의 집에서 기거하면서부터 평온한 생활을 보내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 단편 『범죄자 Der Verbrecher aus verlorener Ehre, 1786』, 미완의 장편 『견령자(見靈者) Der Geiterseher, 1789』, 베토벤의 제 9교향곡으로 유명한 『환희에 붙혀서 An die Freude, 1785』, 폭풍노도에서 고전주의로 이행되는 전환기적인 희곡 『돈 카를로스 Don Carlos』 등이 이 시대의 수확이다.
2. 원작 분석
몇몇 질풍노도의 작가들이 이미 그들의 천재 미학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 17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쉴러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는 그의 처녀작 『군도 Die Rauber』(1781)를 가지고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질풍노도 시대를 시간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쉴러의 『군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질풍노도시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질풍노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쉴러의 『군도』에서 보여지는 질풍노도적인 성향들과 더불어 쉴러 드라마의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드라마 형식은 특별히 시대 비판적 성향이 짙은 질풍노도의 작가들에게 적합한 문학양식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드라마가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긴장과 대립들을, 그리고 젊은 작가들의 비극적인 세계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문학양식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렌쯔 J. M. R. Lenz 의『군인들 Die Soldaten』이나 『가정교사 Der Hofmeister』등 질풍노도시대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군도』에서도 봉건적 절대군주제 가운데서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대립관계가 긴장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카알 모어 Karl Moor는 그의 시대를 단지 전시대의 사적만을 되씹는 die Taten der Vorzeit wiederkauen 축 늘어진 거세된 세기 schlappe Kastratenjahrhundert(I-2)라고 비판하며 시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침없이 토로한다. 그리고 그는 건전한 본성을 무미한 전통으로부터 해방할 것을 선언한다: 법은 어떤 위대한 인물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유는 거대함과 극단적인 것을 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쉴러의 고민과 생각을 잘 알 수가 있다.
3. 공연 감상
지난 학기에 연극의 이해 레포트 덕에 공연을 보고 한 참 만에야 공연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 보는 날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한참만에 공연을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날의 공연은 전체적으로 맥이 빠찐 사이다 같은 느낌이었다.
국립극장의 외부 시스템(음향, 조명) 등은 참으로 소극장 무대와는 댈 것도 아니었다. 나 같은 무명소졸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히 셋팅 되어 있어서 굳이 흠을 잡을 점이 없었다. 다만 관객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다른 소극장에 비해 몇 배나 커서 배우들의 호흡을 느끼기가 힘들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을 알리는 보신각 같은 계열의 종이 울리고 천천히 감상을 시작하였다. 왕의 휠체어와 프란츠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왕의 휠체어에 걸려 있는 문장과 링거 병이 시야에 들어왔다. 링거병이 눈에 거슬렸다. 휠체어만으로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었을 텐데 링거병이라니. 병자를 표현하기에 링거병이란 참으로 좋은 소재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윤택씨가 아니라 다른 연출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안일한 소재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교묘한 은유라기 보다 허술한 서술이라는 생각에 눈살이 절로 찌부려졌다.
왕의 연기는 너무도 낮은 목소리 탓에 간간히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병자의 분위기에 그만한 목소리톤 이라면 만족스러울 정도였다. 프란츠의 연기는 언뜻 들으면 국어책 읽는 것 같았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는 목소리였다. 오히려 그러한 목소리를 창출해낸 배우가 놀라워 보였다.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캐릭터를 창출해 내기는 쉽지만 그러한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드러낸다는 것은 웬만한 내공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왕과 프란츠가 사라지자 카알 - 칼이라고 하지 않음은 한국의 주방 도구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 그의 친구들과 등장하였다. 카알 역할은 신구씨가 맡고 있었다. 그 나이에 무대에 울려 퍼지는 쩌렁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놀라웠다. 하지만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었는지 그의 대사에는 도적 두목다운 날카로움과 카리스마가 잘 배합되지 않았다. 숙련된 기술자라도 무거운 공구는 젊은 보조 기사가 잘 들어 올리 듯 공연 초부터 미스 캐스팅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느낌은 보헤미아의 숲 속 친구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여자 배우의 대사가 홀로 높게 찢어지면서 배우간의 조화를 망치고 있었다. 극 후반부에 젊은 아멜리아가 카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연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스러웠다. 5년도 더 전에 유인촌의 햄릿을 보고 충격을 먹은 후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삼스러운 느낌이었다.
공연을 보고 있노라니 배우들 간의 조화가 때때로 깨어지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보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일단은 배우들이 몹시 지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사람이 피로하면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는가! 공연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몇 배우의 지치고 집중력이 상실된 모습에서 배우들 간의 조화가 겉도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극 중 마지막에 아멜리아가 자기를 떠나지 말라며 카알 곁에서 몸부림치다가 카알과 부딪히는 장면이었다. 원래 부딪히는게 아닌 모양인데 아멜리아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격하게 연기하다가 카알에게 부
2. 원작 분석
몇몇 질풍노도의 작가들이 이미 그들의 천재 미학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 17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쉴러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는 그의 처녀작 『군도 Die Rauber』(1781)를 가지고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질풍노도 시대를 시간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쉴러의 『군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질풍노도시대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질풍노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쉴러의 『군도』에서 보여지는 질풍노도적인 성향들과 더불어 쉴러 드라마의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드라마 형식은 특별히 시대 비판적 성향이 짙은 질풍노도의 작가들에게 적합한 문학양식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드라마가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긴장과 대립들을, 그리고 젊은 작가들의 비극적인 세계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문학양식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렌쯔 J. M. R. Lenz 의『군인들 Die Soldaten』이나 『가정교사 Der Hofmeister』등 질풍노도시대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군도』에서도 봉건적 절대군주제 가운데서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대립관계가 긴장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카알 모어 Karl Moor는 그의 시대를 단지 전시대의 사적만을 되씹는 die Taten der Vorzeit wiederkauen 축 늘어진 거세된 세기 schlappe Kastratenjahrhundert(I-2)라고 비판하며 시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침없이 토로한다. 그리고 그는 건전한 본성을 무미한 전통으로부터 해방할 것을 선언한다: 법은 어떤 위대한 인물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유는 거대함과 극단적인 것을 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쉴러의 고민과 생각을 잘 알 수가 있다.
3. 공연 감상
지난 학기에 연극의 이해 레포트 덕에 공연을 보고 한 참 만에야 공연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 보는 날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한참만에 공연을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날의 공연은 전체적으로 맥이 빠찐 사이다 같은 느낌이었다.
국립극장의 외부 시스템(음향, 조명) 등은 참으로 소극장 무대와는 댈 것도 아니었다. 나 같은 무명소졸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히 셋팅 되어 있어서 굳이 흠을 잡을 점이 없었다. 다만 관객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다른 소극장에 비해 몇 배나 커서 배우들의 호흡을 느끼기가 힘들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을 알리는 보신각 같은 계열의 종이 울리고 천천히 감상을 시작하였다. 왕의 휠체어와 프란츠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왕의 휠체어에 걸려 있는 문장과 링거 병이 시야에 들어왔다. 링거병이 눈에 거슬렸다. 휠체어만으로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었을 텐데 링거병이라니. 병자를 표현하기에 링거병이란 참으로 좋은 소재이지만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윤택씨가 아니라 다른 연출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안일한 소재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교묘한 은유라기 보다 허술한 서술이라는 생각에 눈살이 절로 찌부려졌다.
왕의 연기는 너무도 낮은 목소리 탓에 간간히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병자의 분위기에 그만한 목소리톤 이라면 만족스러울 정도였다. 프란츠의 연기는 언뜻 들으면 국어책 읽는 것 같았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는 목소리였다. 오히려 그러한 목소리를 창출해낸 배우가 놀라워 보였다.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캐릭터를 창출해 내기는 쉽지만 그러한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드러낸다는 것은 웬만한 내공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왕과 프란츠가 사라지자 카알 - 칼이라고 하지 않음은 한국의 주방 도구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 그의 친구들과 등장하였다. 카알 역할은 신구씨가 맡고 있었다. 그 나이에 무대에 울려 퍼지는 쩌렁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놀라웠다. 하지만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었는지 그의 대사에는 도적 두목다운 날카로움과 카리스마가 잘 배합되지 않았다. 숙련된 기술자라도 무거운 공구는 젊은 보조 기사가 잘 들어 올리 듯 공연 초부터 미스 캐스팅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느낌은 보헤미아의 숲 속 친구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여자 배우의 대사가 홀로 높게 찢어지면서 배우간의 조화를 망치고 있었다. 극 후반부에 젊은 아멜리아가 카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연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스러웠다. 5년도 더 전에 유인촌의 햄릿을 보고 충격을 먹은 후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삼스러운 느낌이었다.
공연을 보고 있노라니 배우들 간의 조화가 때때로 깨어지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보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일단은 배우들이 몹시 지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사람이 피로하면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는가! 공연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몇 배우의 지치고 집중력이 상실된 모습에서 배우들 간의 조화가 겉도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극 중 마지막에 아멜리아가 자기를 떠나지 말라며 카알 곁에서 몸부림치다가 카알과 부딪히는 장면이었다. 원래 부딪히는게 아닌 모양인데 아멜리아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격하게 연기하다가 카알에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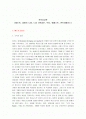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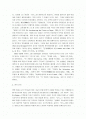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