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nd proportion
9)색채/ Colour
단일색 조화/ 예 - (핑크+빨강+심홍색)
인접색 조화/ 예 - (연두+노랑+귤색+주황) (녹색+연두+노랑+귤색)
보색 조화/ 예 - (빨강+파랑) (파랑+ 주황) (남색+귤색) (노랑+보라)
근접보색 조화/ 예 - (빨강+연두, 빨강+청록) (주황+청록, 주황+남색)
분열보색 조화/ 예 - (빨강+연두+청록) (주황+청록+남색) (귤색+파랑+보라)
(노랑+남색+자주) (연두+빨강+보라) (녹색+자주+다홍)
. 형상/ Figure디자인
. 시팅/ Sheeting 형상
기포성 폼으로 흡수성과 비흡수성이있다.
. 모싱/ Mossing
25㎜철망을 이용 뭉쳐 나가며 형태를 제작
. 콜라주/ Collage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나 말린 꽃잎 등 여러 가지 혼합 재료에 이한 표현 기법이다.
. 오브제/ Object
신선한 재료. 저장 재료. 인조 재료)등이 있으며 예술적 차원으로 높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 현수/ Hanging 디자인
벽에 걸거나 천장에 매달아 장식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벽걸이. 현수 플라워볼.의자에 걸어 장식하는 엔드 디자인)퓨엔드 디자인은 결혼식에 많이 장식되며 옆모습과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지점이 주요 감사위치이다.
화예 디자인의 역사적 배경
<동양>
동양에서는 고대 기우제나 액제 등의 제단에 바치던 헌화나 부족의 상징용 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불교의 승려들이 항아리에 꽃을 꽂아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중국으로 전래되어 꽃꽂이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6조시대 이전에 이미 화훼 그림이 등장하고, 당나라 때에는 화조도와 모란도 등이 자연색으로 채색되고, 당시에 꽃을 항아리에 꽂는 것이 체계화되었다. 송나라 때에는 수반을 이용한 꽃꽂이가 등장하였고, 명나라 때에는 꽃꽂이의 예술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나라 때는 꽃장식의 감상을 중시하였다. 중국에서는 크기가 크고 대칭적으로 항아리와 대조된 화려한 색깔의 1~2종의 꽃을 이용하되, 가벼운 색깔은 가장자리에 두고 무거운 색깔은 가운데 꽂았다. 이러한 중국의 꽃꽂이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었고, 6세기경에 한국을 거쳐 중국의 꽃꽂이 기법이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전래되었다.
일본의 승려 이케나보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꽃예술과 의식을 다듬었고, 최초의 일본식 꽃꽂이 학교 이케나보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뒤에 ‘꽃에 생명을 준다’는 의미의 이케바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꽃꽂이는 잦은 전쟁 등으로 명맥이 뚜렷하게 유지될 수 없었으나, 이론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도입된 디자인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 동양식 꽃꽂이의 주류로 취급받고 있다.
한국의 꽃꽂이도 그 기원이 오래 되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수로부인의 헌화가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많지 않다. 삼국시대에는 불교 등의 신앙에서 신을 섬기기 위하여 소나무, 연꽃, 대나무, 괴석, 그리고 화병을 이용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꽃꽂이가 사용되었음이 무속도, 사당도, 불정심다라니경 등에 나타난다. 뒤에 외래문화 등과 어울려 조형미를 갖추었는데, 삼각형 구성의 꽃꽂이가 삼국시대의 불교의식에 쓰인 꽃 디자인에서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등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연등회나 궁중가례에 꽃을 사용하였다. 불교가 성행하였던 이 시대의 공양화는 의식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수덕사 벽화 야생화도를 보면 많은 꽃을 좌우대칭형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분재와 꽃꽂이 등에 관해서는 『양화소록』, 『산림경제』, 그리고 『임원십육지』등의 전문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원풍속도, 오륜행실도, 궁중의식도 등의 그림을 통하여 마른 소재, 주지와 부지의 개념, 청화백자, 대나무 바구니, 조화와 균형의 미, 국화 등의 꽃과 과일이 종교, 신분, 지역과 관계없이 화훼장식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식 꽃꽂이에서는 식물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가지와 꽃을 조심스럽게 꽂는다. 각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가 꽂힌 각도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양식 꽃꽂이는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을 강조하는 선의 디자인이며, 형식화된 엄격한 규칙을 가진 단순한 디자인이다. 침봉을 이용하여 꽃을 꽂되 형태, 질감, 색깔, 특히 선과 드러나지 않는 음의 공간을 강조한다.
<서양>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꽃과 식물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 특히 향기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① 종교적 의식
②질병치료
③귀신
9)색채/ Colour
단일색 조화/ 예 - (핑크+빨강+심홍색)
인접색 조화/ 예 - (연두+노랑+귤색+주황) (녹색+연두+노랑+귤색)
보색 조화/ 예 - (빨강+파랑) (파랑+ 주황) (남색+귤색) (노랑+보라)
근접보색 조화/ 예 - (빨강+연두, 빨강+청록) (주황+청록, 주황+남색)
분열보색 조화/ 예 - (빨강+연두+청록) (주황+청록+남색) (귤색+파랑+보라)
(노랑+남색+자주) (연두+빨강+보라) (녹색+자주+다홍)
. 형상/ Figure디자인
. 시팅/ Sheeting 형상
기포성 폼으로 흡수성과 비흡수성이있다.
. 모싱/ Mossing
25㎜철망을 이용 뭉쳐 나가며 형태를 제작
. 콜라주/ Collage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나 말린 꽃잎 등 여러 가지 혼합 재료에 이한 표현 기법이다.
. 오브제/ Object
신선한 재료. 저장 재료. 인조 재료)등이 있으며 예술적 차원으로 높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 현수/ Hanging 디자인
벽에 걸거나 천장에 매달아 장식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벽걸이. 현수 플라워볼.의자에 걸어 장식하는 엔드 디자인)퓨엔드 디자인은 결혼식에 많이 장식되며 옆모습과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지점이 주요 감사위치이다.
화예 디자인의 역사적 배경
<동양>
동양에서는 고대 기우제나 액제 등의 제단에 바치던 헌화나 부족의 상징용 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불교의 승려들이 항아리에 꽃을 꽂아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중국으로 전래되어 꽃꽂이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6조시대 이전에 이미 화훼 그림이 등장하고, 당나라 때에는 화조도와 모란도 등이 자연색으로 채색되고, 당시에 꽃을 항아리에 꽂는 것이 체계화되었다. 송나라 때에는 수반을 이용한 꽃꽂이가 등장하였고, 명나라 때에는 꽃꽂이의 예술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나라 때는 꽃장식의 감상을 중시하였다. 중국에서는 크기가 크고 대칭적으로 항아리와 대조된 화려한 색깔의 1~2종의 꽃을 이용하되, 가벼운 색깔은 가장자리에 두고 무거운 색깔은 가운데 꽂았다. 이러한 중국의 꽃꽂이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었고, 6세기경에 한국을 거쳐 중국의 꽃꽂이 기법이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전래되었다.
일본의 승려 이케나보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꽃예술과 의식을 다듬었고, 최초의 일본식 꽃꽂이 학교 이케나보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뒤에 ‘꽃에 생명을 준다’는 의미의 이케바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꽃꽂이는 잦은 전쟁 등으로 명맥이 뚜렷하게 유지될 수 없었으나, 이론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도입된 디자인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 동양식 꽃꽂이의 주류로 취급받고 있다.
한국의 꽃꽂이도 그 기원이 오래 되었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수로부인의 헌화가 등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많지 않다. 삼국시대에는 불교 등의 신앙에서 신을 섬기기 위하여 소나무, 연꽃, 대나무, 괴석, 그리고 화병을 이용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꽃꽂이가 사용되었음이 무속도, 사당도, 불정심다라니경 등에 나타난다. 뒤에 외래문화 등과 어울려 조형미를 갖추었는데, 삼각형 구성의 꽃꽂이가 삼국시대의 불교의식에 쓰인 꽃 디자인에서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등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연등회나 궁중가례에 꽃을 사용하였다. 불교가 성행하였던 이 시대의 공양화는 의식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수덕사 벽화 야생화도를 보면 많은 꽃을 좌우대칭형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분재와 꽃꽂이 등에 관해서는 『양화소록』, 『산림경제』, 그리고 『임원십육지』등의 전문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원풍속도, 오륜행실도, 궁중의식도 등의 그림을 통하여 마른 소재, 주지와 부지의 개념, 청화백자, 대나무 바구니, 조화와 균형의 미, 국화 등의 꽃과 과일이 종교, 신분, 지역과 관계없이 화훼장식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식 꽃꽂이에서는 식물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가지와 꽃을 조심스럽게 꽂는다. 각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가 꽂힌 각도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양식 꽃꽂이는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을 강조하는 선의 디자인이며, 형식화된 엄격한 규칙을 가진 단순한 디자인이다. 침봉을 이용하여 꽃을 꽂되 형태, 질감, 색깔, 특히 선과 드러나지 않는 음의 공간을 강조한다.
<서양>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꽃과 식물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 특히 향기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① 종교적 의식
②질병치료
③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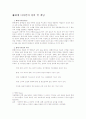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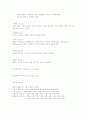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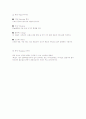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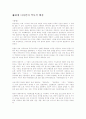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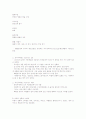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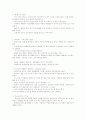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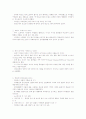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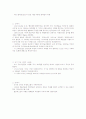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