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외래어 표기법
2.1. 외래어의 정의
2.2. 외래어의 귀화과정과 기준
2.3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2.4 외래어 표기법
Ⅲ.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3.1 표기의 기본원칙의 문제
3.2 표기 세칙의 문제
3.3 인명, 지명표기의 원칙의 문제
Ⅳ. 외래어 표기법의 오용 사례
Ⅴ. 결론 및 해결방안
Ⅱ. 외래어 표기법
2.1. 외래어의 정의
2.2. 외래어의 귀화과정과 기준
2.3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2.4 외래어 표기법
Ⅲ.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3.1 표기의 기본원칙의 문제
3.2 표기 세칙의 문제
3.3 인명, 지명표기의 원칙의 문제
Ⅳ. 외래어 표기법의 오용 사례
Ⅴ.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은 외래어 중에서도 인명, 지명, 고유명사 등을 다루고는 세부 규정이다.
Ⅲ.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3.1 표기 규정의 문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년 1월 7일)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미 제정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규정이다.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언어의 교류도 활발해졌음을 감안할 때 20년간 들어온 말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아직 그대로인 것이다. 물론 외래어 표기 세칙은 국가별로 하나하나 정리되어 발표하고 있다고 하나 그 큰 틀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시대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1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의 문제점
제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로만 적는다.
제 1항에서 외래어는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24자모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모음 중에서 자음 14자(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ㅌ,ㅍ,ㅎ), 모음 10자(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40개의 자모를 사용한다. 위에 표시한 24자모 의외에도 \'ㄲ,ㄸ,ㅃ,ㅆ,ㅉ\'의 경음 된소리와 \'ㅐ,ㅒ,ㅔ,ㅘ,ㅙ,ㅚ,ㅞ,ㅟ,ㅢ,\'의 모음들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에는 24자모로 한정시켜 현실음에 가까운 발음 적기를 외면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지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소리와 이중모음을 배재하여 다양한 발음을 소화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언중들의 언어습관에서는 많은 된소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황재성, 같은 논문, 24쪽.
외국어의 언어를 충실히 표기하기 위하여 없어진 옛 언어를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유성파열음 [β]과 순경음 \'\'과 관계를 지어 표기하고, [z]를 \'\'으로 적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도 기능이 다하여 없어진 음운을 다시 사용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장음기호 \':\'나 \'-\'를 사용하여 우리말에 찾기 힘든 장단음을 구별하고 악센트, 성조 등을 문자에 기호를 덧붙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자에 기호를 첨가시켜 적는다는 것은 번거롭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외래어는 언어체계 속으로 들어와 우리 국어가 된 것이기에 국어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으면 될 것이다. 이강만, 2001,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4~16쪽.
제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라는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규정은 있으나 예외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해설에서는 외국어의 1음운이 그 음성환경에 따라 국어의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음운 1기호 원칙이 무리이며, 이러한 때에 한해서 간혹 두 기호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예상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 음성기호와 국어의 자모 대조표에서 보듯이, 꼭 1음운을 1 기호로 적지 않고 있으며 실제 외국어의 발음 현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외래어의 경우 1음운 1기호 표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있고, 하나로 단순화 되어 있으나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p], [t], [k], [], [w] 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b], [d], [g], [s]의 경우가 후자의 해당한다. 위의 논문 17쪽.
[p], [t], [k]의 경우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모음 앞에서 ‘ㅍ’, ‘ㅌ’, ‘ㅋ’로 적고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ㅂ, 프’, ‘ㅅ, 트’, ‘ㄱ, 크’ 로 적는 다고 규정 되어 있다. 어두나 모음 앞에서의 표기와 어말에서의 표기가 두 가지로 제 2항의 1음운 1기호를 어기고 있다. ‘원칙적’에서 벗어난 예이다. 이는 제 3항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는 원칙과 상호 충돌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우리말의 받침이 어원을 밝히거나 고려하여 발음이 나지 않음에도 적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황재성, 2006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b], [d], [g], [s]의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형행 표기법에서 [b], [d], [g], [s]는 ‘ㅂ, ㄷ, ㄱ, ㅅ’로 대응 된다. 하지만 언중들의 언어 습관에서 ‘ㅃ, ㄸ, ㄲ ,ㅆ’의 발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글의 표기는 언어의 현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경우 된소리로도 표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항의 1음운 1기호 원칙은 원칙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1음운 1기호 원칙에서 벗어난 예
국제
음성
기호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음운 2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예
p
ㅍ
ㅂ, 프
b
ㅂ
브
t
ㅌ
ㅅ, 트
d
ㄷ
드
k
ㅋ
ㄱ, 크
g
ㄱ
그
f
ㅍ
프
v
ㅂ
브
θ
ㅅ
스
o
ㄷ
드
s
ㅅ
스
z
ㅈ
즈
시
슈, 시
ㅈ
지
ts
ㅊ
츠
dz
ㅈ
즈
t
ㅊ
치
ㅈ
지
m
ㅁ
ㅁ
n
ㄴ
ㄴ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h
ㅎ
흐
c
ㅎ
히
x
ㅎ
흐
제 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종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언어생활 속에서 여러 받침들을 쓰는데 이것은 어원이나 어디에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감안하여 적고 있는 것이다. 외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에 들어와 우리말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한계를 가진다. 지적한 것을 예로 표현하면 북[book]은 그 어원을 밝혀 써서 \'
Ⅲ.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3.1 표기 규정의 문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년 1월 7일)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미 제정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규정이다.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언어의 교류도 활발해졌음을 감안할 때 20년간 들어온 말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아직 그대로인 것이다. 물론 외래어 표기 세칙은 국가별로 하나하나 정리되어 발표하고 있다고 하나 그 큰 틀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시대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1 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의 문제점
제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로만 적는다.
제 1항에서 외래어는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24자모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모음 중에서 자음 14자(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ㅌ,ㅍ,ㅎ), 모음 10자(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40개의 자모를 사용한다. 위에 표시한 24자모 의외에도 \'ㄲ,ㄸ,ㅃ,ㅆ,ㅉ\'의 경음 된소리와 \'ㅐ,ㅒ,ㅔ,ㅘ,ㅙ,ㅚ,ㅞ,ㅟ,ㅢ,\'의 모음들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에는 24자모로 한정시켜 현실음에 가까운 발음 적기를 외면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지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소리와 이중모음을 배재하여 다양한 발음을 소화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언중들의 언어습관에서는 많은 된소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황재성, 같은 논문, 24쪽.
외국어의 언어를 충실히 표기하기 위하여 없어진 옛 언어를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유성파열음 [β]과 순경음 \'\'과 관계를 지어 표기하고, [z]를 \'\'으로 적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도 기능이 다하여 없어진 음운을 다시 사용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장음기호 \':\'나 \'-\'를 사용하여 우리말에 찾기 힘든 장단음을 구별하고 악센트, 성조 등을 문자에 기호를 덧붙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자에 기호를 첨가시켜 적는다는 것은 번거롭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외래어는 언어체계 속으로 들어와 우리 국어가 된 것이기에 국어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으면 될 것이다. 이강만, 2001,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4~16쪽.
제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라는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규정은 있으나 예외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해설에서는 외국어의 1음운이 그 음성환경에 따라 국어의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음운 1기호 원칙이 무리이며, 이러한 때에 한해서 간혹 두 기호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예상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 음성기호와 국어의 자모 대조표에서 보듯이, 꼭 1음운을 1 기호로 적지 않고 있으며 실제 외국어의 발음 현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외래어의 경우 1음운 1기호 표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있고, 하나로 단순화 되어 있으나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p], [t], [k], [], [w] 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b], [d], [g], [s]의 경우가 후자의 해당한다. 위의 논문 17쪽.
[p], [t], [k]의 경우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모음 앞에서 ‘ㅍ’, ‘ㅌ’, ‘ㅋ’로 적고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ㅂ, 프’, ‘ㅅ, 트’, ‘ㄱ, 크’ 로 적는 다고 규정 되어 있다. 어두나 모음 앞에서의 표기와 어말에서의 표기가 두 가지로 제 2항의 1음운 1기호를 어기고 있다. ‘원칙적’에서 벗어난 예이다. 이는 제 3항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는 원칙과 상호 충돌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우리말의 받침이 어원을 밝히거나 고려하여 발음이 나지 않음에도 적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황재성, 2006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b], [d], [g], [s]의 경우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형행 표기법에서 [b], [d], [g], [s]는 ‘ㅂ, ㄷ, ㄱ, ㅅ’로 대응 된다. 하지만 언중들의 언어 습관에서 ‘ㅃ, ㄸ, ㄲ ,ㅆ’의 발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글의 표기는 언어의 현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경우 된소리로도 표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항의 1음운 1기호 원칙은 원칙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1음운 1기호 원칙에서 벗어난 예
국제
음성
기호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음운 2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예
p
ㅍ
ㅂ, 프
b
ㅂ
브
t
ㅌ
ㅅ, 트
d
ㄷ
드
k
ㅋ
ㄱ, 크
g
ㄱ
그
f
ㅍ
프
v
ㅂ
브
θ
ㅅ
스
o
ㄷ
드
s
ㅅ
스
z
ㅈ
즈
시
슈, 시
ㅈ
지
ts
ㅊ
츠
dz
ㅈ
즈
t
ㅊ
치
ㅈ
지
m
ㅁ
ㅁ
n
ㄴ
ㄴ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h
ㅎ
흐
c
ㅎ
히
x
ㅎ
흐
제 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종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언어생활 속에서 여러 받침들을 쓰는데 이것은 어원이나 어디에서 변화되어 왔는지를 감안하여 적고 있는 것이다. 외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에 들어와 우리말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한계를 가진다. 지적한 것을 예로 표현하면 북[book]은 그 어원을 밝혀 써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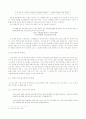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