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이의 역사와 기원, 종이 어원의 유래
1.종이의 어원 유래
2.종이의 기원
3.종이의 역사
4.종이의 전파
1)중국의 종이 역사
2)유럽의 종이 역사
3) 우리나라 종이의 역사
5.제지기술의 발달과정
6.종이의 조건
7.종이의 제작과정
1.종이의 어원 유래
2.종이의 기원
3.종이의 역사
4.종이의 전파
1)중국의 종이 역사
2)유럽의 종이 역사
3) 우리나라 종이의 역사
5.제지기술의 발달과정
6.종이의 조건
7.종이의 제작과정
본문내용
에는 \'닥나무 껍질을 맷돌로 갈아서 종이를 만든다\'는 기록이 있어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닥나무를 이용한 제지 기술을 터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그 제작 년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많은 종이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가운데서도 고구려는 시사를 기록하여 유기(留記)라는 책 100권을 편찬 하였으며, 영양왕(?陽王) 11년 경신에는 이문진 등이 이것을 다시 간추려 신집(新集)5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에 이미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 종이를 처음 만들어 썼다는 후한의 채륜보다 100년이나 앞서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보다 시기가 더 앞서는 내용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일본서기에 284년에 백제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 천자문과 논어 등이 종이 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3,4세기경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서적이 있었고 7세기경에는 우리나라 제지술이 일본에 전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춘삼월에 고구려왕이 담징과 법정이라는 두 승려를 일본왕에게 보냈다\'고 하였는데 담징은 그림 물감과 종이, 먹 만드는 법을 알고있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백추지(白錘紙)가 생산되었는데 이 종이는 중국에서조차 \'천하에 비할 수 없는 종이 \'라 예찬한 바 있고 삼국 유사에는 진덕여왕 원년에 종이로 연(鳶)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
고려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종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시기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유가에서 서적 출판이 성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종이 만드는 것을 장려하였는데 고려사에는 닥나무 심는 것을 장려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 또 인종 23년에서 명종 16년에 걸쳐 전국에 닥나무를 재배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지장은 공조서(供造署)에 예속되어 있었다. 또한 특정물 생산처인 \'소(所)\'가 운영 되었는데 지소(紙所)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려의 닥종이는 밝은 빛을 내므로 모두들 좋아하며 이를 일러 백추지(白錘紙)라 한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을 볼 때 고려시대에서도 신라에 이어서 계속 백추지(白錘紙)를 생산하였던 것 같다. 이 밖에도 견사지(繭絲紙), 아청지(鴉靑紙)와 같은 질이 좋은 종이를 생산하였고 또 감지(紺紙),취지(翠紙),상지(橡紙),자지(紫紙),다지(茶紙) 등의 색지도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종이는 고려 때처럼 공물의 하나였다. 종이를 공물로 바친 지방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 도였다. 그 가운데 서도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라도 전주와 남원 으로 명(明)?청(淸)에 대한 사대의 예로 쓰일 종이의 대부분이 이 두 지역의 생산품으로 충당되었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조공과 교린을 위한 회사(回賜)에 쓸 아주 질 높은 종이를 전주 남원 양쪽 지방에서만 만들어 바치게 하였으므로 종말에는 과중한 징수로 인한 폐단이 심하였고 종이마저 조악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문서와 서책의 간행이 대단이 활발하여 종이가 널리 파급되었고 종이를 다루는 경공도 배첩장(종이 등을 여러 겹 포개서 붙이는 일을 하는 공장) ,도련장(종이의 네 가장자리나 제본한 책의 세 가장자리를 고르게 자르는 공장),도침장(피륙이나 종이 같은 것을 다듬잇돌에 다듬이질 하여 반드럽게 하는 일을 맡아 하는 공장) 등으로 세분 되었다. 이들과 각 지방 관아에 예속된 향공(鄕工)들이 각자의 소임에 따라 한지로 기물들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또 민간 내에서의 제작도 활발해 다양한 한지 공예품과 생활 소품 등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종이는 표전(表箋),자문(咨文) 등 문서와 서책으로 이용되었고 저폐(화폐로 통용되던 종이),지갑 등에서부터 부의(賻儀),창호도배,입모(笠帽),시전(詩箋),선자(扇子,부채),습자용 묵책 등 그 용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의 명으로 1415년에 조지소(造紙所) 가 설치 되었고 세조 12년에는 이를 조지서(造紙署)로 개편하여 한지 생산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조지서(造紙署)는 고종 19년 까지 존속하면서 인쇄술의 발달과 향교,서원,서당의 설치로 급증하는 서책류의 수요와 더불어 기타 생활 용품의 보급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한지의 수요를 감당하였다.
세종 2년에는 지금의 세검정에 조지서를 두어 자문,표천,기차를 비롯하여 인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색지를 만들게 했다. 이 밖에도 고정지,유엽지,유목지,의이지,마고지,왜지 등을 생산하여 전주,남원 지방의 책공의 폐를 덜게 하였고 종이 질도 좋아 졌다고 한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는 성종 6년에 지장 박화증(朴化曾)이 사은사를 따라 중국에 가서 그곳 제지 법을 배워 왔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제지법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성종 연간에는 제지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은 물이끼를 닥 섬유에 섞어 만든 태지를 고안하였다고 한다.
또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종이의 산지로 전남 순창을 들고 있는데 이곳은 근세까지 \'오분백지\'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제지업이 활발한 지역은 전주,의령,월성,제천,남원,산청,단양,울진,삼척,명주 등지 였다.
훨씬 후대인 1932년에 중앙시험소가 전국 13개 도에서 제지의 표본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함경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98종의 종이를 채집하였다. 그 가운데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속지,월명지,피지,소지,분백지,진지,사고지,초지,백로지,갑면지,접선지 등의 종이가 있었다.
이렇듯 예전에는 많은 종이가 만들어져 공예품에 쓰였지만 지금은 그 이름만 전할 뿐 종이 질과 모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미루어 어디에 쓰였던 종인지는 짐작할수 있다. 예컨데 초도지(初塗紙)는 도배시 초벌을 바를 때 쓰였던 것이며 농선지는 전라도 용담에서 나는 부채를 만드는 종이이고,능화지(菱花紙)는 주로 반자지로 쓰였던 마름꽃 무늬가 있는 종이이다. 입모지(笠帽紙)는 글자 그대로 모자를 만들 때 쓰는 종이,갑의지(甲衣紙)는 갑옷을 만들 때 쓰이는 종이,갑쌈지는 쌈지를 만들
그러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보다 시기가 더 앞서는 내용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일본서기에 284년에 백제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 천자문과 논어 등이 종이 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3,4세기경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서적이 있었고 7세기경에는 우리나라 제지술이 일본에 전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춘삼월에 고구려왕이 담징과 법정이라는 두 승려를 일본왕에게 보냈다\'고 하였는데 담징은 그림 물감과 종이, 먹 만드는 법을 알고있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백추지(白錘紙)가 생산되었는데 이 종이는 중국에서조차 \'천하에 비할 수 없는 종이 \'라 예찬한 바 있고 삼국 유사에는 진덕여왕 원년에 종이로 연(鳶)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
고려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종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시기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유가에서 서적 출판이 성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종이 만드는 것을 장려하였는데 고려사에는 닥나무 심는 것을 장려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 또 인종 23년에서 명종 16년에 걸쳐 전국에 닥나무를 재배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지장은 공조서(供造署)에 예속되어 있었다. 또한 특정물 생산처인 \'소(所)\'가 운영 되었는데 지소(紙所)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려의 닥종이는 밝은 빛을 내므로 모두들 좋아하며 이를 일러 백추지(白錘紙)라 한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을 볼 때 고려시대에서도 신라에 이어서 계속 백추지(白錘紙)를 생산하였던 것 같다. 이 밖에도 견사지(繭絲紙), 아청지(鴉靑紙)와 같은 질이 좋은 종이를 생산하였고 또 감지(紺紙),취지(翠紙),상지(橡紙),자지(紫紙),다지(茶紙) 등의 색지도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종이는 고려 때처럼 공물의 하나였다. 종이를 공물로 바친 지방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 도였다. 그 가운데 서도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라도 전주와 남원 으로 명(明)?청(淸)에 대한 사대의 예로 쓰일 종이의 대부분이 이 두 지역의 생산품으로 충당되었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조공과 교린을 위한 회사(回賜)에 쓸 아주 질 높은 종이를 전주 남원 양쪽 지방에서만 만들어 바치게 하였으므로 종말에는 과중한 징수로 인한 폐단이 심하였고 종이마저 조악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문서와 서책의 간행이 대단이 활발하여 종이가 널리 파급되었고 종이를 다루는 경공도 배첩장(종이 등을 여러 겹 포개서 붙이는 일을 하는 공장) ,도련장(종이의 네 가장자리나 제본한 책의 세 가장자리를 고르게 자르는 공장),도침장(피륙이나 종이 같은 것을 다듬잇돌에 다듬이질 하여 반드럽게 하는 일을 맡아 하는 공장) 등으로 세분 되었다. 이들과 각 지방 관아에 예속된 향공(鄕工)들이 각자의 소임에 따라 한지로 기물들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또 민간 내에서의 제작도 활발해 다양한 한지 공예품과 생활 소품 등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종이는 표전(表箋),자문(咨文) 등 문서와 서책으로 이용되었고 저폐(화폐로 통용되던 종이),지갑 등에서부터 부의(賻儀),창호도배,입모(笠帽),시전(詩箋),선자(扇子,부채),습자용 묵책 등 그 용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의 명으로 1415년에 조지소(造紙所) 가 설치 되었고 세조 12년에는 이를 조지서(造紙署)로 개편하여 한지 생산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조지서(造紙署)는 고종 19년 까지 존속하면서 인쇄술의 발달과 향교,서원,서당의 설치로 급증하는 서책류의 수요와 더불어 기타 생활 용품의 보급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한지의 수요를 감당하였다.
세종 2년에는 지금의 세검정에 조지서를 두어 자문,표천,기차를 비롯하여 인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색지를 만들게 했다. 이 밖에도 고정지,유엽지,유목지,의이지,마고지,왜지 등을 생산하여 전주,남원 지방의 책공의 폐를 덜게 하였고 종이 질도 좋아 졌다고 한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는 성종 6년에 지장 박화증(朴化曾)이 사은사를 따라 중국에 가서 그곳 제지 법을 배워 왔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제지법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성종 연간에는 제지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은 물이끼를 닥 섬유에 섞어 만든 태지를 고안하였다고 한다.
또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종이의 산지로 전남 순창을 들고 있는데 이곳은 근세까지 \'오분백지\'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제지업이 활발한 지역은 전주,의령,월성,제천,남원,산청,단양,울진,삼척,명주 등지 였다.
훨씬 후대인 1932년에 중앙시험소가 전국 13개 도에서 제지의 표본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함경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98종의 종이를 채집하였다. 그 가운데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속지,월명지,피지,소지,분백지,진지,사고지,초지,백로지,갑면지,접선지 등의 종이가 있었다.
이렇듯 예전에는 많은 종이가 만들어져 공예품에 쓰였지만 지금은 그 이름만 전할 뿐 종이 질과 모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미루어 어디에 쓰였던 종인지는 짐작할수 있다. 예컨데 초도지(初塗紙)는 도배시 초벌을 바를 때 쓰였던 것이며 농선지는 전라도 용담에서 나는 부채를 만드는 종이이고,능화지(菱花紙)는 주로 반자지로 쓰였던 마름꽃 무늬가 있는 종이이다. 입모지(笠帽紙)는 글자 그대로 모자를 만들 때 쓰는 종이,갑의지(甲衣紙)는 갑옷을 만들 때 쓰이는 종이,갑쌈지는 쌈지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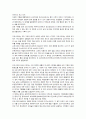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