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2. 최근 남한의 고구려사 연구현황
3.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동향
맺 음 말
2. 최근 남한의 고구려사 연구현황
3.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동향
맺 음 말
본문내용
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로 바뀌었다.
제2편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최근 북한에서 발굴된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는 글 등 19편을 실고 있다.
1.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 건국과 그 의의(남일룡)
2. 고구려의 소국통합과정에 대하여(강세권)
3.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력사적 의의(김덕성)
4. 고구려의 령역확대과정에 대하여(손영종)
5. 조선력대국가들의 계승관계에서 본 고구려의 위치에 대하여(손영종)
6.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손영종)
7. 조국의 존엄을 지켜낸 고구려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김유철)
8.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기풍(김은택)
9. 고구려가 동아시아 문화발전에 논 역할(송순탁)
10. 평양은 세계에 자랑높은 력사의 도시(박일화)
11. 동명왕릉과 정릉사에 대하여(전제현)
12. 고구려 무덤벽화의 특성(손수호)
13. 고구려 산성의 특징(지승철)
14.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리승혁)
15.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력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조희승)
16. 선진대국 고구려가 고대 일본에 준 정치문화적 영향(조희승)
17. 고구려 수기와막새의 기하무늬에 대하여(윤광수)
18. 국내성 도읍시기 수도 방위체계에 대하여(최승택)
19. 새로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들에 대하여(김경삼)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송죽리 등에서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최근에 발굴된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3호 벽화무덤,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벽화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읍벽화무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벽화무덤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맺 음 말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 이후 남한과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남한에서는 많은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저서들이 발간되었다. 대부분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비판하고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한국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대중을 목표로 한 대중교양서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맞물려 고구려의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연구저서도 출간이 되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하여 저서로서 발간한 것들이다.
북한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크게 쟁점화하지 않았으나 ‘동명왕 출생 2300돐기념 학술발표회’를 통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고구려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새로 발굴된 고구려고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내부용이나마 책으로 편집되었다. 처음에는 남북 공동의 고구려에 대한 학술회의나 사진전시회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7월 1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9월 10일과 11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으로 학술회의와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앞으로는 남과 북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며 나아가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북한과 남한의 고구려 자료들을 모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의 학자들이 남과 북의 고구려 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전시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편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최근 북한에서 발굴된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는 글 등 19편을 실고 있다.
1.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 건국과 그 의의(남일룡)
2. 고구려의 소국통합과정에 대하여(강세권)
3.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력사적 의의(김덕성)
4. 고구려의 령역확대과정에 대하여(손영종)
5. 조선력대국가들의 계승관계에서 본 고구려의 위치에 대하여(손영종)
6.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손영종)
7. 조국의 존엄을 지켜낸 고구려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김유철)
8.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기풍(김은택)
9. 고구려가 동아시아 문화발전에 논 역할(송순탁)
10. 평양은 세계에 자랑높은 력사의 도시(박일화)
11. 동명왕릉과 정릉사에 대하여(전제현)
12. 고구려 무덤벽화의 특성(손수호)
13. 고구려 산성의 특징(지승철)
14.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리승혁)
15.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력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조희승)
16. 선진대국 고구려가 고대 일본에 준 정치문화적 영향(조희승)
17. 고구려 수기와막새의 기하무늬에 대하여(윤광수)
18. 국내성 도읍시기 수도 방위체계에 대하여(최승택)
19. 새로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들에 대하여(김경삼)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송죽리 등에서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최근에 발굴된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3호 벽화무덤,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벽화무덤, 황해북도 은파군 읍벽화무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벽화무덤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맺 음 말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 이후 남한과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남한에서는 많은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저서들이 발간되었다. 대부분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비판하고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한국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대중을 목표로 한 대중교양서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맞물려 고구려의 고분과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연구저서도 출간이 되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하여 저서로서 발간한 것들이다.
북한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크게 쟁점화하지 않았으나 ‘동명왕 출생 2300돐기념 학술발표회’를 통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고구려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새로 발굴된 고구려고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내부용이나마 책으로 편집되었다. 처음에는 남북 공동의 고구려에 대한 학술회의나 사진전시회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7월 1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9월 10일과 11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으로 학술회의와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앞으로는 남과 북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며 나아가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북한과 남한의 고구려 자료들을 모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의 학자들이 남과 북의 고구려 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전시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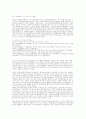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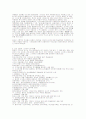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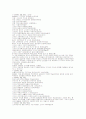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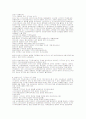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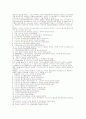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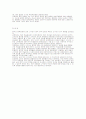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