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는 글
Ⅱ. 인문학에 물들기
◈ 삼인성호(三人成虎)
◈ 발묘조장(拔苗助長)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 용연향과 사람의 향기
◈ 德勝才
◈ 절제와 겸손은 관계론의 최고 형태
◈ 공정함을 유지하라
Ⅲ. 맺는 글
Ⅱ. 인문학에 물들기
◈ 삼인성호(三人成虎)
◈ 발묘조장(拔苗助長)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 용연향과 사람의 향기
◈ 德勝才
◈ 절제와 겸손은 관계론의 최고 형태
◈ 공정함을 유지하라
Ⅲ. 맺는 글
본문내용
성스럽고 충성스런 사람을 이른다. 또한 사람을 쓸 때는 서로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라야 한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시력이 같은 인재라야 같은 물건을 볼 수 있고, 청력이 같은 인재라야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마음과 덕을 가진 인재라야 서로 가까이 해서 사랑할 수 있으며, 소리의 주파수가 같으면 설사 다른 지역에서라도 서로 호응할 수 있다.”
< 정진홍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3- 에서>
◈ 절제와 겸손은 관계론의 최고 형태
『주역』사상을 계사전에서는 단 세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가 그것입니다. “역이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진리를 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하다는 것은 사물의 변화가 궁극에 이른 상태, 즉 양적 변화와 양적 축척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적 변화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通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열린 상황은 답보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久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철학적 구도 이외에 매우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사상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절제사상입니다. 일례로 乾爲天卦의 상구 효사에 황룡유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은 후회한다는 경계입니다. 초로 만들어진 날개를 달고 있는 이카루소가 너무 높이 날아오르자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은 변화의 철학입니다. 변화를 사전에 읽어냄으로써 대응할 수 있고, 또 변화 그 자체를 조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란 바로 이 변화의 조직,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겸손이란 자기가 구성하고 조직한 관계망의 상대성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법이 로마 이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한 관계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택된 여러 부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 이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구성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지인을 망라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주관적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영복 -강의- 에서 >
◈ 공정함을 유지하라
퇴계 선생이 이색, 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등 여러 군자에 대해 모두 논한 바가 있다. 그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감추지 않았다. 이는 진실로 지극히 공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감히 사사로이 좋아함을 가지고 가리어 덮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의 시대에는 말하는 자는 공정하게 말하고, 듣는 자는 공저하게 들었다. 근세에는 파당 짓는 습속이 고질이 되어,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를 높여 배운 대로 따르는 末學을 으뜸가는 스승으로 받든다. 사사로이 미워하는 바를 배척하여 덕이 우뚝한 큰 선비를 曲士라 물리친다. 말하는 것이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아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도산사숙록〕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면 안 된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패거리 짓기는 공부의 가장 으뜸가는 도적이다. 공변됨을 잃으면 학문도 없고 인간도 없다. 공정하게 말했는데 삐딱하게 받으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을 갈라 말하고 덩달아 부화뇌동하면 가망이 없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그른 이치는 없다. 다 좋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大公至正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정민 -다산어록청상- 에서>
Ⅲ. 맺는 글
<고전의 향연>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고전은 세월의 담금질을 이겨낸 인류 지성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야말로 저 깊고 높은 산에 숨어 있는 광맥이며, 사막 가장 깊은 곳을 흐르고 있는 지하수이다. 그러나 고전이란, 바로 앞의 수사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광맥이나, 어디에 있는지 짚어내지 못하면 소용없다. 지하수나, 수맥을 찾지 못하면 퍼 올릴 수 없다. 그것을 만나러 떠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벼락같은 축복이라는 것이 있다.” 여전히 광맥이나 수맥을 짚어내지는 못했으나 인문학 속을 걷는 일은 번잡한 일상에서, 소소하게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시력이 같은 인재라야 같은 물건을 볼 수 있고, 청력이 같은 인재라야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마음과 덕을 가진 인재라야 서로 가까이 해서 사랑할 수 있으며, 소리의 주파수가 같으면 설사 다른 지역에서라도 서로 호응할 수 있다.”
< 정진홍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3- 에서>
◈ 절제와 겸손은 관계론의 최고 형태
『주역』사상을 계사전에서는 단 세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가 그것입니다. “역이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진리를 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하다는 것은 사물의 변화가 궁극에 이른 상태, 즉 양적 변화와 양적 축척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적 변화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通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열린 상황은 답보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久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철학적 구도 이외에 매우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사상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절제사상입니다. 일례로 乾爲天卦의 상구 효사에 황룡유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용은 후회한다는 경계입니다. 초로 만들어진 날개를 달고 있는 이카루소가 너무 높이 날아오르자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은 변화의 철학입니다. 변화를 사전에 읽어냄으로써 대응할 수 있고, 또 변화 그 자체를 조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란 바로 이 변화의 조직,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겸손이란 자기가 구성하고 조직한 관계망의 상대성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법이 로마 이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한 관계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택된 여러 부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 이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구성한 세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지인을 망라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주관적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영복 -강의- 에서 >
◈ 공정함을 유지하라
퇴계 선생이 이색, 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등 여러 군자에 대해 모두 논한 바가 있다. 그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감추지 않았다. 이는 진실로 지극히 공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감히 사사로이 좋아함을 가지고 가리어 덮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의 시대에는 말하는 자는 공정하게 말하고, 듣는 자는 공저하게 들었다. 근세에는 파당 짓는 습속이 고질이 되어,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를 높여 배운 대로 따르는 末學을 으뜸가는 스승으로 받든다. 사사로이 미워하는 바를 배척하여 덕이 우뚝한 큰 선비를 曲士라 물리친다. 말하는 것이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아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도산사숙록〕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면 안 된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패거리 짓기는 공부의 가장 으뜸가는 도적이다. 공변됨을 잃으면 학문도 없고 인간도 없다. 공정하게 말했는데 삐딱하게 받으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을 갈라 말하고 덩달아 부화뇌동하면 가망이 없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그른 이치는 없다. 다 좋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大公至正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정민 -다산어록청상- 에서>
Ⅲ. 맺는 글
<고전의 향연>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고전은 세월의 담금질을 이겨낸 인류 지성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야말로 저 깊고 높은 산에 숨어 있는 광맥이며, 사막 가장 깊은 곳을 흐르고 있는 지하수이다. 그러나 고전이란, 바로 앞의 수사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광맥이나, 어디에 있는지 짚어내지 못하면 소용없다. 지하수나, 수맥을 찾지 못하면 퍼 올릴 수 없다. 그것을 만나러 떠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벼락같은 축복이라는 것이 있다.” 여전히 광맥이나 수맥을 짚어내지는 못했으나 인문학 속을 걷는 일은 번잡한 일상에서, 소소하게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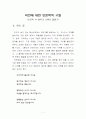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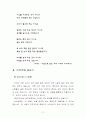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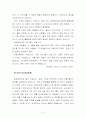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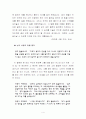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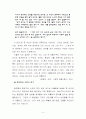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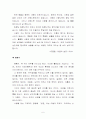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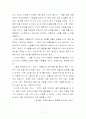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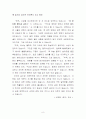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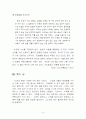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