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송문화의 확산
1. 활발한 문화 교류
2. 문인들의 활동
Ⅲ. 고려 전기 한시의 송시풍 양상
1. 用事의 중시
2. 정교한 묘사
3. 議論의 중시
Ⅳ. 결론
Ⅱ. 송문화의 확산
1. 활발한 문화 교류
2. 문인들의 활동
Ⅲ. 고려 전기 한시의 송시풍 양상
1. 用事의 중시
2. 정교한 묘사
3. 議論의 중시
Ⅳ. 결론
본문내용
글씨, 음악 등 예술작품을 소재로 한 것이 많아진다. 이러한 특징은 唐代 杜甫와 白居易의 시에 이미 나타났던 것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宋代에 더욱 확대되었다. 작법의 측면에서 송풍은 의론을 주로 하고 구법에 있어서는 산문화의 경향이 강하다.
의 한시가 수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고려 전기에서 송시풍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전기에서 송시풍은 用事를 중시하거나, 묘사를 정교하게 하거나, 議論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1. 用事의 중시
송시풍의 특질 중 하나는 以古爲新 소식 <題柳子厚詩二首> ≪蘇軾文集≫ 권67: 詩須要有爲而作 用事當以故爲新 以俗爲雅 好奇務新 乃詩之病.
의 논리로 典故를 활용한 用事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江西詩派 시인들은 특히 독서를 중시하였는데, 오태석 ≪황정견시연구≫, 대구, 경북대출판부, 1991.
이것은 구법의 차원에서 전대 시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고의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독서와 학문을 중시하는 태도는 후배들에게 용사와 구법의 강화로 나아가게 하여 당시와 구별되는 송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황정견의 시는 박학다식한 독서를 바탕으로 허다한 전고와 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정견의 시가 읽기 어려운 것은 전고의 다용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 점은 學詩를 우선으로 하는 송시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송용준오태석이치수 ≪송시사≫, 서울, 역락, 2004. 408쪽.
전고는 기왕에 존재하던 문학적, 역사적 전통을 詩作에 끌어들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모든 글자마다 내력이 없는 것이 없다는 평을 받은 황정견의 창작방법에서 보듯이, 강서시파에 있어 전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시를 짓기 위해서는 用事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사의 활용은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고려 전기인 12세기에 들어오면서 용사의 활용은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경학 강론이 활발해지고 유학이 보편화되었던 예종인종 연간의 유교적 성향의 문인들은 주로 彫蟲篆刻이란 평어의 형태로 당시 유행하던 문풍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그들은 六經과 古學, 고인의 글을 조충전각으로 이루어진 사장과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전자는 마땅히 추구해야할 것이지만, 후자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곧 조충전각으로 명명된 사장은 백성을 교화시키며 좋은 풍속을 이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조충전각한 사장에 대해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비판한 조충전각은 대체로 경전과 관련 없는 유미적이며 기교적인 시어의 조탁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교를 피하며 시에 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사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용사는 대부분 성현의 말씀과 관련이 있으며, 근거 있고 도덕성을 함축하면서 비유와 암시 등의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① 공은 대개 章句를 일삼지 않았다. 화답하는 시를 짓더라도 갑자기 말을 내어 사람을 놀라게 하려 하지 않았다. 더욱 문사를 잘하고 그 부염한 체 중에는 청사의 골격이 있었다. (중략) 문하의 秀士 임종비가 시의 서문을 올렸는데 그 대략을 이르면 “배를 타고 상국에 가니 북방학자들이 앞서지 못했으며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오니 東都에 사는 주인들이 然히 탄식 하네” (중략) 공이 이걸 보고 그 인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옛말을 들어서 지금의 일을 서술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대구도 매우 잘 되었다.” ≪보한집≫ 권상: 公率不事章句 如有和答之作 率爾出語 不欲驚人 尤長於文辭 富艶中有淸之骨 (중략) 門下秀士林宗庇 獻詩引略云 乘航歸上國 北方學者莫之先 衣錦還故鄕 東都主人然嘆 (중략) 公覽之美其引曰 擧前言今事甚的 又對屬甚善.
② 예종이 일찍이 莎樓 앞에 행차하니 木芍藥이 활짝 피어 있거늘 禁署의 儒士들에게 7言 6韻의 刻燭詩를 짓게 했더니 東宮의 寮佐 安寶麟이 장원을 했고 등급에 따라 푸짐하게 하사품을 내렸다. 그 때 康日用 선생이 시로써 천하에 이름이 났는데 왕은 그의 작품을 보고 싶었다. 강은 촛불이 다 되었을 무렵에야 겨우 一聯을 지어 소매 속에 넣은 채 御溝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內侍에게 급히 가져오게 하여 보니 ‘흰 머리 취한 노인 전각의 뒤에서 보고, 눈 밝은 늙은 선비 난간 가에 의지했네’라고 적혀 있었다. 그 用事가 精妙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왕이 歎賞하여 마지않으면서 하는 말이 ‘이는 옛사람들이 이르는 이른바 臼頭花鈿滿面이 西施의 半粧만도 못하다라고 할 만하다’하고 위로하여 보냈다. 이인로 ≪파한집≫ 권상: 睿宗‥‥嘗御莎樓前 有木芍藥盛開 命禁署諸儒 刻燭賦七言六韻詩 東宮寮佐安寶麟爲之魁 隨科級恩例尤厚 時康先生日用 詩名動天下 上心佇觀其作 燭垂盡 得一聯 袖其紙 伏御溝中 上命小黃門遽取之 題云 頭白醉翁看殿後 眼明儒老倚欄邊 其用事精妙如此 上歎賞不已曰 此古人所謂 臼頭花鈿滿面 不若西施半粧 諭慰遣之.
③ 강일용이 御試에서 占韻하여 눈을 읊은 시에는 “소리는 漁翁의 도롱이를 쫓아 위포로 돌아가고 자취는 중의 지팡이를 따라 천대로 들어가네”라고 했다. 이것은 强韻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공교로웠다. ≪보한집≫ 권하: 康日用御試占韻 賦雪云 聲逐漁歸渭浦 迹隨僧杖入天台 此押强韻甚工.
①에서 권적은 자신이 章句를 일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적이 평소에 부화한 사장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종비의 작품에 대하여 “옛말을 들어서 지금의 일을 서술한 것이 잘되었다”고 호평하였는데, 이것은 用事를 중시하는 권적의 詩觀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왕이 강일용의 시를 보고 감탄하였는데, 그 이유는 용사의 정묘함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용사의 정묘함을 중시하는 당시 시풍을 짐작케 해준다.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詩會에 대한 강일용의 비판적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천하에 시로써 이름을 날리던 강일용이 7언 6운의 刻燭詩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신하들이 시간을 다투어 시를 짓는 것과는 달리, 단지 한 연만 지었을 뿐이다. 단순히 시간에
의 한시가 수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고려 전기에서 송시풍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전기에서 송시풍은 用事를 중시하거나, 묘사를 정교하게 하거나, 議論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1. 用事의 중시
송시풍의 특질 중 하나는 以古爲新 소식 <題柳子厚詩二首> ≪蘇軾文集≫ 권67: 詩須要有爲而作 用事當以故爲新 以俗爲雅 好奇務新 乃詩之病.
의 논리로 典故를 활용한 用事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江西詩派 시인들은 특히 독서를 중시하였는데, 오태석 ≪황정견시연구≫, 대구, 경북대출판부, 1991.
이것은 구법의 차원에서 전대 시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고의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독서와 학문을 중시하는 태도는 후배들에게 용사와 구법의 강화로 나아가게 하여 당시와 구별되는 송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황정견의 시는 박학다식한 독서를 바탕으로 허다한 전고와 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정견의 시가 읽기 어려운 것은 전고의 다용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 점은 學詩를 우선으로 하는 송시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송용준오태석이치수 ≪송시사≫, 서울, 역락, 2004. 408쪽.
전고는 기왕에 존재하던 문학적, 역사적 전통을 詩作에 끌어들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모든 글자마다 내력이 없는 것이 없다는 평을 받은 황정견의 창작방법에서 보듯이, 강서시파에 있어 전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시를 짓기 위해서는 用事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사의 활용은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고려 전기인 12세기에 들어오면서 용사의 활용은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경학 강론이 활발해지고 유학이 보편화되었던 예종인종 연간의 유교적 성향의 문인들은 주로 彫蟲篆刻이란 평어의 형태로 당시 유행하던 문풍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그들은 六經과 古學, 고인의 글을 조충전각으로 이루어진 사장과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전자는 마땅히 추구해야할 것이지만, 후자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곧 조충전각으로 명명된 사장은 백성을 교화시키며 좋은 풍속을 이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조충전각한 사장에 대해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비판한 조충전각은 대체로 경전과 관련 없는 유미적이며 기교적인 시어의 조탁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교를 피하며 시에 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사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용사는 대부분 성현의 말씀과 관련이 있으며, 근거 있고 도덕성을 함축하면서 비유와 암시 등의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① 공은 대개 章句를 일삼지 않았다. 화답하는 시를 짓더라도 갑자기 말을 내어 사람을 놀라게 하려 하지 않았다. 더욱 문사를 잘하고 그 부염한 체 중에는 청사의 골격이 있었다. (중략) 문하의 秀士 임종비가 시의 서문을 올렸는데 그 대략을 이르면 “배를 타고 상국에 가니 북방학자들이 앞서지 못했으며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오니 東都에 사는 주인들이 然히 탄식 하네” (중략) 공이 이걸 보고 그 인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옛말을 들어서 지금의 일을 서술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대구도 매우 잘 되었다.” ≪보한집≫ 권상: 公率不事章句 如有和答之作 率爾出語 不欲驚人 尤長於文辭 富艶中有淸之骨 (중략) 門下秀士林宗庇 獻詩引略云 乘航歸上國 北方學者莫之先 衣錦還故鄕 東都主人然嘆 (중략) 公覽之美其引曰 擧前言今事甚的 又對屬甚善.
② 예종이 일찍이 莎樓 앞에 행차하니 木芍藥이 활짝 피어 있거늘 禁署의 儒士들에게 7言 6韻의 刻燭詩를 짓게 했더니 東宮의 寮佐 安寶麟이 장원을 했고 등급에 따라 푸짐하게 하사품을 내렸다. 그 때 康日用 선생이 시로써 천하에 이름이 났는데 왕은 그의 작품을 보고 싶었다. 강은 촛불이 다 되었을 무렵에야 겨우 一聯을 지어 소매 속에 넣은 채 御溝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內侍에게 급히 가져오게 하여 보니 ‘흰 머리 취한 노인 전각의 뒤에서 보고, 눈 밝은 늙은 선비 난간 가에 의지했네’라고 적혀 있었다. 그 用事가 精妙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왕이 歎賞하여 마지않으면서 하는 말이 ‘이는 옛사람들이 이르는 이른바 臼頭花鈿滿面이 西施의 半粧만도 못하다라고 할 만하다’하고 위로하여 보냈다. 이인로 ≪파한집≫ 권상: 睿宗‥‥嘗御莎樓前 有木芍藥盛開 命禁署諸儒 刻燭賦七言六韻詩 東宮寮佐安寶麟爲之魁 隨科級恩例尤厚 時康先生日用 詩名動天下 上心佇觀其作 燭垂盡 得一聯 袖其紙 伏御溝中 上命小黃門遽取之 題云 頭白醉翁看殿後 眼明儒老倚欄邊 其用事精妙如此 上歎賞不已曰 此古人所謂 臼頭花鈿滿面 不若西施半粧 諭慰遣之.
③ 강일용이 御試에서 占韻하여 눈을 읊은 시에는 “소리는 漁翁의 도롱이를 쫓아 위포로 돌아가고 자취는 중의 지팡이를 따라 천대로 들어가네”라고 했다. 이것은 强韻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공교로웠다. ≪보한집≫ 권하: 康日用御試占韻 賦雪云 聲逐漁歸渭浦 迹隨僧杖入天台 此押强韻甚工.
①에서 권적은 자신이 章句를 일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적이 평소에 부화한 사장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종비의 작품에 대하여 “옛말을 들어서 지금의 일을 서술한 것이 잘되었다”고 호평하였는데, 이것은 用事를 중시하는 권적의 詩觀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왕이 강일용의 시를 보고 감탄하였는데, 그 이유는 용사의 정묘함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용사의 정묘함을 중시하는 당시 시풍을 짐작케 해준다.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詩會에 대한 강일용의 비판적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천하에 시로써 이름을 날리던 강일용이 7언 6운의 刻燭詩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신하들이 시간을 다투어 시를 짓는 것과는 달리, 단지 한 연만 지었을 뿐이다. 단순히 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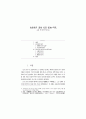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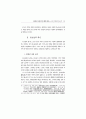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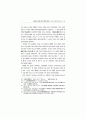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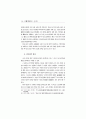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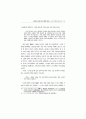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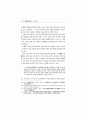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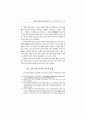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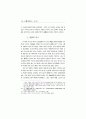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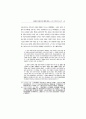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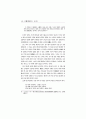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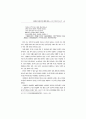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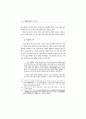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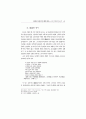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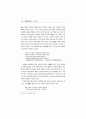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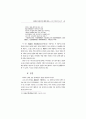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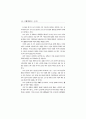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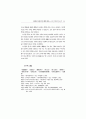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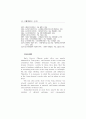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