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소설에서 희곡으로의 장르 변경
Ⅲ. 연극성의 확대와 시극 가능성
Ⅳ. 여백의 미
Ⅳ. 결론
Ⅱ. 소설에서 희곡으로의 장르 변경
Ⅲ. 연극성의 확대와 시극 가능성
Ⅳ. 여백의 미
Ⅳ. 결론
본문내용
차림으로 하늘사자인 백골이 내려오면서, 왕자와 왕비의 머리를 아무렇게나 바랑에 쳐넣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각설이 타령이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비극적 인물들의 내적 독백 이후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타령이다. 일면 관련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극의 대단원에서 극중 노래를 통해서만 하늘 사자의출현과 전체 희곡 주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주를 이루는 작품의 대사와 지문은 함축성과 서정성이 강한 ‘극시’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비극적 주제의 무게와 연관성이 있으며, 여백을 통한 의미의 강조를 위한 시도이며 연극적 상상력을 확대시킨다.
즉 인물의 내적 갈등과 환상이 얽힌 극의 구조는 처음과 끝의 플롯 장치로 이루어진 ‘제의’와 연계되어 인물의 의지가 극한으로 표현되지만 한계점이 함께 노출되는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Ⅳ. 결론
본문Ⅲ는 최인훈 희곡의 시극의 가능성을 형식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며 본문Ⅳ은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시극’이라는 독립된 장르적 고찰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언급은 한계로 남는다. 그러므로 소설과 희곡을 ‘갈등’의 문학으로 분류될 때 시극은 한정적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에 ‘장르들’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일보다 시적 환기의 몇 가지 원리가 각각의 작품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데 머물고 있다. 이 글은 최인훈의 글쓰기 여정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탐색에 있다고 보고 종교성에 주목하여 쓰려고 하는 초고이다.
또한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주를 이루는 작품의 대사와 지문은 함축성과 서정성이 강한 ‘극시’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비극적 주제의 무게와 연관성이 있으며, 여백을 통한 의미의 강조를 위한 시도이며 연극적 상상력을 확대시킨다.
즉 인물의 내적 갈등과 환상이 얽힌 극의 구조는 처음과 끝의 플롯 장치로 이루어진 ‘제의’와 연계되어 인물의 의지가 극한으로 표현되지만 한계점이 함께 노출되는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Ⅳ. 결론
본문Ⅲ는 최인훈 희곡의 시극의 가능성을 형식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며 본문Ⅳ은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시극’이라는 독립된 장르적 고찰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언급은 한계로 남는다. 그러므로 소설과 희곡을 ‘갈등’의 문학으로 분류될 때 시극은 한정적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에 ‘장르들’을 총괄적으로 분류하는 일보다 시적 환기의 몇 가지 원리가 각각의 작품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데 머물고 있다. 이 글은 최인훈의 글쓰기 여정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탐색에 있다고 보고 종교성에 주목하여 쓰려고 하는 초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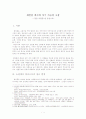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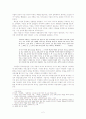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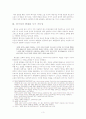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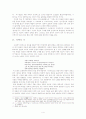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