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bstract
1. 서 론
2. 하이퍼코스트의 기본구조, 원리 및 명칭
3. 하이퍼코스트와 테르마에
4. 하이퍼코스트-잊혀졌던 난방기술
5. 하이퍼코스트와 올림피아 유적
6. 하이퍼코스트와 오라타(Orata)란 인물
7. 하이퍼코스트와 주거난방
8. 중세의 바닥난방
9.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2. 하이퍼코스트의 기본구조, 원리 및 명칭
3. 하이퍼코스트와 테르마에
4. 하이퍼코스트-잊혀졌던 난방기술
5. 하이퍼코스트와 올림피아 유적
6. 하이퍼코스트와 오라타(Orata)란 인물
7. 하이퍼코스트와 주거난방
8. 중세의 바닥난방
9.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배경과 Marienburg의 수도원이 ‘기사회’수도원이란 점에서 이곳의 난방법은 로마의 하이퍼코스트기술을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십자군원정과 함께 유럽의 성직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곳에 남아있던 욕장들과 하이퍼코스트 시설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억으로 모방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Franz-Pascha, Die Baukunst des Islam, Handbuch der Architektur II, 3권, p. 159, Fusch 앞책 p. 98-99
어쨌든 유럽사람들의 난방방식은 벽난로나 카헬오펜이었으며 19세기중반까지 일반적으로 로마시대에 그런 바닥난방기술이 존재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하이퍼코스트는 폼페이의 발굴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원 등에서 유사한 기술이 사용된 몇몇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원리들이 로마의 기술이 그대로 전승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9. 결 론
이상에서 하이퍼코스트의 발전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중요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퍼코스트는 한국문화의 온돌과 매우 유사한, 기준에 따라서는 동일한 난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하이퍼코스트는 기원전 100년경 고대 그리스말기문화에서 욕장시설의 난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욕장시설은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활동과 관련되어 발전된 것으로 믿어진다. 발상지는 Olmpia 또는 지중해의 그리스문화권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대로마의 기술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하이퍼코스트”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 목욕문화는 로마시대의 목욕문화로 계승되고 바닥난방기술인 하이퍼코스트도 계승되고 더욱 발전된다. 기원후 1세기경부터는 주거의 非 목욕공간의 난방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하이퍼코스트는 4세기경 로마의 멸망과 함께 잊혀져 갔고 폼페이 발굴이 시작된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는 거의 잊혀졌던 난방기술로 간주된다. 중세에 몇몇 유사한 난방법이 사용되었으나 하이퍼코스트 기술의 중단 없는 계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또한 기술수준도 고대의 것보다 발전적이라 볼 수 없다.
넷째, 하이퍼코스트는 주로 욕장의 난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용 난방으로 사용된 경우도 한국의 온돌과 달리 취사와 연계되지 않았다.
하이퍼코스트에 관련되는 유적과 연구는 수없이 많다.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과 나라들, 특히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하였고 새로운 유적들이 발굴되면 또다시 주목받곤 한다. 유적들의 대다수는 욕장건축물들이고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개별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연구들은 많지만 유럽에서도 종합 정리한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고 자료들 중 가장 폭넓게 다루어진 것으로 E. Brodner, W. Heinz, D. Krencker의 저작물들이 될것이다(참고문헌 참조).
따라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면 개관하기 어렵다. 또한 발전사의 몇몇 부분은 유럽에서도 아직 합의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전통난방이 아니고 바닥난방은 천년이상 잊혀졌던 데서 오는 한계로 보인다. 그런 문제의 해명에는 대대로 바닥난방을 사용해온 한국인들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양에서는 한국의 온돌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문제의 하나가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유보되었지만 “로마인들은 바닥난방법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벽체난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문제이다.
난방법은 고고학적, 건축사적, 설비적 문제만이 아니다. 한 문화의 건축구조, 생활문화양식의 형성과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더욱이 같은 난방법이 고대로부터 동, 서 兩문화에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승발전 측면에서는 다른 운명을 겪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서양에서는 50년대에 로마시대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난방효과가 믿어지지 않아 시험용 건물을 짓고 실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온돌의 존재를, 그리고 어느 집이나 바닥난방법으로 난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와서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의 연구에 많은 수고를 덜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Marcus Vitruv Pollio, De architectura decem= Zehn Bucher uber Architektur, ubersetzt v. Curt Fensterbusch, Wissenschaftliche Buch- gesellschaft, Darmstadt, Germany, 1991
2. Emil Kunze, Hans Schleif, IV. Bericht uber die Ausgrabungen in Olympia, Walter de Gruyter, Berlin, Germany, 1944
3. Alfred Mallwitz, Olympia und seine Baute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 stadt, Germany, 1972
4. Fritz Kretzschmer, Hypokausten, Bericht des Saalburgmuseums XII, in Saalburg Jahrbuch, Walter de Gruyter, Berlin, Germany, 1953
5. Gustav Fusch, Uber die Hypokausten-Heizungen und mittelalterliche Heizanlagen, Dissertation, Technische Hochschule zu Hannover,
Germany, 1910
6. Hans Eschebach, Die Stabianer Thermen in Pompeji, Walter de Gruyter, Berlin, 1979
7. Werner Heinz, Romische Thermen, Hirmer, Munchen, Germany, 1983
8. Gaius Plinius Caecilius Sekundus / Helmut Kasten역, Briefe, Artemis, Munchen,
Germany, 1990
9. Nam-Ung Kim, Stehendes und liegendes Feuer, Beispiel, Darmstadt, Germany, 1994
어쨌든 유럽사람들의 난방방식은 벽난로나 카헬오펜이었으며 19세기중반까지 일반적으로 로마시대에 그런 바닥난방기술이 존재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하이퍼코스트는 폼페이의 발굴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원 등에서 유사한 기술이 사용된 몇몇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원리들이 로마의 기술이 그대로 전승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9. 결 론
이상에서 하이퍼코스트의 발전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중요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퍼코스트는 한국문화의 온돌과 매우 유사한, 기준에 따라서는 동일한 난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하이퍼코스트는 기원전 100년경 고대 그리스말기문화에서 욕장시설의 난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욕장시설은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활동과 관련되어 발전된 것으로 믿어진다. 발상지는 Olmpia 또는 지중해의 그리스문화권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대로마의 기술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하이퍼코스트”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 목욕문화는 로마시대의 목욕문화로 계승되고 바닥난방기술인 하이퍼코스트도 계승되고 더욱 발전된다. 기원후 1세기경부터는 주거의 非 목욕공간의 난방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하이퍼코스트는 4세기경 로마의 멸망과 함께 잊혀져 갔고 폼페이 발굴이 시작된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는 거의 잊혀졌던 난방기술로 간주된다. 중세에 몇몇 유사한 난방법이 사용되었으나 하이퍼코스트 기술의 중단 없는 계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또한 기술수준도 고대의 것보다 발전적이라 볼 수 없다.
넷째, 하이퍼코스트는 주로 욕장의 난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용 난방으로 사용된 경우도 한국의 온돌과 달리 취사와 연계되지 않았다.
하이퍼코스트에 관련되는 유적과 연구는 수없이 많다.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과 나라들, 특히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하였고 새로운 유적들이 발굴되면 또다시 주목받곤 한다. 유적들의 대다수는 욕장건축물들이고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개별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연구들은 많지만 유럽에서도 종합 정리한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고 자료들 중 가장 폭넓게 다루어진 것으로 E. Brodner, W. Heinz, D. Krencker의 저작물들이 될것이다(참고문헌 참조).
따라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면 개관하기 어렵다. 또한 발전사의 몇몇 부분은 유럽에서도 아직 합의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전통난방이 아니고 바닥난방은 천년이상 잊혀졌던 데서 오는 한계로 보인다. 그런 문제의 해명에는 대대로 바닥난방을 사용해온 한국인들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양에서는 한국의 온돌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문제의 하나가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유보되었지만 “로마인들은 바닥난방법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벽체난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문제이다.
난방법은 고고학적, 건축사적, 설비적 문제만이 아니다. 한 문화의 건축구조, 생활문화양식의 형성과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더욱이 같은 난방법이 고대로부터 동, 서 兩문화에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승발전 측면에서는 다른 운명을 겪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서양에서는 50년대에 로마시대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난방효과가 믿어지지 않아 시험용 건물을 짓고 실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온돌의 존재를, 그리고 어느 집이나 바닥난방법으로 난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와서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의 연구에 많은 수고를 덜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Marcus Vitruv Pollio, De architectura decem= Zehn Bucher uber Architektur, ubersetzt v. Curt Fensterbusch, Wissenschaftliche Buch- gesellschaft, Darmstadt, Germany, 1991
2. Emil Kunze, Hans Schleif, IV. Bericht uber die Ausgrabungen in Olympia, Walter de Gruyter, Berlin, Germany, 1944
3. Alfred Mallwitz, Olympia und seine Baute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 stadt, Germany, 1972
4. Fritz Kretzschmer, Hypokausten, Bericht des Saalburgmuseums XII, in Saalburg Jahrbuch, Walter de Gruyter, Berlin, Germany, 1953
5. Gustav Fusch, Uber die Hypokausten-Heizungen und mittelalterliche Heizanlagen, Dissertation, Technische Hochschule zu Hannover,
Germany, 1910
6. Hans Eschebach, Die Stabianer Thermen in Pompeji, Walter de Gruyter, Berlin, 1979
7. Werner Heinz, Romische Thermen, Hirmer, Munchen, Germany, 1983
8. Gaius Plinius Caecilius Sekundus / Helmut Kasten역, Briefe, Artemis, Munchen,
Germany, 1990
9. Nam-Ung Kim, Stehendes und liegendes Feuer, Beispiel, Darmstadt, Germany,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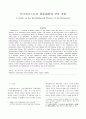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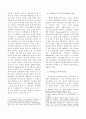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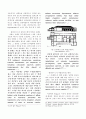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