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우수성
1. 문학적 우수성
2. 기계화에서의 한글의 우수성
Ⅲ.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유래
Ⅳ.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맞춤법
Ⅴ.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인도문자기원설
Ⅵ.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히브리문자기원설
Ⅶ.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과 한글전용
Ⅷ.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과 한글이름
Ⅸ.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인식
Ⅹ.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Ⅱ.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우수성
1. 문학적 우수성
2. 기계화에서의 한글의 우수성
Ⅲ.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유래
Ⅳ.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맞춤법
Ⅴ.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인도문자기원설
Ⅵ.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히브리문자기원설
Ⅶ.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과 한글전용
Ⅷ.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과 한글이름
Ⅸ.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인식
Ⅹ.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Ⅲ.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유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글\'의 \'한\'은 \'大\'와 \'韓\'의 의미이며 지어진 것은 1910년이고 공식적 사용 기록은 1913년 9월까지 높일 수 있으며, 지은 사람은 주시경과 최남선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사용 연대만 확실할 뿐 의미나 지어진 연대 및 지은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한글\'이 우리 글자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 말의 유래를 자세히 캐어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발견된 몇 가지 자료들과 이전의 소견들을 종합함으로써 \'한글\'이라는 이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좀더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갑오경장 이후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國語\'와 \'國文\'으로 불러 왔다. 이 당시 국어 문법을 가장 집념 있게 연구한 사람은 주시경인데 그의 대부분의 저술은 \'國語\'와 \'國文\'으로 되어 있다.
[국문론」(1897), 「國語文法」(1898), 「國語文法」(1905),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 「國文硏究案」(1907), 「國語文典音學」(1908), 「國語硏究」(1909), 「國語文法」(1910)
주 시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도 이런 말을 접할 수 있다.
「新訂國文」(池錫永, 1905), 「初等國語語典」(金熙祥, 1909)
이러한 국어국문이란 말은 주 시경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한 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그대로 목격된다.
國語同式會(1898), 國語文法科(1900), 國語硏究會(1907), 國語硏究所(1907), 國語夜學科(1907), 夏期國語講習所(1907), 國語硏究學會(1908)
국권 상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위와 같이 \'國語國文\'이란 말을 썼다. 그러나 주 시경이, 1910년 6월10일에 발행된 「普中親睦會報」一號에 기고한 글에는 국어와 국문 대신 \'한나라말\'과 \'한나라글\'로 되어 있다. 이 글은 \'國語文法\'의 \'序\'와 \'國文의 소리\'를 한글로 바꾸어 쓴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韓國語\'와 \'韓國文\'에 대응되는 의미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저술들과 단체 등에 나타나는 \'국어\'나 \'국문\'이란 말도 국권 상실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대신 \'조선\'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 나타난 우리말이나 글에 대한 저술이나 이와 관계가 있는 단체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語文法」(周時經, 1911, 1913), 「朝鮮語典」(金熙祥, 1911),「조선말본」 (김두봉, 1916), \"朝鮮語\"(金熙祥, 1915), 朝鮮語講習院(1911), 朝鮮語文會(1911)
한편 순수한 우리말로 된 저술들도 눈에 띈다.
「소리갈」 (周時經, 1913?), 「말모이」(周時經 등, 1913?), 「말듬」(李奎榮 1913?), 「말의 소리」(周時經, 1914)
한편 우리는 주 시경의 이름으로 발부된 한 수료증서에서 \'한말\'이란 말을 발견한다.
다음 증서의 수료자 오 봉빈(吳鳳彬)은 화가인데 최근에 나타난 「한글모죽보기」에 의하면 1910년 10월부터 1911년 6월 27일 사이에 國語硏究學會 강습소 제 2회 졸업생인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다음 증서에 발부 일자가 \"세종임금 나이신 네온 예순 아홉 해 넷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다. \'네온 예순 아홉 해\'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469년이란 뜻이니 1911년으로 환산되고 \'넷째 날 첫날\'은 4월 1일이다. 곧 1911년 4월 1일이다.
이렇게 판독이 된다면 「한글모죽보기」의 강습기간과 어긋나게 되니 국어연구학회의 수료증서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국어연구학회 졸업증서 서식과 체제가 비슷하고 강습 장소가 보성중학교이며 강사가 주시경인 점이 모두 「한글보죽보기」의 기록과 일치되니 일단은 국어연구학회 제2회 졸업증서로 보아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위의 증서와 「한글모죽보기」의 강습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국권 상실의 사정과 얽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모죽보기」는 국어연구학회 제2회 강습기간을 1910. 10~ 1911. 6.27로 잡고 있으나(前術) 이는 이 책의 편자인 이규영의 의도적 기술일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하기 강습소, 국어연구학회 강습소, 조선어 강습원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고 국어연구학회와 조선언문회가 같은 단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증서가 1911년 4월 1일자로 발부되어 있고 증서의 내용이 두 달 동안으로 나와 있으니 1911년 2~3월이 실질적 강습 기간이 된다.
위의 증서가 국어연구학회 제2회 졸업증서라는 사실이 옳다면 강습소의 이름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증서 끝에서 두 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보셩O학교안말익힘곳\'은 普成學校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강습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권 상실 전 1910년 6월 30일자로 발부된 제1회 강습소 졸업증서에 나와 있는 국어강습소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 \'말익힘곳\'이고 보성중학교는 그 소재를 특별히 밝히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우리는 국권 상실 후에 나온 주 시경 등의 저술에서 \'소리갈, 말듬, 말모이, 말의 소리\'와 같은 이름이 있음을 보았는데 이곳의 \'말익힘곳\'의 \'말\'도 같은 사정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증서 첫머리 \'나남\'의 왼쪽에 \'한말익힘곳침\'이란 네모진 도장이 찍혀 있다. 이곳의 \'한말\'이란 주시경이 1910년에 기고한 바 있었던 \'한나라말\'의 \'나라\'를 떼어내고 만든 이름으로 짐작되는데 단순한 \'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국권 상실 이전의 \'국어\'가 표시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남이 손에 떨어지니 \'국어\'나 \'국문\'이란 말은 쓸 수 없고 임시방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말익힘곳\'이요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한말익힘곳\'이 아닌가 한다. 앞의 \'한나라말\'과 관련시켜 볼 때 \'한말\'은 주시경이 창안해 낸 말임에 틀림없다.
1911년 4월 1일자 증서에 나타난 \'말익힘곳\'내지 \'한말익힘곳\'은 같은 해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同年(1911년 -필자) 九月 十七日 國語硏究學會를 배달말글
Ⅲ. 우리글(한글, 우리말, 한국어)의 유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글\'의 \'한\'은 \'大\'와 \'韓\'의 의미이며 지어진 것은 1910년이고 공식적 사용 기록은 1913년 9월까지 높일 수 있으며, 지은 사람은 주시경과 최남선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사용 연대만 확실할 뿐 의미나 지어진 연대 및 지은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한글\'이 우리 글자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 말의 유래를 자세히 캐어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발견된 몇 가지 자료들과 이전의 소견들을 종합함으로써 \'한글\'이라는 이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좀더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갑오경장 이후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國語\'와 \'國文\'으로 불러 왔다. 이 당시 국어 문법을 가장 집념 있게 연구한 사람은 주시경인데 그의 대부분의 저술은 \'國語\'와 \'國文\'으로 되어 있다.
[국문론」(1897), 「國語文法」(1898), 「國語文法」(1905),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 「國文硏究案」(1907), 「國語文典音學」(1908), 「國語硏究」(1909), 「國語文法」(1910)
주 시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도 이런 말을 접할 수 있다.
「新訂國文」(池錫永, 1905), 「初等國語語典」(金熙祥, 1909)
이러한 국어국문이란 말은 주 시경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한 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그대로 목격된다.
國語同式會(1898), 國語文法科(1900), 國語硏究會(1907), 國語硏究所(1907), 國語夜學科(1907), 夏期國語講習所(1907), 國語硏究學會(1908)
국권 상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위와 같이 \'國語國文\'이란 말을 썼다. 그러나 주 시경이, 1910년 6월10일에 발행된 「普中親睦會報」一號에 기고한 글에는 국어와 국문 대신 \'한나라말\'과 \'한나라글\'로 되어 있다. 이 글은 \'國語文法\'의 \'序\'와 \'國文의 소리\'를 한글로 바꾸어 쓴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韓國語\'와 \'韓國文\'에 대응되는 의미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저술들과 단체 등에 나타나는 \'국어\'나 \'국문\'이란 말도 국권 상실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대신 \'조선\'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 나타난 우리말이나 글에 대한 저술이나 이와 관계가 있는 단체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語文法」(周時經, 1911, 1913), 「朝鮮語典」(金熙祥, 1911),「조선말본」 (김두봉, 1916), \"朝鮮語\"(金熙祥, 1915), 朝鮮語講習院(1911), 朝鮮語文會(1911)
한편 순수한 우리말로 된 저술들도 눈에 띈다.
「소리갈」 (周時經, 1913?), 「말모이」(周時經 등, 1913?), 「말듬」(李奎榮 1913?), 「말의 소리」(周時經, 1914)
한편 우리는 주 시경의 이름으로 발부된 한 수료증서에서 \'한말\'이란 말을 발견한다.
다음 증서의 수료자 오 봉빈(吳鳳彬)은 화가인데 최근에 나타난 「한글모죽보기」에 의하면 1910년 10월부터 1911년 6월 27일 사이에 國語硏究學會 강습소 제 2회 졸업생인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다음 증서에 발부 일자가 \"세종임금 나이신 네온 예순 아홉 해 넷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다. \'네온 예순 아홉 해\'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469년이란 뜻이니 1911년으로 환산되고 \'넷째 날 첫날\'은 4월 1일이다. 곧 1911년 4월 1일이다.
이렇게 판독이 된다면 「한글모죽보기」의 강습기간과 어긋나게 되니 국어연구학회의 수료증서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국어연구학회 졸업증서 서식과 체제가 비슷하고 강습 장소가 보성중학교이며 강사가 주시경인 점이 모두 「한글보죽보기」의 기록과 일치되니 일단은 국어연구학회 제2회 졸업증서로 보아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위의 증서와 「한글모죽보기」의 강습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국권 상실의 사정과 얽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모죽보기」는 국어연구학회 제2회 강습기간을 1910. 10~ 1911. 6.27로 잡고 있으나(前術) 이는 이 책의 편자인 이규영의 의도적 기술일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하기 강습소, 국어연구학회 강습소, 조선어 강습원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고 국어연구학회와 조선언문회가 같은 단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증서가 1911년 4월 1일자로 발부되어 있고 증서의 내용이 두 달 동안으로 나와 있으니 1911년 2~3월이 실질적 강습 기간이 된다.
위의 증서가 국어연구학회 제2회 졸업증서라는 사실이 옳다면 강습소의 이름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증서 끝에서 두 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보셩O학교안말익힘곳\'은 普成學校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강습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권 상실 전 1910년 6월 30일자로 발부된 제1회 강습소 졸업증서에 나와 있는 국어강습소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 \'말익힘곳\'이고 보성중학교는 그 소재를 특별히 밝히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우리는 국권 상실 후에 나온 주 시경 등의 저술에서 \'소리갈, 말듬, 말모이, 말의 소리\'와 같은 이름이 있음을 보았는데 이곳의 \'말익힘곳\'의 \'말\'도 같은 사정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증서 첫머리 \'나남\'의 왼쪽에 \'한말익힘곳침\'이란 네모진 도장이 찍혀 있다. 이곳의 \'한말\'이란 주시경이 1910년에 기고한 바 있었던 \'한나라말\'의 \'나라\'를 떼어내고 만든 이름으로 짐작되는데 단순한 \'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국권 상실 이전의 \'국어\'가 표시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남이 손에 떨어지니 \'국어\'나 \'국문\'이란 말은 쓸 수 없고 임시방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말익힘곳\'이요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한말익힘곳\'이 아닌가 한다. 앞의 \'한나라말\'과 관련시켜 볼 때 \'한말\'은 주시경이 창안해 낸 말임에 틀림없다.
1911년 4월 1일자 증서에 나타난 \'말익힘곳\'내지 \'한말익힘곳\'은 같은 해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同年(1911년 -필자) 九月 十七日 國語硏究學會를 배달말글
추천자료
 국어 경어(경어법, 높임말) 주체경어법, 국어 경어(경어법, 높임말) 상대경어법, 국어 경어(...
국어 경어(경어법, 높임말) 주체경어법, 국어 경어(경어법, 높임말) 상대경어법, 국어 경어(... 국어교육(국어과수업) 개념, 국어교육(국어과수업) 목표와 배경, 국어교육(국어과수업) 영역,...
국어교육(국어과수업) 개념, 국어교육(국어과수업) 목표와 배경, 국어교육(국어과수업) 영역,... 국어문법교육(국어문법지도)의 역사와 필요성, 국어문법교육(국어문법지도)의 지위, 국어문법...
국어문법교육(국어문법지도)의 역사와 필요성, 국어문법교육(국어문법지도)의 지위, 국어문법... 국어 높임말(높임법, 경어, 존대어) 유형, 국어 높임말(높임법, 경어, 존대어) 범주, 국어 높...
국어 높임말(높임법, 경어, 존대어) 유형, 국어 높임말(높임법, 경어, 존대어) 범주, 국어 높... 국어(국어과교육)의 특징, 국어(국어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제, 국어(국어과교육)의 수준별...
국어(국어과교육)의 특징, 국어(국어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제, 국어(국어과교육)의 수준별...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의미,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특징,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영역, ...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의미,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특징,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영역, ... 국어과(교육) 발음학습지도, 소집단토의학습지도, 국어과(교육) 갈등학습지도, 역할놀이학습...
국어과(교육) 발음학습지도, 소집단토의학습지도, 국어과(교육) 갈등학습지도, 역할놀이학습... <한국어 교안(문법 & 연습지)> 단원명 : 날씨가 좋아요. : 의문문과 평서문 / 문형 : 현...
<한국어 교안(문법 & 연습지)> 단원명 : 날씨가 좋아요. : 의문문과 평서문 / 문형 : 현... [국문학개론] -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평가,숙달도 평가,성취...
[국문학개론] -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전략적 능력과 어휘 구사력의 평가,숙달도 평가,성취... [국문학개론]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평가 점수의 환산 체계 연구, 기존 원점수 방식의 문...
[국문학개론]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평가 점수의 환산 체계 연구, 기존 원점수 방식의 문...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 [국어국문학과] [우리말의역사]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저서나 논문을 찾아 읽고 그 내용을 요...
[국어국문학과] [우리말의역사]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저서나 논문을 찾아 읽고 그 내용을 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형격‘의’의 분포 양상에 따른 중국어 표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형격‘의’의 분포 양상에 따른 중국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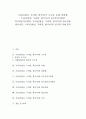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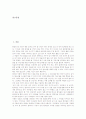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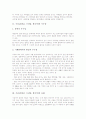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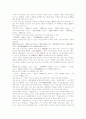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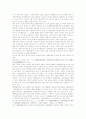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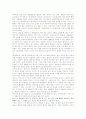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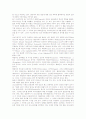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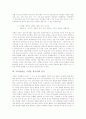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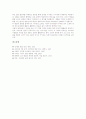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