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제이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한 주부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경제적/재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사전조사 해야 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인 주부들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부들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논문의 주부 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능력수준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는 안정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로 농촌과 도시 주부들의 욕구는 차이가 날 것이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도 달라져야 함을 들 수 있다.
또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의 내용이 대부분 자아성찰이나 가정경영 등과 같이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이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 ‘의식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점, 즉 프로그램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이 기존의 타 기관에서 시행된 교육에 비해서 가지는 차별성이 부족하다. 기존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은 주부만이 가정살림의 주체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인데, 논문에서 제시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행사업안 내용도 이러한 왜곡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녀문제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와 가정이 건강한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주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마찬가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프로그램은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7. 제언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주부대상프로그램,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본 논문은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내용과 방법, 그리고 실제 수행에 관련된 부분 또한 누락되어 있다. 논문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시행사업안의 예시는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결까지의 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적인 목표와 실제적인 수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현사회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30∼50대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맞벌이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을 과연 전업 주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남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한 주부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경제적/재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사전조사 해야 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인 주부들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부들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논문의 주부 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능력수준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는 안정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로 농촌과 도시 주부들의 욕구는 차이가 날 것이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도 달라져야 함을 들 수 있다.
또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부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의 내용이 대부분 자아성찰이나 가정경영 등과 같이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이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 ‘의식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점, 즉 프로그램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이 기존의 타 기관에서 시행된 교육에 비해서 가지는 차별성이 부족하다. 기존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은 주부만이 가정살림의 주체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인데, 논문에서 제시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행사업안 내용도 이러한 왜곡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녀문제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와 가정이 건강한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주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마찬가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프로그램은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7. 제언
전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주부대상프로그램,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본 논문은 주부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내용과 방법, 그리고 실제 수행에 관련된 부분 또한 누락되어 있다. 논문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시행사업안의 예시는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결까지의 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적인 목표와 실제적인 수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현사회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30∼50대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맞벌이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을 과연 전업 주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남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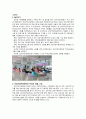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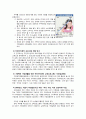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