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츠학은 누구?
Midnight Radio!
태동 - 드랙퀸 클럽, 혹은 보모/창녀
ORIGIN OF LOVE
ANGRY INCH
뮤지컬 <헤드윅…>을 안보면 뉴요커가 아니다?
WIG IN A BOX
MIDNIGHT RADIO
조용히 손잡은 두개의 정체성
Midnight Radio!
태동 - 드랙퀸 클럽, 혹은 보모/창녀
ORIGIN OF LOVE
ANGRY INCH
뮤지컬 <헤드윅…>을 안보면 뉴요커가 아니다?
WIG IN A BOX
MIDNIGHT RADIO
조용히 손잡은 두개의 정체성
본문내용
을 담담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로큰롤 드림이 좌절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한 묘사 역시 천차만별이고 주인공들이 좌절한 뒤 발길을 돌리는 곳도 상이하다. 그렇지만 록문화의 변방의 음악인들의 로큰롤 드림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린 점은 공통적이다. 영미의 록음악은 변방의 록 음악인에게 유년 시절부터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가 막상 록음악의 \'성지\'에서 경험하는 일은 그들의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는 미국 시장에서 아무런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멕시코로 건너가 밴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오고, 보리스 그레벤시코프는 음반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뒤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동료들로부터 배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밴드는 해체된다. 전자는 희극적이고 후자는 비극적이지만 공통분모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금 \'오버\'해서 말한다면, 10대 시절 \"롤링스톤스나 퀸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다짐했던 한국 \'그룹 사운드\'의 운명을 그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결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용히 손잡은 두개의 정체성
그런데 이렇게 \'좌절의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를 넘어서는 길은 없을까. 이 점에서도 <헤드윅>은 하나의 출구를 제시해 준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날 태어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남자에게 차였다\'는 헤드윅의 \'팔자\'는 동독이나 동구권 출신의 혼란되고 희망없는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에게 로큰롤 드림은 미군 병사가 던져주는 미제 젤리의 맛처럼 삼삼한 것이고, \'야메\'로 수술을 해서 성별을 전환해서라도 추구해야 할 꿈이다. 그렇다면 동구권 출신이라는 소수성은 트랜스젠더라는 성적 소수성과 처음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게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혹시 영화의 말미에서 헤드윅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장면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도 재정의하는 장면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불행히도 영화를 볼 때는 \'동구권 출신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압도했고, 감독 역시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트랜스젠더가 문화적 옵션이라면 트랜스에스니시 - transethnicity : 죄송! 한국어 표현을 찾기 정말 힘듭니다. - 라는 문화적 옵션도 가능한 것 아닐까. 별말이 아니라 국적과 민족을 \'문화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은 이쯤에서 그치기로 하자.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남는다. 그건 영화에 잠깐 등장했던 한국계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기지촌\' 부근에서 만난 여성들이다. 미제 젤리를 먹고 싶어했던 헤드윅의 욕망은 한국인들에게는 징그러울 정도로 친숙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보편적인 한국인이 이 영화에서 표상되는 방식은 성적.민족적 주변자인 헤드윅보다도 더 주변적이다. 미국에 동독 출신보다 한국 출신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그 장면에서 헤드윅이 한국계 멤버들과 함께 연주한 음악이 제니 최 (Jenny Choi) 의 노래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나의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한 장면을 침소봉대하여 한국계의 로큰롤 드림을 다룬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엽기적인 것이었을까. 어쨌거나 \'야, 한국 애들 나왔다. 재밌다.\'라고 시시덕거리는 수준은 넘어서야 할 텐데..
<헤드윅>은 노래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플래시백 등을 절묘하게 사용해 내러티브를 이끌어간다. 곳곳에서 실험성과 창의성이 빛나는 것이다.
헤드윅 하면 떠오르는 노래 “The Origin of Love”! 이 주옥 같은 노래의 가사가 플라톤의 <향연>에 근거하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뮤지컬 헤드윅을 구상하면서 미첼은 작곡가 트래스크에게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노래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곡이 만들어진 시점은 사실상 헤드윅의 캐릭터가 틀을
갖추기도 전이었으며, 그러고 보면, “The Origin of Love”는 헤드윅이라는 작품 자체의 오리진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헤드윅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어쩌면 “사랑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기나긴 하나의
여정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에 따르면 , 오래전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기 전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완성체였다고 한다. 그땐 세가지의 性이 있었는데, 소년과 소년 (해의 아이들), 소녀와 소녀 (땅의 아이들),
소년과 소녀 (달의 아이들)가 하나로 붙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완성체로서 당당한 인간이 갖는 능력에
위협을 느낀 제우스 신은 각각의 성을 둘로 갈라버린다. 그리고 사랑이란 바로 완성된 전체를 향한 열망,
즉 잃어버린 반쪽과 다시 결합하여 오래 전 그 행복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열망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헤드윅의 공식 대본에는 <향연> 중 관련 구절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헤드윅의 잃어버린 반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어릴적 성적 학대를 가한 아빠? 아니면 동베를린의 엄마?
아니면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미군병사 루터? 아니면 록스타 토미? 그것도 아니라면 과연 누구일까?
이들 아티스트들은 \"하드로커\"이면서 동시에 페미닌한 특성과 글래머러스한 연주스타일-글램 록 (Glam Rock)-을 추구했다. 펑크록 드랙은 <헤드윅>의 등장에 중요한 모티브가된다. 기존의 드랙이 페르소나, 즉 실체를 떠난 이미지들의 놀이였다면, <헤드윅>의 드랙은 한 구체적인 인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헤드윅은 살아있는 캐릭터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스토리를 가진, 자기 자신의 신념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드랙퀸이다.
한가지를 기억해야하죠..
다리나 장벽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중간에 서있는 나의 존재 없이는 그대.
그대는 아무것도 아닙겁니다.\"
다리나 장벽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다리와 장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둘을 하나로 연결을 해주고 장벽은 하나를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말이죠...이 노래의 가사에는 헤드윅은 베를린 장벽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같던 장벽이 무너지고 난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는 미국 시장에서 아무런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멕시코로 건너가 밴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오고, 보리스 그레벤시코프는 음반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뒤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동료들로부터 배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밴드는 해체된다. 전자는 희극적이고 후자는 비극적이지만 공통분모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금 \'오버\'해서 말한다면, 10대 시절 \"롤링스톤스나 퀸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다짐했던 한국 \'그룹 사운드\'의 운명을 그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결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용히 손잡은 두개의 정체성
그런데 이렇게 \'좌절의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를 넘어서는 길은 없을까. 이 점에서도 <헤드윅>은 하나의 출구를 제시해 준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날 태어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남자에게 차였다\'는 헤드윅의 \'팔자\'는 동독이나 동구권 출신의 혼란되고 희망없는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에게 로큰롤 드림은 미군 병사가 던져주는 미제 젤리의 맛처럼 삼삼한 것이고, \'야메\'로 수술을 해서 성별을 전환해서라도 추구해야 할 꿈이다. 그렇다면 동구권 출신이라는 소수성은 트랜스젠더라는 성적 소수성과 처음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게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혹시 영화의 말미에서 헤드윅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장면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도 재정의하는 장면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불행히도 영화를 볼 때는 \'동구권 출신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압도했고, 감독 역시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트랜스젠더가 문화적 옵션이라면 트랜스에스니시 - transethnicity : 죄송! 한국어 표현을 찾기 정말 힘듭니다. - 라는 문화적 옵션도 가능한 것 아닐까. 별말이 아니라 국적과 민족을 \'문화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은 이쯤에서 그치기로 하자.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남는다. 그건 영화에 잠깐 등장했던 한국계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기지촌\' 부근에서 만난 여성들이다. 미제 젤리를 먹고 싶어했던 헤드윅의 욕망은 한국인들에게는 징그러울 정도로 친숙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보편적인 한국인이 이 영화에서 표상되는 방식은 성적.민족적 주변자인 헤드윅보다도 더 주변적이다. 미국에 동독 출신보다 한국 출신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그 장면에서 헤드윅이 한국계 멤버들과 함께 연주한 음악이 제니 최 (Jenny Choi) 의 노래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나의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한 장면을 침소봉대하여 한국계의 로큰롤 드림을 다룬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엽기적인 것이었을까. 어쨌거나 \'야, 한국 애들 나왔다. 재밌다.\'라고 시시덕거리는 수준은 넘어서야 할 텐데..
<헤드윅>은 노래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플래시백 등을 절묘하게 사용해 내러티브를 이끌어간다. 곳곳에서 실험성과 창의성이 빛나는 것이다.
헤드윅 하면 떠오르는 노래 “The Origin of Love”! 이 주옥 같은 노래의 가사가 플라톤의 <향연>에 근거하고 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뮤지컬 헤드윅을 구상하면서 미첼은 작곡가 트래스크에게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노래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곡이 만들어진 시점은 사실상 헤드윅의 캐릭터가 틀을
갖추기도 전이었으며, 그러고 보면, “The Origin of Love”는 헤드윅이라는 작품 자체의 오리진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헤드윅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어쩌면 “사랑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기나긴 하나의
여정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에 따르면 , 오래전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기 전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완성체였다고 한다. 그땐 세가지의 性이 있었는데, 소년과 소년 (해의 아이들), 소녀와 소녀 (땅의 아이들),
소년과 소녀 (달의 아이들)가 하나로 붙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완성체로서 당당한 인간이 갖는 능력에
위협을 느낀 제우스 신은 각각의 성을 둘로 갈라버린다. 그리고 사랑이란 바로 완성된 전체를 향한 열망,
즉 잃어버린 반쪽과 다시 결합하여 오래 전 그 행복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열망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헤드윅의 공식 대본에는 <향연> 중 관련 구절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헤드윅의 잃어버린 반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어릴적 성적 학대를 가한 아빠? 아니면 동베를린의 엄마?
아니면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미군병사 루터? 아니면 록스타 토미? 그것도 아니라면 과연 누구일까?
이들 아티스트들은 \"하드로커\"이면서 동시에 페미닌한 특성과 글래머러스한 연주스타일-글램 록 (Glam Rock)-을 추구했다. 펑크록 드랙은 <헤드윅>의 등장에 중요한 모티브가된다. 기존의 드랙이 페르소나, 즉 실체를 떠난 이미지들의 놀이였다면, <헤드윅>의 드랙은 한 구체적인 인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헤드윅은 살아있는 캐릭터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스토리를 가진, 자기 자신의 신념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드랙퀸이다.
한가지를 기억해야하죠..
다리나 장벽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중간에 서있는 나의 존재 없이는 그대.
그대는 아무것도 아닙겁니다.\"
다리나 장벽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다리와 장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둘을 하나로 연결을 해주고 장벽은 하나를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말이죠...이 노래의 가사에는 헤드윅은 베를린 장벽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같던 장벽이 무너지고 난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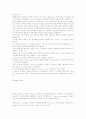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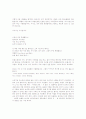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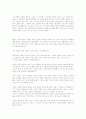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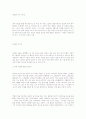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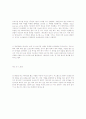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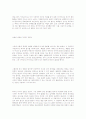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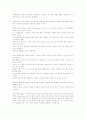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