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만해 한용운의 생애
- 작가연보
2. 만해 한용운, 사상의 세 줄기
2.1 불교에 끼친 발자취
2.2 반제·민족운동의 불기둥
2.3 민족문학 분야의 활동
2.3.1 산문분야
2.3.2 운문분야
3. 만해 한용운의 시 세계
3.1 부재의 ‘님’과 생명적 요소
3.2 민족과 그 존재의 시적 인식
3.3 수사학적경향
3.3.1 시적 허용(poetic license)
3.3.2 역설(paradox)
3.3.3 아이러니(Irony)
3.3.4 여성편향(female complex)
Ⅲ. 결론
Ⅱ. 본론
1. 만해 한용운의 생애
- 작가연보
2. 만해 한용운, 사상의 세 줄기
2.1 불교에 끼친 발자취
2.2 반제·민족운동의 불기둥
2.3 민족문학 분야의 활동
2.3.1 산문분야
2.3.2 운문분야
3. 만해 한용운의 시 세계
3.1 부재의 ‘님’과 생명적 요소
3.2 민족과 그 존재의 시적 인식
3.3 수사학적경향
3.3.1 시적 허용(poetic license)
3.3.2 역설(paradox)
3.3.3 아이러니(Irony)
3.3.4 여성편향(female complex)
Ⅲ. 결론
본문내용
름이 있어 시가 요구하는 음성 구조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 또한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복종만을 일삼는 듯 보이는 화자는 그 실에 있어서 자유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표면적인 진술이 바닥에 깔린 의미 내용과 다르면서도, 양자가 서로 한 문맥속에 얽혀서 튼튼한 형태·구조를 이루고 있는 근대적 기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만해 이전 한국시는 대개가 단선적인 언어를 쓰는데 머문 채였다면 《님의 침묵》에 이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님’이라는 어사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님’이라는 말의 지시내용은 ① 불교의 신앙대상, ②만해가 평생 그 한 몸을 바쳐 싸운 나라·겨레, ③ 이성에 대한 감정을 곁들인 경우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해 이전의 시가 그렇지 못한 데 반해서 《님의 침묵》에서는 한국시의 상상력이 가질 바 새 지평 타개에 훌륭하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항이후 우리 주변에서 씌어진 시는 산과 들판, 꽃과 바다, 저녁노을, 돛단배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노래한 物理詩 유형과, 사상과 관념, 행동이념과 시대의식을 직설적으로 토로한 觀念詩 유형이 있었다. 그런데 만해는 물리시와 관념시가 가진 과제를《님의 침묵》을 통해서 해결해주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알 수 없어요> 전문
얼핏보면 이 작품은 물리시에 속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여기서 소재로 쓰인 것은 오동잎과 하늘, 탑 위를 스치는 향기와 저녁놀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 모사의 상태에서 노래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깊은 정신세계, 곧 사상·관념을 거느린다. 만해는 그런 사상·관념을 직설적으로 노래하지 않고 감각적 실체로 전이시켜낸 것이다.
3. 만해 한용운의 시 세계
- 《님의 沈》을 중심으로
한용운의 시는 대체로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눌한 어조를 보인다. 그 어조의 어눌성은 사투리가 심한 여인의 어조를 차용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우리 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데, 근대시의 형식을 자유시 형식으로 정하고 펼쳐진 당시 시의 흐름에서 한용운의 이같은 시 형식은 독창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시 새롭게 시도된 시 형식을 외국 것의 모방으로 매도하고 민요시에서 시 형식을 구하려 하였던 흐름에서 보아도 이 평가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한용운의 시는 일상적인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고유한 한국어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그만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의 단조로움이나 시 정신의 소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적 정서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켜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기 모국어를 순화하는 것이 시인이 맡은 궁극적인 사명 중의 하나라면, 한용운은 초창기의 시단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수행했던 시인임에 틀림없다.
3.1 부재의 ‘님’과 생명적 요소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이 갈구하고 호소하던 ‘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바친 열광·갈망·尊崇·절규·호소의 대상인 ‘님’의 정체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한용운 문학의 핵심에 이르러 갈 수가 없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의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애(愛)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라고 한 <군말>(序文)은 《님의 침묵》을 쓰기 위한 서문으로 붙인 ‘님’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설이다. 결국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와 같이 하나의 생명적인 근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흔히 ‘님’하면 우리는 애인이나 연인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한용운 문학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님의 침묵》전편에 나타난 ‘님’, 그것은 전혀 그런 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한용운이 전 생애를 두고 ‘님’만을 믿고 ‘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님의 정체’는 문학 이전의 생명적 요소로 파악해야만 할 것 같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같이 관능적인 호소력이 그대로 내용이 되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것도 ‘님’의 생명적인 요소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의해 구상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용운이 그토록 부르고 호소한 ‘님의 정체’는 조국·민족·중생·불타·애인·친구 등 이 모두가 하나로 된 생명적인 근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비록 그 ‘님’은 떠나고 부재한 ‘님’이지만, 그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남게 하지 못한다면 살 수 없을 만큼 절실한 생명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그의 시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3.2 민족과 그 존재의 시적 인식
님은갓슴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슴니다
푸른산빗을치고 단풍나무숩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치고 갓슴니다
黃金의가티 굿고빗나든 옛盟誓는 차듸찬글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나러갓슴니다
날카로은첫‘키스’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뒷거름처서 사러젓슴니다.
나는 향긔로운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다은 님의얼골에 눈머럿슴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
그리고 만해 이전 한국시는 대개가 단선적인 언어를 쓰는데 머문 채였다면 《님의 침묵》에 이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님’이라는 어사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님’이라는 말의 지시내용은 ① 불교의 신앙대상, ②만해가 평생 그 한 몸을 바쳐 싸운 나라·겨레, ③ 이성에 대한 감정을 곁들인 경우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해 이전의 시가 그렇지 못한 데 반해서 《님의 침묵》에서는 한국시의 상상력이 가질 바 새 지평 타개에 훌륭하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항이후 우리 주변에서 씌어진 시는 산과 들판, 꽃과 바다, 저녁노을, 돛단배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노래한 物理詩 유형과, 사상과 관념, 행동이념과 시대의식을 직설적으로 토로한 觀念詩 유형이 있었다. 그런데 만해는 물리시와 관념시가 가진 과제를《님의 침묵》을 통해서 해결해주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알 수 없어요> 전문
얼핏보면 이 작품은 물리시에 속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여기서 소재로 쓰인 것은 오동잎과 하늘, 탑 위를 스치는 향기와 저녁놀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 모사의 상태에서 노래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깊은 정신세계, 곧 사상·관념을 거느린다. 만해는 그런 사상·관념을 직설적으로 노래하지 않고 감각적 실체로 전이시켜낸 것이다.
3. 만해 한용운의 시 세계
- 《님의 沈》을 중심으로
한용운의 시는 대체로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눌한 어조를 보인다. 그 어조의 어눌성은 사투리가 심한 여인의 어조를 차용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우리 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데, 근대시의 형식을 자유시 형식으로 정하고 펼쳐진 당시 시의 흐름에서 한용운의 이같은 시 형식은 독창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시 새롭게 시도된 시 형식을 외국 것의 모방으로 매도하고 민요시에서 시 형식을 구하려 하였던 흐름에서 보아도 이 평가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한용운의 시는 일상적인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고유한 한국어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그만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의 단조로움이나 시 정신의 소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적 정서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켜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기 모국어를 순화하는 것이 시인이 맡은 궁극적인 사명 중의 하나라면, 한용운은 초창기의 시단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수행했던 시인임에 틀림없다.
3.1 부재의 ‘님’과 생명적 요소
《님의 침묵》에서 한용운이 갈구하고 호소하던 ‘님’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바친 열광·갈망·尊崇·절규·호소의 대상인 ‘님’의 정체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한용운 문학의 핵심에 이르러 갈 수가 없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의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애(愛)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라고 한 <군말>(序文)은 《님의 침묵》을 쓰기 위한 서문으로 붙인 ‘님’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설이다. 결국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와 같이 하나의 생명적인 근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흔히 ‘님’하면 우리는 애인이나 연인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한용운 문학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님의 침묵》전편에 나타난 ‘님’, 그것은 전혀 그런 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한용운이 전 생애를 두고 ‘님’만을 믿고 ‘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님의 정체’는 문학 이전의 생명적 요소로 파악해야만 할 것 같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같이 관능적인 호소력이 그대로 내용이 되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것도 ‘님’의 생명적인 요소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의해 구상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용운이 그토록 부르고 호소한 ‘님의 정체’는 조국·민족·중생·불타·애인·친구 등 이 모두가 하나로 된 생명적인 근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비록 그 ‘님’은 떠나고 부재한 ‘님’이지만, 그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남게 하지 못한다면 살 수 없을 만큼 절실한 생명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그의 시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3.2 민족과 그 존재의 시적 인식
님은갓슴니다 아아 사랑하는나의님은 갓슴니다
푸른산빗을치고 단풍나무숩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어치고 갓슴니다
黃金의가티 굿고빗나든 옛盟誓는 차듸찬글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나러갓슴니다
날카로은첫‘키스’의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뒷거름처서 사러젓슴니다.
나는 향긔로운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다은 님의얼골에 눈머럿슴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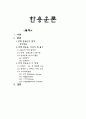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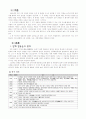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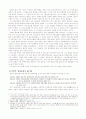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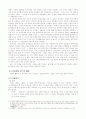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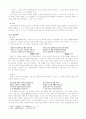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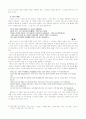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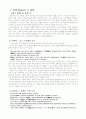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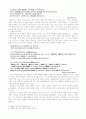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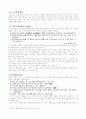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