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색(색상, 색깔, 색채)의 개념
Ⅲ. 색(색상, 색깔, 색채)의 역사
Ⅳ. 색(색상, 색깔, 색채)의 감정효과
1. 온도감
2. 운동감
3. 중량감
4. 경연감
5. 주목성
6. 명시도
7. 판독성
8. 기억색
9. 강약감
10. 색의 연상기분
1) RED
2) YELLOWRED
3) YELLOW
4) YELLOW GREEN
5) GREEN
6) BLUE GREEN
7) BLUE
8) BLUEPURPLE
9) PURPLE
10) RED PURPLE
11. 색의 상징적표정
1) RED
2) ORANGE
3) YELLOW
4) GREEN
5) BLUE
6) PURPLE
7) WHITE
8) GRAY
9) BLACK
Ⅴ. 흰색(백색, 하얀색)과 아동심리
Ⅵ. 흰색(백색, 하얀색)과 자연환경
Ⅶ. 흰색(백색, 하얀색)과 의복
Ⅷ. 흰색(백색, 하얀색)과 단군신화
참고문헌
Ⅱ. 색(색상, 색깔, 색채)의 개념
Ⅲ. 색(색상, 색깔, 색채)의 역사
Ⅳ. 색(색상, 색깔, 색채)의 감정효과
1. 온도감
2. 운동감
3. 중량감
4. 경연감
5. 주목성
6. 명시도
7. 판독성
8. 기억색
9. 강약감
10. 색의 연상기분
1) RED
2) YELLOWRED
3) YELLOW
4) YELLOW GREEN
5) GREEN
6) BLUE GREEN
7) BLUE
8) BLUEPURPLE
9) PURPLE
10) RED PURPLE
11. 색의 상징적표정
1) RED
2) ORANGE
3) YELLOW
4) GREEN
5) BLUE
6) PURPLE
7) WHITE
8) GRAY
9) BLACK
Ⅴ. 흰색(백색, 하얀색)과 아동심리
Ⅵ. 흰색(백색, 하얀색)과 자연환경
Ⅶ. 흰색(백색, 하얀색)과 의복
Ⅷ. 흰색(백색, 하얀색)과 단군신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한 듯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우리 민족은 고대인의 특성 중 하나인 태양숭배와 경천사상에 따라 고유한 ‘’사상을 형성하였다. 부여나 예맥 등 고대의 부족국가는 자신의 민족을 ‘’족이라 자처하였다. ‘부여(夫餘)’라는 말은 ‘밝음’을 뜻하며, 예맥족도 스스로를 동쪽과 밝음의 부족으로 자칭하였다. 이러한 ‘’은 곧 ‘백(白)’을 뜻하며, 그리하여 흰색을 신성한 색으로 다루게 되었다.
나아가 최남선은《고사통(故事通)》의 제 1장〈조선의 여명〉에서 론을 말하면서 ‘’은 ‘백(白)’으로 다시 ‘맥(貊)’으로 고쳐 썼다고 말하고 우리민족의 초기 명칭을 ‘백민(白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백색을 숭상하고 애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신화체계에 연결해서 해석되는 백색은 백광(白光)의 표상적 의미를 갖게 되며 최남선이 말한 청정(淸淨)하고 광명(光明)하며 평강(平康), 열락(悅樂)하기를 기원했던 대표적 색채개념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혁거세의 탄생신화에서 백마(白馬)의 이야기나, 김알지의 신화 가운데서 황금궤가 걸려있는 나무 아래서 울었다는 백계(百鷄)도 수호신조(守護神鳥)로서 천조사상(天鳥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천신강림(天神降臨)의 구조를 갖는 이들 신화에 있어서 백색은 하늘(天)의 색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白)은 진실을 호소하고 추악함을 모르며 밝음을 대표하는 색이다. 인류학자 터너(Victor Turner)는 백(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심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성직자의 승복이나 신부(新婦)의 의상이 백색이며 백색은 현대에 있어서도 역시 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대 한국 신화 가운데 색으로서의 백(白)은 특히 신의적(神儀的)인 근원상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 백색에 의한 그 표상적 색채개념이 형성되고 신(神)으로서의 신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귀의(歸意)하는 신화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민족은 단군의 탄생에서부터 자연의 순리에 귀의하고 자연의 무위(無爲)에 귀일(歸一)하려는 본질적인 조형의식을 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건국신화의 현실 반영은 결국 건국 초기의 샤머니즘이나 이후의 유불 사상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조형의식을 형성하는데 사상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표상은 자연신관에 입각한 천인 합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귀결에서 백색의 민족적 색채의식의 원류가 비롯되며 자연에 귀일(歸一)하려는 순수한 무위의 순응의식이 싹트게 되고 생활 깊숙이 베여져서 무작위(無作爲)의 미감(美感) 혹은 이와 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백색의 미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신화를 통한 의식과 더불어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김원룡은 “대상을 그대로 파악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한 아(我)의 배제이다”라고 하여 온대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적 조건에서 자연과의 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자연환경과 자연관의 사상적인 형성은 인위를 거부하고 무작위적인 경지를 추구하여 담백, 소박, 질박한 한국의 미감을 잘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고도의 정신적 고양이 잘 내포된 예술품을 형성하여 품격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는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Ⅶ. 흰색(백색, 하얀색)과 의복
우리 나라는 흰색을 숭상하는 백의 민족이다. 태양을 숭상하는 고대인들은 모두흰색을 숭상하였다. 이는 태양의 빛이 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흰색은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순수한 색으로 정절, 순결, 겸손, 기쁨의 색이다.
흰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 흰색은 광선을 100% 난반사한 상태이며(90%정도 반사하더라도 보통의 흰색으로 보인다) 어느 색과도 잘 조화한다. 특히 파란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의 배색은 명쾌하고 아름답다.
Ⅷ. 흰색(백색, 하얀색)과 단군신화
단군신화에서 보여지는 자연주의적 예술사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천인(天人)의 일체화, 천상(天上)과 인간세계(人間世界)의 일치에서 보여지는 우리 민족의 자연(自然)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숭배사상이다. 신의 아들은 사람으로 변한 곰, 즉 웅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 혈연 관계에 있어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결합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단군은 곧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단군은 인간화된 합일적 존재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연신관(Animism)이 시작된다. 한국인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흙의 문화라고 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한국 공예품들은 자연이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 장인의 숨결이 선뜻선뜻 묻어나듯이 만들어진 도자기에서의 그 형태, 문양과 무량수전의 나무기둥은 그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문화, 예술에 있어서 자연의 비중은 크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의 기저에 흥건히 고여 있다. 한국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의 저변에 자연이 깔려 있으며 이는 자연숭배 사상에서 배어나오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단군신화가 된다.
두 번째로는 백색 숭상의 이유가 단군신화에서 그 출발이 보여진다. 백색미는 원래 경천사상에서 유래되기 시작하는데 단군의 다른 이름인 한배검에서 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단군의 다른 이름으로는 ‘배달 임금 한배검’, ‘배달 임금’ 또는 ‘한배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학적 풀이로 보면 배달임금 한배검은 ‘밝은 땅의 임금’, ‘밝달 임금’으로 불리울 수 있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보면
밝은 배달이요. 국(國)은 나라요, 군(君)은 임금이다.
라 하였다.(鷄林類事 : 檀倍達 國那羅 君王儉)
《신단실기(神檀實記)》에서는
“밝달 임금(단군) 때에는 사람들이 밝달(檀)은 배달(倍達)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그 음(音)이 구울러 박달(朴達)이 되었다.”
고 전한다.(金獻, 神檀實記 1檀君世紀 魚允迪 東史年表 : 君世復 木亶考)
우리말에 있어서 “밝”은 밝음, 선(鮮)명(明)백(白)적(赤)이 보통
나아가 최남선은《고사통(故事通)》의 제 1장〈조선의 여명〉에서 론을 말하면서 ‘’은 ‘백(白)’으로 다시 ‘맥(貊)’으로 고쳐 썼다고 말하고 우리민족의 초기 명칭을 ‘백민(白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백색을 숭상하고 애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신화체계에 연결해서 해석되는 백색은 백광(白光)의 표상적 의미를 갖게 되며 최남선이 말한 청정(淸淨)하고 광명(光明)하며 평강(平康), 열락(悅樂)하기를 기원했던 대표적 색채개념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혁거세의 탄생신화에서 백마(白馬)의 이야기나, 김알지의 신화 가운데서 황금궤가 걸려있는 나무 아래서 울었다는 백계(百鷄)도 수호신조(守護神鳥)로서 천조사상(天鳥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천신강림(天神降臨)의 구조를 갖는 이들 신화에 있어서 백색은 하늘(天)의 색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白)은 진실을 호소하고 추악함을 모르며 밝음을 대표하는 색이다. 인류학자 터너(Victor Turner)는 백(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심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성직자의 승복이나 신부(新婦)의 의상이 백색이며 백색은 현대에 있어서도 역시 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대 한국 신화 가운데 색으로서의 백(白)은 특히 신의적(神儀的)인 근원상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 백색에 의한 그 표상적 색채개념이 형성되고 신(神)으로서의 신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귀의(歸意)하는 신화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민족은 단군의 탄생에서부터 자연의 순리에 귀의하고 자연의 무위(無爲)에 귀일(歸一)하려는 본질적인 조형의식을 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건국신화의 현실 반영은 결국 건국 초기의 샤머니즘이나 이후의 유불 사상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조형의식을 형성하는데 사상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표상은 자연신관에 입각한 천인 합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귀결에서 백색의 민족적 색채의식의 원류가 비롯되며 자연에 귀일(歸一)하려는 순수한 무위의 순응의식이 싹트게 되고 생활 깊숙이 베여져서 무작위(無作爲)의 미감(美感) 혹은 이와 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백색의 미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신화를 통한 의식과 더불어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김원룡은 “대상을 그대로 파악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한 아(我)의 배제이다”라고 하여 온대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적 조건에서 자연과의 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런 자연환경과 자연관의 사상적인 형성은 인위를 거부하고 무작위적인 경지를 추구하여 담백, 소박, 질박한 한국의 미감을 잘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고도의 정신적 고양이 잘 내포된 예술품을 형성하여 품격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는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Ⅶ. 흰색(백색, 하얀색)과 의복
우리 나라는 흰색을 숭상하는 백의 민족이다. 태양을 숭상하는 고대인들은 모두흰색을 숭상하였다. 이는 태양의 빛이 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흰색은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순수한 색으로 정절, 순결, 겸손, 기쁨의 색이다.
흰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 흰색은 광선을 100% 난반사한 상태이며(90%정도 반사하더라도 보통의 흰색으로 보인다) 어느 색과도 잘 조화한다. 특히 파란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의 배색은 명쾌하고 아름답다.
Ⅷ. 흰색(백색, 하얀색)과 단군신화
단군신화에서 보여지는 자연주의적 예술사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천인(天人)의 일체화, 천상(天上)과 인간세계(人間世界)의 일치에서 보여지는 우리 민족의 자연(自然)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숭배사상이다. 신의 아들은 사람으로 변한 곰, 즉 웅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 혈연 관계에 있어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결합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단군은 곧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단군은 인간화된 합일적 존재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연신관(Animism)이 시작된다. 한국인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흙의 문화라고 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한국 공예품들은 자연이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 장인의 숨결이 선뜻선뜻 묻어나듯이 만들어진 도자기에서의 그 형태, 문양과 무량수전의 나무기둥은 그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문화, 예술에 있어서 자연의 비중은 크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의 기저에 흥건히 고여 있다. 한국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의 저변에 자연이 깔려 있으며 이는 자연숭배 사상에서 배어나오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단군신화가 된다.
두 번째로는 백색 숭상의 이유가 단군신화에서 그 출발이 보여진다. 백색미는 원래 경천사상에서 유래되기 시작하는데 단군의 다른 이름인 한배검에서 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단군의 다른 이름으로는 ‘배달 임금 한배검’, ‘배달 임금’ 또는 ‘한배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학적 풀이로 보면 배달임금 한배검은 ‘밝은 땅의 임금’, ‘밝달 임금’으로 불리울 수 있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 보면
밝은 배달이요. 국(國)은 나라요, 군(君)은 임금이다.
라 하였다.(鷄林類事 : 檀倍達 國那羅 君王儉)
《신단실기(神檀實記)》에서는
“밝달 임금(단군) 때에는 사람들이 밝달(檀)은 배달(倍達)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그 음(音)이 구울러 박달(朴達)이 되었다.”
고 전한다.(金獻, 神檀實記 1檀君世紀 魚允迪 東史年表 : 君世復 木亶考)
우리말에 있어서 “밝”은 밝음, 선(鮮)명(明)백(白)적(赤)이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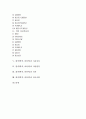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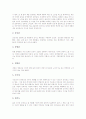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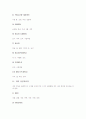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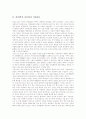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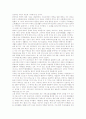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