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작품 해제
Ⅱ. 작품 분석
<표 1> 중세 국어의 의문형 어미
Ⅲ. ‘강남봉이구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
<표 2> ‘강남봉이구년’에 실현된 중세 국어의 조사
<표 3> ‘강남봉이구년’에 실현된 중세 국어의 어미
Ⅱ. 작품 분석
<표 1> 중세 국어의 의문형 어미
Ⅲ. ‘강남봉이구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
<표 2> ‘강남봉이구년’에 실현된 중세 국어의 조사
<표 3> ‘강남봉이구년’에 실현된 중세 국어의 어미
본문내용
왕’, ‘최구’ 등의 당대 귀족들의 집에서 두보와 함께 풍류를 즐겼던 인물이다. 두보는 이런 ‘이구년’을 어느 봄날의 방랑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심정을 읊고 있다.
Ⅱ. 작품 분석
제1행의 ‘岐王ㅅ’의 ‘-ㅅ’는 관형격 조사이다. 관형격 조사 ‘-ㅅ’은 무정 명사나 높임의 대상인 유정 명사 뒤에서 실현된다.(고영근:2011, 93) ‘기왕’은 현종의 아우인 이범(李範)인데, 두보는 이 집에서 자주를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안해’는 ‘안ㅎ+-애’로 이때 ‘-애’는 양성 모음 아래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다. ‘안ㅎ’은 ‘ㅎ’ 종성 체언으로 지금도 ‘안팎(안+밖)’처럼 합성어를 이룰 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녜’는 ‘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다. ‘보다니’는 ‘보-+-더-+-오-+-니’로 분석되는데, ‘-더-’는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오-’는 화자 표시의 선어말 어미 혹은 인칭 표현의 선어말 어미이다. 이 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다-’가 되었다. 따라서 제1행은 “기왕의 집 안에서 늘 보았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崔九의’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최구’는 현종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다. ‘알’는 ‘
Ⅱ. 작품 분석
제1행의 ‘岐王ㅅ’의 ‘-ㅅ’는 관형격 조사이다. 관형격 조사 ‘-ㅅ’은 무정 명사나 높임의 대상인 유정 명사 뒤에서 실현된다.(고영근:2011, 93) ‘기왕’은 현종의 아우인 이범(李範)인데, 두보는 이 집에서 자주를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안해’는 ‘안ㅎ+-애’로 이때 ‘-애’는 양성 모음 아래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다. ‘안ㅎ’은 ‘ㅎ’ 종성 체언으로 지금도 ‘안팎(안+밖)’처럼 합성어를 이룰 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녜’는 ‘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다. ‘보다니’는 ‘보-+-더-+-오-+-니’로 분석되는데, ‘-더-’는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오-’는 화자 표시의 선어말 어미 혹은 인칭 표현의 선어말 어미이다. 이 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다-’가 되었다. 따라서 제1행은 “기왕의 집 안에서 늘 보았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崔九의’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최구’는 현종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다. ‘알’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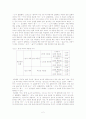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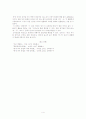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