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목차
第二十三回 澶州城磋商和約 承天門僞降帛書
제이십삼회 단주성차상화약 승천문위강백서
송사통속연의 23회 단주성에 상인을 보내 약속하며 승천문에서 거짓으로 비단 편지가 내려오다.
第二十四回 孫待制空言阻西幸 劉美人徼寵繼中宮
제이십사회 손대제공언조서행 류미인요총계중궁
제 24회 손석 대제가 공언히 서쪽 행차를 막고 유미인은 총애를 입어서 중궁을 계승하다.
제이십삼회 단주성차상화약 승천문위강백서
송사통속연의 23회 단주성에 상인을 보내 약속하며 승천문에서 거짓으로 비단 편지가 내려오다.
第二十四回 孫待制空言阻西幸 劉美人徼寵繼中宮
제이십사회 손대제공언조서행 류미인요총계중궁
제 24회 손석 대제가 공언히 서쪽 행차를 막고 유미인은 총애를 입어서 중궁을 계승하다.
본문내용
과 손자 조근을 보내 북쪽에 거란에 가게 하여 소태후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며 바치는 국서에 송을 스스로 남조라 칭하며 거란을 북조라고 호칭하였다.
直史館王曾上言:“春秋外夷狄,爵不過子,今只從他國號,於他無損,於我有名,何必對稱兩朝?”
직사관왕증상언 춘추외이적 작불과자 금지종타국호 어타무손 어아유명 하필대칭양조?
직사관인 왕증이 상소를 올렸다. “춘추에 이적을 도외시하며 벼슬이 자작을 넘지 않는데 지금 단지 다른 나라의 국호에 그들에 손상이 없고 우리에 명분이 있으니 하필 양조라고 호칭하십니까?”
(所言甚當。)
소언심당
말이 매우 타당하다.
宗也以爲然。
진종야이위연.
진종도 그렇게 여겼다.
嗣又有人謂:“稱兄弟,應作兩朝稱呼,庶較示親睦”云云,乃仍用原書齎去。
사우유인위 기칭형제 응작양조칭호 서교시친목운운 내잉용원서재거.
이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미 형제를 호칭하여 양쪽 조정이 호칭하니 거의 비교적 친목을 표시하려고 함입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원래 서신을 사용해 가지고 갔다.
(宗實無定見 定見: 일정(一定)한 주견(主見) 一定見解。主見。主意。
。)
진종실무정견.
진종은 실제로 일정한 견해가 없다.
此後南北通問 通問:찾아보며 왕래함. 또는 서로 물어봄
,用南北朝相稱,(已兆南渡之機。) 這也不在話下。
차후남북통문 개용남북조상칭 이조남도지기 저야부재화하.
이 뒤로 남북이 문호를 통하니 대개 남북조를 서로 호칭하니 (이미 남쪽으로 천도할 기미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且說知天雄軍王欽若,因南北通好,奉詔還京,仍任參知政事。
차설지천웅군왕흠약 인남북통호 봉조환경 잉임참지정사.
각설하고 천웅군 지사 왕흠약은 남북이 우호를 통해서 조서를 받들어 수도로 돌아와서 참지정사에 임명되었다.
欽若以與准不協,迭請解職,乃命馮拯代任,改授欽若爲資政殿學士。
흠약이여준불협 질청해직 내명풍증대임 개수흠약위자정전학사.
왕흠약은 구준과 불협하여 번갈아 해직을 청하니 풍증을 대신 임명하게 하며 왕흠약을 자정전학사로 다시 제수했다.
未幾,畢士安病歿,惟准獨相。
미기 필사안병몰 유준독상.
얼마 안되어 필사안이 병으로 죽고 오직 구준만 승상이 되었다.
准性剛直,賴士安曲爲調停,州一役,政策雖多出自准,但也幸有士安襄助 襄助[xingzhu] :찬조하다. 돕다. 거들다. 협조하다.
,因得成功。
준성강직 뢰사인곡위조정 단주일역 정책수다출자준 단야행유사안양조 인득성공.
구준의 성품이 강직하여 필사안이 굽혀 조정하니 단주의 한 역사는 정책이 비록 많이 구준으로부터 나왔지만 단지 다행히 필사안의 도움이 있어서 성공하였다.
宗謂士安飭躬 飭(신칙할, 경계할, 삼가다 칙; -총13획; chi) 躬(몸 궁; -총10획; gong):몸가짐을 바르게 함,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
畏謹,有古人風,因此深信不疑。
진종위사안칙궁외근 유고인풍 인차심신불의.
진종이 필사안이 몸가짐을 삼가고 두렵고 근신하여 고대 사람의 풍모가 있어서 이로 기인하여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士安歿後,賜諡文簡,車駕哭臨 哭臨:임금이 친히 영전(靈前)에 곡하고 조문함. 또는 장사(葬事)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해진 때에 슬피 우는 것을 말함
,輟朝五日。
사안몰후 사시문간 거가곡임 철조오일.
필사안이 죽은 뒤에 문간이란 시호를 하사하며 거가가 크게 곡하며 조회를 5일동안 안했다.
准因士安已歿,一切政令,多半獨斷獨行,每當除拜官吏,輒不循資格,任意選用,僚屬遂有怨言。
준인사안이몰 일체정령 다반독단독행 매당제배관리 첩불순자격 임의선용 료속수유원언.
구준은 필사안이 이미 죽고 일체의 정령을 태반을 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하게 하며 매번 관리를 제수함에 곧 자격을 살피지 않고 임의대로 선택등용해 관료가 곧 원망의 말이 있었다.
宗因他有功,累加 累加 :①거듭하여 보태는 것 ②(수학) 같은 수를 차례(次例)로 더하는 것
優待,就是他語言挺撞 挺撞 [tngzhuang] :반박하여 대들다, 말대꾸하다, 발대꾸하다
,也嘗含忍過去。
진종인타유공 루가우대 취시타어언정당 야상함인과거.
진종은 그가 공로가 있어서 자주 우대하여 곧 그의 말이 대꾸를 하여도 일찍이 참아버렸다.
一日會朝,准奏事侃侃 侃(강직할 간; -총8획; kan)侃 [knkn] :강직한 모양, 화락한 모양, (말하는 것이) 당당하고 차분한 모양
,聲徹大廷,宗溫 [wnyan]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許可。
일일회조 준주사간간 성철대정 진종온안허가.
하루 조회에서 구준의 상주의 일이 깐깐하여 목소리가 큰 조정에 울리니 진종이 온난한 용안으로 허가하였다.
及准奏畢,當趨退,宗目送 目送 :사람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며 전송(傳送)함
准出,注視不已。
급준기주필 당즉추퇴 진종목송준출 주시불이.
구준이 이미 상주를 마치고 응당 물러나가야 하느데 진종이 눈으로 구준이 나감을 주시하길 그치지 않았다.
適王欽若在朝,趨前奏道:“陛下敬准,是否因准有社稷功?”
적왕흠약재조 극추전궤주도 폐하경준 시부인준유사직공?
마침 왕흠약이 조정에 있어서 빨리 종종걸음으로 와서 꿇어앉아서 상주하였다. “폐하께서 구준을 공경하는데 구준이 사직에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宗點首稱是。
진종점수칭시.
진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欽若又道:“州一役,陛下不以爲恥,乃反目准爲功臣,臣實不解。”
흠약우도 단주일역 폐하불이위치 내반목준위공신 신실불해.
왕흠약이 또 말했다. “단주의 한 역할은 폐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반대로 구준을 공신으로 봄은 신이 실제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宗愕然問故?
진종경악문고
진종이 경악하며 이유를 물었다.
欽若又道:“城下乞盟 乞盟 [qmeng] : 적에게 강화(講和)를 청하다, 동맹을 맺을 때 신에게 고하다
,《春秋》所恥,州親征,陛下爲中國天子,反與外夷作城下盟,難道不是可恥?”
흠약우도 성하걸맹 춘추소치 단주친정 폐하위중국천자 반여외이작성하맹 난도부시가치마?
왕흠약이 또 말했다. “성 아래에서 동맹을 구굴함은 춘추에서 부끄럽게 여기니 단주에 친히 정벌을 가시어 폐하께서는 중국의 천자가 되어 반대로 외부 오랑캐에게 성아래에서 동맹을 맺음은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宋儒專《春秋》,欽若特以爲證,果足搖動帝心。
송유전상춘추 흠약특거이위증 과족요동제심.
송나라 유생은 오로지 춘추를 숭상하니 왕흠약이 특별히 거론하여 증거로 삼으니 과연 족히 화
直史館王曾上言:“春秋外夷狄,爵不過子,今只從他國號,於他無損,於我有名,何必對稱兩朝?”
직사관왕증상언 춘추외이적 작불과자 금지종타국호 어타무손 어아유명 하필대칭양조?
직사관인 왕증이 상소를 올렸다. “춘추에 이적을 도외시하며 벼슬이 자작을 넘지 않는데 지금 단지 다른 나라의 국호에 그들에 손상이 없고 우리에 명분이 있으니 하필 양조라고 호칭하십니까?”
(所言甚當。)
소언심당
말이 매우 타당하다.
宗也以爲然。
진종야이위연.
진종도 그렇게 여겼다.
嗣又有人謂:“稱兄弟,應作兩朝稱呼,庶較示親睦”云云,乃仍用原書齎去。
사우유인위 기칭형제 응작양조칭호 서교시친목운운 내잉용원서재거.
이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미 형제를 호칭하여 양쪽 조정이 호칭하니 거의 비교적 친목을 표시하려고 함입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원래 서신을 사용해 가지고 갔다.
(宗實無定見 定見: 일정(一定)한 주견(主見) 一定見解。主見。主意。
。)
진종실무정견.
진종은 실제로 일정한 견해가 없다.
此後南北通問 通問:찾아보며 왕래함. 또는 서로 물어봄
,用南北朝相稱,(已兆南渡之機。) 這也不在話下。
차후남북통문 개용남북조상칭 이조남도지기 저야부재화하.
이 뒤로 남북이 문호를 통하니 대개 남북조를 서로 호칭하니 (이미 남쪽으로 천도할 기미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且說知天雄軍王欽若,因南北通好,奉詔還京,仍任參知政事。
차설지천웅군왕흠약 인남북통호 봉조환경 잉임참지정사.
각설하고 천웅군 지사 왕흠약은 남북이 우호를 통해서 조서를 받들어 수도로 돌아와서 참지정사에 임명되었다.
欽若以與准不協,迭請解職,乃命馮拯代任,改授欽若爲資政殿學士。
흠약이여준불협 질청해직 내명풍증대임 개수흠약위자정전학사.
왕흠약은 구준과 불협하여 번갈아 해직을 청하니 풍증을 대신 임명하게 하며 왕흠약을 자정전학사로 다시 제수했다.
未幾,畢士安病歿,惟准獨相。
미기 필사안병몰 유준독상.
얼마 안되어 필사안이 병으로 죽고 오직 구준만 승상이 되었다.
准性剛直,賴士安曲爲調停,州一役,政策雖多出自准,但也幸有士安襄助 襄助[xingzhu] :찬조하다. 돕다. 거들다. 협조하다.
,因得成功。
준성강직 뢰사인곡위조정 단주일역 정책수다출자준 단야행유사안양조 인득성공.
구준의 성품이 강직하여 필사안이 굽혀 조정하니 단주의 한 역사는 정책이 비록 많이 구준으로부터 나왔지만 단지 다행히 필사안의 도움이 있어서 성공하였다.
宗謂士安飭躬 飭(신칙할, 경계할, 삼가다 칙; -총13획; chi) 躬(몸 궁; -총10획; gong):몸가짐을 바르게 함,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
畏謹,有古人風,因此深信不疑。
진종위사안칙궁외근 유고인풍 인차심신불의.
진종이 필사안이 몸가짐을 삼가고 두렵고 근신하여 고대 사람의 풍모가 있어서 이로 기인하여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士安歿後,賜諡文簡,車駕哭臨 哭臨:임금이 친히 영전(靈前)에 곡하고 조문함. 또는 장사(葬事)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해진 때에 슬피 우는 것을 말함
,輟朝五日。
사안몰후 사시문간 거가곡임 철조오일.
필사안이 죽은 뒤에 문간이란 시호를 하사하며 거가가 크게 곡하며 조회를 5일동안 안했다.
准因士安已歿,一切政令,多半獨斷獨行,每當除拜官吏,輒不循資格,任意選用,僚屬遂有怨言。
준인사안이몰 일체정령 다반독단독행 매당제배관리 첩불순자격 임의선용 료속수유원언.
구준은 필사안이 이미 죽고 일체의 정령을 태반을 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하게 하며 매번 관리를 제수함에 곧 자격을 살피지 않고 임의대로 선택등용해 관료가 곧 원망의 말이 있었다.
宗因他有功,累加 累加 :①거듭하여 보태는 것 ②(수학) 같은 수를 차례(次例)로 더하는 것
優待,就是他語言挺撞 挺撞 [tngzhuang] :반박하여 대들다, 말대꾸하다, 발대꾸하다
,也嘗含忍過去。
진종인타유공 루가우대 취시타어언정당 야상함인과거.
진종은 그가 공로가 있어서 자주 우대하여 곧 그의 말이 대꾸를 하여도 일찍이 참아버렸다.
一日會朝,准奏事侃侃 侃(강직할 간; -총8획; kan)侃 [knkn] :강직한 모양, 화락한 모양, (말하는 것이) 당당하고 차분한 모양
,聲徹大廷,宗溫 [wnyan]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許可。
일일회조 준주사간간 성철대정 진종온안허가.
하루 조회에서 구준의 상주의 일이 깐깐하여 목소리가 큰 조정에 울리니 진종이 온난한 용안으로 허가하였다.
及准奏畢,當趨退,宗目送 目送 :사람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며 전송(傳送)함
准出,注視不已。
급준기주필 당즉추퇴 진종목송준출 주시불이.
구준이 이미 상주를 마치고 응당 물러나가야 하느데 진종이 눈으로 구준이 나감을 주시하길 그치지 않았다.
適王欽若在朝,趨前奏道:“陛下敬准,是否因准有社稷功?”
적왕흠약재조 극추전궤주도 폐하경준 시부인준유사직공?
마침 왕흠약이 조정에 있어서 빨리 종종걸음으로 와서 꿇어앉아서 상주하였다. “폐하께서 구준을 공경하는데 구준이 사직에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宗點首稱是。
진종점수칭시.
진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欽若又道:“州一役,陛下不以爲恥,乃反目准爲功臣,臣實不解。”
흠약우도 단주일역 폐하불이위치 내반목준위공신 신실불해.
왕흠약이 또 말했다. “단주의 한 역할은 폐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반대로 구준을 공신으로 봄은 신이 실제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宗愕然問故?
진종경악문고
진종이 경악하며 이유를 물었다.
欽若又道:“城下乞盟 乞盟 [qmeng] : 적에게 강화(講和)를 청하다, 동맹을 맺을 때 신에게 고하다
,《春秋》所恥,州親征,陛下爲中國天子,反與外夷作城下盟,難道不是可恥?”
흠약우도 성하걸맹 춘추소치 단주친정 폐하위중국천자 반여외이작성하맹 난도부시가치마?
왕흠약이 또 말했다. “성 아래에서 동맹을 구굴함은 춘추에서 부끄럽게 여기니 단주에 친히 정벌을 가시어 폐하께서는 중국의 천자가 되어 반대로 외부 오랑캐에게 성아래에서 동맹을 맺음은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宋儒專《春秋》,欽若特以爲證,果足搖動帝心。
송유전상춘추 흠약특거이위증 과족요동제심.
송나라 유생은 오로지 춘추를 숭상하니 왕흠약이 특별히 거론하여 증거로 삼으니 과연 족히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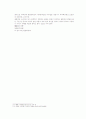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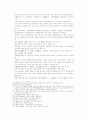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