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내용
Ⅱ-2.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 비교
- 구조적 특성
- 문체적 특징
- 내용적 특성
- 갈등형상화 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Ⅱ-1.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내용
Ⅱ-2.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 비교
- 구조적 특성
- 문체적 특징
- 내용적 특성
- 갈등형상화 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과 형식에 큰 차이가 없으며, 4음보를 1행으로 헤아려 총 63행이다.
집안의 경제적인 곤궁과 양반가(兩班家)의 체면이 빚어낸 갈등 때문에 혼인의 기회를 놓쳐버린 노처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노처녀가 겪는 슬픔과 한스러움을 자탄의 어법으로 토로하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나이 사십이 넘은 노처녀인데, 밤마다 적막한 빈 방에서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출가시키지 않는 부모를 원망한다. 낮이면 행여 중매라도 들어올까 기다리는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신랑감을 이리저리 꼽아보면서 출가한 뒤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노처녀로서 시집가고픈 심리와 양반가(兩班家)이기에 아무 데나 시집갈 수 없는 처지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층의 몰락상을 생생히 반영한다. 화자는 자신이 노처녀가 된 신세를 체념하거나 순응하려 들지 않고, 그것이 부모의 무능과 체면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통렬히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봉건왕조 사회의 신분적 질곡에 대하여 날카롭게 항의하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②삼설기본 노처녀가
국문 고소설집인 ≪삼설기 三說記≫ 권3에 실려있다. 가사형식을 취했으나 작품의 앞뒤에 편집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질적 서술자가 개입하고,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의 면모를 갖추어 소설의 경향을 보여준다.
화자는 나이가 오십이 다 되었으며, 갖은 병신인 추녀(醜女)로 설정되어 있다. 얼굴이 얽고, 귀가 먹고, 눈은 애꾸요, 왼손과 왼쪽 다리는 불구인데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읊조리다가, 하루는 건넛집에 사는 김도령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깬 노처녀는 자신의 가엾은 처지를 한탄하며 홍두깨에다 갓과 옷을 입혀 모의 결혼식을 올리는 등, 파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김도령 집에서 혼인 제의가 들어오고 결혼해서 기쁨을 누리니 그 동안의 시름은 간 데 없고, 허물을 벗어 흉한 몰골을 모두 벗어 버렸다. 그 뒤 쌍둥이 옥동자를 낳아 자손이 번창하고 가산이 풍족한 가운데 부귀공명을 오래도록 누렸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불구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인공은 불구의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끈질긴 노력 끝에 노처녀 신세를 면하게 된다. 이로써 육체적 불구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면서 서사적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어 한층 서사성을 강화하고 있다
Ⅱ-2.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 비교
① 구조적 특성
- 열린구조 vs 닫힌구조
- 서사적 성격無 vs 서사적 성격有
<잡가본 노처녀가>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시작된다. 혼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자연사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다시금 한탄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처녀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그저 원망만하고 갈등이 해결되기 보다는 긴장을 조성한 채 끝을 맺는다. 예를 들어보면, 화자는 ‘월명사창 긴긴 밤’에 ‘적막한 빈 방안’에서 ‘적적료 혼자 안자’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좀 들어보소’라며 막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는 나이 사십에 아직껏 시집을 못가고 시집갈 비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장래사를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갈등이야 말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지함은 ‘침불안석 다니면서’, ‘안잣다가 누엇다가’하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해결책 없는 모색임을 느끼게 하며 또한, ‘안잣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목숨
집안의 경제적인 곤궁과 양반가(兩班家)의 체면이 빚어낸 갈등 때문에 혼인의 기회를 놓쳐버린 노처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노처녀가 겪는 슬픔과 한스러움을 자탄의 어법으로 토로하고 있다.
작품의 화자는 나이 사십이 넘은 노처녀인데, 밤마다 적막한 빈 방에서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출가시키지 않는 부모를 원망한다. 낮이면 행여 중매라도 들어올까 기다리는 마음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신랑감을 이리저리 꼽아보면서 출가한 뒤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노처녀로서 시집가고픈 심리와 양반가(兩班家)이기에 아무 데나 시집갈 수 없는 처지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층의 몰락상을 생생히 반영한다. 화자는 자신이 노처녀가 된 신세를 체념하거나 순응하려 들지 않고, 그것이 부모의 무능과 체면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통렬히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봉건왕조 사회의 신분적 질곡에 대하여 날카롭게 항의하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②삼설기본 노처녀가
국문 고소설집인 ≪삼설기 三說記≫ 권3에 실려있다. 가사형식을 취했으나 작품의 앞뒤에 편집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질적 서술자가 개입하고,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의 면모를 갖추어 소설의 경향을 보여준다.
화자는 나이가 오십이 다 되었으며, 갖은 병신인 추녀(醜女)로 설정되어 있다. 얼굴이 얽고, 귀가 먹고, 눈은 애꾸요, 왼손과 왼쪽 다리는 불구인데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읊조리다가, 하루는 건넛집에 사는 김도령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깬 노처녀는 자신의 가엾은 처지를 한탄하며 홍두깨에다 갓과 옷을 입혀 모의 결혼식을 올리는 등, 파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김도령 집에서 혼인 제의가 들어오고 결혼해서 기쁨을 누리니 그 동안의 시름은 간 데 없고, 허물을 벗어 흉한 몰골을 모두 벗어 버렸다. 그 뒤 쌍둥이 옥동자를 낳아 자손이 번창하고 가산이 풍족한 가운데 부귀공명을 오래도록 누렸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불구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인공은 불구의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끈질긴 노력 끝에 노처녀 신세를 면하게 된다. 이로써 육체적 불구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면서 서사적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어 한층 서사성을 강화하고 있다
Ⅱ-2.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 비교
① 구조적 특성
- 열린구조 vs 닫힌구조
- 서사적 성격無 vs 서사적 성격有
<잡가본 노처녀가>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시작된다. 혼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자연사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다시금 한탄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처녀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그저 원망만하고 갈등이 해결되기 보다는 긴장을 조성한 채 끝을 맺는다. 예를 들어보면, 화자는 ‘월명사창 긴긴 밤’에 ‘적막한 빈 방안’에서 ‘적적료 혼자 안자’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좀 들어보소’라며 막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는 나이 사십에 아직껏 시집을 못가고 시집갈 비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장래사를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갈등이야 말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지함은 ‘침불안석 다니면서’, ‘안잣다가 누엇다가’하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해결책 없는 모색임을 느끼게 하며 또한, ‘안잣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목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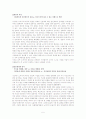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