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혜석 전기
나혜석 작품
나혜석 그림
나혜석 연보
나혜석 저작
나혜석 사진
참고자료
나혜석 작품
나혜석 그림
나혜석 연보
나혜석 저작
나혜석 사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린 나혜석의 연속 목판화이다. <신여자>를 주재했던 김일엽의 바쁜 생활을 그렸다. <저것이 무엇인고>는 <신여자> 제 2 호(1920년 4월)에 게재된 나혜석의 목판화이다. 원래 창간호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편집사정으로 한 호 밀려 실렸다. <개척자>는 1921년 7월 <開闢> 제 13 호에 실렸다. 해가 쨍쨍한 낮에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다. <견우화>는 1924년 작, 염상섭작품집 표지화에 실렸다. 견우화가 피어 있고 토끼와 새의 부리가 그려져 있는 표지그림이다. <섣달대목>은 1919년 1월 21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어느 주사집 석닫대목 아침상을 받은 모습을 그렸다. <섣달대목> 1919년 1월 30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아낙들이 다듬이질을 하고 한 할멈이 발다듬이질을 하고 서 있다. <섣달대목> 1919년 1월 31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다듬이질이 끝나고 바느질감이 가득한 두 아낙 앞에 할멈이 저고리 솜을 펴고 있다. <섣달대목> 1919년 2월 1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가득한 다림질감들을 숯불에 다리고 놋쇠로 다리고 붓삽으로 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다. <초하룻날>은 1919년 2월 2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섣달 초하루 날 삼부자가 떡국 차례 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다. <초하룻날>은 1919년 2월 3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새해 첫날 딸이 얼굴에 분이 잘 안 발라진다 하자 어머니가 아버지와 오빠 새해 옷 챙기고 딸의 댕기, 저고리, 명주치마, 노리개 등 차례 빔을 입히고 덕순 네 널뛰기 가자는 이야기이다. <초하룻날>은 1919년 2월 4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수남이가 세배를 드리자 새해에는 몇 살 몇 학년이냐고 묻고 10살 된다고 답하자 13살에 장가들게 사서삼경을 읽으라고 권한다. <초하룻날>은 1919년 2월 6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아이들 널뛰기 장면이다. <초하룻날>은 1919년 2월 7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아녀자들 윷놀이 장면이다. <인형의 家> 1921년 3월 4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노라의 대사와 함께 노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인형의 家> 1921년 3월 5일자 <매일신보>에 실렸다. 노라의 모습가 대사가 실렸다. <이상을 지시하는 계명자>는 나혜석의 계명구락부 기관지 <계명> 1932년 12월호에 실린 그림이다. 중절모를 쓰고 반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오른팔로 위를 가리키고 있다. <총석정 어촌에서>는 1932년 총석정에서 스케치한 총석정 어촌 풍경이다. <경성역에서, 전동식당에서, 계명구락부에서>는 경성역, 전동식당, 계명구락부의 풍경을 스케치했다. 김종욱 편 <라혜석-날아간 청조>에 소개되었다. 자전거 탄 식당 배달부, 당구대에서 당구치는 사람들, 기차역 앞 캡 쓴 보이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pp. 5391).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는 <여자계 3호> 1918년 9월호에 실렸다. <閨怨>은 <新家庭> 창간호, 1921년 7월호에 실렸다. <규원>은 1회 발표되었고, <신가정> 속간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단되었다. <怨恨>은 <조선문단> 1926년 4월호에 실렸다. <玄淑>은 <삼천리> 1936년 12월호에 실렸다. <어머니와 딸>은 <삼천리> 1937년 10월호에 실렸다.
나혜석의 희곡 <巴里의 그 女子>는 3막극으로 <삼천리>에 1935년 11월호에 실렸다.
나혜석의 시 <光>은 <여자계> 1918년 3월호에 실렸다. <내 물>은 <華虹門樓上에셔>라고 서정자의 전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폐허> 제 2 호 1921년 4월호에 실렸다. <沙>는 <폐허> 1921년 1월호에 실렸다. <人形의 家>는 나혜석 작사, 김영환 작곡의 노래로서, 각본 <인형의 가> 중 마지막 회 삽입 시이다. <매일신보> 1921년 4월 3일자로 실렸다. <앗겨 무엇하리, 靑春을>은 <삼천리> 1935년 3월호에 실렸다. <노라>는 박화성(朴花城) 단편 <狂風 속에서>, 창작집 <殘影>, 所修, 1947년에 실렸다. 박화성은 <노라>가 나혜석이 작사한 노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혜석의 콩트 <떡먹은 이야기>는 <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4일자로 실렸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현상원고 ‘우스운 이야기’ 부문에 입선하였다.
나혜석은 1930년 5월호에 게재된 세 가지 설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첫째, 선생은 민족/사회주의자 입니까? 둘째, 선생은 실행가/학자가 되겠습니까? 셋째, 선생은 사상상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답은 이러했다. “1. 答을 避합니다. 2. 장차 조흔 時機 잇스면 女性運動에 나서려 합니다.”(p. 698). 나혜석의 장편소설에 대한 신문기사도 소개되어 있다. <삼천리>에 소개된 벽신문 1933년 11월자는 나혜석이 김명혜(金明愛)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다 써서 거의 탈고해서 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pp. 704).
서정자의 <라혜석 전집> 부록에는 염상섭의 소설 <추도>가 실려 있다. 나혜석 여사의 죽음을 추도하는 소설이다. <신천지> 1954년 1월호에 실렸다. <나혜석 신문조서>는 대정 팔년 삼월 십칠일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피고인 나혜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신문한 내용이다. 주로 이화학당에서 박인덕, 황애리덕, 김마리아, 김하르논, 손정순, 안병숙, 안숙자, 신체르뇨, 박승일과 또 한 사람 성명을 모르는 사람과 도합 11명이 남학생들이 시작한 독립운동에 여학생들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4, 국사편찬위원회, 1991) (p. 732-736).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변호사였고, 파리에서 염문설을 뿌린 최린은 천도교신파의 두령이었다.
나혜석은 <삼천리> 1934년 5월호에 실린 <朝鮮에 태여난 거슬 幸福으로 압니다>(설문: 朝鮮에 태여난 것이 幸福한가 不幸한가)에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幸福은 富를 得하엿을 때나 地位를 求하엿슬 때나 學問을 取하엿을 때가 아니라 事物과 事物 사이에 神이 往來하는 一念이 되엿슬 때입니다 그런데 이 一念이 될 때는 깃부고 즐거울 때보다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는 <여자계 3호> 1918년 9월호에 실렸다. <閨怨>은 <新家庭> 창간호, 1921년 7월호에 실렸다. <규원>은 1회 발표되었고, <신가정> 속간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단되었다. <怨恨>은 <조선문단> 1926년 4월호에 실렸다. <玄淑>은 <삼천리> 1936년 12월호에 실렸다. <어머니와 딸>은 <삼천리> 1937년 10월호에 실렸다.
나혜석의 희곡 <巴里의 그 女子>는 3막극으로 <삼천리>에 1935년 11월호에 실렸다.
나혜석의 시 <光>은 <여자계> 1918년 3월호에 실렸다. <내 물>은 <華虹門樓上에셔>라고 서정자의 전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폐허> 제 2 호 1921년 4월호에 실렸다. <沙>는 <폐허> 1921년 1월호에 실렸다. <人形의 家>는 나혜석 작사, 김영환 작곡의 노래로서, 각본 <인형의 가> 중 마지막 회 삽입 시이다. <매일신보> 1921년 4월 3일자로 실렸다. <앗겨 무엇하리, 靑春을>은 <삼천리> 1935년 3월호에 실렸다. <노라>는 박화성(朴花城) 단편 <狂風 속에서>, 창작집 <殘影>, 所修, 1947년에 실렸다. 박화성은 <노라>가 나혜석이 작사한 노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혜석의 콩트 <떡먹은 이야기>는 <조선중앙일보> 1934년 1월 4일자로 실렸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현상원고 ‘우스운 이야기’ 부문에 입선하였다.
나혜석은 1930년 5월호에 게재된 세 가지 설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첫째, 선생은 민족/사회주의자 입니까? 둘째, 선생은 실행가/학자가 되겠습니까? 셋째, 선생은 사상상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답은 이러했다. “1. 答을 避합니다. 2. 장차 조흔 時機 잇스면 女性運動에 나서려 합니다.”(p. 698). 나혜석의 장편소설에 대한 신문기사도 소개되어 있다. <삼천리>에 소개된 벽신문 1933년 11월자는 나혜석이 김명혜(金明愛)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다 써서 거의 탈고해서 춘원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pp. 704).
서정자의 <라혜석 전집> 부록에는 염상섭의 소설 <추도>가 실려 있다. 나혜석 여사의 죽음을 추도하는 소설이다. <신천지> 1954년 1월호에 실렸다. <나혜석 신문조서>는 대정 팔년 삼월 십칠일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피고인 나혜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신문한 내용이다. 주로 이화학당에서 박인덕, 황애리덕, 김마리아, 김하르논, 손정순, 안병숙, 안숙자, 신체르뇨, 박승일과 또 한 사람 성명을 모르는 사람과 도합 11명이 남학생들이 시작한 독립운동에 여학생들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4, 국사편찬위원회, 1991) (p. 732-736).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변호사였고, 파리에서 염문설을 뿌린 최린은 천도교신파의 두령이었다.
나혜석은 <삼천리> 1934년 5월호에 실린 <朝鮮에 태여난 거슬 幸福으로 압니다>(설문: 朝鮮에 태여난 것이 幸福한가 不幸한가)에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幸福은 富를 得하엿을 때나 地位를 求하엿슬 때나 學問을 取하엿을 때가 아니라 事物과 事物 사이에 神이 往來하는 一念이 되엿슬 때입니다 그런데 이 一念이 될 때는 깃부고 즐거울 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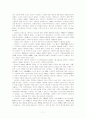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