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본 론
■이육사의 생애
■이육사 시의 변천과정
■항일 저항시적 해석
■신적 표형 양상
1) 자연적 대상
2) 초인적 대상
■ 형식적 구조
3. 나가며
※참고문헌
2. 본 론
■이육사의 생애
■이육사 시의 변천과정
■항일 저항시적 해석
■신적 표형 양상
1) 자연적 대상
2) 초인적 대상
■ 형식적 구조
3.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영향을 끼쳤으며,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의 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 발레리는 “그보다 위대하고 재능이 풍부한 시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시인은 없다”라고 절찬하였다. E.A.포의 지적 세계에 감동하여 낭만파·고답파의 구폐(舊弊)에서 벗어났으며 명석한 분석력과 논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심리의 심층을 탐구하고, 고도의 비평정신을 추상적인 관능과 음악성이 넘치는 시에 결부한 점에 그의 위대성이 있다.
나 베를렌 베를렌(1844~1896), 프랑스 상징파의 시인, 로렌주(州) 메스 출생. 아버지는 공병 대위였고 어머니는 농업과 양조업을 겸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그의 시풍(詩風)은 낭만파나 고답파(高踏派)의 외면적이고 비개성적인 시로부터 탈피하여 무엇보다도 음악을 중시하고, 다채로운 기교를 구사하여 유원(幽遠)한 운율과 깊은 음영(陰影)과 망막(茫漠)한 비애의 정감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밖에 랭보, 말라르메 등 근대시의 귀재(鬼才)들을 소개한 평론집 《저주받은 시인들 Les poetes maudits》(1884), 회상기 《나의 감옥 Mes prisons》(1893) 《참회록 Confessions》(1895) 등의 저서도 유명하다.
을 수입하였던 《백조》시대의 우울하고 퇴폐적인 작품 경향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육사의 시에는 그러한 그늘이 없었다. 우리의 시가 상징적 수법으로 접근해 간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같은 수법이 아니고는 당시 우리가 관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던 것이다. 이동영, 앞의 책, p232.
그 무렵의 작품으로 〈교목〉과 〈호수〉등이 있다. 다음은 <교목>의 전문이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喬木」,(1940.7)
이 무렵의 작품이야 말로 육사의 순수시라 할만하다. 낭만주의건 상징주의건 서구시에서 온 개념의 시형식이기는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수법 상으로만 말한다면 동양의 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험해 오던 것이었다.
■항일 저항시적 해석
이육사는 나이 20대 초반에 그는 이미 항일저항 운동의 대열에 한 몸을 내어 맡겼다. 그리고 1944년 41세를 일기로 순국하기까지 한 번도 그 고삐를 늦추거나 놓치지 않았다. 연보를 통해서 보면 이육사가 일제에 의해 구금, 투옥된 횟수는 모두 10여 차례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도 중국의 북경이었다. 사유도 일본의 체포와 잦은 고문, 압박이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일제 암흑기에 민족해방투쟁에 동참하여 싸우다 순국한 지사였고 혁명가였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자야곡」,(1941), 첫 연
위의 부분은 〈자야곡〉의 한 부분이다. 시인 육사의 눈에 비친 당시의 현실은 위에 인용한 〈자야곡〉에 드러나 있는 대로 무덤처럼 캄캄한 밤(子夜)의 현실이요, 개인적인 슬픔이나 자랑이 있기 어려운 악몽의 현장이다. 김용직, 앞의 책, p183.
시인의 개인적 체험과 민족적 집단의 체험이 하나가 되어 민족 전체의 음성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절정>을 꼽을 수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의 핍박을 고도의 압축과 긴장된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채찍, 강철 등의 절박한 은유가 적절히 등장하여 당시의 정말로 숨막힐 듯한 민족적 현실을 팽팽하게 긴장된 표현 속에 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방으로
나 베를렌 베를렌(1844~1896), 프랑스 상징파의 시인, 로렌주(州) 메스 출생. 아버지는 공병 대위였고 어머니는 농업과 양조업을 겸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그의 시풍(詩風)은 낭만파나 고답파(高踏派)의 외면적이고 비개성적인 시로부터 탈피하여 무엇보다도 음악을 중시하고, 다채로운 기교를 구사하여 유원(幽遠)한 운율과 깊은 음영(陰影)과 망막(茫漠)한 비애의 정감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밖에 랭보, 말라르메 등 근대시의 귀재(鬼才)들을 소개한 평론집 《저주받은 시인들 Les poetes maudits》(1884), 회상기 《나의 감옥 Mes prisons》(1893) 《참회록 Confessions》(1895) 등의 저서도 유명하다.
을 수입하였던 《백조》시대의 우울하고 퇴폐적인 작품 경향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육사의 시에는 그러한 그늘이 없었다. 우리의 시가 상징적 수법으로 접근해 간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같은 수법이 아니고는 당시 우리가 관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던 것이다. 이동영, 앞의 책, p232.
그 무렵의 작품으로 〈교목〉과 〈호수〉등이 있다. 다음은 <교목>의 전문이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喬木」,(1940.7)
이 무렵의 작품이야 말로 육사의 순수시라 할만하다. 낭만주의건 상징주의건 서구시에서 온 개념의 시형식이기는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수법 상으로만 말한다면 동양의 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험해 오던 것이었다.
■항일 저항시적 해석
이육사는 나이 20대 초반에 그는 이미 항일저항 운동의 대열에 한 몸을 내어 맡겼다. 그리고 1944년 41세를 일기로 순국하기까지 한 번도 그 고삐를 늦추거나 놓치지 않았다. 연보를 통해서 보면 이육사가 일제에 의해 구금, 투옥된 횟수는 모두 10여 차례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도 중국의 북경이었다. 사유도 일본의 체포와 잦은 고문, 압박이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일제 암흑기에 민족해방투쟁에 동참하여 싸우다 순국한 지사였고 혁명가였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자야곡」,(1941), 첫 연
위의 부분은 〈자야곡〉의 한 부분이다. 시인 육사의 눈에 비친 당시의 현실은 위에 인용한 〈자야곡〉에 드러나 있는 대로 무덤처럼 캄캄한 밤(子夜)의 현실이요, 개인적인 슬픔이나 자랑이 있기 어려운 악몽의 현장이다. 김용직, 앞의 책, p183.
시인의 개인적 체험과 민족적 집단의 체험이 하나가 되어 민족 전체의 음성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절정>을 꼽을 수 있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의 핍박을 고도의 압축과 긴장된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채찍, 강철 등의 절박한 은유가 적절히 등장하여 당시의 정말로 숨막힐 듯한 민족적 현실을 팽팽하게 긴장된 표현 속에 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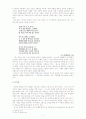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