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레포트 표지
2. 읽은 기간
3. 내용 요약(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논어의 내용 목차별로 간단하게 정리)
4. 느낀점 (명문장 중심으로 나의 생각)
5. 간단한 책의 정보
2. 읽은 기간
3. 내용 요약(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논어의 내용 목차별로 간단하게 정리)
4. 느낀점 (명문장 중심으로 나의 생각)
5. 간단한 책의 정보
본문내용
이 름 :
1. 읽은 기간.
: 2012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2. 내용 요약.
: 혼란한 시대 속에 태어난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자 했지만, 현실은 그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듬기 위한 과정으로 알았던 공자는, 적지 않은 벼슬을 하면서도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공자가 펼치고자 노력한 정치사상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비춰질 뿐이었고, 그에 따라 그의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은 번번이 실패만 거듭하게 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공자가 말년이 되었을 때, 먼 훗날 언제라도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자들과 더불어 인(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논어(論語)’다.
논어(論語)에는 ‘인’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논의한 얘기가 들어있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제자의 말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으며, 때로는 제자 이외에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은자(隱者)들, 혹은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까지도 기록 되어 있다.
책의 성립 과정이 이러하다보니 논어의 구성은 다소 산만하고 일정한 흐름조차도 없는 편이다. 그러나 공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근본 사상만은 흔들림이 없기에, 불규칙한 내용 전개의 패턴 속에서도 그의 의도만은 분명히 읽힌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를 익히고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공자도 그들 중 한 명에 속했다. 이들은 예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제후나 세도가들에게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에 대해 강조한 지식인 중 공자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라는 번잡한 형식을 왜 따라야만 하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철학적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데에 있었다.
공자가 제기한 예의 정신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이란 논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고, 공자의 사상을 이야기 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공자는 ‘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최고의 덕목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의 경지를 알고 싶어 했다.
공자가 ‘인’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한 것은, 제자인 ‘번지’의 질문에, “인(仁)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을 미루어 보자면,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 주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남이 먼저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덕은 항상 겸손하게 말을 조심하며,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예’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인’이란 글자 그대로 ‘두 사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공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고, 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인’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예를 통해 인의 실현을 이루려 하되, 그러한 인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효(孝)라는 자연적 본성에서 찾았다.
공자가 ‘인’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제4편에서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예의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랜 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오직 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문장에서 특히 그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의 생각이 이러하다보니 ‘논어(論語)’의 주제는 시종일관 인(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통 우리들이 막연하게 ‘어질다’ 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이 개념은, 선생 노릇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문명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던 공자가 일관되게 추구한 주제였다.
그렇기에 논어에서는 인(仁)이란 주제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또한 상황을 달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인 공자님 말씀[言]이니까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경건하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책 제목은 논어가 아니라 논언[言]이 되었을 것이다. 어(語)라는 것은 일방인 말씀인 언(言)과는 다르다. 어(語)는 대화다.
공자는 남들이 알아듣건 말건 자기 말만 필기시키는 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의 개성과 지식수준을 살폈다. 그런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과 지적 갈망이 요구하는 만큼 인(仁)에 대해 말해주었다. 제자들도 공자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진 않았다. 오히려 나름대로 신념과 논리를 갖고 공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공자는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싶어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표본으로 삼았다. 이러한 효도의 마음을 형제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천하에까지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인간관계의 실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예’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자는 ‘진심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이 바라는 바를 먼저 해주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것이 바로 정명론(正名論)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예를 따라 산다는 것은, 경직된 규범에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도덕적 욕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
다만,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와 유
1. 읽은 기간.
: 2012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2. 내용 요약.
: 혼란한 시대 속에 태어난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자 했지만, 현실은 그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듬기 위한 과정으로 알았던 공자는, 적지 않은 벼슬을 하면서도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공자가 펼치고자 노력한 정치사상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비춰질 뿐이었고, 그에 따라 그의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은 번번이 실패만 거듭하게 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공자가 말년이 되었을 때, 먼 훗날 언제라도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자들과 더불어 인(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논어(論語)’다.
논어(論語)에는 ‘인’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논의한 얘기가 들어있다.
그 안에는 공자의 혼잣말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제자의 말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으며, 때로는 제자 이외에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은자(隱者)들, 혹은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까지도 기록 되어 있다.
책의 성립 과정이 이러하다보니 논어의 구성은 다소 산만하고 일정한 흐름조차도 없는 편이다. 그러나 공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근본 사상만은 흔들림이 없기에, 불규칙한 내용 전개의 패턴 속에서도 그의 의도만은 분명히 읽힌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를 익히고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공자도 그들 중 한 명에 속했다. 이들은 예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제후나 세도가들에게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에 대해 강조한 지식인 중 공자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라는 번잡한 형식을 왜 따라야만 하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철학적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데에 있었다.
공자가 제기한 예의 정신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이란 논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고, 공자의 사상을 이야기 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공자는 ‘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최고의 덕목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의 경지를 알고 싶어 했다.
공자가 ‘인’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한 것은, 제자인 ‘번지’의 질문에, “인(仁)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을 미루어 보자면,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 주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남이 먼저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덕은 항상 겸손하게 말을 조심하며,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예’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인’이란 글자 그대로 ‘두 사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공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고, 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인’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예를 통해 인의 실현을 이루려 하되, 그러한 인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효(孝)라는 자연적 본성에서 찾았다.
공자가 ‘인’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제4편에서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예의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랜 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오직 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문장에서 특히 그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의 생각이 이러하다보니 ‘논어(論語)’의 주제는 시종일관 인(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통 우리들이 막연하게 ‘어질다’ 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이 개념은, 선생 노릇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문명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던 공자가 일관되게 추구한 주제였다.
그렇기에 논어에서는 인(仁)이란 주제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또한 상황을 달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인 공자님 말씀[言]이니까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경건하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책 제목은 논어가 아니라 논언[言]이 되었을 것이다. 어(語)라는 것은 일방인 말씀인 언(言)과는 다르다. 어(語)는 대화다.
공자는 남들이 알아듣건 말건 자기 말만 필기시키는 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의 개성과 지식수준을 살폈다. 그런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과 지적 갈망이 요구하는 만큼 인(仁)에 대해 말해주었다. 제자들도 공자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진 않았다. 오히려 나름대로 신념과 논리를 갖고 공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공자는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싶어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표본으로 삼았다. 이러한 효도의 마음을 형제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천하에까지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인간관계의 실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예’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자는 ‘진심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이 바라는 바를 먼저 해주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것이 바로 정명론(正名論)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예를 따라 산다는 것은, 경직된 규범에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도덕적 욕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
다만,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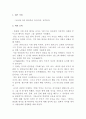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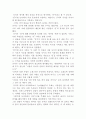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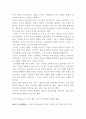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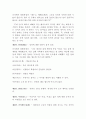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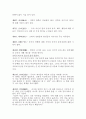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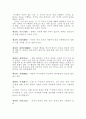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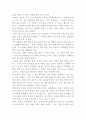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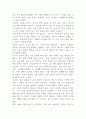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