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정주 論
Ⅰ. 서론
Ⅱ. 본론
1. 생애
2. 서정주 시에 나타난 모티프
1)꽃의 모티프
2)여성의 모티프
3)바람의 모티프
3. 전기시와 후기시의 특징
1) 전기
2)후기
4. 근대와 반근대
Ⅲ.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생애
2. 서정주 시에 나타난 모티프
1)꽃의 모티프
2)여성의 모티프
3)바람의 모티프
3. 전기시와 후기시의 특징
1) 전기
2)후기
4. 근대와 반근대
Ⅲ.결론
본문내용
입설…… 슴여라! 베암.
-<화사(花蛇)>의 전문
성적 대상인 여성과 육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화사집』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와 같은 장면은 화사를 비롯하여『화사집』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화자는 뱀을 뒤쫓던 이브와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뱀은 화자를 유혹하는 ‘순네’와 겹쳐짐. 따라서 화자가 뒤쫓고 있는 것은 할머니를 꼬여내던 남성적인 ‘배암’이기도 하고, 현재 화자를 유혹하며 달아나고 있는 여성, ‘순네’이기도 하다. 이에 상응하여 화자 또한 ‘이브’의 후손으로서 여성적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여자의 뒤를 쫓는 남성적 속성도 갖음.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어법은 화자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법은 욕망과 정서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집『화사집』의 출간은, 어쩌면 선천적으로 시인일 수밖에 없었던 서정주의 기질과, 후천적으로는 시에 뜻을 둔 한 사람의 문학 청년적 방황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청년 시인으로서 어떤 확정된 미래관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 또는 현실을 자기 것으로서 동화시키는 시인 의식이 덜 성숙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화사집』무렵 유독 서구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그가『귀촉도』무렵엔 동양적인 것에로 회귀하고 있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먼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나 있을 거예요!
-<춘향유문(春香遺文)>의 뒷부분
위 시의 화자는 작가가 아니라 춘향이다. 우리의 고전 속에 정절의 여인 춘향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춘양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춘향의 그러한 영원한 사랑은 특히 제3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몸은 비록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도련님’을 연모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랑의 의지 표현이 다름 아닌 불교의 윤회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한다.
향단아 그넷물을 밀어라 /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듯이 / 향단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 벼겟모에 뇌이듯한 풀꽃뎀이로부터,
아조 내어 밀듯이 향단아.
-<추천사(韆詞)>의 앞부분
그리움은 현실에서는 결코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애수와 한탄같은 비극적인 정조를 주조로 갖게 된다. 한국 시가의 경우 애수와 한탄의 비극적 정서는 주로 여성화자의 입을 빌어 표현되는 전통을 갖고 있다.『귀촉도』이후의 작품에서 춘향이나 사소부인과 같은 과거 역사 속의 여자들이 화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떠나버린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임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의 /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 굽이굽이 은핫물 목이 젖은 새 / 차마 아니 솟는 가락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하.
-<귀촉도(歸蜀途)> 전문
전통적 서정시의 주류를 이루는 정서, 곧 한의 극치가 표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작품의 제목 그대로 제2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했다. 사별한 임을 향한 애끓는 정한과 슬픔을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귀촉도는 동양의 시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미지로서, 임을 그리워하다 죽은 넋으로 애절한 정한을 표상하는 새. 또한 ‘삼만 리’가 상징하듯 먼 곳으로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인 여인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아롱아롱’ 맺힌다. 전통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통 장례 풍속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으로 망자가 저승 가는 길에 신고 가라고 신발을 넣어주는 데 입관할 때 시신에 신발을 신기는 것을 뜻한다.
3)바람의 모티프
초기시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바람’의 심상은 후기시에 와서 시집의 제목이 되어 그의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떠돌이의 시』를 통해서는 바람의 부유하는 속성을 ‘떠돌이’라는 자질로 대체시키고『팔할이 바람』에서는 자신의 삶 자체를 ‘바람’으로 은유화하고 있다. 시인은 바람으로부터 존재하고 바람으로부터 연출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기질은 ‘8할의 바람’이라 표현했던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의 그의 시에 나타난 정서적 불안정과 방황 혹은 원죄의식과 육정적 방황으로 일삼던 것이 바로 그것이며, 톨스토이 보들레르를 흉내 내던 방황, 희랍신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본능과 도덕과의 갈등 속에 얽매였던 방황들이 바로 그런 ‘떠돌이’기질의 출발점이었다. 20대의 바람은 주체할 길 없는 젊음과 정열의 소산이었고 70대 노년의 미당의 ‘떠돌이’는 20대의 그런 방황이 아니라 ‘나그네’의 의식으로 돌아와 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기퍼도 오지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어매는 달을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아들.
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하는 外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눈이 나는 닮었다한다. / 스믈세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 어떤이는 내눈에서 罪人을 읽고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天痴를 읽고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찬란히 티워오는 어느아침에도 /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화사(花蛇)>의 전문
성적 대상인 여성과 육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화사집』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와 같은 장면은 화사를 비롯하여『화사집』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화자는 뱀을 뒤쫓던 이브와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뱀은 화자를 유혹하는 ‘순네’와 겹쳐짐. 따라서 화자가 뒤쫓고 있는 것은 할머니를 꼬여내던 남성적인 ‘배암’이기도 하고, 현재 화자를 유혹하며 달아나고 있는 여성, ‘순네’이기도 하다. 이에 상응하여 화자 또한 ‘이브’의 후손으로서 여성적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여자의 뒤를 쫓는 남성적 속성도 갖음.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어법은 화자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법은 욕망과 정서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집『화사집』의 출간은, 어쩌면 선천적으로 시인일 수밖에 없었던 서정주의 기질과, 후천적으로는 시에 뜻을 둔 한 사람의 문학 청년적 방황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청년 시인으로서 어떤 확정된 미래관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 또는 현실을 자기 것으로서 동화시키는 시인 의식이 덜 성숙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화사집』무렵 유독 서구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그가『귀촉도』무렵엔 동양적인 것에로 회귀하고 있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먼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나 있을 거예요!
-<춘향유문(春香遺文)>의 뒷부분
위 시의 화자는 작가가 아니라 춘향이다. 우리의 고전 속에 정절의 여인 춘향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춘양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춘향의 그러한 영원한 사랑은 특히 제3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몸은 비록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도련님’을 연모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랑의 의지 표현이 다름 아닌 불교의 윤회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한다.
향단아 그넷물을 밀어라 /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듯이 / 향단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 벼겟모에 뇌이듯한 풀꽃뎀이로부터,
아조 내어 밀듯이 향단아.
-<추천사(韆詞)>의 앞부분
그리움은 현실에서는 결코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애수와 한탄같은 비극적인 정조를 주조로 갖게 된다. 한국 시가의 경우 애수와 한탄의 비극적 정서는 주로 여성화자의 입을 빌어 표현되는 전통을 갖고 있다.『귀촉도』이후의 작품에서 춘향이나 사소부인과 같은 과거 역사 속의 여자들이 화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떠나버린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임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의 /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 굽이굽이 은핫물 목이 젖은 새 / 차마 아니 솟는 가락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하.
-<귀촉도(歸蜀途)> 전문
전통적 서정시의 주류를 이루는 정서, 곧 한의 극치가 표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작품의 제목 그대로 제2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했다. 사별한 임을 향한 애끓는 정한과 슬픔을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귀촉도는 동양의 시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미지로서, 임을 그리워하다 죽은 넋으로 애절한 정한을 표상하는 새. 또한 ‘삼만 리’가 상징하듯 먼 곳으로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인 여인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아롱아롱’ 맺힌다. 전통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통 장례 풍속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으로 망자가 저승 가는 길에 신고 가라고 신발을 넣어주는 데 입관할 때 시신에 신발을 신기는 것을 뜻한다.
3)바람의 모티프
초기시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바람’의 심상은 후기시에 와서 시집의 제목이 되어 그의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떠돌이의 시』를 통해서는 바람의 부유하는 속성을 ‘떠돌이’라는 자질로 대체시키고『팔할이 바람』에서는 자신의 삶 자체를 ‘바람’으로 은유화하고 있다. 시인은 바람으로부터 존재하고 바람으로부터 연출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기질은 ‘8할의 바람’이라 표현했던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의 그의 시에 나타난 정서적 불안정과 방황 혹은 원죄의식과 육정적 방황으로 일삼던 것이 바로 그것이며, 톨스토이 보들레르를 흉내 내던 방황, 희랍신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본능과 도덕과의 갈등 속에 얽매였던 방황들이 바로 그런 ‘떠돌이’기질의 출발점이었다. 20대의 바람은 주체할 길 없는 젊음과 정열의 소산이었고 70대 노년의 미당의 ‘떠돌이’는 20대의 그런 방황이 아니라 ‘나그네’의 의식으로 돌아와 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기퍼도 오지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어매는 달을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밑에
손톱이 깜한 에미의아들.
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하는 外할아버지의 숯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눈이 나는 닮었다한다. / 스믈세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 어떤이는 내눈에서 罪人을 읽고가고
어떤이는 내입에서 天痴를 읽고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찬란히 티워오는 어느아침에도 /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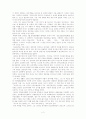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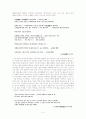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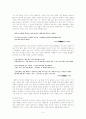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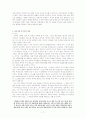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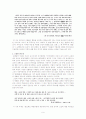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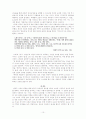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