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이름이지, 음료인 음청(飮淸)의 이름이 아니다. - 《주례(周禮)》에 육음(六飮)과 육청(六淸)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환(丸)이나 고(膏)를 끓여 마시는 종류처럼 생각한다. 무릇 약물을 한 가지만 넣고 끓이는 것은 모두 차라고 말한다. 생강차, 귤피차, 모과차, 상지차(桑枝茶), 송절차(松節茶), 오과차(五果茶) 같은 것이 익어서 늘 하는 말이 되었으나 그렇지 않다. 중국에는 이러한 법은 없는 듯하다. 이동(李洞)은 시에서 나무 계곡 은자 부름 기약하면서, 시 읊으며 백차(柏茶)를 끓이는 도다[樹谷期招隱, 吟詩煮柏茶]라고 했고, 송시에는 한 잔의 창포차를 마시는 동안, 사탕떡 몇 개를 먹어 치웠네[一盞菖蒲茶, 數箇沙糖○]라는 구절이 있다. 육유의 시에서도 찬 샘물 스스로 창포수로 바뀌니, 활화(活火)로 한가로이 감람차를 다린다는 구절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찻덩이 가운데 잣잎이나 창포, 감람 등을 섞은 까닭에 차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한 가지 다른 물건만 다리면서 차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다. - 소동파가 대야장로에게 도화차재(桃花茶裁)를 청하면서 부친 시가 있는데, 이 또한 차나무의 별명일 뿐 복사꽃에다 차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茶者冬靑之木. 陸羽茶經, 一曰茶, 二曰↖, 三曰○, 四曰茗, 五曰○. 本是草木之名, 非飮淸之號. 周禮有六飮六淸. 東人認茶字, 如湯丸膏飮之類. 凡藥物之單煮者, 總謂之茶. 薑茶橘皮茶木瓜茶桑枝茶松節茶五果茶, 習爲恒言, 非矣. 中國似無此法. 李洞詩云: 樹谷期招隱, 吟詩煮柏茶. 宋詩云: 一盞菖蒲茶, 數箇沙糖 V. 陸游詩云: 寒泉自換菖蒲水, 活火閒煮橄欖茶. 斯皆於茶錠之中, 雜以柏葉菖蒲橄欖之等, 故名茶如此. 非單煮別物, 而冒名爲茶也. 東坡有寄大冶長老, 乞桃花茶裁詩. 此亦茶樹之別名, 非以桃花冒名爲茶也].5)
다산의 주장은 이렇다. 차는 오직 차나무 잎을 법제하여 뜨거운 물에 우린 것만 차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맹물에 어떤 것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다 차라고 말한다. 귤껍질을 넣고 달이면 귤피차라 하고 모과를 넣은 것은 모과차라 한다. 보리를 넣으면 보리차가 되고, 유자를 넣으면 유자차가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백차니 창포차니 감람차니 하는 것은 잣잎이나 창포, 감람만 따로 넣고 끓인 것이 아니라, 찻덩이를 넣으면서 이것을 함께 넣어 가미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차 아닌 차 즉, 대용차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부풍향차보》의 7종 상차는 찻덩이에 약물을 섞어 끓인 향차다. 그저 이름만 차인 일반 대용차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제 《부풍향차보》가 갖는 차문화사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한다. 첫째, 《부풍향차보》는 1755년, 또는 1756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다서다. 초의의 《동다송》보다 80년, 이덕리의 《동다기》보다 28년 앞선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로 작설차에 처방에 따라 주치를 두어 7가지 약재(藥材)를 조제해서 만든 기능성 향차다. 셋째, 지금까지 차 산지로 부각된 적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차로 우리나라 차 산지와 향유 공간을 확장시켰다. 넷째, 차 그릇의 크기와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량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음다풍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자료의 발굴 소개를 계기로 향후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부풍향차의 복원과 대중화가 이루어져, 효능 및 맛과 향기가 각각 다른 다양한 차를 일반인들이 기호에 따라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
-<차의 세계> 2008년 5월호 참조
기사 작성일 : 2008-05-09 오전 10:29:21
다산의 주장은 이렇다. 차는 오직 차나무 잎을 법제하여 뜨거운 물에 우린 것만 차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맹물에 어떤 것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다 차라고 말한다. 귤껍질을 넣고 달이면 귤피차라 하고 모과를 넣은 것은 모과차라 한다. 보리를 넣으면 보리차가 되고, 유자를 넣으면 유자차가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백차니 창포차니 감람차니 하는 것은 잣잎이나 창포, 감람만 따로 넣고 끓인 것이 아니라, 찻덩이를 넣으면서 이것을 함께 넣어 가미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차 아닌 차 즉, 대용차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부풍향차보》의 7종 상차는 찻덩이에 약물을 섞어 끓인 향차다. 그저 이름만 차인 일반 대용차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제 《부풍향차보》가 갖는 차문화사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한다. 첫째, 《부풍향차보》는 1755년, 또는 1756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다서다. 초의의 《동다송》보다 80년, 이덕리의 《동다기》보다 28년 앞선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로 작설차에 처방에 따라 주치를 두어 7가지 약재(藥材)를 조제해서 만든 기능성 향차다. 셋째, 지금까지 차 산지로 부각된 적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차로 우리나라 차 산지와 향유 공간을 확장시켰다. 넷째, 차 그릇의 크기와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량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음다풍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자료의 발굴 소개를 계기로 향후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부풍향차의 복원과 대중화가 이루어져, 효능 및 맛과 향기가 각각 다른 다양한 차를 일반인들이 기호에 따라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
-<차의 세계> 2008년 5월호 참조
기사 작성일 : 2008-05-09 오전 10:2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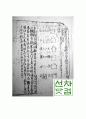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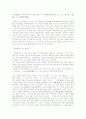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