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려 차 문화
차문화에 대해..
일제시기에는 차의 생산, 보급, 연구 등이 일본인들에 의해 진해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다원이 조성되었으며, 고등여학교와 여자 전문학교에서 차생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다시 차에 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호인이나 친목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애용하고 있다. 1990년에 들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차에 대한 효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차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호에 맞는 차를 생산하고 있다.
Ⅵ.우리나라의 차 문화
1.우리나라 차 문화의 역사
① 신라의 음다 풍속
차는 7세기 전반인 신라 선덕여왕 (632~646)때부터 있었지만, 그 성행은 흥덕왕 3년 (823) 김대렴(金大廉)이 당나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다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은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과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차의 본고장이 되었다. 이 지방의 기후 및 입지 조건이 차나무 재배에 적합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부 승려 및 화랑도들 중에서 차를 마셨다. 원효(元曉)가 부안의 원효방에 머물 때 사복이 그에게 차를 달여드렸다는 설화가 전한다.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이라는 신라의 두 왕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매일 이른 아침이면 우통수(于洞水)의 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1만의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은 그 19년(760)에 월명(月明) 스님에게 좋은 차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당시 궁중에서도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일부 승려나 화랑도들 중에서 차를 즐겨 마셨던 것은, 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트였음은 물론이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이 이들의 수행이나 풍류정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고려시대의 차 문화
고려시대에는 왕실 및 문인, 그리고 승려 등 귀족층에 차가 폭넓게 수용되어 있었다. 고려 왕실에서는 초기부터 차가 귀중하게 쓰였다. 궁중에서는 중요 의식이 행해질 때마다 진다(進多) 의식이 행해졌고, 국제 외교상의 예물로 쓰이기도 했으며, 국왕이 신하나 고승 등에서 주는 하사품 중에도 흔히 차가 포함되고 했다. 궁중에서는 연등회나 팔관회 등의 국가적인 대제전이나 왕자, 왕비 등의 책봉의식에는 흔히 진다 의식을 행했고, 송나라의 예물 중에는 용봉 차가 끼어 있었고, 고려에서는 거란에 뇌원 차를 보내기도 했다. 궁중의 차에 관한 일은 다방(茶房)이라는 관부에서 맡아보았다.
고려의 문인들은 차와 다구 등을 서로 귀하게 선물했고,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그 고마움에 대해 시로써 화답하고 했다. 그들은 차로써 막힌 가슴과 혼미한 정신과 번뇌를 씻고자 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바람을 타고 신선의 경계에 이르기를 염원했다.
승려들이 차를 마시거나 불전에 공양하던 것은 신라 이래로 있었던 일이지만,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더욱 차를 즐겼다. 잠을
차문화에 대해..
일제시기에는 차의 생산, 보급, 연구 등이 일본인들에 의해 진해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다원이 조성되었으며, 고등여학교와 여자 전문학교에서 차생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다시 차에 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호인이나 친목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애용하고 있다. 1990년에 들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차에 대한 효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차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호에 맞는 차를 생산하고 있다.
Ⅵ.우리나라의 차 문화
1.우리나라 차 문화의 역사
① 신라의 음다 풍속
차는 7세기 전반인 신라 선덕여왕 (632~646)때부터 있었지만, 그 성행은 흥덕왕 3년 (823) 김대렴(金大廉)이 당나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다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은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과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차의 본고장이 되었다. 이 지방의 기후 및 입지 조건이 차나무 재배에 적합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부 승려 및 화랑도들 중에서 차를 마셨다. 원효(元曉)가 부안의 원효방에 머물 때 사복이 그에게 차를 달여드렸다는 설화가 전한다.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이라는 신라의 두 왕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매일 이른 아침이면 우통수(于洞水)의 물을 길어다 차를 끓여 1만의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은 그 19년(760)에 월명(月明) 스님에게 좋은 차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당시 궁중에서도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일부 승려나 화랑도들 중에서 차를 즐겨 마셨던 것은, 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트였음은 물론이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이 이들의 수행이나 풍류정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고려시대의 차 문화
고려시대에는 왕실 및 문인, 그리고 승려 등 귀족층에 차가 폭넓게 수용되어 있었다. 고려 왕실에서는 초기부터 차가 귀중하게 쓰였다. 궁중에서는 중요 의식이 행해질 때마다 진다(進多) 의식이 행해졌고, 국제 외교상의 예물로 쓰이기도 했으며, 국왕이 신하나 고승 등에서 주는 하사품 중에도 흔히 차가 포함되고 했다. 궁중에서는 연등회나 팔관회 등의 국가적인 대제전이나 왕자, 왕비 등의 책봉의식에는 흔히 진다 의식을 행했고, 송나라의 예물 중에는 용봉 차가 끼어 있었고, 고려에서는 거란에 뇌원 차를 보내기도 했다. 궁중의 차에 관한 일은 다방(茶房)이라는 관부에서 맡아보았다.
고려의 문인들은 차와 다구 등을 서로 귀하게 선물했고,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그 고마움에 대해 시로써 화답하고 했다. 그들은 차로써 막힌 가슴과 혼미한 정신과 번뇌를 씻고자 했고, 그리고 세속적인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바람을 타고 신선의 경계에 이르기를 염원했다.
승려들이 차를 마시거나 불전에 공양하던 것은 신라 이래로 있었던 일이지만,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더욱 차를 즐겼다. 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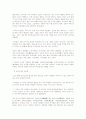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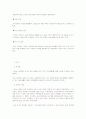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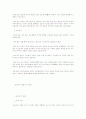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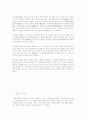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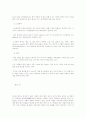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