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희랍철학에서 정신의 발견과 그 대상에 대한 자각
2. 플라톤 철학 개관
3. 《정치가》를 중심으로 한 '형상'과 그것의 '인식방법'
4. 《정치가》에서 논의된 '참된 치자'
2. 플라톤 철학 개관
3. 《정치가》를 중심으로 한 '형상'과 그것의 '인식방법'
4. 《정치가》에서 논의된 '참된 치자'
본문내용
만들어 낸다. 반면 신화 이후의 나눔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바른 나눔인 \'종에 따른\'(kat\' eid ) 나눔다. 그러나 이 나눔은 이분법적 나눔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이런 식으로 나눔을 그때마다 수행함으로써 이 방법에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아닌게아니라 화탈도 이 대화편에서 발견되는 나눔의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의 혼합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 종류, 즉 ① 아이러니와 우수개소리를 만드는 규제되지 않은 나눔, ② 잠정적인 규칙들에 의해 한가운데로 나누는 이분법에 기초한 나눔, ③ 플라톤이 지향하는 정확한 나눔을 구별하는데, 스코델은 앞의 두 가지 나눔은 \'방법론적 나눔\'으로, 마지막 나눔은 \'존재론적 나눔\'으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나눔의 목적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바른 정의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가지 형태의 나눔을 수행했을까? 왜 그는 이 대화편에서 장난스러움과 진지함을, 즉 정확함과 혼란을 섞은 대조적인 나눔을 수행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나눔이 각기 갖고 있는 방법적인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할까?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대화편에서 수행된 나눔의 특징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이 대화편에서 수행된 나눔은, 그것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든 그릇되게 수행된 것이든, 이 대화편의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릇된 나눔을 통해서는 바른 나눔이 가능한 조건을 생각하게 하거니와, 바른 나눔을 통해서는 변증술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참된 치술을 정의하려는 이 대화편의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나눔은 한편으론 변증술의 훈련을 위한 것으로서 나눔의 방법 자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바른 정의에 이르려는 나눔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닌게아니라 플라톤도 이 대화편의 목적이 \'한층 변증술에 능해지기 위한 것\'(dialektik teros, 284d6)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의의를 갖는 까닭은, 지금까지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나눔만이 플라톤의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대화편에서는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신화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다. 플라톤은 신화 이전의 나눔에서 \'한가운데로\'(dia mes n) 나누는 양적인 나눔이 실재의 구조를 반영치 않는 자의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나눔은 가치와는 무관한 엉뚱한 결과와 바르지 않은 정의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양적인 균형에만 유의하는 \'상대적\'(pros all la) 측정에 의한 탓이다. 양적인 이런 나눔은 반드시 종에 따른 바른 나눔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눔은 양적인 균형보다는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측정에 의해 종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이런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측정이야말로 절대적 측정, 즉 \'적도와 관련된\'(pros metrion) 측정이다. 신화 이후의 나눔은 이런 적도와 관련된 측정에 의해 행해진다. 신화 이전의 나눔이 제거되어야 할 왼편의 것을 전체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눔의 다른 한쪽과의 관계 속에서만 고려하는 상대적 측정에 의한 것이라면, 신화 이후의 나눔은 제 관절에 따른, 즉 \'종에 따른\'(kat\' eid ) 나눔으로서, 왼편의 것들도 적도와 관련된 측정에 의해 전체에 대한 그것들의 기여를 고려해서 종(형상)으로 한정하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과의 타자성이라는 점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그게 종(형상)에 관여하는 한 이분법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듯 이 대화편은 신화 이전과 이후에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나눔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수행했다. 하나는 그릇된 나눔의 수행을 통해 바른 나눔이 가능한 조건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방법적 훈련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른 나눔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참된 치술을 정의하려는 이 대화편의 목적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에서 《정치가》의 나눔은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한층 변증술에 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285d4-6)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나눔도 바른 나눔도 이 대화편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들이다. 4. 《정치가》에서 논의된 \'참된 치자\'플라톤은 먼저 치술도 일종의 지식이므로 지식을 둘로 나누기 시작한다. 이런 이분법적 나눔을 통해서 도달한 치술의 첫 번째 정의는 비교배종의 양육술 중에서, 이족 동물로서의 인간양육술이다(267b-c). 그러나 인간사와 관련된 목자들인 치자들에게 자신들도 인간들의 양육을 보살핀다고 나서는 자들, 즉 상인들, 농부, 방앗간 주인들, 체육교사들과 의사들이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들한테서 치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대 신화를 원용하는데, 이 신화는 신이 인간들의 목자(牧者)로서 인간들의 삶을 전적으로 배려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치술은 이런 신화시대에는 필요치 않으므로, 이 신화를 통해서 앞선 정의의 두 가지 잘못이 지적된다. 그건 치자를 신적인 목자로서 말했다는 것과 그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74e-275a). 그리하여 목자개념을 폐기하고 새로이 채택되는 것이 보살핌(therapeuein, epimeleia)이며, 첫 번째 정의는 \'자발적 이족 동물의 무리보살핌\'으로 수정된다. 그러나 이것도 치자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다른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플라톤은 직조술(hyphantik )을 예(본)로 삼아 치술을 정의한다. 플라톤은 직조의 예를 사용하기에 앞서 예(paradeigma)의 본성을 밝힌 다음(277a-278e), 직조술의 예를 제시하며(279a-283b), 또한 직조술에 관한 논의가 길게 된 것 같다는 고민과 관련해서 논의의 길이를 칭찬하고 비난할 원칙을 찾는 측정술(metr tik )도 논급한다(283b-287b). 직조술의 예는 이렇다. 모직 옷감을 갖기 위해서는 모직물을 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모직물의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기술들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들은 보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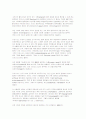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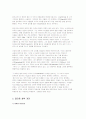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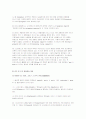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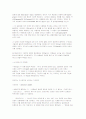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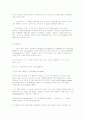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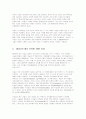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