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전봉건의 생애
전봉건의 1950년대 시연구-전쟁체험의 시적 개입
전봉건 시인을 통한 1950년대 시의 재인식
본론
밝은 생명과 전통 서정의 시세계-전쟁 이전의 시
파편화된 의식과 물질화된 언어- 6.25 전쟁과 그 직후의 초기 시 (1950~1952)
‘금 간 거울의 틈’에 나타나는 욕망-1950년대후반~60년대후반
에로스적 상상력을 통한 내면세계의 복구와 고향탐색
통합적 세계를 지향하는 은유적 인식-후반기 70,80년대의 시
은유적 구성을 통해 보여주는 통합적 세계관
- ‘여성’과 ‘돌’이미지가 보여주는 합일의 세계
‘피’의 이미지가 재현하는 ‘고향’
-돌 .1 전문
과거를 현실로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과거와의 소통
결론
전봉건의 시론과 시세계
1950년대 모더니즘과 전봉건
전봉건의 생애
전봉건의 1950년대 시연구-전쟁체험의 시적 개입
전봉건 시인을 통한 1950년대 시의 재인식
본론
밝은 생명과 전통 서정의 시세계-전쟁 이전의 시
파편화된 의식과 물질화된 언어- 6.25 전쟁과 그 직후의 초기 시 (1950~1952)
‘금 간 거울의 틈’에 나타나는 욕망-1950년대후반~60년대후반
에로스적 상상력을 통한 내면세계의 복구와 고향탐색
통합적 세계를 지향하는 은유적 인식-후반기 70,80년대의 시
은유적 구성을 통해 보여주는 통합적 세계관
- ‘여성’과 ‘돌’이미지가 보여주는 합일의 세계
‘피’의 이미지가 재현하는 ‘고향’
-돌 .1 전문
과거를 현실로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과거와의 소통
결론
전봉건의 시론과 시세계
1950년대 모더니즘과 전봉건
본문내용
합일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 속에서 은유적인 동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복구조를 통해 나와 자연이 동일화되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
이처럼 전봉건의 시들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세계들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병렬과 반복을 통하여서 의미를 공고히 한다. 이것은 각자 처해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렬과 반복을 통하여 보여주는 은유적 세계관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유사성을 통해서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들의 특징은 병렬과 반복을 통해 ‘나’와 ‘자연’의 동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봉건의 후기 시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들 사이의 동일성을 추구하며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 지향점은 시적 주체와 대상 사이의 동일화를 통해 드러난다.
먼저 그의 시들 중에는 ‘여성’과 ‘돌’의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재현하고 그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시도하며 통합하려는 주체의 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여자’와 ‘돌’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상 세계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때 드러난다. 시적 주체는 바로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현재 갈 수 없는 ‘북의 고향’을 그리며 나타나고 그로 인해 현재와 과거의 합일을 보여준다.
- ‘여성’과 ‘돌’이미지가 보여주는 합일의 세계
하기야 그 사이/3월이라는데/온 천지를 얼구는/ 영하의 눈발이 쳤고
요즈음엔 숨 막히는/ 황사까지 덮쳤습니다
어린 새싹이야 어디/ 봄 가누어 눈 뜰 엄두나 / 낼 때이겠습니까
하지만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내가 혹시 /오늘 밤 꿈에/물빛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없이 향기로운 /황진이의 벌거벗은 허리를/만나기라도 한다면
내일 아침쯤/더덕 씨앗은 새싹을/ 내 놓을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봄편지」의 부분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며 새로운 새생명이 도래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시적 주체는 이러한 계절에 ‘영하의 눈발’과 ‘황사’로 인하여 어린 새싹이 눈 뜰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재를 절망스럽게 보고 있다. 하지만 황진이의 벌거벗은 허리와 만나게 되는 꿈 속에서는 새싹이 돋을지도 모른다며 희망을 갖는다. 즉 시적주체가 여성성을 간직하는 대표적인 황진이를 만남으로써 새싹이 돋는 희망,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쯤 더덕 씨앗이 새싹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현실화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이상세계가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구현되는 합일의 세계, 이상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이른 봄날 오후였다
사냥을 하다가 지친 온몸 검정 털 난 젊은 여자가
얼음 풀린 산개울 기슭에서 돌멩이 하나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깊은 낮잠이었다.
깊은 낮잠에 빠진 온몸 검정털 난
젊은 여자의 배는 불룩하니 솟아 있었다.
-「돌 17」의 부분
이 시에서도 봄날 오후 따스한 햇볕이 등장하며 그 아래서 졸고 있는 여자를 묘사하고 있다. 이 여자의 배가 불룩하니 솟아 있는 것으로 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봄’과 ‘임신한 여성’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이 때의 여성은 사냥을 하다 지친 여자로 산개울에서 돌멩이를 베개삼아 자고 있는 여성이다. 즉 이 여성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성으로서 지치고 힘겨운 삶보다는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라보는 시적 주체는 봄과 임신한 여성을 통해 ‘생명성’이라는 동질성을 얻어내고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구멍은 전부 아홉 개다/ 사람의 몸에도 아니 뼈에도/ 아홉 개의 구멍은 날 수가 있다./ 아홉 개의 구멍난 돌도 있다./ 그제는 30년 전 한 이등병이 피흘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떠도는 피리 소리를 들었고/ 어제는 충청북도 후미진 돌밭을 적시는/ 강물 속에 떠도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 오늘 내가 부는 대나무 피리 소리는/ 그제의 피리 소리와 어제의 피리 소리가/ 하나로 섞인 소리고 떠돈다. -「돌 .31」전문
\'피리, 사람, 돌‘에 ‘아홉 개의 구멍’이 새겨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위의 시는 어제와 오늘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제와 어제의 피리소리는 대나무로 만든 내가 오늘 부는 피리소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마지막 행에서 ‘하나로 섞인 소리로’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대나무, 피리, 사람,돌’이라는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소리지만 이들 소리는 세상에서 만나고 함께 섞임으로써 바로 오늘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시적 주체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30년 전 이등병’의 피리소리와 ‘후미진 돌밭’사이의 피리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과거와 소통하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와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제, 어제 , 오늘 부는 피리 소리가 하나로 섞이면서 산, 돌, 강물 속에서 피리 소리가 만나는 것을 통해 ‘피리’는 통합적 세계를 위해 의미를 담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연관성을 통해 분열되고 파괴되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세계를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전봉건으로 하여금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시를 쓰도록 만든 근본적인 힘이다. 피리에서 뼈로, 뼈에서 돌로 이어지는 그의 시 정신을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에서 돌은 6.25의식과 같은 피냄새 나는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세상의 세계로 상승의 이미지를 낳으며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분단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시적 형상화와 정신적인 극복의 노력을 통해서 6.25체험을 새롭게 극복하고자 했던 것을 말이다.
‘피’의 이미지가 재현하는 ‘고향’
전봉건은 자신의 아픔을 되새기며, 여섯번째 시집 『북의 고향』(1982)를 간행하고 「형제여 핏줄이여」,「피울음」같은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시를
이처럼 전봉건의 시들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세계들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병렬과 반복을 통하여서 의미를 공고히 한다. 이것은 각자 처해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렬과 반복을 통하여 보여주는 은유적 세계관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유사성을 통해서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들의 특징은 병렬과 반복을 통해 ‘나’와 ‘자연’의 동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봉건의 후기 시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들 사이의 동일성을 추구하며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 지향점은 시적 주체와 대상 사이의 동일화를 통해 드러난다.
먼저 그의 시들 중에는 ‘여성’과 ‘돌’의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재현하고 그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시도하며 통합하려는 주체의 시도를 읽어낼 수 있다. ‘여자’와 ‘돌’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상 세계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때 드러난다. 시적 주체는 바로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현재 갈 수 없는 ‘북의 고향’을 그리며 나타나고 그로 인해 현재와 과거의 합일을 보여준다.
- ‘여성’과 ‘돌’이미지가 보여주는 합일의 세계
하기야 그 사이/3월이라는데/온 천지를 얼구는/ 영하의 눈발이 쳤고
요즈음엔 숨 막히는/ 황사까지 덮쳤습니다
어린 새싹이야 어디/ 봄 가누어 눈 뜰 엄두나 / 낼 때이겠습니까
하지만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
내가 혹시 /오늘 밤 꿈에/물빛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없이 향기로운 /황진이의 벌거벗은 허리를/만나기라도 한다면
내일 아침쯤/더덕 씨앗은 새싹을/ 내 놓을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봄편지」의 부분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며 새로운 새생명이 도래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시적 주체는 이러한 계절에 ‘영하의 눈발’과 ‘황사’로 인하여 어린 새싹이 눈 뜰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재를 절망스럽게 보고 있다. 하지만 황진이의 벌거벗은 허리와 만나게 되는 꿈 속에서는 새싹이 돋을지도 모른다며 희망을 갖는다. 즉 시적주체가 여성성을 간직하는 대표적인 황진이를 만남으로써 새싹이 돋는 희망,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쯤 더덕 씨앗이 새싹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현실화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이상세계가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구현되는 합일의 세계, 이상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이른 봄날 오후였다
사냥을 하다가 지친 온몸 검정 털 난 젊은 여자가
얼음 풀린 산개울 기슭에서 돌멩이 하나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깊은 낮잠이었다.
깊은 낮잠에 빠진 온몸 검정털 난
젊은 여자의 배는 불룩하니 솟아 있었다.
-「돌 17」의 부분
이 시에서도 봄날 오후 따스한 햇볕이 등장하며 그 아래서 졸고 있는 여자를 묘사하고 있다. 이 여자의 배가 불룩하니 솟아 있는 것으로 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봄’과 ‘임신한 여성’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이 때의 여성은 사냥을 하다 지친 여자로 산개울에서 돌멩이를 베개삼아 자고 있는 여성이다. 즉 이 여성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성으로서 지치고 힘겨운 삶보다는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라보는 시적 주체는 봄과 임신한 여성을 통해 ‘생명성’이라는 동질성을 얻어내고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구멍은 전부 아홉 개다/ 사람의 몸에도 아니 뼈에도/ 아홉 개의 구멍은 날 수가 있다./ 아홉 개의 구멍난 돌도 있다./ 그제는 30년 전 한 이등병이 피흘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떠도는 피리 소리를 들었고/ 어제는 충청북도 후미진 돌밭을 적시는/ 강물 속에 떠도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 오늘 내가 부는 대나무 피리 소리는/ 그제의 피리 소리와 어제의 피리 소리가/ 하나로 섞인 소리고 떠돈다. -「돌 .31」전문
\'피리, 사람, 돌‘에 ‘아홉 개의 구멍’이 새겨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위의 시는 어제와 오늘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제와 어제의 피리소리는 대나무로 만든 내가 오늘 부는 피리소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마지막 행에서 ‘하나로 섞인 소리로’세상을 떠돌아다닌다. ‘대나무, 피리, 사람,돌’이라는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소리지만 이들 소리는 세상에서 만나고 함께 섞임으로써 바로 오늘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시적 주체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30년 전 이등병’의 피리소리와 ‘후미진 돌밭’사이의 피리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과거와 소통하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와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제, 어제 , 오늘 부는 피리 소리가 하나로 섞이면서 산, 돌, 강물 속에서 피리 소리가 만나는 것을 통해 ‘피리’는 통합적 세계를 위해 의미를 담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연관성을 통해 분열되고 파괴되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세계를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전봉건으로 하여금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시를 쓰도록 만든 근본적인 힘이다. 피리에서 뼈로, 뼈에서 돌로 이어지는 그의 시 정신을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에서 돌은 6.25의식과 같은 피냄새 나는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세상의 세계로 상승의 이미지를 낳으며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분단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시적 형상화와 정신적인 극복의 노력을 통해서 6.25체험을 새롭게 극복하고자 했던 것을 말이다.
‘피’의 이미지가 재현하는 ‘고향’
전봉건은 자신의 아픔을 되새기며, 여섯번째 시집 『북의 고향』(1982)를 간행하고 「형제여 핏줄이여」,「피울음」같은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시를
추천자료
 동남아인들의 세계관과 우리나라세계관의 비교
동남아인들의 세계관과 우리나라세계관의 비교 세계화의 실체와 세계 자본주의의 전망
세계화의 실체와 세계 자본주의의 전망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와 지역화 동아세계체제형성의 정치경제학 -중국의 역할과 한계
동아세계체제형성의 정치경제학 -중국의 역할과 한계 세계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한국
세계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한국 [정지용][문학][시 세계][정지용 문학][정지용 시 세계][시][동시][율격]정지용의 문학과 시 ...
[정지용][문학][시 세계][정지용 문학][정지용 시 세계][시][동시][율격]정지용의 문학과 시 ... [세계의 5대종교 분석][종교의 다양성]세계의 종교들(분석레포트)
[세계의 5대종교 분석][종교의 다양성]세계의 종교들(분석레포트) 세계화와 제 3세계 의료환경
세계화와 제 3세계 의료환경 [여성교류, 여성교류와 세계여성대회, 여성교류와 남북여성, 여성교류와 한중여성, 여성교류...
[여성교류, 여성교류와 세계여성대회, 여성교류와 남북여성, 여성교류와 한중여성, 여성교류... [국제화, 국제화 정의, 국제화 성격, 국제화 중요성, 국제화 전제조건, 국제화 세계도시]국제...
[국제화, 국제화 정의, 국제화 성격, 국제화 중요성, 국제화 전제조건, 국제화 세계도시]국제... [아시아,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화, 연대관]아시아의 개념, 아시아의 민족주의, 아시아의 ...
[아시아,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화, 연대관]아시아의 개념, 아시아의 민족주의, 아시아의 ... [인권][권리][인권 의미][인권 내용][인권 발달과정][세계사회포럼][전문가][교육]인권의 의...
[인권][권리][인권 의미][인권 내용][인권 발달과정][세계사회포럼][전문가][교육]인권의 의... 기독교 세계관적 실과 교재 개발 연구 - 초등 6학년 ‘일과 직업의 세계’ 단원을 중심으로 - (...
기독교 세계관적 실과 교재 개발 연구 - 초등 6학년 ‘일과 직업의 세계’ 단원을 중심으로 - (... [세계의정치와경제 -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
[세계의정치와경제 -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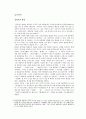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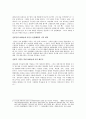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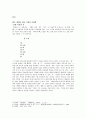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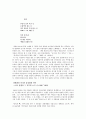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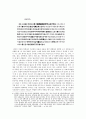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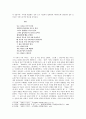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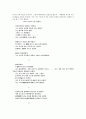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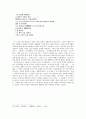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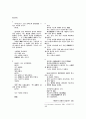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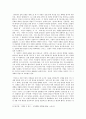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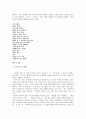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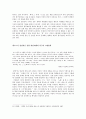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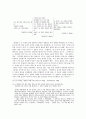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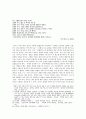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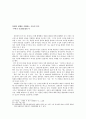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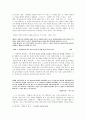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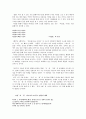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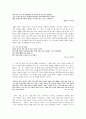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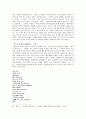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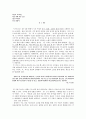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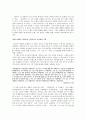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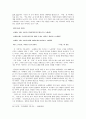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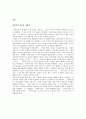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