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무신정권기 건축의 성향
Ⅱ. 원의 정치간섭과 건축의 영향
Ⅲ. 목조건축의 구조와 조형미
Ⅳ. 목조건축의 두 가지 형식, 주심포식과 다포식
Ⅴ. 온돌의 보급
Ⅱ. 원의 정치간섭과 건축의 영향
Ⅲ. 목조건축의 구조와 조형미
Ⅳ. 목조건축의 두 가지 형식, 주심포식과 다포식
Ⅴ. 온돌의 보급
본문내용
한국건축의 역사
- 2편 중세건축의 성립 -
(5장 고려후기 사회변화와 건축변모)
Ⅰ. 무신정권기 건축의 성향
1. 무신정권
* 1170년 무신들은 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장학하고, 100년간 무신정권을 수립하였다.
* 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무인 중심의 새로운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라말 이후 형성되어 온 귀족사회가 뒤엎어지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 귀족취미가 지배하던 풍조는 사라지고 거칠 것 없는 권력을 쥔 소수 무인의 문화가 펼쳐짐
* 13세기 전반기 최씨 일파의 2대 장군 최우 때, 무인문화는 정절기였다.
- 최우는 자기 집 남쪽에 거대한 누각을 짓고, 서쪽에는 십자각을 지었다.
- 누각은 2층에 1천명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하며, 십자각은 내부가 十자 모형을 이루었으며,
실내가 모두 거울로 되고 대들보는 굽어 휘어지고 휘황한 채색이 가미 되었다고 한다.
* 절대적 권력 속에 화려함과 장대함을 마음껏 과시한 과장된 것이었으며 이는 봉건적 관료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무인정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문신들의 삶
* 문신들은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거나 무인 밑에서 관리를 지냈다.
- 점차 개경에 돌아와 무신 아래서 관료 생활을 하였으며, 대표적 인물로 이규보가 있다.
* 문인들은 무인과는 반대로 소박하고 절제하여 최소한으로 응측된 세계를 나타내었다.
-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사륜정기」은 그러한 건축세계를 표현하였다.
3. 불교계의 동요와 변화
* 고려전기 정치와 밀착되어 있던 불교계는 무신집권에 의해 크게 동요되었다.
집권초기 귀법사, 영통사, 흥왕사등의 전통적 대찰들은 무력투쟁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 경상도 운문사, 영주 부석사, 부인사 등도 가담하여 농민 반란에 지지를 보냈으나,
불교계의 무력 항쟁은 모두 좌절되었다.
* 13세기 불교계를 이끌어 간 것은 지방산간에서 전개된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 보조국사 지눌은 세속화된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산림에 은둔하여 결성한 수선사로 하여금
종교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 수선사는 선종을 종지로 하여 후에 조계선정으로 발전 하였고, 다른 신앙 결사로
천태종을 이은백련결사운동이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 수선사는 뒤에 송광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비슷한 가람구성을 보이는 곳으로 곡성의 태안사가
있으며, 『태안사지』에 절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 두 절의 가람구성의 특징은 수많은 건문들이 결국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금당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전이 하나의 예불공간을 이루고 또 승려들의 살림채가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하나의 자급자족적인 생활공간을 잘 갖추고 있다.
*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변화는 가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되며, 장대한 불교행사 위조의 가람
운영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 흔히 한국건축의 한 가지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은 이시기에
확고한 위상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 이 시기의 산간 사찰의 큰 재목의 확보는 쉬었으나, 돌을 떠오고 가공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 통일신라 때의 양식들을 일일이 흉내내기는 용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 결국 석재를 자연석 그대로 약간 가공하여 쓰는 자연석축으로 가공하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Ⅱ. 원의 정치간섭과 건축의 영향
1. 원의 정치 간섭 : 1260년 고려는 몽고에 굴복하였으며 이후 100년간 원의 정치 간섭이 시작
- 2편 중세건축의 성립 -
(5장 고려후기 사회변화와 건축변모)
Ⅰ. 무신정권기 건축의 성향
1. 무신정권
* 1170년 무신들은 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장학하고, 100년간 무신정권을 수립하였다.
* 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무인 중심의 새로운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라말 이후 형성되어 온 귀족사회가 뒤엎어지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 귀족취미가 지배하던 풍조는 사라지고 거칠 것 없는 권력을 쥔 소수 무인의 문화가 펼쳐짐
* 13세기 전반기 최씨 일파의 2대 장군 최우 때, 무인문화는 정절기였다.
- 최우는 자기 집 남쪽에 거대한 누각을 짓고, 서쪽에는 십자각을 지었다.
- 누각은 2층에 1천명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하며, 십자각은 내부가 十자 모형을 이루었으며,
실내가 모두 거울로 되고 대들보는 굽어 휘어지고 휘황한 채색이 가미 되었다고 한다.
* 절대적 권력 속에 화려함과 장대함을 마음껏 과시한 과장된 것이었으며 이는 봉건적 관료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무인정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문신들의 삶
* 문신들은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거나 무인 밑에서 관리를 지냈다.
- 점차 개경에 돌아와 무신 아래서 관료 생활을 하였으며, 대표적 인물로 이규보가 있다.
* 문인들은 무인과는 반대로 소박하고 절제하여 최소한으로 응측된 세계를 나타내었다.
-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사륜정기」은 그러한 건축세계를 표현하였다.
3. 불교계의 동요와 변화
* 고려전기 정치와 밀착되어 있던 불교계는 무신집권에 의해 크게 동요되었다.
집권초기 귀법사, 영통사, 흥왕사등의 전통적 대찰들은 무력투쟁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 경상도 운문사, 영주 부석사, 부인사 등도 가담하여 농민 반란에 지지를 보냈으나,
불교계의 무력 항쟁은 모두 좌절되었다.
* 13세기 불교계를 이끌어 간 것은 지방산간에서 전개된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 보조국사 지눌은 세속화된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산림에 은둔하여 결성한 수선사로 하여금
종교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 수선사는 선종을 종지로 하여 후에 조계선정으로 발전 하였고, 다른 신앙 결사로
천태종을 이은백련결사운동이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 수선사는 뒤에 송광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비슷한 가람구성을 보이는 곳으로 곡성의 태안사가
있으며, 『태안사지』에 절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 두 절의 가람구성의 특징은 수많은 건문들이 결국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금당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전이 하나의 예불공간을 이루고 또 승려들의 살림채가 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하나의 자급자족적인 생활공간을 잘 갖추고 있다.
*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변화는 가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되며, 장대한 불교행사 위조의 가람
운영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 흔히 한국건축의 한 가지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은 이시기에
확고한 위상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 이 시기의 산간 사찰의 큰 재목의 확보는 쉬었으나, 돌을 떠오고 가공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 통일신라 때의 양식들을 일일이 흉내내기는 용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 결국 석재를 자연석 그대로 약간 가공하여 쓰는 자연석축으로 가공하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Ⅱ. 원의 정치간섭과 건축의 영향
1. 원의 정치 간섭 : 1260년 고려는 몽고에 굴복하였으며 이후 100년간 원의 정치 간섭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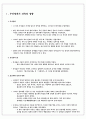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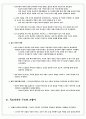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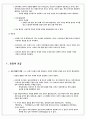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