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설
1. 작가 프로필과 역사적 배경
2. 작품 줄거리
Ⅱ. 본론
1. 문제적 장면 (법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대목)
2. 예술과 외설, 그리고 법
3. 작성자의 감상, 해석, 논평
Ⅲ. 맺음말
참고문헌
Ⅰ. 서설
1. 작가 프로필과 역사적 배경
2. 작품 줄거리
Ⅱ. 본론
1. 문제적 장면 (법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대목)
2. 예술과 외설, 그리고 법
3. 작성자의 감상, 해석, 논평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정에 다다른 순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중략)… 들것에 실려온 병사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부분에서는 피가 샘솟듯 뿜어 나왔다. 그러나 부상병은 그녀의 수고도 헛되이 서서히 죽어갔다. 그녀는 나에게 부상병에게서 뿜어 나오는 피가 뜨겁다고 말하면서 극도로 흥분해, 피곤해 하는 나에게 자신의 피로 얼룩진 옷을 벗겨 달라고 애원했다. Ibid., pp 147-149.
이윽고 선고문이 낭독되었다. 선고문은 짧았다. 그곳에 주둔한 모든 일본군 병사로부터 한 대씩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대원은 총 1만1천명이었다. …(중략)… 첫 번째 채찍은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이 나의 윤기 흐르는 피부에 내리치는 채찍은 어둡고 뻘건 자국을 남겼다. 나는 꾹 참고 1천대의 채찍을 맞고는 심벌이 흥분된 채 내 핏속에 쓰러졌다. 그러자 병사들이 나를 들것에 담은 후, 계속해서 나의 부풀어오른 피투성이 몸을 내리치는 채찍 속을 박자를 맞춰 걸어갔다. 곧 내 심벌에선 정액이 뿜어 나왔고, 몇 번씩 흥분된 나의 심벌은 이제 인간 넝마가 된 나를 힘껏 내리치는 병사들의 얼굴에 정액을 튀겼다. 얼마 후 나는 2천대의 채찍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도 계속 형은 집행되었고, 더 이상 어디가 어딘지 모를 나의 넝마조각 위를 마지막 병사가 내리쳤다. Ibid., pp 174-175.
2. 예술과 외설, 그리고 법
아름다운 서정시 <미라보 다리>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항문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항문 숭배자였다. 조은섭, “포도주, 해시시 그리고 섹스”, 밝은 세상, 2003.
문학적인 측면을 뛰어넘을 정도로 엉덩이에 대해 그가 보여주는 관심과 <엉덩이(cul)> 황현산, “얼굴 없는 희망 : 아폴리네르 시집 『알콜』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라는 단어에 대한 그의 집착은 <돈쥬앙>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의 여성 성기에 대한 불안과 항문에 대한 새디스트적인 역진적 단계에 그가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은섭, Op. cit., p.85.
또한 이 작품에는 공격적인 잔혹성이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 퀼퀴린이 치아로 라샤루프의 성기를 바로 거세하는 장면이나 코르나뵈의 새디스트적인 복수가 그것이다. 또 채찍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면과 포로를 말뚝에 박아 죽이는 장면 또한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도 나타나고 있다. 죽은 시체와 성교하는 시간(屍姦) 장면이나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獸姦) 장면은 금기를 벗어난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애널 섹스 장면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묘사 등도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더러운 분뇨 속에서의 성행위 장면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음란성의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도 그렇다. 성에 대한 문화 또는 성 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란성 유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1987년 12월 12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1970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 1982년 2월 9일의 대법원 판결도 음란성의 개념에 관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은 음란성의 정의에 관해 대법원 판례와 거의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도서 잡지에 실리는 글이나 사진이 예술성을 지니는 경우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성과 음란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예술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대법원은 1970년 10월 30일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사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침대 위에 비스듬히 위를 보고 누워 있는 천연색 나체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건과 같이 성냥갑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고 그 그림은 이를 보는 자에게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케 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조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음란한 도화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제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도서 또는 잡지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서 또는 잡지의 내용을 이루는 전체적 흐름 내지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5년 12월 9일 『반노』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반노의 13장 내지 14장 기재 부분이 음란하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나 정상적인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음란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3월 13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문학작품에 있어 고도의 예술성이 인정된다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다.
1969년 10월 15일 『악덕의 번영』이라는 사건의 판결에서 \'문서가 가지는 예술성, 사상성이 문서의 내용인 외설성을 해소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정도로 외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예술적 사상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외설 문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다.
이 두 가지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 정신은 『성냥갑 속의 나체사진』에 대한 우리 나라 대법원 판결과 맥이 통하는 바 있다. 또 1980년 11월 28일 『四疊半澳
이윽고 선고문이 낭독되었다. 선고문은 짧았다. 그곳에 주둔한 모든 일본군 병사로부터 한 대씩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대원은 총 1만1천명이었다. …(중략)… 첫 번째 채찍은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이 나의 윤기 흐르는 피부에 내리치는 채찍은 어둡고 뻘건 자국을 남겼다. 나는 꾹 참고 1천대의 채찍을 맞고는 심벌이 흥분된 채 내 핏속에 쓰러졌다. 그러자 병사들이 나를 들것에 담은 후, 계속해서 나의 부풀어오른 피투성이 몸을 내리치는 채찍 속을 박자를 맞춰 걸어갔다. 곧 내 심벌에선 정액이 뿜어 나왔고, 몇 번씩 흥분된 나의 심벌은 이제 인간 넝마가 된 나를 힘껏 내리치는 병사들의 얼굴에 정액을 튀겼다. 얼마 후 나는 2천대의 채찍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도 계속 형은 집행되었고, 더 이상 어디가 어딘지 모를 나의 넝마조각 위를 마지막 병사가 내리쳤다. Ibid., pp 174-175.
2. 예술과 외설, 그리고 법
아름다운 서정시 <미라보 다리>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항문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항문 숭배자였다. 조은섭, “포도주, 해시시 그리고 섹스”, 밝은 세상, 2003.
문학적인 측면을 뛰어넘을 정도로 엉덩이에 대해 그가 보여주는 관심과 <엉덩이(cul)> 황현산, “얼굴 없는 희망 : 아폴리네르 시집 『알콜』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라는 단어에 대한 그의 집착은 <돈쥬앙>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의 여성 성기에 대한 불안과 항문에 대한 새디스트적인 역진적 단계에 그가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은섭, Op. cit., p.85.
또한 이 작품에는 공격적인 잔혹성이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 퀼퀴린이 치아로 라샤루프의 성기를 바로 거세하는 장면이나 코르나뵈의 새디스트적인 복수가 그것이다. 또 채찍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면과 포로를 말뚝에 박아 죽이는 장면 또한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도 나타나고 있다. 죽은 시체와 성교하는 시간(屍姦) 장면이나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獸姦) 장면은 금기를 벗어난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애널 섹스 장면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묘사 등도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더러운 분뇨 속에서의 성행위 장면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음란성의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도 그렇다. 성에 대한 문화 또는 성 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란성 유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1987년 12월 12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1970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 1982년 2월 9일의 대법원 판결도 음란성의 개념에 관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은 음란성의 정의에 관해 대법원 판례와 거의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도서 잡지에 실리는 글이나 사진이 예술성을 지니는 경우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성과 음란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예술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대법원은 1970년 10월 30일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사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침대 위에 비스듬히 위를 보고 누워 있는 천연색 나체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건과 같이 성냥갑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고 그 그림은 이를 보는 자에게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케 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조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음란한 도화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제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도서 또는 잡지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서 또는 잡지의 내용을 이루는 전체적 흐름 내지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75년 12월 9일 『반노』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반노의 13장 내지 14장 기재 부분이 음란하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나 정상적인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음란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3월 13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문학작품에 있어 고도의 예술성이 인정된다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다.
1969년 10월 15일 『악덕의 번영』이라는 사건의 판결에서 \'문서가 가지는 예술성, 사상성이 문서의 내용인 외설성을 해소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정도로 외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예술적 사상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외설 문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다.
이 두 가지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 정신은 『성냥갑 속의 나체사진』에 대한 우리 나라 대법원 판결과 맥이 통하는 바 있다. 또 1980년 11월 28일 『四疊半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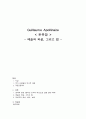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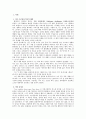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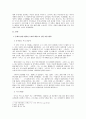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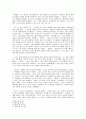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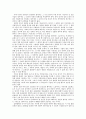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