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목차
☀ 9주차 ☀ …………………………………01p
☀ 10주차 ☀…………………………………08p
☀ 11주차 ☀…………………………………16p
☀ 12주차 ☀…………………………………23p
☀ 13주차 ☀…………………………………28p
☀ 14주차 ☀…………………………………31p
☀ 15주차 ☀…………………………………36p
☀ 10주차 ☀…………………………………08p
☀ 11주차 ☀…………………………………16p
☀ 12주차 ☀…………………………………23p
☀ 13주차 ☀…………………………………28p
☀ 14주차 ☀…………………………………31p
☀ 15주차 ☀…………………………………36p
본문내용
된다는 믿음에 근거
: 산신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문을 읽음
- 전통상례에서는 화장은 없고 거의가 매장이기 때문에 무덤을 중요시 함
- 무덤은 묘지를 고르는 풍수의 자문을 받음
- 땅과 산에 대한 경외를 표하기 위해 축문을 지어 산신에게 일정한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을 보호해 달라는 기원
매장의 풍속
- 신체를 중요시한다는 의미
- 특히 뼈의 보존과 관련됨
: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만 남아 흙 속에 묻힌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뼈가 썩어 황금색이라면 무덤의 풍수가 좋은 것, 검은색이면 풍수가 나쁘다는 의미로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에 매장해야 한다.
- 조상의 뼈를 포함한 주검의 정성스런 숭배와 풍수는 푸손의 길흉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속신
: 조상의뼈를 포함한 주검의 정성스러운 숭배와 풍수는 후손의 길흉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속신
: 좋은 풍수에 위치한 조상의 뼈들은 땅의 고동치는 풍수와 기의 충만한 힘을 받음
: 만약 풍수가 좋으면 조상의 뼈는 밝은 노란빛으로 변하고 매우 효력있는 것으로 간주
: 뼈의 노란 색은 그것에 불어넣어진 기의 결과이며 이 같은 기는 행운의 사람의 영혼에서 밝아짐
-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야 하는 이유
: 어버이의 육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자는 말한다. (화장은 육신의 훼손)
- 불교가 들어오기 전 동북아시아의 오랜 부활의 전통이 뼈를 중시한 매장법의 배경.
2) 반곡(反哭) - 우제(虞祭) - 졸곡 (卒哭)
우제
- 사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
- 치장을 한 후 우제를 지냄
-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세 번이 있음
* 초우제: 장일 낮에 지냄
* 재우제: 유일(柔日), 즉 일진이 乙丁己辛癸 (을정기신계) 에 해당하는 날에 지냄
* 삼우제: 강일(剛日, 즉 일진이 甲丙戊庚壬 (갑병무경임) 에 해당하는 날에 지냄
옛 선인들은 음력을 따졌기 때문에 길일인지 아닌지를 그에 따라 판단
- 우제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흉례에서 길례로의 전환이 가능 (금기상태에서 벗어남)
- 우제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숭모의 대상 혹은 제례의 대상이 됨
* 귀신 : 천지간에 하나의 기운을 통틀어 말함
* 혼백 : 사람의 몸을 주로 말함
- 기가 펼쳐지고 있을 경우 : 정백이 단단하게 갖추어 있으나 신(神)이 주가 됨
- 기가 오므려지게 될 경우 : 혼기가 비록 존재하나 귀신이 주가 됨
- 기가 소진하게 될 경우 : 백이 내려가 귀(鬼)만의 상태가 됨 (사람 죽는 것을 ‘귀(鬼’)라 한다)
◆ 상례의 절차를 통한 윤리적 의의
한국 전통 상례의 윤리적 의미 정리
- 상례는 흉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닥친 죽음의 통과의례를 거행하는 것
- 이러한 것은 금기상태에서 재난으로 간주됨
- 한국의 전통상례
: 유교, 불교, 민간신앙 (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적 의례 위주 / 동시에 불교, 민간신앙의 요소 공존)
- 한국의 전통상례는 인간의 생명이 윤회하거나 부활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특징
- 비록 죽은 자일 망정 후손들에게 추모의 대상이 됨으로써 재생이 가능함 (명당존중사상 발생)
* 명당존중사상
: 남은 육신의 잔재인 뼈가 잘 유지됨으로써 자손에게 죽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상례는 슬픔의 의례인 동시에 영구한 이별이 아닌 제례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유대를 맺어 효를 실현하는 것
: 한국 전통상례의 윤리적 의의
1) 생명존중 사상
- 죽은 자의 신체와 뼈를 소중히 여김
: 사람이 비록 사망했더라도 그 체에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봄
: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의 상징이고 재생을 기약하는 것. 따라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
2) 조상숭배 사상
- 부모를 위시한 조상은 자기생명의 근원
: 이를 종교적인 대상으로 영원히 추모
: 그 종교적 상징은 다름아닌 무덤
- 후손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영생한다고 생각함
: 금기적 흉례는 곧 상례를 마무리하면 길례로 변환함
3)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
-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의 가치가 들어있음
- 상복제도의 경우 철저한 부계가족위주로 5단계의 복식을 나눔
: 외조부모는 방계재종의 상복
: 처부모는 방계삼종의 복식에 준함
: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 의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4) 죽은 자에 대한 예의
-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의 기준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음 (유교적 가르침)
- 생명을 잃었지만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예절을 갖추어 상례를 치름
-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
: 결코 기쁨이 아닌 슬픔의 의례를 중시
◆ 장례식의 의의
-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각하기조차 꺼려함
-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에 죽음의 문제를 대화 속에 화제로 올리는 것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 여러 가지 의식 등 애도의 제도화는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여러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정도는 다르더라도 그들의 슬픔을 서로 나눈다.
-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느낌
: 좀 더 슬퍼하는 사람을 지지해 주어야 할 필요성
: 그들의 퇴행(Regress)을 받아 주어야 할 필요성
: 이 때 공격적인 표현이 최초로 감소된다.
: 그러면서도 부활신앙이 강조되어야 한다.
- 대부분 장례의식에 행해지는 절차는 가족에 대한 위로의 한계를 넘지 못함
- 장례식의 여러 의식 절차를 통해
: 죽음의 현실을 명확히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
: 부정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시체를 보는 것, 관에 흙을 덮는 것, 여러 가지 종교의식 (더 이상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 장례식은 슬퍼하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상징
- 장례식이 끝난 후 서서히 슬픔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죽음의 현실이 받아들여짐
: 처음으로 슬픔으로 인해 몸에 일시적 마비증상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통증 경험
: 때때로 이러한 통증은 죽은 사람이 임종 때 경험했던 똑같은 증세를 보임
: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 유형
◆ 장례식절차
1) 첫째 날 (임종)
-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
- 운명(殞命)이라고도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준비해야 할 것
-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 산신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문을 읽음
- 전통상례에서는 화장은 없고 거의가 매장이기 때문에 무덤을 중요시 함
- 무덤은 묘지를 고르는 풍수의 자문을 받음
- 땅과 산에 대한 경외를 표하기 위해 축문을 지어 산신에게 일정한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을 보호해 달라는 기원
매장의 풍속
- 신체를 중요시한다는 의미
- 특히 뼈의 보존과 관련됨
: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만 남아 흙 속에 묻힌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뼈가 썩어 황금색이라면 무덤의 풍수가 좋은 것, 검은색이면 풍수가 나쁘다는 의미로 자리를 옮겨 다른 장소에 매장해야 한다.
- 조상의 뼈를 포함한 주검의 정성스런 숭배와 풍수는 푸손의 길흉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속신
: 조상의뼈를 포함한 주검의 정성스러운 숭배와 풍수는 후손의 길흉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속신
: 좋은 풍수에 위치한 조상의 뼈들은 땅의 고동치는 풍수와 기의 충만한 힘을 받음
: 만약 풍수가 좋으면 조상의 뼈는 밝은 노란빛으로 변하고 매우 효력있는 것으로 간주
: 뼈의 노란 색은 그것에 불어넣어진 기의 결과이며 이 같은 기는 행운의 사람의 영혼에서 밝아짐
-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야 하는 이유
: 어버이의 육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자는 말한다. (화장은 육신의 훼손)
- 불교가 들어오기 전 동북아시아의 오랜 부활의 전통이 뼈를 중시한 매장법의 배경.
2) 반곡(反哭) - 우제(虞祭) - 졸곡 (卒哭)
우제
- 사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
- 치장을 한 후 우제를 지냄
-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세 번이 있음
* 초우제: 장일 낮에 지냄
* 재우제: 유일(柔日), 즉 일진이 乙丁己辛癸 (을정기신계) 에 해당하는 날에 지냄
* 삼우제: 강일(剛日, 즉 일진이 甲丙戊庚壬 (갑병무경임) 에 해당하는 날에 지냄
옛 선인들은 음력을 따졌기 때문에 길일인지 아닌지를 그에 따라 판단
- 우제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흉례에서 길례로의 전환이 가능 (금기상태에서 벗어남)
- 우제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숭모의 대상 혹은 제례의 대상이 됨
* 귀신 : 천지간에 하나의 기운을 통틀어 말함
* 혼백 : 사람의 몸을 주로 말함
- 기가 펼쳐지고 있을 경우 : 정백이 단단하게 갖추어 있으나 신(神)이 주가 됨
- 기가 오므려지게 될 경우 : 혼기가 비록 존재하나 귀신이 주가 됨
- 기가 소진하게 될 경우 : 백이 내려가 귀(鬼)만의 상태가 됨 (사람 죽는 것을 ‘귀(鬼’)라 한다)
◆ 상례의 절차를 통한 윤리적 의의
한국 전통 상례의 윤리적 의미 정리
- 상례는 흉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닥친 죽음의 통과의례를 거행하는 것
- 이러한 것은 금기상태에서 재난으로 간주됨
- 한국의 전통상례
: 유교, 불교, 민간신앙 (주자가례에 의한 유교적 의례 위주 / 동시에 불교, 민간신앙의 요소 공존)
- 한국의 전통상례는 인간의 생명이 윤회하거나 부활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특징
- 비록 죽은 자일 망정 후손들에게 추모의 대상이 됨으로써 재생이 가능함 (명당존중사상 발생)
* 명당존중사상
: 남은 육신의 잔재인 뼈가 잘 유지됨으로써 자손에게 죽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상례는 슬픔의 의례인 동시에 영구한 이별이 아닌 제례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유대를 맺어 효를 실현하는 것
: 한국 전통상례의 윤리적 의의
1) 생명존중 사상
- 죽은 자의 신체와 뼈를 소중히 여김
: 사람이 비록 사망했더라도 그 체에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봄
: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의 상징이고 재생을 기약하는 것. 따라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
2) 조상숭배 사상
- 부모를 위시한 조상은 자기생명의 근원
: 이를 종교적인 대상으로 영원히 추모
: 그 종교적 상징은 다름아닌 무덤
- 후손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영생한다고 생각함
: 금기적 흉례는 곧 상례를 마무리하면 길례로 변환함
3)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
-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의 가치가 들어있음
- 상복제도의 경우 철저한 부계가족위주로 5단계의 복식을 나눔
: 외조부모는 방계재종의 상복
: 처부모는 방계삼종의 복식에 준함
: 부계 중심적 가족주의 의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4) 죽은 자에 대한 예의
-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의 기준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음 (유교적 가르침)
- 생명을 잃었지만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예절을 갖추어 상례를 치름
-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
: 결코 기쁨이 아닌 슬픔의 의례를 중시
◆ 장례식의 의의
-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각하기조차 꺼려함
-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에 죽음의 문제를 대화 속에 화제로 올리는 것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 여러 가지 의식 등 애도의 제도화는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여러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정도는 다르더라도 그들의 슬픔을 서로 나눈다.
-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느낌
: 좀 더 슬퍼하는 사람을 지지해 주어야 할 필요성
: 그들의 퇴행(Regress)을 받아 주어야 할 필요성
: 이 때 공격적인 표현이 최초로 감소된다.
: 그러면서도 부활신앙이 강조되어야 한다.
- 대부분 장례의식에 행해지는 절차는 가족에 대한 위로의 한계를 넘지 못함
- 장례식의 여러 의식 절차를 통해
: 죽음의 현실을 명확히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
: 부정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시체를 보는 것, 관에 흙을 덮는 것, 여러 가지 종교의식 (더 이상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 장례식은 슬퍼하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상징
- 장례식이 끝난 후 서서히 슬픔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죽음의 현실이 받아들여짐
: 처음으로 슬픔으로 인해 몸에 일시적 마비증상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통증 경험
: 때때로 이러한 통증은 죽은 사람이 임종 때 경험했던 똑같은 증세를 보임
: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 유형
◆ 장례식절차
1) 첫째 날 (임종)
-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
- 운명(殞命)이라고도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준비해야 할 것
-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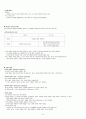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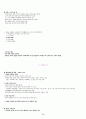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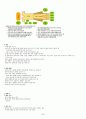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