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작가 소개
2. <오분간> 작품 소개
3. 작품 감상
2. <오분간> 작품 소개
3. 작품 감상
본문내용
. 처음에 나는 신이라는 인물이 이제까지 모든 것이 신에 의해 결정되었던 중세 시대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지금 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즉, ‘신’은 ‘종교’이다. 종교가 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신의 힘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점점 과학과 지식이 발달할수록 종교의 입지는 좁아져갔으며 사람들의 의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인간의 편인 프로메테우스는 ‘지식’이나 ‘과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종교는 틀리고 과학이 옳다고 보는 것은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원자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에게 지혜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가 아니었나. 과학은 원자 폭탄을 발명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말해 주지 않는다. 그 역할은 아마도 종교의 영역이다. 신과 프로메테우스, 즉 과학과 종교는 어느 하나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싸우며 때로 타협하며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신에 치우쳐 살았을 때의 인간이 어리석었듯, 지금의 프로메테우스 또한 극한에 가까웠다는 신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4)
세상은 부글부글 끓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교지(狡智; 교활한 재주와 꾀)와 폭력과 간악이 활개를 치면서 신의 옆구리를 차겠다고 날치는 판이었다. -중략- 회담은 오분간에 끝나고 제각기 자기 고장을 향해서 아래 위로 떠났다. 도중에서 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 혼돈의 허무 속에서 제삼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시비를 내 어찌 책임질소냐.”
이정민은 행길에 나서 크게 숨을 내쉬었다.
“후-, 세상은 여전하구나, ぢ차두 가구, 앗다 기생은 웃구, 하이야가 달리구. 사내자식은 휘청거리구, 더-럽다 더-러워, 관성의 법칙이로구나.”
- 프로메테우스를 부하로 삼아 지상을 다스리려 했던 신의 의지가 매사에 삐딱하게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꺾이고, 마침내 회담은 끝난다. 그리고 신은 제삼존재의 출현을 바라며 떠난다. 신이 떠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와 부패뿐이다. 기존의 신이 주었던 쇠사슬을 벗어던진 인간에게 더 이상 욕망을 절제할 이유는 없다. 온갖 억눌러 왔던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간세계의 모습을 보면 타락 그 자체이다. 이 ‘혼돈의 허무’ 속에서 제삼존재란 대체 무엇일까? 신이 종교, 프로메테우스를 과학이라 본다면 제삼존재란 어떠한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 것 같다. 즉, 제 3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무언가 직접적인 해결은 없고 그저 세태의 비판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처음부터 신화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난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과 해결책마저도 관념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세상은 부글부글 끓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교지(狡智; 교활한 재주와 꾀)와 폭력과 간악이 활개를 치면서 신의 옆구리를 차겠다고 날치는 판이었다. -중략- 회담은 오분간에 끝나고 제각기 자기 고장을 향해서 아래 위로 떠났다. 도중에서 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 혼돈의 허무 속에서 제삼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시비를 내 어찌 책임질소냐.”
이정민은 행길에 나서 크게 숨을 내쉬었다.
“후-, 세상은 여전하구나, ぢ차두 가구, 앗다 기생은 웃구, 하이야가 달리구. 사내자식은 휘청거리구, 더-럽다 더-러워, 관성의 법칙이로구나.”
- 프로메테우스를 부하로 삼아 지상을 다스리려 했던 신의 의지가 매사에 삐딱하게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꺾이고, 마침내 회담은 끝난다. 그리고 신은 제삼존재의 출현을 바라며 떠난다. 신이 떠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와 부패뿐이다. 기존의 신이 주었던 쇠사슬을 벗어던진 인간에게 더 이상 욕망을 절제할 이유는 없다. 온갖 억눌러 왔던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간세계의 모습을 보면 타락 그 자체이다. 이 ‘혼돈의 허무’ 속에서 제삼존재란 대체 무엇일까? 신이 종교, 프로메테우스를 과학이라 본다면 제삼존재란 어떠한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 것 같다. 즉, 제 3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무언가 직접적인 해결은 없고 그저 세태의 비판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처음부터 신화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난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과 해결책마저도 관념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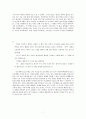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