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왜 60년대 인가?
1-1. 미술계 밖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격변, 미국의 패권화
1-2. 미술계 안
다양한 미술사조 발발
뉴욕미술시장의 활황
2. 60s 작품 경향
2-1. Pro ?
팝 아트: 앤디 워홀
미니멀리즘: 도널드 저드
2-2. Anti ?
해프닝: 앨런 캐프로
퍼포먼스 및 설치: 클래스 올덴버그
전시: <서술적 구상>展 (1965)
3. 폴 우드의 「상품」을 통해 진단해보는 근현대 미술에서 상품화의 문제.
나오며
1. 왜 60년대 인가?
1-1. 미술계 밖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격변, 미국의 패권화
1-2. 미술계 안
다양한 미술사조 발발
뉴욕미술시장의 활황
2. 60s 작품 경향
2-1. Pro ?
팝 아트: 앤디 워홀
미니멀리즘: 도널드 저드
2-2. Anti ?
해프닝: 앨런 캐프로
퍼포먼스 및 설치: 클래스 올덴버그
전시: <서술적 구상>展 (1965)
3. 폴 우드의 「상품」을 통해 진단해보는 근현대 미술에서 상품화의 문제.
나오며
본문내용
포스터 외 지음,『1900년 이후의 미술사』, p. 579.
이 때 크라우스가 말하는 “대상의 코드를 취함”은 다름 아닌 산업생산방식을 뜻하는 듯하다. 크로우는 저드가 전문 기술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정확한 지시사항들을 따라 금속박판, 플렉시글라스, 합판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후속 작품들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했다. 토머스 크로 지음,『60년대 미술』, p. 194.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런 산업적인 제조 방식은 작품이 대량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동시에, 극도로 탈개성화된 작품 제작 방식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복수로 제작된 작품들이기에,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원본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 반(反)작업의 방식은 단순히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이가 레디메이드라는 극한까지 밀어붙여, ‘상점에서 구입한’ 단위들로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할 포스터 외 지음,『1900년 이후의 미술사』, p. 494.
공업용 재료로 균일한 형태를 반복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진 저드의 작품은 당대 일상사물에 내장된 또 하나의 사물이다. Holiday T. Day, The Nature of Rower, Power: Its Myths and Mores in American Art 1961-1991, Indianapolis Museum of Art, 1991(exh. cat), P17참조. (윤난지,「특정한 물체의 불특정한 정체: 도널드 저드의 예술-상품」, 2005, p. 168에서 재인용)
이제 하나의 사물로써, 상품으로써 작품을 제작했던 구체적 예술가들을 살펴보자. 저드는 “특정한 물체(Specific Object)”에서 미니멀리스트들이 대량생산 작업의 이점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드의 판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개 정도를 제작하였는데, 100개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무제 untitled>(1967년) 같은 입체작품도 200개의 에디션으로 만들었다. Donald Judd(1977), “In defence of my work, Donald Judd: Selected Words 1960-1991, The Mudern Art, Saitama; The Museum of Modern ART, Shiga, 1999(exh.cat), p. 186. ” (윤난지,「특정한 물체의 불특정한 정체: 도널드 저드의 예술-상품」, 2005, p. 168에서 재인용)
후에, 저드는 생활공간으로 까지 확장하여 자신의 작업의 형태를 변용하여 상품성 있는 가구 등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작가 자신의 고유한 형식적 특징으로 브랜드화 한 것으로서, 진정한 예술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2-2. Anti ?
이브-알랑 부아(Yve-Alain Bois)는 『1900년 이후의 미술사』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 Benjamin H.D. Buchloh, Art Since 1900, London: Thames & Hudson, 2004; 할 포스터, 로자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랑 부아, 벤자민 부클로 지음, 배수희 외 옮김,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의 1961년 파트에서 해프닝과 설치라는 새로운 작업양식을 갖고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한 두 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바로 앨런 캐프로(Allan Kaprow)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가 그들인데, 이 작가들은 일회적인 파괴작업를 통해 예술작품이 거래될 수 없게끔 하거나(캐프로의 경우), 오히려 예술이 상품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상품으로 거래되는 예술(올덴버그의 경우)을 보여주었다.
해프닝: 앨런 캐프로
캐프로는 수년간 회화를 전시해 왔으나 1957년 말부터는 공간적 ‘환경’(spatial environments)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액션 콜라주(action collage)및 해프닝(happening) 작업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모더니즘에 대한 수용 및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을 이처럼 순수하게 형식주의 관점 액션 콜라주에 대해 캐프로 자신은 이를 잭슨 폴록을 직접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프닝과 관련하여 수잔 손택은 스토리 라인이 부재한다는 해프닝의 특성은 자율적인 총체로서의 예술 작품이라는 모더니즘의 개념과 불화를 일으켰다고 했다. 할 포스터, 로자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랑 부아, 벤자민 부클로 지음, 배수희 외 옮김,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pp. 450-453.
에서만 보게 되면, 그가 작업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놓치기 쉽다. 캐프로의 작업은 당대 사회와 미술계에 대한 비판 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시장 그리고 모더니즘 갤러리에 관련된 하얀 벽, 고상한 알루미늄 액자, 부드러운 조명, 아첨(회색 카펫, 칵테일, 정중한 대화)에 대한 캐프로의 경멸은 그가 환경 작업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였다. 위의 책, p. 454.
미술사학자 로버트 헤이우드(Robert Haywood)가 지적했듯이, 캐프로는 특히 상품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업 전략인 “예정된 폐기(planned obsolescence)”를 연출함으로써 당시 소비 사회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보여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촉진시키려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이전 상품을 폐기하는 것에 주목했다. 새로운 상품이 구매되기 위해서는 이전 상품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 전제였다. 특히 헤이우드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1967년의 해프닝 <유체(Fluids)>에 주목했는데, 이 작업에서 캐프로는 패서디나 로스엔젤레스의 다양한 장소에 세운 15개의 거대한 기하학적 얼음 덩어리들을 세우고 녹게 했다.” 위와 같음.
이전의 예술작품과 달리 그의 해프닝 작업은 “폐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단 1회로 끝나버렸다. 작품은 보존되지 않고, 폐기처분 되었기에 모더니즘시기까지의 작품들이 그러했던
이 때 크라우스가 말하는 “대상의 코드를 취함”은 다름 아닌 산업생산방식을 뜻하는 듯하다. 크로우는 저드가 전문 기술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정확한 지시사항들을 따라 금속박판, 플렉시글라스, 합판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후속 작품들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했다. 토머스 크로 지음,『60년대 미술』, p. 194.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런 산업적인 제조 방식은 작품이 대량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동시에, 극도로 탈개성화된 작품 제작 방식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복수로 제작된 작품들이기에,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원본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 반(反)작업의 방식은 단순히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이가 레디메이드라는 극한까지 밀어붙여, ‘상점에서 구입한’ 단위들로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할 포스터 외 지음,『1900년 이후의 미술사』, p. 494.
공업용 재료로 균일한 형태를 반복하여 공장에서 만들어진 저드의 작품은 당대 일상사물에 내장된 또 하나의 사물이다. Holiday T. Day, The Nature of Rower, Power: Its Myths and Mores in American Art 1961-1991, Indianapolis Museum of Art, 1991(exh. cat), P17참조. (윤난지,「특정한 물체의 불특정한 정체: 도널드 저드의 예술-상품」, 2005, p. 168에서 재인용)
이제 하나의 사물로써, 상품으로써 작품을 제작했던 구체적 예술가들을 살펴보자. 저드는 “특정한 물체(Specific Object)”에서 미니멀리스트들이 대량생산 작업의 이점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드의 판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개 정도를 제작하였는데, 100개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무제 untitled>(1967년) 같은 입체작품도 200개의 에디션으로 만들었다. Donald Judd(1977), “In defence of my work, Donald Judd: Selected Words 1960-1991, The Mudern Art, Saitama; The Museum of Modern ART, Shiga, 1999(exh.cat), p. 186. ” (윤난지,「특정한 물체의 불특정한 정체: 도널드 저드의 예술-상품」, 2005, p. 168에서 재인용)
후에, 저드는 생활공간으로 까지 확장하여 자신의 작업의 형태를 변용하여 상품성 있는 가구 등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작가 자신의 고유한 형식적 특징으로 브랜드화 한 것으로서, 진정한 예술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2-2. Anti ?
이브-알랑 부아(Yve-Alain Bois)는 『1900년 이후의 미술사』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 Benjamin H.D. Buchloh, Art Since 1900, London: Thames & Hudson, 2004; 할 포스터, 로자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랑 부아, 벤자민 부클로 지음, 배수희 외 옮김,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의 1961년 파트에서 해프닝과 설치라는 새로운 작업양식을 갖고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한 두 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바로 앨런 캐프로(Allan Kaprow)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가 그들인데, 이 작가들은 일회적인 파괴작업를 통해 예술작품이 거래될 수 없게끔 하거나(캐프로의 경우), 오히려 예술이 상품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상품으로 거래되는 예술(올덴버그의 경우)을 보여주었다.
해프닝: 앨런 캐프로
캐프로는 수년간 회화를 전시해 왔으나 1957년 말부터는 공간적 ‘환경’(spatial environments)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액션 콜라주(action collage)및 해프닝(happening) 작업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모더니즘에 대한 수용 및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을 이처럼 순수하게 형식주의 관점 액션 콜라주에 대해 캐프로 자신은 이를 잭슨 폴록을 직접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프닝과 관련하여 수잔 손택은 스토리 라인이 부재한다는 해프닝의 특성은 자율적인 총체로서의 예술 작품이라는 모더니즘의 개념과 불화를 일으켰다고 했다. 할 포스터, 로자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랑 부아, 벤자민 부클로 지음, 배수희 외 옮김,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pp. 450-453.
에서만 보게 되면, 그가 작업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놓치기 쉽다. 캐프로의 작업은 당대 사회와 미술계에 대한 비판 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시장 그리고 모더니즘 갤러리에 관련된 하얀 벽, 고상한 알루미늄 액자, 부드러운 조명, 아첨(회색 카펫, 칵테일, 정중한 대화)에 대한 캐프로의 경멸은 그가 환경 작업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였다. 위의 책, p. 454.
미술사학자 로버트 헤이우드(Robert Haywood)가 지적했듯이, 캐프로는 특히 상품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업 전략인 “예정된 폐기(planned obsolescence)”를 연출함으로써 당시 소비 사회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보여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촉진시키려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이전 상품을 폐기하는 것에 주목했다. 새로운 상품이 구매되기 위해서는 이전 상품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 전제였다. 특히 헤이우드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1967년의 해프닝 <유체(Fluids)>에 주목했는데, 이 작업에서 캐프로는 패서디나 로스엔젤레스의 다양한 장소에 세운 15개의 거대한 기하학적 얼음 덩어리들을 세우고 녹게 했다.” 위와 같음.
이전의 예술작품과 달리 그의 해프닝 작업은 “폐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단 1회로 끝나버렸다. 작품은 보존되지 않고, 폐기처분 되었기에 모더니즘시기까지의 작품들이 그러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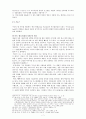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