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송사의 개관
2. 이청조의 생애와 사의 창작배경
3. 이청조의 사의 대표작품
- 전기작품의 특성과 대표작
- 후기작품의 특성과 대표작
4. 이청조와 허난설헌의 비교 연구
5. 이청조의 사와 현대가요의 비교 연구
6. 이청조 사의 지위와 후대 작품에 남긴 영향
1. 송사의 개관
2. 이청조의 생애와 사의 창작배경
3. 이청조의 사의 대표작품
- 전기작품의 특성과 대표작
- 후기작품의 특성과 대표작
4. 이청조와 허난설헌의 비교 연구
5. 이청조의 사와 현대가요의 비교 연구
6. 이청조 사의 지위와 후대 작품에 남긴 영향
본문내용
황혼이 되어도 (도황혼)
두둑두둑 두둑두둑 (點)(點)(점점적적)
이때라 (자차제)
어찌 ‘수(愁:근심)’ 이 한 자를 견디리오! (個)
(즘이개수자료득)
먼저 이 사의 시구를 풀이해보면 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고, 은 매우 초췌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은 표면으로는 마르고 시들은 국화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이청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窓), 」에서 黑은 하늘이 검다는 뜻인데 혼자서 창가를 지키며 어떻게 날이 저물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적막감이 나타나 있으며, 黃花란 국화를 일컫는다.
이 작품은 이청조가 가을날, 황혼이 질 무렵에 자신의 감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으로, 이 사 한편만 보아도 이청조의 생활상의 변화와 사풍의 전환을 알 수 있다. 작품 자체가 시대의 상흔이자 사회의 반영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어린 시절『감자목란화』에서 그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면과 대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일면을 볼 수 있고, 성년이 된 후 『취화음』에 서 표출된 담담한 애수가 이 후 작풍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이 만년의 『성성만』은 한마디로 비통과 처참함으로 글자마다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줄 한 줄에 모두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근심 수(愁)자 한 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사를 씀에 있어서 독특한 조구와 수사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사를 쓰는 방식인데, 이 작품에서 역시 대구와 첩자를 쓰고 있으며, 전편이 모두 통속적인 구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속적인 구어의 사용은 이 사를 마치 생동하는 화면같이 느끼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를 풀이해보면 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고, 은 매우 초췌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은 표면이르는 마르고 시들은 국화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이청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窓), 」에서 黑은 하늘이 검다는 뜻인데 혼자서 창가를 지키며 어떻게 날이 저물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적막감이 나타나 있다. 黃花란 국화를 일컫는다.
2)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영우락(永遇樂)>
☞ 현실에 대한 불만과 국사에 관심
낙조는 강물에 황금을 푼 듯 (락일용금)
저녁 구름 백옥을 맞물린 듯 (雲)(모운합벽)
허나 님은 어디로 갔나? ?(인재하처)
자글자글 아지랑이 끓는 버들숲속에 (煙)(염류연농)
피리에 실린 ‘소매곡’원성 (취매적원)
봄뜻이야 얼마나 알고 있으랴? (幾)(춘의지기허)
정월 대보름날 (원소가절)
(융화천기)
풍우가 없으리라 뉘 장담하랴? ?(차제기무풍우)
화려한 차를 몰고 (래상소)
데리러 왔건만 (향차보마)
술 친구 시우를 사절해 버렸네. (사타주붕시려)
흥성하던 옛서울 (중주성일)
규방에선 한가하여 (규문다가)
대보름을 중히 여겼더라. (기득편중삼오)
비취 단 모자 위에 (포취관아)
백황지로 만든 버들 꽂고 (념금설류)
머리 장식 아름답다 서로 다투었네. (족대쟁제초)
지금은 외꽃 핀 얼굴에 (여금초췌)
봉두 난발이라 (풍환무빈)
밤구경 나가기도 싫거니 (파견야간출거)
외려 사창 밑에 숨어서 (簾)
(불여향렴아저하)
남들이 즐기는 소리 듣기보다 못해라. (청천소어)
이 사 역시 사구를 먼저 풀이해보면 (雲)은 저녁노을의 구름이 한 곳에 모이다라는 뜻이고, 는 북송의 국도로서 현재의 하남성에 있으며, 과거 구주의 궁간에 있어서 중주라고도 칭했다. 또한 三五는 원소절을 뜻하고 있으며, 濟楚는 즉,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의 捻金은 허리띠에 수놓는 금실을 뜻하며 雪柳는 여자의 허리띠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는 이청조가 말년 원소절에 쓴 것으로, 변경에서의 옛생활을 회고하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청조는 전후에 남편을 잃은 슬픔,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의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중 이 「영우락(永遇樂)」은 특히 현실에 대한 불만과 국사에 대한 관심의 토로를 하고 있다. 즉, 시인의 정서는 나라의 절반 땅을 잃었건만 화려한 꽃수레를 몰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과는 완연하게 다르다 이 시의 밑바닥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가정이 파산된 데 대한 시인의 슬픔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작가의 마음과 이청조 자신의 만년의 상심하고 처량한 심정은 ‘如今憔悴, 風霧, 見夜間出去. 不如向簾兒底下, 廳天笑語’.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청조는 이러한 자신의 슬픔과는 달리 「落日熔金, 暮雲合璧」와 같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이 사에 함께 써서 우리의 눈을 끌고 있다.
3)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여름날에 쓴 절구시(夏日絶句)>
☞ 호걸다운 면
살아서 호걸이 되고 (傑)(생당작인걸)
죽어서 저승 영웅 되어지리 (사역위귀웅)
지금도 항우를 생각하면 (지금사항우)
강동 가고 싶지 않아라. (불긍과강동)
이청조의 전후의 시는 대체적으로 말년의 여러 슬픔(남편을 잃은 슬픔, 망국의 슬픔)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향락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인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슬픔이었다. 그러나 중국 문학사에서 걸출한 여류 작가인 이청조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 못지않게 호걸다운 기백 또한 있었다. 이 〈여름날에 쓴 절구시〉는 20자로 매우 짧지만 이 사에서 그녀는 항우를 끌어와 적을 보기만 하면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는 남송 지배층의 비겁한 인물들을 호되게 채찍질하였다.
4)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어가오(漁家傲)>
☞ 자유 갈망, 낭만주의적
(천접운도연소무)
(성하욕전천범무) (彿)(방불몽혼귀제소)
(문천어)
(은동문아귀하처) (아보로장차일모)
(학시만유경인구) (구만리풍붕정거)
(풍휴주)
(봉주취취산산거)
이 사는 이청조의 전후 어느 사풍과도 사뭇 다른 현실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풍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애에 대한 사를 쓰다가 그 고통을 이러한 사로써 탈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는 그러므로 낭만주의적
두둑두둑 두둑두둑 (點)(點)(점점적적)
이때라 (자차제)
어찌 ‘수(愁:근심)’ 이 한 자를 견디리오! (個)
(즘이개수자료득)
먼저 이 사의 시구를 풀이해보면 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고, 은 매우 초췌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은 표면으로는 마르고 시들은 국화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이청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窓), 」에서 黑은 하늘이 검다는 뜻인데 혼자서 창가를 지키며 어떻게 날이 저물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적막감이 나타나 있으며, 黃花란 국화를 일컫는다.
이 작품은 이청조가 가을날, 황혼이 질 무렵에 자신의 감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으로, 이 사 한편만 보아도 이청조의 생활상의 변화와 사풍의 전환을 알 수 있다. 작품 자체가 시대의 상흔이자 사회의 반영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어린 시절『감자목란화』에서 그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면과 대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일면을 볼 수 있고, 성년이 된 후 『취화음』에 서 표출된 담담한 애수가 이 후 작풍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이 만년의 『성성만』은 한마디로 비통과 처참함으로 글자마다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줄 한 줄에 모두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근심 수(愁)자 한 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사를 씀에 있어서 독특한 조구와 수사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사를 쓰는 방식인데, 이 작품에서 역시 대구와 첩자를 쓰고 있으며, 전편이 모두 통속적인 구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속적인 구어의 사용은 이 사를 마치 생동하는 화면같이 느끼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를 풀이해보면 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고, 은 매우 초췌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은 표면이르는 마르고 시들은 국화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이청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窓), 」에서 黑은 하늘이 검다는 뜻인데 혼자서 창가를 지키며 어떻게 날이 저물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적막감이 나타나 있다. 黃花란 국화를 일컫는다.
2)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영우락(永遇樂)>
☞ 현실에 대한 불만과 국사에 관심
낙조는 강물에 황금을 푼 듯 (락일용금)
저녁 구름 백옥을 맞물린 듯 (雲)(모운합벽)
허나 님은 어디로 갔나? ?(인재하처)
자글자글 아지랑이 끓는 버들숲속에 (煙)(염류연농)
피리에 실린 ‘소매곡’원성 (취매적원)
봄뜻이야 얼마나 알고 있으랴? (幾)(춘의지기허)
정월 대보름날 (원소가절)
(융화천기)
풍우가 없으리라 뉘 장담하랴? ?(차제기무풍우)
화려한 차를 몰고 (래상소)
데리러 왔건만 (향차보마)
술 친구 시우를 사절해 버렸네. (사타주붕시려)
흥성하던 옛서울 (중주성일)
규방에선 한가하여 (규문다가)
대보름을 중히 여겼더라. (기득편중삼오)
비취 단 모자 위에 (포취관아)
백황지로 만든 버들 꽂고 (념금설류)
머리 장식 아름답다 서로 다투었네. (족대쟁제초)
지금은 외꽃 핀 얼굴에 (여금초췌)
봉두 난발이라 (풍환무빈)
밤구경 나가기도 싫거니 (파견야간출거)
외려 사창 밑에 숨어서 (簾)
(불여향렴아저하)
남들이 즐기는 소리 듣기보다 못해라. (청천소어)
이 사 역시 사구를 먼저 풀이해보면 (雲)은 저녁노을의 구름이 한 곳에 모이다라는 뜻이고, 는 북송의 국도로서 현재의 하남성에 있으며, 과거 구주의 궁간에 있어서 중주라고도 칭했다. 또한 三五는 원소절을 뜻하고 있으며, 濟楚는 즉,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의 捻金은 허리띠에 수놓는 금실을 뜻하며 雪柳는 여자의 허리띠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는 이청조가 말년 원소절에 쓴 것으로, 변경에서의 옛생활을 회고하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청조는 전후에 남편을 잃은 슬픔,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의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중 이 「영우락(永遇樂)」은 특히 현실에 대한 불만과 국사에 대한 관심의 토로를 하고 있다. 즉, 시인의 정서는 나라의 절반 땅을 잃었건만 화려한 꽃수레를 몰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과는 완연하게 다르다 이 시의 밑바닥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가정이 파산된 데 대한 시인의 슬픔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작가의 마음과 이청조 자신의 만년의 상심하고 처량한 심정은 ‘如今憔悴, 風霧, 見夜間出去. 不如向簾兒底下, 廳天笑語’.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청조는 이러한 자신의 슬픔과는 달리 「落日熔金, 暮雲合璧」와 같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이 사에 함께 써서 우리의 눈을 끌고 있다.
3)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여름날에 쓴 절구시(夏日絶句)>
☞ 호걸다운 면
살아서 호걸이 되고 (傑)(생당작인걸)
죽어서 저승 영웅 되어지리 (사역위귀웅)
지금도 항우를 생각하면 (지금사항우)
강동 가고 싶지 않아라. (불긍과강동)
이청조의 전후의 시는 대체적으로 말년의 여러 슬픔(남편을 잃은 슬픔, 망국의 슬픔)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향락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인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슬픔이었다. 그러나 중국 문학사에서 걸출한 여류 작가인 이청조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 못지않게 호걸다운 기백 또한 있었다. 이 〈여름날에 쓴 절구시〉는 20자로 매우 짧지만 이 사에서 그녀는 항우를 끌어와 적을 보기만 하면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는 남송 지배층의 비겁한 인물들을 호되게 채찍질하였다.
4) 이청조의 전란 후 대표 사 <어가오(漁家傲)>
☞ 자유 갈망, 낭만주의적
(천접운도연소무)
(성하욕전천범무) (彿)(방불몽혼귀제소)
(문천어)
(은동문아귀하처) (아보로장차일모)
(학시만유경인구) (구만리풍붕정거)
(풍휴주)
(봉주취취산산거)
이 사는 이청조의 전후 어느 사풍과도 사뭇 다른 현실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풍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애에 대한 사를 쓰다가 그 고통을 이러한 사로써 탈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는 그러므로 낭만주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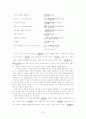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