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훈민정음 한문본
1.1. 훈민정음 해례본
1.1.1.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
1.1.2.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
1.2. 조선왕조실록본
1.3. 배장예부운략본
1.4. 열성어제본
1.5. 경세훈민정음도설본
2) 훈민정음 한문본의 오기와 내용의 차이
3) 훈민정음 언해본
2.1. 월인석보본
2.2. 박승빈 구장본
2.3. 일본 궁내성본
4) 훈민정음 언해본의 실태와 복원의 노력
4.1. 훈민정음 언해본의 실태
4.2. 훈민정음 언해본 복원의 노력
3. 맺음말
2. 본론
1) 훈민정음 한문본
1.1. 훈민정음 해례본
1.1.1.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
1.1.2.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
1.2. 조선왕조실록본
1.3. 배장예부운략본
1.4. 열성어제본
1.5. 경세훈민정음도설본
2) 훈민정음 한문본의 오기와 내용의 차이
3) 훈민정음 언해본
2.1. 월인석보본
2.2. 박승빈 구장본
2.3. 일본 궁내성본
4) 훈민정음 언해본의 실태와 복원의 노력
4.1. 훈민정음 언해본의 실태
4.2. 훈민정음 언해본 복원의 노력
3. 맺음말
본문내용
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경찰과 검찰이 양측 모두 혐의가 없다고 일단락 짓자 조씨는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내 민사소송에 들어갔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최근(2010년 6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씨가 책 상태를 자세히 알고 있고 조씨의 가게에서 책을 봤다는 증인이 있지만 배씨가 책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새로 발견된 이 해례본이 송사에 휘말리면서 훼손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책을 찍은 지 560년이 흘러 하루빨리 전문적인 보존처리와 함께 항온 항습 등 제대로 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비닐봉지에 담겨 제대로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배씨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훈민정음을 확보하려 했지만, 배씨가 낱장으로 분리한 뒤 비닐봉지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며 내 주지 않아 압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 그 사이 고귀한 문화재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배모씨가 비닐봉지 안에 보관하다 1년여만에 다시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16,17쪽.>
1.2. 조선왕조실록본
「조선왕조실록」은 규장각에 태백산본(太白山本)과 정족산본(鼎足山本)이 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판본 중 태백산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출판(1955~1958년)하여 학계에 배포하였으므로,「조선왕조실록」하면 이 태백산본의 영인본만 이용하고 정족산본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종실록본이란 「세종장헌대왕실록」권제113 세종 28년 9월 29일(갑오) 그믐조에 실려 있는 것을 말한다.
실록본의 내용은 처음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是月訓民正音成]” 라고 밝히고, 본문 곧 예의(例義)에 해당하는 세종대왕의 어제 서(序)와 글자의 음가(소리값) 풀이, 글자의 운용 등이 있고, 그 밑에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 서(序)가 잇달아 실려 있다. 여기에 “예조판서 정인지 서왈(禮曹判書鄭麟趾序曰)”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실록본을 ‘훈민정음 원본’의 세종대왕의 서문, 본문(예의), 정인지의 해례 서문과 대조해 보면 몇 군데 글자의 오기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정족산본보다 태백산본이 잘못된 글자가 더 많다.
1.3. 배자예부운략본
이 본은 한문본으로 숙종 4년(1678) 음력 3월에 새로 간행된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 : 시부(詩賦)의 운(韻)을 찾기 위하여 만든 자전(字典)으로 고려시대 이후 선비들의 필수적인 자전이었으며, 조선후기 활자 인쇄술과 서지학, 국어학· 음운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님
」권5 뒤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은 처음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제목 하에 “어제왈(御製曰)”이라 하고, 이어서 세종대왕의 서문이 나오며, 서문이 끝난 다음에 잇대어 “정통 십일년 병인 구월 일”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글자의 음가 풀이, 글자의 운용 등이 있고 끝에 가서는 줄을 바꾸어 “명 예조판서 정인지 등 작 해례”라고 되어 있다.
원명이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인데, 이 책은 5권 2책으로 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의 크기는 판광이 가로 17.5cm, 세로 26.5cm이고, 종이는 한지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귀중본으로, 현재 남아 있는 책이라고 해야 몇 질 정도에 불과한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 국립도서관 소장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등이 그것이다.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略)> <열성어제(列聖御製)>
1.4. 열성어제본
이 한문본은 숙종 때 낭선군(浪善君) 이우(李: 인조 15년~숙종 19년)가 편차(編次)하고 권유(權兪)가 증정한 「열성어제 열성어제 [列聖御製] : 조선왕조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까지의 역대 임금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대(數代)에 걸쳐 완성되었다.
(列聖御製)」권지2 세종대왕 시.문편(時文篇)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한다.
이 본은 세종 28년(1446) 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는 오자와 탈자가 많은데 이것은 ‘훈민정음 원본’에서 보사(補寫)할 때 잘못된 것들을 고친 흔적이다.
1.5. 경세훈민정음도설본
이 한문본은 숙종 때(숙종 27~41)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머리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한다.
내용은 첫 장 첫머리에는 ‘경세정운서설’이라 되어 있고, 한 행간 너비쯤 띄어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제호(題號)가 있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세종장헌대왕어제”라 하고, 줄을 바꾸어서 글자의 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의 운용이, 그리고 “어제왈(御製曰)”하고 바로 잇대어 세종대왕의 서문 전문이 나온다.
「경세훈민정음도설」은 건곤(乾坤) 두 책으로 된 수사본(手寫本)인데, 책의 이름에 있어서는 그 표지에는 ‘경세훈민정음 건 또는 곤이라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을 「경세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현재 일본 동부대학 부속도서관 하합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68년 8월 5일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인문과학자료총서3」으로 발행한 영인본이 있다.
2) 훈민정음 한문본의 오기와 내용의 차이
2.1. 조선왕조실록본
이 실록본을 ‘훈민정음 원본’의 세종대왕의 서문, 본문(예의), 정인지의 해례 서문과 대조해 보면 몇 군데 글자의 오기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정족산본보다 태백산본이 잘못된 글자가 더 많다.
세종대왕의 서문에서는 “욕사인인이습(欲使人人易習)” → “욕사인이습(欲使人易習)”
본문(예의)에서는 “여규자초발성(如字初發聲)”→“여두자초발성(如字初發聲)”
“여탄자초발성(如呑字初發聲)”→ “탄자초발성(呑字初發聲)”
“순음(脣音)”→“진음(唇音)” ‘훈민정음 원본’에는 모두 “순음(脣音)”으로 되어 있고, 「훈몽자회」에도 “脣”을 “입시울
이러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새로 발견된 이 해례본이 송사에 휘말리면서 훼손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책을 찍은 지 560년이 흘러 하루빨리 전문적인 보존처리와 함께 항온 항습 등 제대로 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비닐봉지에 담겨 제대로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배씨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훈민정음을 확보하려 했지만, 배씨가 낱장으로 분리한 뒤 비닐봉지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며 내 주지 않아 압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 그 사이 고귀한 문화재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배모씨가 비닐봉지 안에 보관하다 1년여만에 다시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16,17쪽.>
1.2. 조선왕조실록본
「조선왕조실록」은 규장각에 태백산본(太白山本)과 정족산본(鼎足山本)이 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판본 중 태백산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출판(1955~1958년)하여 학계에 배포하였으므로,「조선왕조실록」하면 이 태백산본의 영인본만 이용하고 정족산본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종실록본이란 「세종장헌대왕실록」권제113 세종 28년 9월 29일(갑오) 그믐조에 실려 있는 것을 말한다.
실록본의 내용은 처음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是月訓民正音成]” 라고 밝히고, 본문 곧 예의(例義)에 해당하는 세종대왕의 어제 서(序)와 글자의 음가(소리값) 풀이, 글자의 운용 등이 있고, 그 밑에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 서(序)가 잇달아 실려 있다. 여기에 “예조판서 정인지 서왈(禮曹判書鄭麟趾序曰)”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실록본을 ‘훈민정음 원본’의 세종대왕의 서문, 본문(예의), 정인지의 해례 서문과 대조해 보면 몇 군데 글자의 오기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정족산본보다 태백산본이 잘못된 글자가 더 많다.
1.3. 배자예부운략본
이 본은 한문본으로 숙종 4년(1678) 음력 3월에 새로 간행된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 : 시부(詩賦)의 운(韻)을 찾기 위하여 만든 자전(字典)으로 고려시대 이후 선비들의 필수적인 자전이었으며, 조선후기 활자 인쇄술과 서지학, 국어학· 음운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님
」권5 뒤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은 처음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제목 하에 “어제왈(御製曰)”이라 하고, 이어서 세종대왕의 서문이 나오며, 서문이 끝난 다음에 잇대어 “정통 십일년 병인 구월 일”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글자의 음가 풀이, 글자의 운용 등이 있고 끝에 가서는 줄을 바꾸어 “명 예조판서 정인지 등 작 해례”라고 되어 있다.
원명이 「배자예부운략(徘字禮部韻略)」인데, 이 책은 5권 2책으로 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의 크기는 판광이 가로 17.5cm, 세로 26.5cm이고, 종이는 한지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귀중본으로, 현재 남아 있는 책이라고 해야 몇 질 정도에 불과한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 국립도서관 소장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등이 그것이다.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略)> <열성어제(列聖御製)>
1.4. 열성어제본
이 한문본은 숙종 때 낭선군(浪善君) 이우(李: 인조 15년~숙종 19년)가 편차(編次)하고 권유(權兪)가 증정한 「열성어제 열성어제 [列聖御製] : 조선왕조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까지의 역대 임금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대(數代)에 걸쳐 완성되었다.
(列聖御製)」권지2 세종대왕 시.문편(時文篇)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한다.
이 본은 세종 28년(1446) 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는 오자와 탈자가 많은데 이것은 ‘훈민정음 원본’에서 보사(補寫)할 때 잘못된 것들을 고친 흔적이다.
1.5. 경세훈민정음도설본
이 한문본은 숙종 때(숙종 27~41)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머리에 실린 훈민정음을 말한다.
내용은 첫 장 첫머리에는 ‘경세정운서설’이라 되어 있고, 한 행간 너비쯤 띄어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제호(題號)가 있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세종장헌대왕어제”라 하고, 줄을 바꾸어서 글자의 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의 운용이, 그리고 “어제왈(御製曰)”하고 바로 잇대어 세종대왕의 서문 전문이 나온다.
「경세훈민정음도설」은 건곤(乾坤) 두 책으로 된 수사본(手寫本)인데, 책의 이름에 있어서는 그 표지에는 ‘경세훈민정음 건 또는 곤이라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이름을 「경세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현재 일본 동부대학 부속도서관 하합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68년 8월 5일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인문과학자료총서3」으로 발행한 영인본이 있다.
2) 훈민정음 한문본의 오기와 내용의 차이
2.1. 조선왕조실록본
이 실록본을 ‘훈민정음 원본’의 세종대왕의 서문, 본문(예의), 정인지의 해례 서문과 대조해 보면 몇 군데 글자의 오기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정족산본보다 태백산본이 잘못된 글자가 더 많다.
세종대왕의 서문에서는 “욕사인인이습(欲使人人易習)” → “욕사인이습(欲使人易習)”
본문(예의)에서는 “여규자초발성(如字初發聲)”→“여두자초발성(如字初發聲)”
“여탄자초발성(如呑字初發聲)”→ “탄자초발성(呑字初發聲)”
“순음(脣音)”→“진음(唇音)” ‘훈민정음 원본’에는 모두 “순음(脣音)”으로 되어 있고, 「훈몽자회」에도 “脣”을 “입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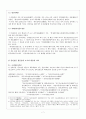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