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감의 연합으로 치부해버린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사 서술이 지나치게 장감 위주에 치우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지금의 시점에서도 연합운동이 모든 교파를 망라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초기의 장감 연합은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 정황을 무시하고 한국교회사 서술들이 장로교 혹은 감리교에 치우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사를 벗어나면, 한국교회사 서술들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예로서 『한국기독교의 역사』의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교파간의 연합교류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1918년에는 서울의 중앙 YMCA 회관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각 교파 대표들이 참석하여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를 창설하였다. 31운동을 전후한 한국기독교 교파간의 협력은 이러한 연합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단 조직면의 발전과 함께 교인의 수도 증가하였다. 31운동 직전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장로교인이 16만, 감리교인이 3만명으로 기타 중소 교파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었다.”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28.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파별 분류보다는 기독교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기타 중소 교파”라는 표현이다. 한국교회사 서술에서 나머지 교파들은 “기타”로 구분되고 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한국교회사의 일반적인 서술에서 장감을 제외한 교파들은 “기타” 교파로 생각된다. 이는 일정한 관점(혹은 사관)을 가지고 기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로교와 감리교를 제외한 다른 교파들은 이른바 ‘종파운동’보다도, 때로는 ‘가톨릭’보다도 그 비중이 작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편파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 한국 교회사 통사 중 민경배 교수의 『韓國基督敎會史』는 “장로교 편향적” 역사서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특히 감리교 학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감리교회사 역사서에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장로교 편향적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감리교회사에서는 민영익, 홍역식의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1883년 미국에서 미감리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를 만난 사건, 가우처가 1883년 11월 6일 감리교 해외선교본부의 파울러(C. H. Fowler)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일, 1884년에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업 책임자 매클레이 박사에게 한국선교 파견에 대한 편지를 쓰는 일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한국 선교의 시작을 감리교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알렌과 광혜원/제중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와 반대로 『韓國基督敎會史』는 감리교의 선교 초기 과정에 대해 소략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둘째, 윤치호와 남감리회 한국 선교에 대해 『韓國基督敎會史』는 1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감리교회사 윤춘병 교수의 책에는 12쪽에 걸쳐 소개된다. 이는 『韓國基督敎會史』가 장로교 초기 선교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과 대조된다.
셋째, 한국 최초의 교회를 장로교 중심(새문안 교회)으로 설명하면서 베델제단(정동제일감리교회), 애오개교회(현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 교회, 중앙교회, 여성교회 등의 감리교 초기 교회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고 있다.
넷째, 『韓國基督敎會史』에서는 감리교적 선교방식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여 선교사의 비율이 높았고 그들이 부녀 사업에 공헌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결국 감리교가 네비우스 선교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근대화 이후 장로교에 비해 교세가 약해진 원인으로 분석하며 장로교와 대비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부흥 운동에 대해 감리교는, 감리교 선교사 노블과 존스 선교사에 의해 부흥회가 1898년 도입되고 이러한 부흥회가 1903년 서울에서 존스에 의해 존속되다가 1903년 원산 하디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즉, 장로회의 사경회와 감리회의 부흥회가 합쳐져 부흥사경회로 정착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민경배 교수는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섯째, 청년운동에 있어서도 『韓國基督敎會史』는 YMCA 만을 강조하고, 감리교의 엡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사를 벗어나면, 한국교회사 서술들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예로서 『한국기독교의 역사』의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교파간의 연합교류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1918년에는 서울의 중앙 YMCA 회관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각 교파 대표들이 참석하여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를 창설하였다. 31운동을 전후한 한국기독교 교파간의 협력은 이러한 연합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단 조직면의 발전과 함께 교인의 수도 증가하였다. 31운동 직전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장로교인이 16만, 감리교인이 3만명으로 기타 중소 교파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었다.”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28.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파별 분류보다는 기독교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기타 중소 교파”라는 표현이다. 한국교회사 서술에서 나머지 교파들은 “기타”로 구분되고 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한국교회사의 일반적인 서술에서 장감을 제외한 교파들은 “기타” 교파로 생각된다. 이는 일정한 관점(혹은 사관)을 가지고 기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로교와 감리교를 제외한 다른 교파들은 이른바 ‘종파운동’보다도, 때로는 ‘가톨릭’보다도 그 비중이 작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편파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 한국 교회사 통사 중 민경배 교수의 『韓國基督敎會史』는 “장로교 편향적” 역사서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특히 감리교 학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감리교회사 역사서에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장로교 편향적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감리교회사에서는 민영익, 홍역식의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1883년 미국에서 미감리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를 만난 사건, 가우처가 1883년 11월 6일 감리교 해외선교본부의 파울러(C. H. Fowler)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일, 1884년에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업 책임자 매클레이 박사에게 한국선교 파견에 대한 편지를 쓰는 일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한국 선교의 시작을 감리교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알렌과 광혜원/제중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와 반대로 『韓國基督敎會史』는 감리교의 선교 초기 과정에 대해 소략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둘째, 윤치호와 남감리회 한국 선교에 대해 『韓國基督敎會史』는 1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감리교회사 윤춘병 교수의 책에는 12쪽에 걸쳐 소개된다. 이는 『韓國基督敎會史』가 장로교 초기 선교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과 대조된다.
셋째, 한국 최초의 교회를 장로교 중심(새문안 교회)으로 설명하면서 베델제단(정동제일감리교회), 애오개교회(현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 교회, 중앙교회, 여성교회 등의 감리교 초기 교회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고 있다.
넷째, 『韓國基督敎會史』에서는 감리교적 선교방식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여 선교사의 비율이 높았고 그들이 부녀 사업에 공헌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결국 감리교가 네비우스 선교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근대화 이후 장로교에 비해 교세가 약해진 원인으로 분석하며 장로교와 대비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부흥 운동에 대해 감리교는, 감리교 선교사 노블과 존스 선교사에 의해 부흥회가 1898년 도입되고 이러한 부흥회가 1903년 서울에서 존스에 의해 존속되다가 1903년 원산 하디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즉, 장로회의 사경회와 감리회의 부흥회가 합쳐져 부흥사경회로 정착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민경배 교수는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섯째, 청년운동에 있어서도 『韓國基督敎會史』는 YMCA 만을 강조하고, 감리교의 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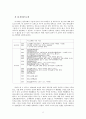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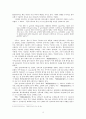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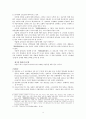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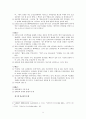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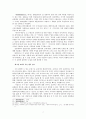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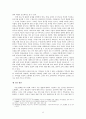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