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창작 배경
3. 내용 분석
4. 서술상의 특징
5. 문학사적 의의
6. 결론
2. 창작 배경
3. 내용 분석
4. 서술상의 특징
5. 문학사적 의의
6. 결론
본문내용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태식은 의병 항쟁에 직접 참가한 의병장이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의병 봉기에 대한 대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처음 작자는 고향에서 “오천 년 요순지치 이천 년 공부자도 인의예지 법을 삼아 삼강오륜 분명하다 계계승승 나린 덕화 팔역이 안돈하다”와 같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된 상태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을사조약이다. 이에 작자는 “죽자 하니 어리석고 살자 하니 성병일래”라고 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밤은 해결방법을 찾는 탐색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수많은 고민 끝에 관동 의병대의 연락으로 인해 마침내 작자는 의병 항쟁을 결심하게 된다.
두 번째는 展開 및 絶頂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1907년 聞慶起兵 이후 3년여에 걸친 작자의 의병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의병장으로 몇 번이나 死線을 넘나들었으며, 누구보다 많이 인정과 의리에 몸부림쳤다. 그는 적과 우군을 찾아 무수히 많은 고을을 지나치고 심산을 헤맸으며, 그 사이 두 번이나 큰 부상을 당하고, 많은 부하를 잃기도 했다. 여기서는 그 모든 사실이 빠짐없이 되뇌어지며 항전의 과정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전편을 통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 동시에 가장 길이가 긴 부분이기도 하다.
칼을 집고 이러서서
충남진이 선착허여
익일의 행진허야
토벌대 수백 명이
호자진 부합하야
피차 사망 미판허고
용못 와 밤 새우고
즉시에 목얼 비여
심중의 싸인 분심
문경 읍 더러가니
적병을 소멸이라
갈평 장터 더러간니
북양사로 너머 온다
종일토록 접전한니
날리 이미 저문지라
이 명을 사로잡아
만중 O의 해시한니
만분지 일 풀일손나
이 부분은 聞慶ㆍ葛坪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起義한 신태식 의병장이 의병부대를 이끌고 문경읍에 入陣하니, 이미 重南陣 즉 李麟榮의 의병부대가 먼저 도착하여 왜적을 소멸하였다. 다음날인 9월 10일에는 갈평장터에서 湖左陣 이강년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종일토록 전투를 벌였다. 이후 날이 저물어 龍淵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적 2명을 생포하여 목을 베었다.
이후 작자의 체험은 전투와 전투의 연속이었다. 전투에서 그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다. 일제에 의한 조선 침략을 ‘문제’라고 하고, 일제로부터의 자주권 탈환을 ‘해결’이라고 할 때, 전투에 이기는 것은 해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투에서 지는 것은 문제해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좌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의병 항쟁은 사실 시련의 연속이었다.
세 번째는 작자가 수난을 당하는 부분으로, 영평 전투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사로잡힌 다음, 적이 주관하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죄수로 복역하는 기간 동안의 實況, 소감 등을 나타냈다. 여기에서도 大義에 사는 남아로서의 작자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선명히 나타난다.
포군의 덩에 업혀
쥬마갓치 라오며
좌선봉 강 천건아
우리가 이러다는
나는 이미 죽더레도
적병 틔진 하거덜낭
네 손어로 업섭허여
내 집어로 기별허여
죽난 사정 보지 말고
산중어로 올라갈 제
가지 마라 소리허네
내 말을 잇지 마라
몰살 죽엄 할 터인니
너의덜은 사라 가서
내 신체 차사다가
향양지지 무더 놋코
혼귀고토 씨겨다고
날 바리고 밧비 가라
여기에서 신태식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자는 결국 적에게 생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곧 작자의 좌절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작자는 10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되고,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쓸쓸하게 귀향한다.
마지막은 전편을 결말짓는 부분으로, 여기서 작자는 스스로 향리에 돌아왔음을 만족하고 앞으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리라 작정하고 있다.
민지을 건너가서
가진 엄 차려 놋코
기장도 되러니와
햇콩 놋코 밀개은
포자회손 낙얼 삼아
이 다운 나문 말은
종숙모 댁 더러간니
관곡히 건하실 졔
도 맛침 궁절이라
고양진미 각 업다
농부 어오 조헐시고
후로 기록허오리다
이는 작자가 고향인 섬안 마을(민지)에 되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다. 의병 항쟁을 통한 작자의 고난에 찬 경험은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으며, 그는 여기서 “포자회손 낙을 삼아 농부 어응 좋을시고”의 여생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자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되었던 국권회복활동, 즉 의병 항쟁은 개인적인 일상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작자인 신태식은 안정된 상태의 향리 생활을 영위하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의병 항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병 항쟁은 곧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작자는 두 차례의 부상을 입고, 적에게 생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등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결국 좌절의 끝에 작자는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조용한 전원생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갓 修辭的인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그의 저항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서술상의 특징
4.1. 시어 선택의 평이성
신태식은 위정척사론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한 유학자였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한문 문장을 쉽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태식이 지은 <신의관창의가>는 全文이 한글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처럼 유학자인 작자가 평소에 잘 즐겨 쓰는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작품을 창작한 것은 작자가 한글의 주된 효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작품에 작자의 실제 생활체험이 절실하게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생동하는 체험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문보다 한글이 더 적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자어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올나가 슈엄허니
산상의 갓다 놋코
불상허고 참혹허다
불원천리 날 조차 와
너어 부모 너 보늴 재
누대로 상놈 대여
육남매을 다
두 번째는 展開 및 絶頂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1907년 聞慶起兵 이후 3년여에 걸친 작자의 의병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의병장으로 몇 번이나 死線을 넘나들었으며, 누구보다 많이 인정과 의리에 몸부림쳤다. 그는 적과 우군을 찾아 무수히 많은 고을을 지나치고 심산을 헤맸으며, 그 사이 두 번이나 큰 부상을 당하고, 많은 부하를 잃기도 했다. 여기서는 그 모든 사실이 빠짐없이 되뇌어지며 항전의 과정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전편을 통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 동시에 가장 길이가 긴 부분이기도 하다.
칼을 집고 이러서서
충남진이 선착허여
익일의 행진허야
토벌대 수백 명이
호자진 부합하야
피차 사망 미판허고
용못 와 밤 새우고
즉시에 목얼 비여
심중의 싸인 분심
문경 읍 더러가니
적병을 소멸이라
갈평 장터 더러간니
북양사로 너머 온다
종일토록 접전한니
날리 이미 저문지라
이 명을 사로잡아
만중 O의 해시한니
만분지 일 풀일손나
이 부분은 聞慶ㆍ葛坪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起義한 신태식 의병장이 의병부대를 이끌고 문경읍에 入陣하니, 이미 重南陣 즉 李麟榮의 의병부대가 먼저 도착하여 왜적을 소멸하였다. 다음날인 9월 10일에는 갈평장터에서 湖左陣 이강년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종일토록 전투를 벌였다. 이후 날이 저물어 龍淵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적 2명을 생포하여 목을 베었다.
이후 작자의 체험은 전투와 전투의 연속이었다. 전투에서 그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다. 일제에 의한 조선 침략을 ‘문제’라고 하고, 일제로부터의 자주권 탈환을 ‘해결’이라고 할 때, 전투에 이기는 것은 해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투에서 지는 것은 문제해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좌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의병 항쟁은 사실 시련의 연속이었다.
세 번째는 작자가 수난을 당하는 부분으로, 영평 전투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사로잡힌 다음, 적이 주관하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죄수로 복역하는 기간 동안의 實況, 소감 등을 나타냈다. 여기에서도 大義에 사는 남아로서의 작자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선명히 나타난다.
포군의 덩에 업혀
쥬마갓치 라오며
좌선봉 강 천건아
우리가 이러다는
나는 이미 죽더레도
적병 틔진 하거덜낭
네 손어로 업섭허여
내 집어로 기별허여
죽난 사정 보지 말고
산중어로 올라갈 제
가지 마라 소리허네
내 말을 잇지 마라
몰살 죽엄 할 터인니
너의덜은 사라 가서
내 신체 차사다가
향양지지 무더 놋코
혼귀고토 씨겨다고
날 바리고 밧비 가라
여기에서 신태식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자는 결국 적에게 생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곧 작자의 좌절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작자는 10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되고, 감옥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쓸쓸하게 귀향한다.
마지막은 전편을 결말짓는 부분으로, 여기서 작자는 스스로 향리에 돌아왔음을 만족하고 앞으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리라 작정하고 있다.
민지을 건너가서
가진 엄 차려 놋코
기장도 되러니와
햇콩 놋코 밀개은
포자회손 낙얼 삼아
이 다운 나문 말은
종숙모 댁 더러간니
관곡히 건하실 졔
도 맛침 궁절이라
고양진미 각 업다
농부 어오 조헐시고
후로 기록허오리다
이는 작자가 고향인 섬안 마을(민지)에 되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다. 의병 항쟁을 통한 작자의 고난에 찬 경험은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으며, 그는 여기서 “포자회손 낙을 삼아 농부 어응 좋을시고”의 여생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자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되었던 국권회복활동, 즉 의병 항쟁은 개인적인 일상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작자인 신태식은 안정된 상태의 향리 생활을 영위하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의병 항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병 항쟁은 곧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작자는 두 차례의 부상을 입고, 적에게 생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등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결국 좌절의 끝에 작자는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조용한 전원생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갓 修辭的인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그의 저항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서술상의 특징
4.1. 시어 선택의 평이성
신태식은 위정척사론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한 유학자였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한문 문장을 쉽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태식이 지은 <신의관창의가>는 全文이 한글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처럼 유학자인 작자가 평소에 잘 즐겨 쓰는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작품을 창작한 것은 작자가 한글의 주된 효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작품에 작자의 실제 생활체험이 절실하게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생동하는 체험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문보다 한글이 더 적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자어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올나가 슈엄허니
산상의 갓다 놋코
불상허고 참혹허다
불원천리 날 조차 와
너어 부모 너 보늴 재
누대로 상놈 대여
육남매을 다
키워드
추천자료
 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고용보험...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교육행정 및 경영 공통] 대표적인 교육행정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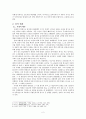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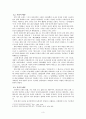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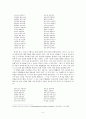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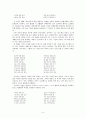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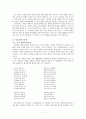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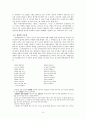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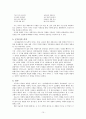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