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점의 잘못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순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늙음에 이르러서도 <도산십이곡>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말로 시를 짓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이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으며 漢詩로 표현하여 그 회포를 풀 수 있으나, 그 한시를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시는 한시로서의 한계를 가진 것이다. 정재호, 『한국 시조 문학론』, 태학사, 1999, p.84~p.92.
2.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내용
<도산십이곡>은 전 6곡과 후 6곡의 12곡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전 6곡은 언지(言志)로서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한 것으고, 후 6곡은 언학(言學)이라 하여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1) 언지(言志)
이런 엇더며 엇다료 : 어떠하겠는가, 어떠하리요.
뎌런들 엇더료 【基一】
草野 愚生 초야우생 :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 이러타 엇더료
며 泉石膏 천석고황 : ‘천석(泉石)’은 ‘자연의 경치’를, ‘고황(膏)’은 ‘한방의 술어’로서,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말한다.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의 고질병.
을 고텨 므삼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서(세상의 공명이나 시비에는 아무 흥미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버리고 살 수 없는 이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초장에서의 이런들이나 저런들은 삶의 여러 형태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초야 우생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겸양하여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비록 남들은 그것을 업수이 볼 지라도 스스로는 천석고황이라고 하면서 고쳐서 무엇하겠느냐라 하여 고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야 우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강호에 묻혀 사는 은자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스로 어리석은 체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즐기고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으며 그 곳에 침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생으로서 환로에 나아가 환해풍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에 묻혀 스스로의 인격을 연마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높게 부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퇴계의 천석고황의 의지이면서 강호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큰 소리라 할 수도 있다.
煙霞 연하 : 연기와 놀, 멋진 자연의 풍치
로 지블 삼고 風月 풍월 : 맑은 바람과 달, 자연의 아름다움
로 버들 사마 【基二】
太平聖代 태평성대 :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시대.
에 病으로 늘거가뇌 늘거가뇌 : 늙어 가는구나. ‘~뇌’는 ‘노이’의 축약형으로 감탄종지형.
이듕에 라 이른 허므리나 업고쟈 업고쟈 : 없게 하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뽀얗고 다사롭게 감싸주는) 연기나 노을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을 삼아,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하는 일 없이 그저) 노병(老病)으로만 늙어 가는구나. 이러한 생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게 허물되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
제 2연은 강호에 살면서 바라는 바를 읊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사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초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는 공간적 모습이 표현되었다면, 중장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자연에 묻혀 사는 모습이 매우 소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허물이나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하와 풍월로, 게다가 병으로 늙어 간다는 그가 바라는 바가 너무도 겸허하게 보인다. 자연을 벗하여 산다고 하여 자기의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정신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허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가 허물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한 점의 허물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완벽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것이 되며 또한 수신의 최상에 위치하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퇴계의 소망이란 허물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퇴계의 소망 이면에는 허물을 남겼다기 보다는 남기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퇴계는 당대 유학이나 덕망의 최고봉일 수 있으며 조선조 일대에 사표가 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淳風 순풍 :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
이 죽다 니 진실로 거즈마리 거즈마리 : 거짓말이로다.
【基三】
人性이 어디다 니 진실로 올 마리
天下 천하 : 이 세상
에 許多 英才 허다 영재 : 뛰어난 많은 인재
를 소겨 말솜가 소겨 말솜가 : 거짓말할 것인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로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없어졌다는 말로써) 이 세상의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순풍과 인성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지금 세상에는 순풍이 다 없어졌다고 하나 이는 거짓말이며, 인성이 어질다고 한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라는 것이다. 인성이 어질다는 말이 옳다는 것은 퇴계가 맹자의 성선설을 찬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순풍이 없어졌다고 하고 인성은 옳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퇴계는 순풍이 죽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인성이 선하다는 말은 진실이라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비록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이라 할 지라도 충분히 그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幽蘭 유란 : 난초, 그윽하여 향기를 풍기는 난초
이 在谷니 재곡니 : 산골짜기에 피었으니.
自然이 듣디 됴해 듣디 됴해 : 듣기 좋구나.
【基四】
白雪이 在山 재산니 : 산봉우리에 걸려 있으니.
니 自然이 보디 됴해
이듕에 彼美一人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여기서는 ‘임금’을 가르키는 말
을 더옥 닛디
또한 그는 우리말로 시를 짓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이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으며 漢詩로 표현하여 그 회포를 풀 수 있으나, 그 한시를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시는 한시로서의 한계를 가진 것이다. 정재호, 『한국 시조 문학론』, 태학사, 1999, p.84~p.92.
2.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내용
<도산십이곡>은 전 6곡과 후 6곡의 12곡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전 6곡은 언지(言志)로서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한 것으고, 후 6곡은 언학(言學)이라 하여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1) 언지(言志)
이런 엇더며 엇다료 : 어떠하겠는가, 어떠하리요.
뎌런들 엇더료 【基一】
草野 愚生 초야우생 :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 이러타 엇더료
며 泉石膏 천석고황 : ‘천석(泉石)’은 ‘자연의 경치’를, ‘고황(膏)’은 ‘한방의 술어’로서,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을 말한다.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의 고질병.
을 고텨 므삼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서(세상의 공명이나 시비에는 아무 흥미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버리고 살 수 없는 이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초장에서의 이런들이나 저런들은 삶의 여러 형태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초야 우생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겸양하여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비록 남들은 그것을 업수이 볼 지라도 스스로는 천석고황이라고 하면서 고쳐서 무엇하겠느냐라 하여 고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야 우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강호에 묻혀 사는 은자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스로 어리석은 체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즐기고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으며 그 곳에 침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생으로서 환로에 나아가 환해풍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에 묻혀 스스로의 인격을 연마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높게 부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퇴계의 천석고황의 의지이면서 강호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큰 소리라 할 수도 있다.
煙霞 연하 : 연기와 놀, 멋진 자연의 풍치
로 지블 삼고 風月 풍월 : 맑은 바람과 달, 자연의 아름다움
로 버들 사마 【基二】
太平聖代 태평성대 :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살기 좋은 시대.
에 病으로 늘거가뇌 늘거가뇌 : 늙어 가는구나. ‘~뇌’는 ‘노이’의 축약형으로 감탄종지형.
이듕에 라 이른 허므리나 업고쟈 업고쟈 : 없게 하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뽀얗고 다사롭게 감싸주는) 연기나 노을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을 삼아,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하는 일 없이 그저) 노병(老病)으로만 늙어 가는구나. 이러한 생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게 허물되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
제 2연은 강호에 살면서 바라는 바를 읊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사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초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는 공간적 모습이 표현되었다면, 중장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자연에 묻혀 사는 모습이 매우 소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허물이나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하와 풍월로, 게다가 병으로 늙어 간다는 그가 바라는 바가 너무도 겸허하게 보인다. 자연을 벗하여 산다고 하여 자기의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정신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허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가 허물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한 점의 허물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완벽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것이 되며 또한 수신의 최상에 위치하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퇴계의 소망이란 허물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퇴계의 소망 이면에는 허물을 남겼다기 보다는 남기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퇴계는 당대 유학이나 덕망의 최고봉일 수 있으며 조선조 일대에 사표가 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淳風 순풍 :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
이 죽다 니 진실로 거즈마리 거즈마리 : 거짓말이로다.
【基三】
人性이 어디다 니 진실로 올 마리
天下 천하 : 이 세상
에 許多 英才 허다 영재 : 뛰어난 많은 인재
를 소겨 말솜가 소겨 말솜가 : 거짓말할 것인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로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없어졌다는 말로써) 이 세상의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순풍과 인성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지금 세상에는 순풍이 다 없어졌다고 하나 이는 거짓말이며, 인성이 어질다고 한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라는 것이다. 인성이 어질다는 말이 옳다는 것은 퇴계가 맹자의 성선설을 찬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순풍이 없어졌다고 하고 인성은 옳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퇴계는 순풍이 죽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인성이 선하다는 말은 진실이라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비록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이라 할 지라도 충분히 그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幽蘭 유란 : 난초, 그윽하여 향기를 풍기는 난초
이 在谷니 재곡니 : 산골짜기에 피었으니.
自然이 듣디 됴해 듣디 됴해 : 듣기 좋구나.
【基四】
白雪이 在山 재산니 : 산봉우리에 걸려 있으니.
니 自然이 보디 됴해
이듕에 彼美一人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여기서는 ‘임금’을 가르키는 말
을 더옥 닛디
추천자료
 퇴계이황선생에 대해서
퇴계이황선생에 대해서 도산십이곡 (작품 분석, 표현, 내용, 구성)
도산십이곡 (작품 분석, 표현, 내용, 구성) 퇴계 이황과 도산십이곡
퇴계 이황과 도산십이곡 [퇴계 이황]퇴계 이황의 생애, 퇴계 이황의 가정생활과 건강법, 퇴계 이황의 이념, 퇴계 이황...
[퇴계 이황]퇴계 이황의 생애, 퇴계 이황의 가정생활과 건강법, 퇴계 이황의 이념, 퇴계 이황... [퇴계 이황][철학 사상][사단칠정][이기호발설][도산십이곡][퇴계][이황]퇴계 이황의 철학 사...
[퇴계 이황][철학 사상][사단칠정][이기호발설][도산십이곡][퇴계][이황]퇴계 이황의 철학 사... [퇴계 이황][퇴계 이황 교육사상][성학십도][교사론][인식론]퇴계이황의 생애, 퇴계이황의 교...
[퇴계 이황][퇴계 이황 교육사상][성학십도][교사론][인식론]퇴계이황의 생애, 퇴계이황의 교...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교육사상가 중 1명을 선정하여...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교육사상가 중 1명을 선정하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비교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 비교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사상가 및 실천가 중 1명을 선정...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사상가 및 실천가 중 1명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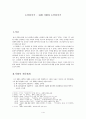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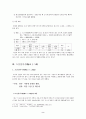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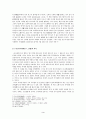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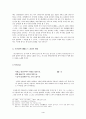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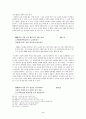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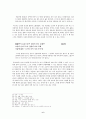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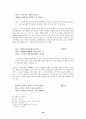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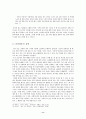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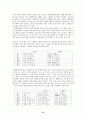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