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문
2. 책의 중심 이야기
3. 책에 대한 평가
4. 나가면서
2. 책의 중심 이야기
3. 책에 대한 평가
4. 나가면서
본문내용
White, Church Architecture : Building and Renovating for Christian Worship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8), 11 ; cited in William A. Dyrness, Reformed Theology and Visual Culture : the Protestant Imagination from Calvin to Edward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01
을 한다.
예배 안에서 상징물은 단순히 교회 예배위원들의 선호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의 비전을 말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상징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도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지만 상징은 완벽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상징이 상징 너머의 무언가를 완벽하게 드러낸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기에 지속적인 상징에 관한 반추와 묵상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회중의 영성을 이끈다. Dupre′, Symbols of the Sacred, 3.
저자는 더불어 현대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시각적인 미디어들의 위험 요소에 대해 지적했다. 지나친 시각적 미디어 활용은 회중을 방관자적인 자세와, 예배를 재미 위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각적인 미디어와 상징물의 사용에 적절성, 조화성, 통합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상징물들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실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고, 가르쳐 주고, 강화시켜 주고,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 예배를 표현하기 : 예배 안에서 우리 몸의 사용
이 장에서는 상징의 언어로서 몸의 언어에 대해 언급한다. 저자는 캐서린 스파크의 주장처럼 몸과 영혼, 내적인 묵상과 외적인 표현의 관계가 상하체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공동체 적으로 보고 있다.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의 몸이 참여함으로써 영혼이 춤으로 표현된다는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2장에 이어 다시 언급을 하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합당한 모델이라 말한다.
몸으로써 참여는 행함과 존재의 영성인 ‘체현된 영성’이며, 몸으로 표현된 예배 행위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 더욱 힘을 얻는다. 체현된 예배의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 사인-행동의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와 행위를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함으로 회중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사인-행동을 통해 예배 안에서 구원 받았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앙 안에서 강해지며, 소명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성경읽기, 세례, 성만찬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사인-행동이다. 특히 세례와 성찬은 회중이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을 통해 배워가며 사인-행동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이 장에서 ‘기도’의 자세와 손의 제스처에 많은 관심을 갖은 듯하다. 기도의 풍성한 자세들과 손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 전통의 귀한 유산인 성호를 긋는 행위가 없어짐에 안타까워한다.
제인 밴은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인 성호 긋기와 논란이 많은 평화의 인사와 같은 예전적인 행동과 제스처는 다양한 예배 표현의 통로가 되며, 다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가
을 한다.
예배 안에서 상징물은 단순히 교회 예배위원들의 선호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의 비전을 말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상징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도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지만 상징은 완벽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상징이 상징 너머의 무언가를 완벽하게 드러낸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기에 지속적인 상징에 관한 반추와 묵상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회중의 영성을 이끈다. Dupre′, Symbols of the Sacred, 3.
저자는 더불어 현대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시각적인 미디어들의 위험 요소에 대해 지적했다. 지나친 시각적 미디어 활용은 회중을 방관자적인 자세와, 예배를 재미 위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각적인 미디어와 상징물의 사용에 적절성, 조화성, 통합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상징물들이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실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고, 가르쳐 주고, 강화시켜 주고,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 예배를 표현하기 : 예배 안에서 우리 몸의 사용
이 장에서는 상징의 언어로서 몸의 언어에 대해 언급한다. 저자는 캐서린 스파크의 주장처럼 몸과 영혼, 내적인 묵상과 외적인 표현의 관계가 상하체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공동체 적으로 보고 있다. 살아 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의 몸이 참여함으로써 영혼이 춤으로 표현된다는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2장에 이어 다시 언급을 하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합당한 모델이라 말한다.
몸으로써 참여는 행함과 존재의 영성인 ‘체현된 영성’이며, 몸으로 표현된 예배 행위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 더욱 힘을 얻는다. 체현된 예배의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 사인-행동의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와 행위를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함으로 회중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사인-행동을 통해 예배 안에서 구원 받았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앙 안에서 강해지며, 소명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성경읽기, 세례, 성만찬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사인-행동이다. 특히 세례와 성찬은 회중이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을 통해 배워가며 사인-행동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이 장에서 ‘기도’의 자세와 손의 제스처에 많은 관심을 갖은 듯하다. 기도의 풍성한 자세들과 손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 전통의 귀한 유산인 성호를 긋는 행위가 없어짐에 안타까워한다.
제인 밴은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인 성호 긋기와 논란이 많은 평화의 인사와 같은 예전적인 행동과 제스처는 다양한 예배 표현의 통로가 되며, 다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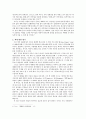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