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2) 김유정의 문학관
(3)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 및 사진
Ⅲ.〈봄봄〉의 작품 해석
Ⅳ.〈동백꽃〉의 작품 해석
Ⅴ. 〈봄봄〉과〈동백꽃〉에 사용한 고유어 및 토속어
Ⅵ. 〈봄봄〉과 〈 동백꽃〉에 사용한 비속어와 동물 비유
Ⅶ. 結論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2) 김유정의 문학관
(3)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 및 사진
Ⅲ.〈봄봄〉의 작품 해석
Ⅳ.〈동백꽃〉의 작품 해석
Ⅴ. 〈봄봄〉과〈동백꽃〉에 사용한 고유어 및 토속어
Ⅵ. 〈봄봄〉과 〈 동백꽃〉에 사용한 비속어와 동물 비유
Ⅶ. 結論
본문내용
문인 답사 보고서
Ⅰ. 序論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2) 김유정의 문학관
(3)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 및 사진
Ⅲ.〈봄봄〉의 작품 해석
Ⅳ.〈동백꽃〉의 작품 해석
Ⅴ. 〈봄봄〉과〈동백꽃〉에 사용한 고유어 및 토속어
Ⅵ. 〈봄봄〉과 〈 동백꽃〉에 사용한 비속어와 동물 비유
Ⅶ. 結論
Ⅰ. 序論
한국 근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김유정은 큰 업적을 남긴 작가이다.
그가 거둔 文學的 성과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자신의 독특한 산문 미학으로 정착시켰다는 데에 있다. 김유정이 활동한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는 식민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에 속한다. 그의 소설은 이러한 시대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체로 생활 능력을 잃고 방황하는 무력한 사회 계층, 예컨대 농촌의 빈농이나 도시의 빈민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창작 태도 자체가 자기 시대의 모습을 관념이 아니라 실상으로 파헤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본 김유정 전집』, (강출판사, 1997)을 바탕으로, 김유정의 자라온 환경과 문학관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작품 〈봄봄〉과 〈동백꽃〉의 작품을 먼저 해석한 후에 작품에 투영된 작가정신과 예술성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은 문학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유정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삶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정에 관한 연보에 의하면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 강원도 춘성군 신남면 두메 산골인 실레에서 부농의 8남매(2남 6녀) 중 일곱 번째인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靑松 沈氏는 그의 나이 만 6살에, 아버지 金春植은 만 8살에 돌아가셨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는 외롭게 자라면서 모성 결핍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유정은 12살까지 실레에서 성장하여 그는 늘 울창한 숲과 맑은 냇물이 흐르는 자연 환경을 접하였다. 그의 고향 풍경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의 모든 작품의 자연 묘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찍 부모를 잃은 김유정은 평탄치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
가산의 관리자요 유정의 보호자였던 형 김유근이 술과 난봉의로 재산을 축내면서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암송하면서 출발하여 1919년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하였다. 그 후 1923년 4월 9일 徽文高普 시절에 安懷南, 林和, 朴秀鎬 등과 사귀면서 독서와 문학에 눈뜬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 때는 문학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야구, 아령, 축구 등 운동도 즐겼으며 주로 러시아 문학에 심취한 경향을 보였다. 이 때의 모습은〈이런 음악회〉〈봄밤〉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26년 4학년 때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연상의 기생 朴祿珠(1906-1979)와 연애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는 祿珠에게 반해서 연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으나 번번이 무시당했다.
그의 조카 김영수는 祿珠에 대한 사랑을 \'모순 덩어리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순 덩어리의 사랑은 김유정에게 예술혼을 불러 일으켜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허구화된 박녹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소설은〈두꺼비〉와〈生의 伴侶〉다.
봉익동 삼촌집으로 옮긴 김유정은 1927년 4학년에 복학하여 1929년 3월에 徽文高普 5학년을 졸업했다. 그 후 그는 연희전문에 입학하였지만 한 학기도 끝내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다.
1930년 삼촌의 집이 있는 봉익동에서 조카 영수와 같이 기거하며 춘천을 왕래하다가 더 있을 수 없어 삼촌의 집에서 나와 둘째 누이 유형과 같이 지내게 된다. 사직동 단칸방에서도 유정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 누이는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돌아와 피복 공장을 다니다가 노동자를 상대로 밥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이 가난한 시기의 생활이〈따라지〉〈연기〉〈슬픈 이야기〉〈심청〉〈생의 伴侶〉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김유정은 스무살의 나이에 접어들자 병마의 포로가 되었다.
1929년 치질이 발병 1930년 늑막염 이내 당시의 문화병인 폐결핵의 신병을 이끌고 형수와 조카만이 가는 춘천 실레 마을로 내려갔다. 열과 오한에 실달리면서 몸을 고치려고 닮과 뱀을 고아 먹는다. 그러나 禁酒는 不禁한 듯하다.
신병 중이었으나 유정은 이 시기에 자연과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듯하다.들병이와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광산을 하며 허황한 꿈을 꾸기도 한다.
이 체험이〈金따는 콩밧〉〈만무방〉〈총각과 맹꽁이〉〈아내〉등의 작품의 배경이 된다.
1932년 얼마간의 휴양 끝에 그의 병이 일시 완화된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가 32년 24살의 시점인 듯하다.
김유정의 무기력한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인간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생산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이 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카 영수와 같이 야학을 하고 농민협동조합인 \'농우회\'를 조직한다. 이때가 유정의 유일한 인생론인 수필〈病床의 생각〉에서 실토하고 있는 사라을 깨친 시기인 듯하다. 그러나 義塾의 화재, 부친의 유산이 바닥나면서 유정의 농촌운동은 막을 내리고 金甁義塾도 이내 명맥이 끊긴다.
1933년 25살 때 유정은 서울 입성은 문단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춘천에서 완전히 이사한 형수와 조카가 사는 신당동이 창작의 산실이 된다.
이때부터 벽상에 \'겸허\'란 두 글자를 붙여 놓고 약값을 벌기 위해 집필하였다.
창작의 기쁨
Ⅰ. 序論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2) 김유정의 문학관
(3)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 및 사진
Ⅲ.〈봄봄〉의 작품 해석
Ⅳ.〈동백꽃〉의 작품 해석
Ⅴ. 〈봄봄〉과〈동백꽃〉에 사용한 고유어 및 토속어
Ⅵ. 〈봄봄〉과 〈 동백꽃〉에 사용한 비속어와 동물 비유
Ⅶ. 結論
Ⅰ. 序論
한국 근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김유정은 큰 업적을 남긴 작가이다.
그가 거둔 文學的 성과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자신의 독특한 산문 미학으로 정착시켰다는 데에 있다. 김유정이 활동한 193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는 식민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에 속한다. 그의 소설은 이러한 시대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대체로 생활 능력을 잃고 방황하는 무력한 사회 계층, 예컨대 농촌의 빈농이나 도시의 빈민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창작 태도 자체가 자기 시대의 모습을 관념이 아니라 실상으로 파헤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본 김유정 전집』, (강출판사, 1997)을 바탕으로, 김유정의 자라온 환경과 문학관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작품 〈봄봄〉과 〈동백꽃〉의 작품을 먼저 해석한 후에 작품에 투영된 작가정신과 예술성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Ⅱ.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관
(1)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은 문학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유정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삶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정에 관한 연보에 의하면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 강원도 춘성군 신남면 두메 산골인 실레에서 부농의 8남매(2남 6녀) 중 일곱 번째인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靑松 沈氏는 그의 나이 만 6살에, 아버지 金春植은 만 8살에 돌아가셨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는 외롭게 자라면서 모성 결핍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유정은 12살까지 실레에서 성장하여 그는 늘 울창한 숲과 맑은 냇물이 흐르는 자연 환경을 접하였다. 그의 고향 풍경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의 모든 작품의 자연 묘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찍 부모를 잃은 김유정은 평탄치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
가산의 관리자요 유정의 보호자였던 형 김유근이 술과 난봉의로 재산을 축내면서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암송하면서 출발하여 1919년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하였다. 그 후 1923년 4월 9일 徽文高普 시절에 安懷南, 林和, 朴秀鎬 등과 사귀면서 독서와 문학에 눈뜬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 때는 문학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야구, 아령, 축구 등 운동도 즐겼으며 주로 러시아 문학에 심취한 경향을 보였다. 이 때의 모습은〈이런 음악회〉〈봄밤〉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26년 4학년 때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연상의 기생 朴祿珠(1906-1979)와 연애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는 祿珠에게 반해서 연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으나 번번이 무시당했다.
그의 조카 김영수는 祿珠에 대한 사랑을 \'모순 덩어리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순 덩어리의 사랑은 김유정에게 예술혼을 불러 일으켜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허구화된 박녹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소설은〈두꺼비〉와〈生의 伴侶〉다.
봉익동 삼촌집으로 옮긴 김유정은 1927년 4학년에 복학하여 1929년 3월에 徽文高普 5학년을 졸업했다. 그 후 그는 연희전문에 입학하였지만 한 학기도 끝내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다.
1930년 삼촌의 집이 있는 봉익동에서 조카 영수와 같이 기거하며 춘천을 왕래하다가 더 있을 수 없어 삼촌의 집에서 나와 둘째 누이 유형과 같이 지내게 된다. 사직동 단칸방에서도 유정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 누이는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돌아와 피복 공장을 다니다가 노동자를 상대로 밥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이 가난한 시기의 생활이〈따라지〉〈연기〉〈슬픈 이야기〉〈심청〉〈생의 伴侶〉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김유정은 스무살의 나이에 접어들자 병마의 포로가 되었다.
1929년 치질이 발병 1930년 늑막염 이내 당시의 문화병인 폐결핵의 신병을 이끌고 형수와 조카만이 가는 춘천 실레 마을로 내려갔다. 열과 오한에 실달리면서 몸을 고치려고 닮과 뱀을 고아 먹는다. 그러나 禁酒는 不禁한 듯하다.
신병 중이었으나 유정은 이 시기에 자연과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듯하다.들병이와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광산을 하며 허황한 꿈을 꾸기도 한다.
이 체험이〈金따는 콩밧〉〈만무방〉〈총각과 맹꽁이〉〈아내〉등의 작품의 배경이 된다.
1932년 얼마간의 휴양 끝에 그의 병이 일시 완화된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가 32년 24살의 시점인 듯하다.
김유정의 무기력한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인간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생산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이 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카 영수와 같이 야학을 하고 농민협동조합인 \'농우회\'를 조직한다. 이때가 유정의 유일한 인생론인 수필〈病床의 생각〉에서 실토하고 있는 사라을 깨친 시기인 듯하다. 그러나 義塾의 화재, 부친의 유산이 바닥나면서 유정의 농촌운동은 막을 내리고 金甁義塾도 이내 명맥이 끊긴다.
1933년 25살 때 유정은 서울 입성은 문단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춘천에서 완전히 이사한 형수와 조카가 사는 신당동이 창작의 산실이 된다.
이때부터 벽상에 \'겸허\'란 두 글자를 붙여 놓고 약값을 벌기 위해 집필하였다.
창작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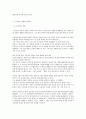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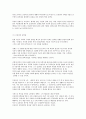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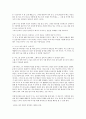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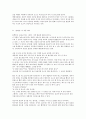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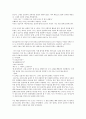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