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목차
1. 개 요
2. 주요 작품
①도 솔 가
②회 소 곡
③물계자가
④우 식 악
⑤대 악
⑥원 사
⑦해 론 가
⑧실 혜 가
⑨장 한 성
⑩몰가부가와 무애가
⑪양 산 가
⑫명 주 가
⑬정 읍 사
⑭방 등 산
⑮선 운 산
⑯무 등 산
⑰지 리 산
⑱내 원 성
⑲연 양
3. 결 론
4. 참조문헌
2. 주요 작품
①도 솔 가
②회 소 곡
③물계자가
④우 식 악
⑤대 악
⑥원 사
⑦해 론 가
⑧실 혜 가
⑨장 한 성
⑩몰가부가와 무애가
⑪양 산 가
⑫명 주 가
⑬정 읍 사
⑭방 등 산
⑮선 운 산
⑯무 등 산
⑰지 리 산
⑱내 원 성
⑲연 양
3. 결 론
4. 참조문헌
본문내용
중에서 이름 정도만을 제공하여주는 자료이다.
내원성
고려 초 여진이 장악하였는데, 991년(성종 10) 거란이 성장하면서 고려와 송(宋)나라의 교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이곳을 점령하였다. 993년에 거란이 소손녕(蕭遜寧)을 보내어 침략한 다음에 서희(徐熙)의 담판으로 외교관계가 성립되자, 양국을 왕래하는 교통 요지가 되었다. 또한 거란의 2차 침략이 실패로 끝난 뒤 양국 사이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1012년(현종 3) 거란에 사신으로 갔다오던 김은부(金殷傅)가 이곳에서 거란의 조종을 받은 여진에 의해 납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략도 실패로 끝나고 양국 사이에 국교가 성립한 뒤인 32년(덕종 1) 거란의 사신이 이곳에서 고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고려측에서 거절한 일도 있었다.
55년(문종 9)에 이 성의 군사가 고려의 성 부근에 정사(亭舍)를 지으려 하자 이에 항의한 일이 있었으며, 1116년(예종 11)에 거란의 내원성과 포주성(抱州城)이 금(金)나라의 공격을 받자 거란 장수의 요청으로 고려가 이들 성을 접수하고 포주를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로 삼았다. 그러나 내원성은 다시 금나라에 점령되었고, 83년(명종 3)에는 금나라에서 내원군(來遠郡)으로 개칭하였다고 알려오기도 하였다.(출처 : 동아대백과사전)
고구려 이래 압록강의 검동도(黔同島)에 설치되었던 성. 고구려 멸망 후 여진족(女眞族)의 소굴이 되었다. 991년(성종 10) 경 거란(契丹)이 압록강 가에 위구성(威寇城)·진화성(振化城)과 함께 이 성을 다시 쌓아 여진이 송나라와 교통하는 것을 막는 한편, 고려 서북면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뒤 고려와 거란 사이를 왕래하는 요지가 되었다. 1012년(현종 3) 거란에 사신으로 갔던 형부시랑 김은부(金殷傅)가 돌아오는 길에 이 성에 이르렀다가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에게 납치된 일이 있었다.
이듬해 고려에서 이 성에 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을 보내어 외교를 닦았고, 1032년(덕종 1)에는 거란의 사신이 이 성에 이르러 입국하려 하는 것을 고려에서 거절한 일이 있었다. 1035년(정종 1) 거란의 내원성사(來遠城使)가 흥화진(興化鎭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 첩(牒)을 보내어 조공을 독촉하였다.
1055년(문종 9) 이 성의 군사가 고려의 성 근처에 궁구문(弓口門)을 설치하고 정사(亭舍)를 지으려 하자, 고려에서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 : 遼陽)에게 국서를 보내 항의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시 내원성은 군사상 뿐만 아니라 외교상으로도 요지가 되었던 것이다.
1116년(예종 11) 내원성이 포주성(抱州城 : 의주)과 함께 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듬해 3월 요나라 장군이 고려에게 내원성과 포주성을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해로로 철수하자, 고려는 두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포주를 고쳐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를 삼고, 압록강으로서 경계를 삼았다.
금나라가 요나라의 내원성과 포주성을 공격한 것은 고려와 요나라 사이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가 두 성을 접수, 점령하는 것을 금나라가 쉽게 승인한 것은 고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내원성은 금나라가 점유해, 1183년(명종 13) 이 성을 내원군(來遠軍)으로 고쳤음을 고려에 통보해 왔고, 1217년(고종 4) 내원성이 고려의 영덕성(寧德城 : 의주)에 첩(牒)을 보내어 동진국(東眞國)의 포선만노(蒲鮮萬奴)와 거란의 군대를 서로 방어할 것을 약속해 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내원성은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서도 국방상·외교상의 요지가 되었다.
19. 연양가(延陽歌)
연양현에 한 충실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자기 몸을 나무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나무가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되도록 직분을 다하듯이 나도 비록 재가 되어 버리더라도 열심히 일을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읊었다.
고려시대의 작자, 연대 미상의 가요로 가사는 전하지 않고, \'고려사\'권71 삼국속악 고구려조에 그 내력만이 전하고, 내용은 연양(延陽) 땅에 남의 집 사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몸을 나무에 비유하여 “나무가 쓰일 대로 쓰이다가 불타서 없어지듯이 자기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여 죽음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읊은 노래라 한다. 가사는 전하지 않고, 그 유래만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 전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는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작품들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문학은 그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말은 진리이다.
結 論
韓國의 古代歌謠들은 그 발생과 형성,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 說話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곧, 上代歌謠들은 노래 단독으로 형성된 詩歌, 詩形이라기보다는 이들 노래를 가능케 한 주변의 시 背景說話라는 뿌리를 작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代歌謠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背景說話의 검토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된다. 상대시가가 보여준 說話와 歌謠의 관련 문제는 노래를 評價하는데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곧, 한국의 上代歌謠들은 그들 노래가 형성되고 전수되는 과정에 있어 한 개인에 의해 장안 제작된 독창적인 창작 노래들이기보다는, 傳來한 숱한 얘기들 중에서 다듬어졌으며, 민중과 집단 속에서 자라난 일종의 儀式歌謠 로서 면모를 띠고 있다는 점을 발견케 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文獻備考
『高慮歌謠 美學的 硏究』李光雨 1982.p137 학위논문(석사)
『百濟文學의 硏究』安東 1992 학위논문(석사)
『高慮詩歌의 硏究』 김학성 p 120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저, 새문사, 1985.
『삼국유사』 옮긴이:김원중 을유문화사(2002)
『韓國文學槪說』 한국문학편찬위원회 편, 형설출판사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지식산업사
『국문학통사』 장덕순, 신구문화사(1979)
「兜率歌와 新羅初期의 歌樂」 허남춘, 李佑成先生定年退職紀念 國語國文學論叢(1990)
「兜率歌」 김승찬, 崔珍源博士 停年紀念論叢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1991)
「정읍사의 연구」 지헌영 p 3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culture.chongup.chonbuk.kr
내원성
고려 초 여진이 장악하였는데, 991년(성종 10) 거란이 성장하면서 고려와 송(宋)나라의 교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이곳을 점령하였다. 993년에 거란이 소손녕(蕭遜寧)을 보내어 침략한 다음에 서희(徐熙)의 담판으로 외교관계가 성립되자, 양국을 왕래하는 교통 요지가 되었다. 또한 거란의 2차 침략이 실패로 끝난 뒤 양국 사이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1012년(현종 3) 거란에 사신으로 갔다오던 김은부(金殷傅)가 이곳에서 거란의 조종을 받은 여진에 의해 납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략도 실패로 끝나고 양국 사이에 국교가 성립한 뒤인 32년(덕종 1) 거란의 사신이 이곳에서 고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고려측에서 거절한 일도 있었다.
55년(문종 9)에 이 성의 군사가 고려의 성 부근에 정사(亭舍)를 지으려 하자 이에 항의한 일이 있었으며, 1116년(예종 11)에 거란의 내원성과 포주성(抱州城)이 금(金)나라의 공격을 받자 거란 장수의 요청으로 고려가 이들 성을 접수하고 포주를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로 삼았다. 그러나 내원성은 다시 금나라에 점령되었고, 83년(명종 3)에는 금나라에서 내원군(來遠郡)으로 개칭하였다고 알려오기도 하였다.(출처 : 동아대백과사전)
고구려 이래 압록강의 검동도(黔同島)에 설치되었던 성. 고구려 멸망 후 여진족(女眞族)의 소굴이 되었다. 991년(성종 10) 경 거란(契丹)이 압록강 가에 위구성(威寇城)·진화성(振化城)과 함께 이 성을 다시 쌓아 여진이 송나라와 교통하는 것을 막는 한편, 고려 서북면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뒤 고려와 거란 사이를 왕래하는 요지가 되었다. 1012년(현종 3) 거란에 사신으로 갔던 형부시랑 김은부(金殷傅)가 돌아오는 길에 이 성에 이르렀다가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에게 납치된 일이 있었다.
이듬해 고려에서 이 성에 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을 보내어 외교를 닦았고, 1032년(덕종 1)에는 거란의 사신이 이 성에 이르러 입국하려 하는 것을 고려에서 거절한 일이 있었다. 1035년(정종 1) 거란의 내원성사(來遠城使)가 흥화진(興化鎭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 첩(牒)을 보내어 조공을 독촉하였다.
1055년(문종 9) 이 성의 군사가 고려의 성 근처에 궁구문(弓口門)을 설치하고 정사(亭舍)를 지으려 하자, 고려에서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 : 遼陽)에게 국서를 보내 항의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시 내원성은 군사상 뿐만 아니라 외교상으로도 요지가 되었던 것이다.
1116년(예종 11) 내원성이 포주성(抱州城 : 의주)과 함께 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듬해 3월 요나라 장군이 고려에게 내원성과 포주성을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해로로 철수하자, 고려는 두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포주를 고쳐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를 삼고, 압록강으로서 경계를 삼았다.
금나라가 요나라의 내원성과 포주성을 공격한 것은 고려와 요나라 사이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가 두 성을 접수, 점령하는 것을 금나라가 쉽게 승인한 것은 고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내원성은 금나라가 점유해, 1183년(명종 13) 이 성을 내원군(來遠軍)으로 고쳤음을 고려에 통보해 왔고, 1217년(고종 4) 내원성이 고려의 영덕성(寧德城 : 의주)에 첩(牒)을 보내어 동진국(東眞國)의 포선만노(蒲鮮萬奴)와 거란의 군대를 서로 방어할 것을 약속해 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내원성은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서도 국방상·외교상의 요지가 되었다.
19. 연양가(延陽歌)
연양현에 한 충실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자기 몸을 나무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나무가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되도록 직분을 다하듯이 나도 비록 재가 되어 버리더라도 열심히 일을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읊었다.
고려시대의 작자, 연대 미상의 가요로 가사는 전하지 않고, \'고려사\'권71 삼국속악 고구려조에 그 내력만이 전하고, 내용은 연양(延陽) 땅에 남의 집 사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몸을 나무에 비유하여 “나무가 쓰일 대로 쓰이다가 불타서 없어지듯이 자기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여 죽음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읊은 노래라 한다. 가사는 전하지 않고, 그 유래만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 전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는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작품들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면 문학은 그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말은 진리이다.
結 論
韓國의 古代歌謠들은 그 발생과 형성,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 說話와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곧, 上代歌謠들은 노래 단독으로 형성된 詩歌, 詩形이라기보다는 이들 노래를 가능케 한 주변의 시 背景說話라는 뿌리를 작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代歌謠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背景說話의 검토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된다. 상대시가가 보여준 說話와 歌謠의 관련 문제는 노래를 評價하는데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곧, 한국의 上代歌謠들은 그들 노래가 형성되고 전수되는 과정에 있어 한 개인에 의해 장안 제작된 독창적인 창작 노래들이기보다는, 傳來한 숱한 얘기들 중에서 다듬어졌으며, 민중과 집단 속에서 자라난 일종의 儀式歌謠 로서 면모를 띠고 있다는 점을 발견케 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文獻備考
『高慮歌謠 美學的 硏究』李光雨 1982.p137 학위논문(석사)
『百濟文學의 硏究』安東 1992 학위논문(석사)
『高慮詩歌의 硏究』 김학성 p 120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 저, 새문사, 1985.
『삼국유사』 옮긴이:김원중 을유문화사(2002)
『韓國文學槪說』 한국문학편찬위원회 편, 형설출판사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지식산업사
『국문학통사』 장덕순, 신구문화사(1979)
「兜率歌와 新羅初期의 歌樂」 허남춘, 李佑成先生定年退職紀念 國語國文學論叢(1990)
「兜率歌」 김승찬, 崔珍源博士 停年紀念論叢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1991)
「정읍사의 연구」 지헌영 p 3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culture.chongup.chonbu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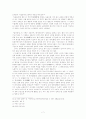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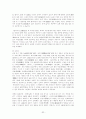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