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비감한 내면을 노래한 음유시인 월명사
2.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경계인 최치원
3. 시대와 불화한 천재들의 뒷모습
Ⅱ. 본론
1. 월명사
1.1 시대적 배경 및 인물탐구
1.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1.2.1 도솔가
1.2.2 제망매가
2. 최치원
2.1 시대적 배경 및 인물탐구
2.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2.2.1 최치원이 남긴 작품
2.2.2 작품의 특징
2.2.3 최치원의 작품 사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비감한 내면을 노래한 음유시인 월명사
2.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경계인 최치원
3. 시대와 불화한 천재들의 뒷모습
Ⅱ. 본론
1. 월명사
1.1 시대적 배경 및 인물탐구
1.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1.2.1 도솔가
1.2.2 제망매가
2. 최치원
2.1 시대적 배경 및 인물탐구
2.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2.2.1 최치원이 남긴 작품
2.2.2 작품의 특징
2.2.3 최치원의 작품 사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할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월명사가 지은 향가로는 짧은 형식의 「도솔가」와 긴 형식의 「제망매가」가 있는데 「도솔가」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발원으로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미륵 신앙에 근거한 주술적인 향가작품이며 「제망매가」는 누이의 죽음을 애도한 만가(輓歌)이다. 향가를 다른 이름으로 사뇌가(詞腦歌)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이 ‘신에게 사뢰는 노래’이고 천지귀신을 감동시킨 바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그 주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월명은 사천왕사에 머물던 밀교계통의 승려로 누이를 위해 부른 노래가 지전을 하늘로 날려 서방정토로 가는 누이의 노자돈으로 삼게 했다고 한다. 이임수, “월명의 삶과 예술”, 『월명학술발표 논문집』, 경주문화축제위원회, 2003
자세한 작품설명은 본론에서 하기로 한다.
1.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1.2.1 도솔가
국문학사에서 「도솔가」란 이름의 작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작품은 전하지 않고 이름만 「兜率歌」라 전하는 신라 제 3대 유례왕(유리왕) 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덕왕 때 월명이 지는 「도솔가」이다. 가사가 전하지 않는 「兜率歌」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나라가 태평함에 ‘민속환강을 노래한 樂의 시작’이요, ‘차사가 있는 사뇌격의 노래’라 하였다.
‘兜率’을 순수한 우리말로 읽으면 ‘두솔, 두률, 두리, 도리, 두래, 두류’등의 다양한 음이 가능하고, 의미 또한 양주동님은 지역의 노래나 애국가(愛國歌, 돗노래, 텃노래)로, 이혜구님은 살풀이(도살풀이)인 무가(巫歌)로, 정병욱님은 공동체의 노동요인 두릿노래로, 조지훈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노래라 기원의 노래인 치리가(治理歌, 다살노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가 전하지 않는 「兜率歌」는 국가적인 노래요, 공도체(집단)의 우리말 노래임에 이름 또한 ‘두릿노래’나 ‘다살노래’라 부름이 더 타당하다.
이에 비해 8세기 경덕왕 때 월명이 지는 「도솔가」에서의 ‘도솔’은 불교의 도솔천(兜率天)이며, 이 「도솔가」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발원으로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미륵신앙에 근거한 주술적인 향가작품이다. 「도솔가」의 향찰 원문과 양주동님의 해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찰원문)
今日此矣散花唱良(금일차의산화창량)
巴寶白乎隱花良汝隱(파보백호은화량여은)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직등은심음의명질사이악지)
彌勒座主陪立羅良(미륵좌주배립라량)
(한글해독)
오늘이해 산화(散花)(歌) 불러
보은(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 부리어(받들어)
미륵좌주(彌勒座主) 모셔라.
경덕왕 때,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으므로 일관이 왕에게 산화공덕으로 변괴를 물리칠 것을 청한다. 조원전에 깨끗한 단을 모으고 왕이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더니 마침 남쪽 밭둑길로 월명사가 걸어왔다. 왕이 스님으로 하여금 단을 열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 월명사가 미륵부처님께 꽃을 뿌리며 공덕을 비는 짧은 향가를 지은 것이다.
- 이일병현(二日竝現)과 산화공덕(散花功德) 이임수, “월명의 삶과 예술”, 『월명학술발표 논문집』, 경주문화축제위원회, 2003
『삼국사기』의 경덕왕 19년 기록에는 ‘하늘에 해가 둘 타나났다’는 사실이 없다. 다만 ‘정월에 도성 북쪽에 북치는 소리가 들리고, 2월엔 궁중에 큰 못을 팠으며, 4월엔 시중 염상이 물러가고 김옹이 시중이 되었다.’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를 두고 학자(이기백, 김승찬)들은 경덕왕 말년의 어지러운 정쟁으로 해석하여 경덕왕의 전제정치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이에 반대하는 반왕당파의 투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덕왕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 월명에게 「도솔가」를 짓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침을 찾은 것이 충담의 「안민가」인 셈이다.
하늘의 변괴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인도나, 신라에서 고려까지 불교 행사에 사용되어온 의식이 산화공덕이다. 불교의 산화행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월명사 도솔가’ 조의 기록에 “산화가는 따로 있으니 글이 번다하여 싣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솔가」와 작품에 나오는 「산화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 ‘散花唱良’라고 하여 꽃을 뿌리고(散花) 노래 불렀음(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연은 해설에서 이 「도솔가」와「산화가」는 분명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산화의식과 더불어 실제로 「산화가」를 창한 것은 다른 인도승이나 범패승이고, 그러한 의식의 과정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하여 월명이 지은 것이 위의 향가인 「도솔가」이다.
- 꽃 박노준, “월명의 향가문학세계”,『월명학술발표 논문집』 경주문화축제위원회, 2003
「도솔가」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의연 ‘꽃’이다. 그때의 상서롭지 못한 사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륵보살의 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 미륵보살을 모셔올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도솔가」의 꽃이 지니고 있는 심상은 우선 인간의 청순한 소망의 표상으로 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곧은 마음의 명령’이 거기에 포개짐에 따라 꽃은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반영된 존재물로서 엄격한 굴레에 갇히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절대소망·절대의지를 표상하고 있는 꽃은 원상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지상의 메시지를 수리하여 삼엄한 임무를 받아들인다. 마침내 꽃의 임무는 ‘기이일괴즉멸’의 순간에 이르자 완벽하게 달성된다. 꽃은 이처럼 놀랍게도 변화의 마력을 소유하고 있다.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도솔가」의 꽃, 그러므로 그것은 어차피 ‘광명의 사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원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곧 광명의 세계를 되찾는다는 뜻이다. 그 비밀이 ‘기이일괴즉멸’에 이르러 분명하게 판명된 것이다.
1.2.2 제망매가
「도솔가」보다 앞서 일찍 타계한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며 지었다고 전하는 월명의 「제망매가」를 보자.
(향찰원문)
生死路隱 生死(생사) 길흔
此矣有阿米次伊遣 이 이샤매 머믓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 가다 말ㅅ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자세한 작품설명은 본론에서 하기로 한다.
1.2 작품감상 및 작품세계 분석
1.2.1 도솔가
국문학사에서 「도솔가」란 이름의 작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작품은 전하지 않고 이름만 「兜率歌」라 전하는 신라 제 3대 유례왕(유리왕) 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덕왕 때 월명이 지는 「도솔가」이다. 가사가 전하지 않는 「兜率歌」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나라가 태평함에 ‘민속환강을 노래한 樂의 시작’이요, ‘차사가 있는 사뇌격의 노래’라 하였다.
‘兜率’을 순수한 우리말로 읽으면 ‘두솔, 두률, 두리, 도리, 두래, 두류’등의 다양한 음이 가능하고, 의미 또한 양주동님은 지역의 노래나 애국가(愛國歌, 돗노래, 텃노래)로, 이혜구님은 살풀이(도살풀이)인 무가(巫歌)로, 정병욱님은 공동체의 노동요인 두릿노래로, 조지훈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노래라 기원의 노래인 치리가(治理歌, 다살노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가 전하지 않는 「兜率歌」는 국가적인 노래요, 공도체(집단)의 우리말 노래임에 이름 또한 ‘두릿노래’나 ‘다살노래’라 부름이 더 타당하다.
이에 비해 8세기 경덕왕 때 월명이 지는 「도솔가」에서의 ‘도솔’은 불교의 도솔천(兜率天)이며, 이 「도솔가」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발원으로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미륵신앙에 근거한 주술적인 향가작품이다. 「도솔가」의 향찰 원문과 양주동님의 해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찰원문)
今日此矣散花唱良(금일차의산화창량)
巴寶白乎隱花良汝隱(파보백호은화량여은)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직등은심음의명질사이악지)
彌勒座主陪立羅良(미륵좌주배립라량)
(한글해독)
오늘이해 산화(散花)(歌) 불러
보은(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 부리어(받들어)
미륵좌주(彌勒座主) 모셔라.
경덕왕 때,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으므로 일관이 왕에게 산화공덕으로 변괴를 물리칠 것을 청한다. 조원전에 깨끗한 단을 모으고 왕이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더니 마침 남쪽 밭둑길로 월명사가 걸어왔다. 왕이 스님으로 하여금 단을 열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 월명사가 미륵부처님께 꽃을 뿌리며 공덕을 비는 짧은 향가를 지은 것이다.
- 이일병현(二日竝現)과 산화공덕(散花功德) 이임수, “월명의 삶과 예술”, 『월명학술발표 논문집』, 경주문화축제위원회, 2003
『삼국사기』의 경덕왕 19년 기록에는 ‘하늘에 해가 둘 타나났다’는 사실이 없다. 다만 ‘정월에 도성 북쪽에 북치는 소리가 들리고, 2월엔 궁중에 큰 못을 팠으며, 4월엔 시중 염상이 물러가고 김옹이 시중이 되었다.’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를 두고 학자(이기백, 김승찬)들은 경덕왕 말년의 어지러운 정쟁으로 해석하여 경덕왕의 전제정치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이에 반대하는 반왕당파의 투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덕왕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 월명에게 「도솔가」를 짓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침을 찾은 것이 충담의 「안민가」인 셈이다.
하늘의 변괴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인도나, 신라에서 고려까지 불교 행사에 사용되어온 의식이 산화공덕이다. 불교의 산화행법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월명사 도솔가’ 조의 기록에 “산화가는 따로 있으니 글이 번다하여 싣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솔가」와 작품에 나오는 「산화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 ‘散花唱良’라고 하여 꽃을 뿌리고(散花) 노래 불렀음(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연은 해설에서 이 「도솔가」와「산화가」는 분명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산화의식과 더불어 실제로 「산화가」를 창한 것은 다른 인도승이나 범패승이고, 그러한 의식의 과정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하여 월명이 지은 것이 위의 향가인 「도솔가」이다.
- 꽃 박노준, “월명의 향가문학세계”,『월명학술발표 논문집』 경주문화축제위원회, 2003
「도솔가」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의연 ‘꽃’이다. 그때의 상서롭지 못한 사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륵보살의 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그 미륵보살을 모셔올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도솔가」의 꽃이 지니고 있는 심상은 우선 인간의 청순한 소망의 표상으로 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곧은 마음의 명령’이 거기에 포개짐에 따라 꽃은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반영된 존재물로서 엄격한 굴레에 갇히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절대소망·절대의지를 표상하고 있는 꽃은 원상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지상의 메시지를 수리하여 삼엄한 임무를 받아들인다. 마침내 꽃의 임무는 ‘기이일괴즉멸’의 순간에 이르자 완벽하게 달성된다. 꽃은 이처럼 놀랍게도 변화의 마력을 소유하고 있다.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도솔가」의 꽃, 그러므로 그것은 어차피 ‘광명의 사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원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곧 광명의 세계를 되찾는다는 뜻이다. 그 비밀이 ‘기이일괴즉멸’에 이르러 분명하게 판명된 것이다.
1.2.2 제망매가
「도솔가」보다 앞서 일찍 타계한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며 지었다고 전하는 월명의 「제망매가」를 보자.
(향찰원문)
生死路隱 生死(생사) 길흔
此矣有阿米次伊遣 이 이샤매 머믓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 가다 말ㅅ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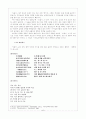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