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목차
1. 음운과 음운 변동에 대한 Q&A
1.1 이중모음은 왜 음운이 아닌가요?
~
5. 훈민정음과 국어사에 대한 Q&A
~
5.8 움라우트와 전설모음화는 같은 것인가요?
1.1 이중모음은 왜 음운이 아닌가요?
~
5. 훈민정음과 국어사에 대한 Q&A
~
5.8 움라우트와 전설모음화는 같은 것인가요?
본문내용
하기 때문.
종성에 자음이 최대 1개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의 결과인 자음군 단순화는 ‘불파’와는 또 다른 음절구조 제약임.
음절구조제약은 2가지인데 음절말 불파,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최대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제약임.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남은 1개 자음이 불파된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자세히] 읊다-(자음군단순화) → 읖다 - (음절의 끝소리규칙) → 읍다 -(경음화) → 읍따
어간말 자음군 단어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지 않는 한 자음군 C1C2 중 하나가 반드시 탈락함.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최대한 개만 올 수 있는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C2가 후행음절 초성으로 연음 됨.
(1) ㉠ 닭이 → [달기], 닭을→[달글] ㉡ 닭→[닥] ㉢ 닭도 →[닥또], 닭만[당만]
음절구조제약으로 자음군 중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나 (㉡,㉢ ㄺ중 ㄹ이 탈락함.) 자음군 C1C2 중 어느 자음이 탈락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말하기 어려움. 같은 ‘ㄺ’자음군이지만 읽고[일꼬]에서는 닭도[닥또]에서와 달리 ㄱ이 탈락하기 때문.
(2) 음운변동의 적용순서가 정확한 예
㉠ /닭도/ -(자음군 단순화) → 닥도 -(경음화) → [닥또]
㉡ /닭만/- (자음군 단순화) → 닥만-(비음동화) →[당만]
(3) /읊다/ →[읍따]
↓ (결론)
(4) 읊다 -> 읖다 /ㄹ→/ (자음군단순화) → 읍다/ㅍ→ㅂ/ (음절의 끝소리규칙) → 읍따/다→따/(경음화)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ㄹ/탈락, /ㅍ/이 /ㅂ/ 교체 , 둘째 음절 초성 /ㄷ/이 된소리/ㄸ/으로 바뀜.
/ㄹ/탈락는 음절말에 자음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때문.
/ㅍ/이 /ㅂ/ 교체는 음절말 자음의 불파 때문
> 종성에 최대 1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자음군이 단순화되는데 불파는 그렇게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어 남은 자음에 적용되는 발음제약임.
결론) 자음군단순화가 불파에 선행하는 음절구조제약임.(자단→불파 순) 둘째 음절 [따]의 경음화는 불파된 /ㅂ/때문.
(5) 순서 확정이 어려운 예 /핥다/ → [할따]
↓ (6)과 같이 해석하는 데 문제 有
(6) 핥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다- (경음화) →따 - /ㄷ탈락/→ 할따 (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일 뿐 )
* 표면적(눈에 보이는) 음운 변동
어간말 자음군 /ㄾ/ 중에서 /ㅌ/탈락 어미두음 /ㄷ/이 /ㄸ/ 경음화
1) → 순서 아님
/ㅌ/탈락이 먼저 일어났다면 /ㄹ/뒤 경음화 설명 안됨- 알다[알다], 불다[불다]가 있으므로.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정 필요
어미 두음의 경음화 설명 단서를 위해 어간말 자음군 /ㄾ/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
3) 읊다[읍따]와의 차이 : [읍따]에서는 /ㄹ/이 먼저 탈락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에 문제 없음.
그런데! [할따]에서는 [읍따]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쉽게 가정하기 어려움
> 이유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가정하는 것은 표면형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절대로 실현될 수도 없는 ‘다,따’를 상정해야 함. 앞에서 국어에는 음절말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이 있고, 이 제약은 발음했을 때 즉 표면형에서의 제약이라고 설명함.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원인인 불파 역시 표면형에서 발음했을 때의 제약임.
자음군 단순화는 불파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선행하는 음절구조 제약임. ( 종성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고, 그 자음도 불파로 인해 모든 자음이 실현되지 못하고 7개 만 실현)
이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절대로 ‘’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존재하려면 종성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제약에 앞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야하기 때문.
이유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 실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가정하면 ‘’에서 /ㄷ/이 탈락하는 시점이 문제가 됨. /ㄷ/은 어미를 경음화 시킨 후 탈락해야 함. 즉‘ 핥다→다→따→할따’에서 ‘다’ 시점에서 탈락하면 안되고 반드시 ‘따’ 이후 탈락해야 함.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가정해야할 근거 없음. 즉 /ㄷ/이 ‘다’ 이후 탈락한다는 증거 찾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자음군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에 선행한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김.)
* 위와 같은 설명할 수 있으나 (6)에서 제기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예
(7) 앉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다 (경음화) →따 (/ㄷ/탈락)→ 안따
1.4. 예삿일[예산닐]은 사잇소리현상인가요, / ‘ㄴ’첨가인가요? [문싶문]
[한마디] 예삿일은 ‘예사+일’이 결합한 합성어. ‘예사+일→[예산닐]에는 /ㄴ/이 두 개 첨가되었는데, [산]의 /ㄴ/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첨가 된 것이고, [닐]은 /ㄴ/첨가로 첨가된 것. 즉 사잇소리현상과 /ㄴ/첨가 둘 다 적용된 것임!
참고> <한글맞춤법> : 사잇소리현상이 아니라 사이시옷 첨가라는 용어 사용.
<한글 맞춤법-제30항> : 사이시옷 첨가 규정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예로 제시되어 있음. ’ㄴ-ㄴ’이 모두 사이시옷 첨가는 아니므로 음운론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님. 다만, ’ㄴ-ㄴ’중 앞에 /ㄴ/은 사이시옷 첨가이므로 사이시옷 첨가의 예가 될 수는 있음. 그리고 뒤의 /ㄴ/은 /ㄴ/첨가이므로 /ㄴ/첨가의 예 또한 될 수 있음.
[자세히]
* 사잇소리 현상의 이해를 위한 두 가지 확인 조건 확인 필요
합성어이면서, 두 어근 중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일 것 사잇소리 현상의 대상에 대한 규정
ⓐ 후행 어근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거나 ⓑ 선행어근 종성에 표면적으로 [ㄴ]이 첨가된 경우
은 사잇소리 현상의 대상에 대한 규정 > ‘해님’처럼 파생어, ‘효과’[효꽈], ‘사건’[사껀]처럼 한자어는 대상이 아님.
는 사잇소리 현상의 판단준거> 사이시옷이 첨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내+가[
종성에 자음이 최대 1개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의 결과인 자음군 단순화는 ‘불파’와는 또 다른 음절구조 제약임.
음절구조제약은 2가지인데 음절말 불파,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최대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제약임.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남은 1개 자음이 불파된다.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자세히] 읊다-(자음군단순화) → 읖다 - (음절의 끝소리규칙) → 읍다 -(경음화) → 읍따
어간말 자음군 단어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지 않는 한 자음군 C1C2 중 하나가 반드시 탈락함.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최대한 개만 올 수 있는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C2가 후행음절 초성으로 연음 됨.
(1) ㉠ 닭이 → [달기], 닭을→[달글] ㉡ 닭→[닥] ㉢ 닭도 →[닥또], 닭만[당만]
음절구조제약으로 자음군 중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나 (㉡,㉢ ㄺ중 ㄹ이 탈락함.) 자음군 C1C2 중 어느 자음이 탈락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말하기 어려움. 같은 ‘ㄺ’자음군이지만 읽고[일꼬]에서는 닭도[닥또]에서와 달리 ㄱ이 탈락하기 때문.
(2) 음운변동의 적용순서가 정확한 예
㉠ /닭도/ -(자음군 단순화) → 닥도 -(경음화) → [닥또]
㉡ /닭만/- (자음군 단순화) → 닥만-(비음동화) →[당만]
(3) /읊다/ →[읍따]
↓ (결론)
(4) 읊다 -> 읖다 /ㄹ→/ (자음군단순화) → 읍다/ㅍ→ㅂ/ (음절의 끝소리규칙) → 읍따/다→따/(경음화)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ㄹ/탈락, /ㅍ/이 /ㅂ/ 교체 , 둘째 음절 초성 /ㄷ/이 된소리/ㄸ/으로 바뀜.
/ㄹ/탈락는 음절말에 자음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때문.
/ㅍ/이 /ㅂ/ 교체는 음절말 자음의 불파 때문
> 종성에 최대 1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자음군이 단순화되는데 불파는 그렇게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어 남은 자음에 적용되는 발음제약임.
결론) 자음군단순화가 불파에 선행하는 음절구조제약임.(자단→불파 순) 둘째 음절 [따]의 경음화는 불파된 /ㅂ/때문.
(5) 순서 확정이 어려운 예 /핥다/ → [할따]
↓ (6)과 같이 해석하는 데 문제 有
(6) 핥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다- (경음화) →따 - /ㄷ탈락/→ 할따 (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일 뿐 )
* 표면적(눈에 보이는) 음운 변동
어간말 자음군 /ㄾ/ 중에서 /ㅌ/탈락 어미두음 /ㄷ/이 /ㄸ/ 경음화
1) → 순서 아님
/ㅌ/탈락이 먼저 일어났다면 /ㄹ/뒤 경음화 설명 안됨- 알다[알다], 불다[불다]가 있으므로.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정 필요
어미 두음의 경음화 설명 단서를 위해 어간말 자음군 /ㄾ/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
3) 읊다[읍따]와의 차이 : [읍따]에서는 /ㄹ/이 먼저 탈락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에 문제 없음.
그런데! [할따]에서는 [읍따]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쉽게 가정하기 어려움
> 이유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가정하는 것은 표면형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절대로 실현될 수도 없는 ‘다,따’를 상정해야 함. 앞에서 국어에는 음절말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음절구조제약이 있고, 이 제약은 발음했을 때 즉 표면형에서의 제약이라고 설명함.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원인인 불파 역시 표면형에서 발음했을 때의 제약임.
자음군 단순화는 불파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선행하는 음절구조 제약임. ( 종성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고, 그 자음도 불파로 인해 모든 자음이 실현되지 못하고 7개 만 실현)
이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절대로 ‘’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존재하려면 종성에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는 제약에 앞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야하기 때문.
이유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 실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순서를 가정하면 ‘’에서 /ㄷ/이 탈락하는 시점이 문제가 됨. /ㄷ/은 어미를 경음화 시킨 후 탈락해야 함. 즉‘ 핥다→다→따→할따’에서 ‘다’ 시점에서 탈락하면 안되고 반드시 ‘따’ 이후 탈락해야 함.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가정해야할 근거 없음. 즉 /ㄷ/이 ‘다’ 이후 탈락한다는 증거 찾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자음군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에 선행한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김.)
* 위와 같은 설명할 수 있으나 (6)에서 제기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예
(7) 앉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다 (경음화) →따 (/ㄷ/탈락)→ 안따
1.4. 예삿일[예산닐]은 사잇소리현상인가요, / ‘ㄴ’첨가인가요? [문싶문]
[한마디] 예삿일은 ‘예사+일’이 결합한 합성어. ‘예사+일→[예산닐]에는 /ㄴ/이 두 개 첨가되었는데, [산]의 /ㄴ/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첨가 된 것이고, [닐]은 /ㄴ/첨가로 첨가된 것. 즉 사잇소리현상과 /ㄴ/첨가 둘 다 적용된 것임!
참고> <한글맞춤법> : 사잇소리현상이 아니라 사이시옷 첨가라는 용어 사용.
<한글 맞춤법-제30항> : 사이시옷 첨가 규정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예로 제시되어 있음. ’ㄴ-ㄴ’이 모두 사이시옷 첨가는 아니므로 음운론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님. 다만, ’ㄴ-ㄴ’중 앞에 /ㄴ/은 사이시옷 첨가이므로 사이시옷 첨가의 예가 될 수는 있음. 그리고 뒤의 /ㄴ/은 /ㄴ/첨가이므로 /ㄴ/첨가의 예 또한 될 수 있음.
[자세히]
* 사잇소리 현상의 이해를 위한 두 가지 확인 조건 확인 필요
합성어이면서, 두 어근 중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일 것 사잇소리 현상의 대상에 대한 규정
ⓐ 후행 어근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거나 ⓑ 선행어근 종성에 표면적으로 [ㄴ]이 첨가된 경우
은 사잇소리 현상의 대상에 대한 규정 > ‘해님’처럼 파생어, ‘효과’[효꽈], ‘사건’[사껀]처럼 한자어는 대상이 아님.
는 사잇소리 현상의 판단준거> 사이시옷이 첨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내+가[
키워드
추천자료
 현대문법 - 현재 중,고등학교의 문법교육 실태 조사
현대문법 - 현재 중,고등학교의 문법교육 실태 조사 초등영어문법 지도방법 연구
초등영어문법 지도방법 연구  이 야 기(최종)
이 야 기(최종) 유중원의 문법공식 1차완성(대박강추)
유중원의 문법공식 1차완성(대박강추) 문법교육론 - 부사어
문법교육론 - 부사어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성취기준
국어과 교과서에 반영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성취기준  언어의이해=내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간략히...
언어의이해=내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간략히...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문법적 교수요목과 개념기능적 교수요목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문법적 교수요목과 개념기능적 교수요목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교육론] 2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 사용, 주제 설정해서 말하기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교육론] 2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 사용, 주제 설정해서 말하기 ... 영어 생초보를 위한 문법은 생까자는 영문법 이야기
영어 생초보를 위한 문법은 생까자는 영문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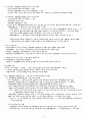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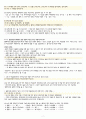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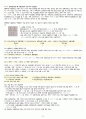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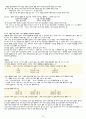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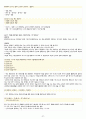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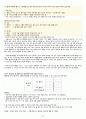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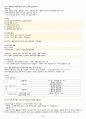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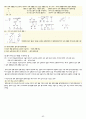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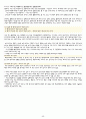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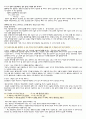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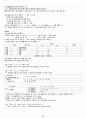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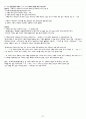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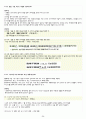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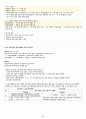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