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장의 성분
<1>문장 성분과 성분의 재료
<2>주성분
<3>부속성분
<4>독립 성분
2. 문장의 짜임
<1>문장의 분류
<2>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
<3>이어진 문장-두개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전체 문장
3. 문법 요소
<1>문장 종결 표현
<2>높임 표현
<3>시간 표현
<4>使動과 피동
<5>부정 표현
<1>문장 성분과 성분의 재료
<2>주성분
<3>부속성분
<4>독립 성분
2. 문장의 짜임
<1>문장의 분류
<2>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
<3>이어진 문장-두개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전체 문장
3. 문법 요소
<1>문장 종결 표현
<2>높임 표현
<3>시간 표현
<4>使動과 피동
<5>부정 표현
본문내용
③왠지 내 마음속에 그녀가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 ④빨리 집에 가고 싶어
⑤광국이는 그녀에게 예쁜 인형을 주었다. ⑥방이 무척 밝다.
⑦그는 대구 지리에 밝다.
조건>1.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의 유형을 설명할 것
2.서술어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것
3.서술어의 자릿수의 이동에 대해 설명할 것
3>목적어-두 자리 서술어인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
└구조┌ 체언+목적격조사(을/를) 예>나는 테니스를 친다. : 원칙
└체언+보조사, 체언+보조사+목적격조사, 체언+(목적격조사 생략), 구, 절+목적격조사
①목적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위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말에 목적격 조사가 특별히 쓰이는 경우)
ㄱ.나는 학교를 갔다.
ㄴ.나는 학교에 갔다.
ㄷ.나는 학교에를 갔다.
학교 문법의 목적어 논의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ㄱ과 같은 경우에 과연학교를이 목적어인가 하는 것이다. 서술어가다는 분명히 위치(또는 방향)를 요구하는 소위 필수적 부사어학교에와 호응하는 동사이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ㄴ의학교에는 부사어로 인정되고 있고, ㄱ의학교를은 목적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똑같은가다앞인데 왜 하나는 부사어, 하나는 목적어가 된다는 것인가. 또 ㄷ의 경우학교에를은 문장 성분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이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때의-를은 단순히 <강조>의미의 보조사일 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목적어의 겹침(이중 목적어) 예>동규는 나를 책을 주었다.
위 예문에서나를, 책을이라는 이중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로서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기본 문장 성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온전한 이중 목적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나를은 실상은나에게라는 것이다. 결국 이때의를도 목적격 조사가 아닌 <강조>의 보조사라고 보는 것이 낫다.
: 한 문장에 목적어가 두 개 이상 쓰이는 경우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 예>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그것의 한 종류 : 예>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일 때 : 예>어머니께서 용돈을 千원을 주셨다.
㉡해결 방법┌앞 목적어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꾸는 것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두 목적어 중 어느 한 목적어의 조사를 생략
4>보어-서술어를 보충에 주는 말
└구조 : 체언, 명사구, 명사절, 체언 구실을 하는 말 +-이/가
ㄱ.물이 얼음이 되다.
ㄴ.물이 얼음으로 되다.
ㄱ은 보어이고 ㄴ은 필수적 부사어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서술어 자릿수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각각이, (으)로라는 조사가 쓰인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둘을 모두 보어로 보고,이/가, (으)로를 모두 보격 조사로 본다면,집으로 가다의(으)로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1.보어에 대하여 예문을 통해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①철수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②그는 영리한 아이가 아니다.
③물이 얼음으로 된다.
④농사가 기후에 적합하다.
⑤철수는 기영이와 키가 비슷하다.
조건>1.예문을 통해 학교 문법에서 보어 개념과 보어 설정의 문제점을 설명할 것
2.②에서 보어가 사용될 경우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꼭 필요한 성분을 밝히고 그 경우 서 술어 자릿수 설정의 문제점을 설명할 것
<3>부속성분
1>관형어-체언으로 된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 앞에 붙어서 그것을 꾸며 주는 말
└구조 :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단독 두 개의 체언이 연속될 때 앞의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한다. 예> 시골 청년
└─┘
, 체언+관형격조사(-의)관형격조사 구성 : 체언A+의+체언B
1)의미의 다양성: 관형격조사 또는 그 구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예>박사님의 책 →박사님이 가진 책 박사님이 지은 책
2)의미상 주어 표시의→주어 서술어 관계(주술관계) 예>철수의 어리석음→철수가 어리석다.
3)의미상 목적어 표시의→목적어 서술어 관계 예>평화의 파괴→평화를 파괴하다.
4)은유를 만드는의(=동격의의)→직유를 포함한다.
예>낙엽의 산더미←낙엽이 산더미다.←낙엽이 산더미 같다.
5)체언+조사: 구성의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할 때는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성공으로의 길(*성공으로 길) 나라의 보배(*나라 보배)
①관형어의 기능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때는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던’ 중의 어느 하나를 취함으로써 그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되었을 때 그 꾸밈을 받는 체언은, 그 용언을 서술어로 한 격성분으로서의 체언인 것이 보통이다.
ㄱ. 어제 내가 책을 빌린 도서관은 이 쪽에 있다. →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러나, 서술절의 주어나 동반 부사의 체언 등은 그 서술어를 관형어로 하여 꾸밈을 받을 수 없다. ㄴ. 미영이가 과대표가 되었다. → *미영이가 된 과대표
② ‘-던’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는가?
‘-던’은 ‘-더’라는 회상 시제의 형태소와 ‘-(으)ㄴ’이 합쳐진 것으로 본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 -(으)ㄴ, -(으)ㄹ’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관형어는 부속성분이나 주성분인 체언이 의존명사이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답다.→*것보다 것이 아름답다.(필수적 관형어)
cf> 중세 국어 관형어의 특수성
1>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관형어(단순히 주어라고 하면 틀림)
예>迦葉의 能히 信受호 讚歎시니라.
→현대 국어에서도 뒤의 명사형 전성어미-ㅁ, -기가 올 때 주격 조사가 관형격 조사인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중세 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2>절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어일 때(관형격조사가 결합되었을 때)그 체언의 끝모음ㅣ는 탈락하지 않는다.
예>제자ㅣ아비의 편안히 안알오
(>제자(여러 아들이)가아비가 편안히 앉은 줄알고)
→일반적으로 유정 명사(사람, 동물)의 끝모음이ㅣ일 때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면아
⑤광국이는 그녀에게 예쁜 인형을 주었다. ⑥방이 무척 밝다.
⑦그는 대구 지리에 밝다.
조건>1.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의 유형을 설명할 것
2.서술어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것
3.서술어의 자릿수의 이동에 대해 설명할 것
3>목적어-두 자리 서술어인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
└구조┌ 체언+목적격조사(을/를) 예>나는 테니스를 친다. : 원칙
└체언+보조사, 체언+보조사+목적격조사, 체언+(목적격조사 생략), 구, 절+목적격조사
①목적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위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말에 목적격 조사가 특별히 쓰이는 경우)
ㄱ.나는 학교를 갔다.
ㄴ.나는 학교에 갔다.
ㄷ.나는 학교에를 갔다.
학교 문법의 목적어 논의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ㄱ과 같은 경우에 과연학교를이 목적어인가 하는 것이다. 서술어가다는 분명히 위치(또는 방향)를 요구하는 소위 필수적 부사어학교에와 호응하는 동사이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ㄴ의학교에는 부사어로 인정되고 있고, ㄱ의학교를은 목적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똑같은가다앞인데 왜 하나는 부사어, 하나는 목적어가 된다는 것인가. 또 ㄷ의 경우학교에를은 문장 성분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이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때의-를은 단순히 <강조>의미의 보조사일 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목적어의 겹침(이중 목적어) 예>동규는 나를 책을 주었다.
위 예문에서나를, 책을이라는 이중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로서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기본 문장 성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온전한 이중 목적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나를은 실상은나에게라는 것이다. 결국 이때의를도 목적격 조사가 아닌 <강조>의 보조사라고 보는 것이 낫다.
: 한 문장에 목적어가 두 개 이상 쓰이는 경우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 예>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그것의 한 종류 : 예>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일 때 : 예>어머니께서 용돈을 千원을 주셨다.
㉡해결 방법┌앞 목적어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꾸는 것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두 목적어 중 어느 한 목적어의 조사를 생략
4>보어-서술어를 보충에 주는 말
└구조 : 체언, 명사구, 명사절, 체언 구실을 하는 말 +-이/가
ㄱ.물이 얼음이 되다.
ㄴ.물이 얼음으로 되다.
ㄱ은 보어이고 ㄴ은 필수적 부사어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서술어 자릿수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각각이, (으)로라는 조사가 쓰인다는 것이다. 만약 이 둘을 모두 보어로 보고,이/가, (으)로를 모두 보격 조사로 본다면,집으로 가다의(으)로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1.보어에 대하여 예문을 통해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①철수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②그는 영리한 아이가 아니다.
③물이 얼음으로 된다.
④농사가 기후에 적합하다.
⑤철수는 기영이와 키가 비슷하다.
조건>1.예문을 통해 학교 문법에서 보어 개념과 보어 설정의 문제점을 설명할 것
2.②에서 보어가 사용될 경우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꼭 필요한 성분을 밝히고 그 경우 서 술어 자릿수 설정의 문제점을 설명할 것
<3>부속성분
1>관형어-체언으로 된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 앞에 붙어서 그것을 꾸며 주는 말
└구조 :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단독 두 개의 체언이 연속될 때 앞의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한다. 예> 시골 청년
└─┘
, 체언+관형격조사(-의)관형격조사 구성 : 체언A+의+체언B
1)의미의 다양성: 관형격조사 또는 그 구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예>박사님의 책 →박사님이 가진 책 박사님이 지은 책
2)의미상 주어 표시의→주어 서술어 관계(주술관계) 예>철수의 어리석음→철수가 어리석다.
3)의미상 목적어 표시의→목적어 서술어 관계 예>평화의 파괴→평화를 파괴하다.
4)은유를 만드는의(=동격의의)→직유를 포함한다.
예>낙엽의 산더미←낙엽이 산더미다.←낙엽이 산더미 같다.
5)체언+조사: 구성의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할 때는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성공으로의 길(*성공으로 길) 나라의 보배(*나라 보배)
①관형어의 기능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때는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던’ 중의 어느 하나를 취함으로써 그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되었을 때 그 꾸밈을 받는 체언은, 그 용언을 서술어로 한 격성분으로서의 체언인 것이 보통이다.
ㄱ. 어제 내가 책을 빌린 도서관은 이 쪽에 있다. →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러나, 서술절의 주어나 동반 부사의 체언 등은 그 서술어를 관형어로 하여 꾸밈을 받을 수 없다. ㄴ. 미영이가 과대표가 되었다. → *미영이가 된 과대표
② ‘-던’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는가?
‘-던’은 ‘-더’라는 회상 시제의 형태소와 ‘-(으)ㄴ’이 합쳐진 것으로 본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 -(으)ㄴ, -(으)ㄹ’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관형어는 부속성분이나 주성분인 체언이 의존명사이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답다.→*것보다 것이 아름답다.(필수적 관형어)
cf> 중세 국어 관형어의 특수성
1>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관형어(단순히 주어라고 하면 틀림)
예>迦葉의 能히 信受호 讚歎시니라.
→현대 국어에서도 뒤의 명사형 전성어미-ㅁ, -기가 올 때 주격 조사가 관형격 조사인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중세 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2>절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어일 때(관형격조사가 결합되었을 때)그 체언의 끝모음ㅣ는 탈락하지 않는다.
예>제자ㅣ아비의 편안히 안알오
(>제자(여러 아들이)가아비가 편안히 앉은 줄알고)
→일반적으로 유정 명사(사람, 동물)의 끝모음이ㅣ일 때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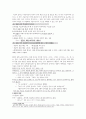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