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 있다. 이는 목탑양식의 수법을 모방하여 전탑이 조성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금동제상륜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없어졌다.
4. 임청각(臨淸閣)
안동 영남산의 동쪽 기슭에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넓은 대지에 자리한 옛집이다. 현 소유자의 11대 조상인 이후식(1653∼1714)이 조선 숙종 때 안채를 짓고 이어 사랑채를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손자 이원미가 마저 짓고 대청인 영모당도 지었다. 대청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북정(北亭)은 영조 51년(1775)에 지어졌다. 순조 24년(1824)에 대수리를 하였고, 1991년에는 안채의 정침을 고쳐지었다.
<군자정>
고성 이씨는 본래 중국 당나라 때 난을 피하여 들어온 이경· 이황 형제를 시조로 한다. 고려 때는 개경 송악산 밑에서 살았는데, 토족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경상남도 고성땅에 살게 되어 ‘고성 이씨’로 관향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조선 세조 때 현감을 지낸 이증이 안동에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가옥전체를 당호인 임청각이라 부르고, 임청각에 딸린 별당채를 군자정이라 부르는 이 가옥은 고성이씨 대종택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國務領: 현재의 국무총리)을 지낸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생가이기도 하다. 원래는 아흔아홉 간 집으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바깥 행랑채 등으로 건물 군이 남녀별, 계층별로 뚜렷한 구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 안채와 바깥채 기단의 높이차이가 2m나 되어 건물의 위계질서를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제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되었던 1930년대 후반, 그들이 태백산맥 인근의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을 반출하여 대륙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량리와 경주를 연결하는 중앙선철로(1936년에 착공하여 1942년에 개통)를 이 집을 통과하게 건설하면서 파괴하여 50여 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건물도 채 3m정도의 간격밖에 두지 않고 집 앞을 막고 선 대문보다 훨씬 더 높은 중앙선철로의 방음벽에 갇혀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5. 동부동 오층전탑
안동 동부동 오층전탑은 안동역 앞에 있는데 『영가지(永嘉誌)』에는 이 탑이 \'법림사지탑(法林寺址塔)\'이라고 되어 있어 이 주위에 법림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탑의 기단부는 화강암 3단으로 되어있고 탑신부는 길이 27.5cm, 넓이 12.5cm, 두께 6cm의 무문전(無文塼)을 사용한 5층탑이다. 초층은 높고 2층부터는 체감되었다. 옥개하부의 받침수는 초층에서부터 10, 8, 6, 4, 3단으로 체감되었고 상면은 층을 두지 않고 각층전면에 기와를 입혔다.
탑신에는 각층에 감실을 설치하였으며 2층 탑신 남면에는 2구의 인왕상을 조각한 화강암 판석이 끼워져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연화가 조각된 복발 형 석재가 얹혀져 있다.『영가지』에 의하면 원래 정상에는 금동으로 된 상륜부가 있었으나 조선 선조조(宣祖朝)에 명나라 병사에 의 하여 철거되었다고 한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화강암과 전을 사용하였는데 총 높이 8.35m, 기단부 3.65m이며 원래 는 7층탑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도괴되어 조선 선조 31년(1598)에 5층으로 개축하였다.
6. 제비원 석불
제비원 석불은 안동시 이천동 연미사(燕尾寺) 옆에 있다. 안동 주민들에게는 안동의 상징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연미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명덕이란 승려가 창건하였고, 뒤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행하는 관리를 위한 숙소인 원(院)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원이란 사찰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서 제비원은 그 말 자체가 사찰의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절은 1918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절 위의 바위 위에는 안동 이천동 3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9호)이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가(巫歌)인‘성주풀이’사설에 나오는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라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래라”라는 가사와 ‘연이 처녀와 노랭이 김씨 총각’, ‘불상 목 벤 이여송’, ‘불상 만든 형제’, ‘제비원과 법룡사 절 짓기 시합’, ‘자리 빼앗긴 울바위’ 등 지금까지 안동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많은 전설들이 얽혀 있기도 하다.
불상은 크게 몸체와 머리로 나누어지는데, 몸체는 높은 바위절벽에 얕은 부조(浮彫)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다. 머리는 얼굴과 큼직한 육계가 표현된 소발(素髮)의 머리를 각기 다른 돌로 만들어 조합하였다. 얼굴은 풍만하여 자비로우면서도 근엄한 느낌을 주며 양 눈썹 사이에는 백호를 양각으로 새겼고, 눈은 가늘고 길게 떴으며, 눈 위로 초승달 모양의 눈썹의 안쪽 선끝이 바로 삼각형으로 우뚝 솟은 코의 윤곽선과 연결되었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아랫입술을 밑으로 도톰하게 새겼다. 따로 된 머리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명나라에서 참전한 이여송 장군이 이 앞을 지날 때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칼로 머리를 쳐서 떨어뜨린 후 비로소 말이 발을 옮길 수 있었다는 설화가 붙어 있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라시대에 조각된 머리 부분이 있었는데 풍화가 심하여 후대에 다시 만들어 붙였으며 옛날에 있던 머리는 산 밑 계곡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 제비원 석불에 얽힌 연이낭자 전설 신라시대, 고창이라 불리어진 이곳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다. 이 여관에 여덟 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심부름을 하는 \"연(燕)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다. 연이는 인물이 예뻤다. 그녀는 밥 짓기와 청소는 물론 빨래까지 하느라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곧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글을 익히고 내일은 어떻게 하여 손님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불심도 대단하여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염불을 해서, 지나가는 과객들로 하여금 그 알뜰한 정성과 고운 마음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원의 이웃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성미여서 거지를 보는 대로 내
4. 임청각(臨淸閣)
안동 영남산의 동쪽 기슭에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넓은 대지에 자리한 옛집이다. 현 소유자의 11대 조상인 이후식(1653∼1714)이 조선 숙종 때 안채를 짓고 이어 사랑채를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손자 이원미가 마저 짓고 대청인 영모당도 지었다. 대청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북정(北亭)은 영조 51년(1775)에 지어졌다. 순조 24년(1824)에 대수리를 하였고, 1991년에는 안채의 정침을 고쳐지었다.
<군자정>
고성 이씨는 본래 중국 당나라 때 난을 피하여 들어온 이경· 이황 형제를 시조로 한다. 고려 때는 개경 송악산 밑에서 살았는데, 토족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경상남도 고성땅에 살게 되어 ‘고성 이씨’로 관향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조선 세조 때 현감을 지낸 이증이 안동에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가옥전체를 당호인 임청각이라 부르고, 임청각에 딸린 별당채를 군자정이라 부르는 이 가옥은 고성이씨 대종택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國務領: 현재의 국무총리)을 지낸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생가이기도 하다. 원래는 아흔아홉 간 집으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바깥 행랑채 등으로 건물 군이 남녀별, 계층별로 뚜렷한 구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 안채와 바깥채 기단의 높이차이가 2m나 되어 건물의 위계질서를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제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되었던 1930년대 후반, 그들이 태백산맥 인근의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을 반출하여 대륙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량리와 경주를 연결하는 중앙선철로(1936년에 착공하여 1942년에 개통)를 이 집을 통과하게 건설하면서 파괴하여 50여 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건물도 채 3m정도의 간격밖에 두지 않고 집 앞을 막고 선 대문보다 훨씬 더 높은 중앙선철로의 방음벽에 갇혀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5. 동부동 오층전탑
안동 동부동 오층전탑은 안동역 앞에 있는데 『영가지(永嘉誌)』에는 이 탑이 \'법림사지탑(法林寺址塔)\'이라고 되어 있어 이 주위에 법림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탑의 기단부는 화강암 3단으로 되어있고 탑신부는 길이 27.5cm, 넓이 12.5cm, 두께 6cm의 무문전(無文塼)을 사용한 5층탑이다. 초층은 높고 2층부터는 체감되었다. 옥개하부의 받침수는 초층에서부터 10, 8, 6, 4, 3단으로 체감되었고 상면은 층을 두지 않고 각층전면에 기와를 입혔다.
탑신에는 각층에 감실을 설치하였으며 2층 탑신 남면에는 2구의 인왕상을 조각한 화강암 판석이 끼워져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연화가 조각된 복발 형 석재가 얹혀져 있다.『영가지』에 의하면 원래 정상에는 금동으로 된 상륜부가 있었으나 조선 선조조(宣祖朝)에 명나라 병사에 의 하여 철거되었다고 한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화강암과 전을 사용하였는데 총 높이 8.35m, 기단부 3.65m이며 원래 는 7층탑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도괴되어 조선 선조 31년(1598)에 5층으로 개축하였다.
6. 제비원 석불
제비원 석불은 안동시 이천동 연미사(燕尾寺) 옆에 있다. 안동 주민들에게는 안동의 상징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연미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명덕이란 승려가 창건하였고, 뒤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행하는 관리를 위한 숙소인 원(院)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원이란 사찰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서 제비원은 그 말 자체가 사찰의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절은 1918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절 위의 바위 위에는 안동 이천동 3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9호)이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가(巫歌)인‘성주풀이’사설에 나오는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라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래라”라는 가사와 ‘연이 처녀와 노랭이 김씨 총각’, ‘불상 목 벤 이여송’, ‘불상 만든 형제’, ‘제비원과 법룡사 절 짓기 시합’, ‘자리 빼앗긴 울바위’ 등 지금까지 안동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많은 전설들이 얽혀 있기도 하다.
불상은 크게 몸체와 머리로 나누어지는데, 몸체는 높은 바위절벽에 얕은 부조(浮彫)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다. 머리는 얼굴과 큼직한 육계가 표현된 소발(素髮)의 머리를 각기 다른 돌로 만들어 조합하였다. 얼굴은 풍만하여 자비로우면서도 근엄한 느낌을 주며 양 눈썹 사이에는 백호를 양각으로 새겼고, 눈은 가늘고 길게 떴으며, 눈 위로 초승달 모양의 눈썹의 안쪽 선끝이 바로 삼각형으로 우뚝 솟은 코의 윤곽선과 연결되었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아랫입술을 밑으로 도톰하게 새겼다. 따로 된 머리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명나라에서 참전한 이여송 장군이 이 앞을 지날 때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칼로 머리를 쳐서 떨어뜨린 후 비로소 말이 발을 옮길 수 있었다는 설화가 붙어 있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라시대에 조각된 머리 부분이 있었는데 풍화가 심하여 후대에 다시 만들어 붙였으며 옛날에 있던 머리는 산 밑 계곡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 제비원 석불에 얽힌 연이낭자 전설 신라시대, 고창이라 불리어진 이곳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다. 이 여관에 여덟 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심부름을 하는 \"연(燕)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다. 연이는 인물이 예뻤다. 그녀는 밥 짓기와 청소는 물론 빨래까지 하느라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곧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글을 익히고 내일은 어떻게 하여 손님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불심도 대단하여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염불을 해서, 지나가는 과객들로 하여금 그 알뜰한 정성과 고운 마음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원의 이웃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성미여서 거지를 보는 대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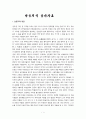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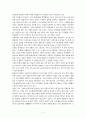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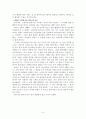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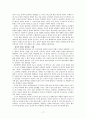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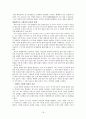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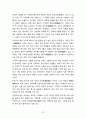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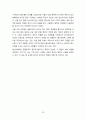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