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푸코의 하이데거 비판
본문내용
취급방법을 전적으로 문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9장에서 논하고 있는 \'3가지의 이중체\'(이에 대해서는 후술)를 각각 뽕띠, 후설, 하이데거 등등으로 도식화시켜 적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지닌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푸코의 주장은 그 보다 더욱 광범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 3인은 3가지 이중체 모두가 지닌 문제를 동일하게 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줄기이다.
14. ≪말과 사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분석은 이미 ≪임상의학의 탄생≫의 결론부분에서 개시되고 있다. \"비이성에 대한 경험이 심리학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죽음을 의학적 사고 안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의학적 경험이 있었기에 개인에 대한 과학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서구 근대문명에서 개별성에 대한 경험은 분명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죽음이 인간에게 부여한 유한성은 역설적이게도 언어의 보편성을 개별자의 일시적인 모습에 연결시켜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과학 안에서 의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의미란 인간의 존재를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방법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자가 지식의 구성에서 주체와 더불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유한성의 역할이 뒤바뀌었음을 뜻한다. 고전적인 사상에서 유한성이란 무한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던 것에 반하여, 18세기에 형성된 사유체계는 유한성에 긍정적인 요인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학적 발상은 유한성에 대한 한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실증의학의 형성에 철학적 기초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역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증의학이란 근대적 인간을 본원적인 유한성과 가장 처음으로 짝지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과학의 형성에 있어서 실증의학이 차지한 자리이며, 근대의학이 갖는 위엄이기도 하다. [구제 대산 건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의학이 근대적 인간에게 유한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제 근대의학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재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한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죽음은 또한 실증주의로 무장된 근대적 기술에 대해서도 웅변을 하게 된 것이다. 18세기에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근대 문명의 새로운 경험은 유한성의 형태를 명확히 포착했는데, 이 때 죽음이란 가장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충만한 존재이기도 했다.\" (홍성민 역, pp. 319-322)
15. 허버트 L. 드레퓌스와 폴 레비노우,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나남, p. 64.
16.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p. 385. * 참고로 이 책은 가급적 영어판으로 읽는 것이 좋다. 영어판은 두 가지가 있으나 ≪The Orders of Things≫를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은 푸코 자신이 영어판 서문을 붙인 것이기도 하다.
17. Ibid., p. 390,
18.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존재의 망각됨\'이다. \"존재의 망각됨은 존재자에 대한 존재의 차이에 대한 망각됨이다. 그러나 차이의 망각됨은 결코 사유의 건망증의 결과는 아니다. 존재의 망각됨은 그것 스스로를 통해 감추어진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존재의 망각됨은 존재의 운명(혹은 역운)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속해서, 이 운명의 이른 아침은 현존하는 것의 현존 속에서의 드러남으로 시작된다.\" (김진석, 앞의 책, pp. 96-97에서 재인용)
19. 푸코의 사건에 관한 주장과 하이데거의 사건에 관한 주장을 비교하는 것도, 어쩌면 그보다 더 넓게 들뢰즈나 다른 프랑스철학자들에게 사건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연결시켜 파악하려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일 게다. 앞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89년에 빅토르 파리아스의 ≪하이데거와 나찌≫ 출간을 계기로 하여 벌어진 하이데거 논쟁 속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20. 이때 진리의 자리가 바뀌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시간\'에 놓여 있다. 시간은 이미 존재가 드러나는 \'지평\'으로서 \'존재의 의미\' 혹은 \'존재의 진리\'로 파악된다. 존재는 자신의 은밀한 사랑의 힘을 시간의 사건으로 드러낸다. 시간은 존재를 드러내는 지평이자 그 지평에 드러난 존재의 의미이며 존재의 사건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의해 진리의 장소가 존재의 드러남에 놓여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진리의 자리는 존재의 시간이자 시간의 존재, 즉 존재의 사건에 놓여야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실체성에서 진리의 근거를 보았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시간의 문제가 쉽게 간과되었다는 점을 그는 비판한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역사를 통해 시간의 문제가 배제되었던 것은 우선 존재에 대한 해석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이데거에 의하면 시간 자체가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 시간성과 비본래적 시간성,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속적 이해를 구별하고 있다. 즉 시간성은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폐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존재자에 한정되어 질 때, 시간은 존재를 은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시간과 존재≫라는 후기 작품에서 시간은 \'도래, 기재, 현재를 서로 멀게 하면서, 가까움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은 한편으로는 존재 사건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 사건을 철저히 막기도 한다. 이렇게 존재 사건을 막는 시간에 의해 형이상학의 역사가 가능했고, 따라서 진리의 장소가 바뀌게 된 두번째 이유는 시간 자체의 이중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본래적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을 각각의 고유함에 있어 \'존재자 없이 사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21. BT, pp. 33-34.
22. ≪말과 사물≫, p. 368.
23. p. 374참조.
24. Ibid., p. 328.
25. Ibid., p. 380.
26. Ibid., pp. 439-440.
14. ≪말과 사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분석은 이미 ≪임상의학의 탄생≫의 결론부분에서 개시되고 있다. \"비이성에 대한 경험이 심리학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죽음을 의학적 사고 안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의학적 경험이 있었기에 개인에 대한 과학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서구 근대문명에서 개별성에 대한 경험은 분명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죽음이 인간에게 부여한 유한성은 역설적이게도 언어의 보편성을 개별자의 일시적인 모습에 연결시켜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과학 안에서 의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의미란 인간의 존재를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방법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자가 지식의 구성에서 주체와 더불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유한성의 역할이 뒤바뀌었음을 뜻한다. 고전적인 사상에서 유한성이란 무한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던 것에 반하여, 18세기에 형성된 사유체계는 유한성에 긍정적인 요인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학적 발상은 유한성에 대한 한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실증의학의 형성에 철학적 기초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역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증의학이란 근대적 인간을 본원적인 유한성과 가장 처음으로 짝지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과학의 형성에 있어서 실증의학이 차지한 자리이며, 근대의학이 갖는 위엄이기도 하다. [구제 대산 건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의학이 근대적 인간에게 유한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제 근대의학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재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한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죽음은 또한 실증주의로 무장된 근대적 기술에 대해서도 웅변을 하게 된 것이다. 18세기에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근대 문명의 새로운 경험은 유한성의 형태를 명확히 포착했는데, 이 때 죽음이란 가장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충만한 존재이기도 했다.\" (홍성민 역, pp. 319-322)
15. 허버트 L. 드레퓌스와 폴 레비노우,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나남, p. 64.
16.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p. 385. * 참고로 이 책은 가급적 영어판으로 읽는 것이 좋다. 영어판은 두 가지가 있으나 ≪The Orders of Things≫를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은 푸코 자신이 영어판 서문을 붙인 것이기도 하다.
17. Ibid., p. 390,
18.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존재의 망각됨\'이다. \"존재의 망각됨은 존재자에 대한 존재의 차이에 대한 망각됨이다. 그러나 차이의 망각됨은 결코 사유의 건망증의 결과는 아니다. 존재의 망각됨은 그것 스스로를 통해 감추어진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존재의 망각됨은 존재의 운명(혹은 역운)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속해서, 이 운명의 이른 아침은 현존하는 것의 현존 속에서의 드러남으로 시작된다.\" (김진석, 앞의 책, pp. 96-97에서 재인용)
19. 푸코의 사건에 관한 주장과 하이데거의 사건에 관한 주장을 비교하는 것도, 어쩌면 그보다 더 넓게 들뢰즈나 다른 프랑스철학자들에게 사건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연결시켜 파악하려는 것도 매우 유용한 것일 게다. 앞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89년에 빅토르 파리아스의 ≪하이데거와 나찌≫ 출간을 계기로 하여 벌어진 하이데거 논쟁 속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20. 이때 진리의 자리가 바뀌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시간\'에 놓여 있다. 시간은 이미 존재가 드러나는 \'지평\'으로서 \'존재의 의미\' 혹은 \'존재의 진리\'로 파악된다. 존재는 자신의 은밀한 사랑의 힘을 시간의 사건으로 드러낸다. 시간은 존재를 드러내는 지평이자 그 지평에 드러난 존재의 의미이며 존재의 사건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의해 진리의 장소가 존재의 드러남에 놓여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진리의 자리는 존재의 시간이자 시간의 존재, 즉 존재의 사건에 놓여야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실체성에서 진리의 근거를 보았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시간의 문제가 쉽게 간과되었다는 점을 그는 비판한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역사를 통해 시간의 문제가 배제되었던 것은 우선 존재에 대한 해석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이데거에 의하면 시간 자체가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 시간성과 비본래적 시간성,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속적 이해를 구별하고 있다. 즉 시간성은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폐시키기도 한다. 시간이 존재자에 한정되어 질 때, 시간은 존재를 은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시간과 존재≫라는 후기 작품에서 시간은 \'도래, 기재, 현재를 서로 멀게 하면서, 가까움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은 한편으로는 존재 사건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 사건을 철저히 막기도 한다. 이렇게 존재 사건을 막는 시간에 의해 형이상학의 역사가 가능했고, 따라서 진리의 장소가 바뀌게 된 두번째 이유는 시간 자체의 이중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본래적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을 각각의 고유함에 있어 \'존재자 없이 사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21. BT, pp. 33-34.
22. ≪말과 사물≫, p. 368.
23. p. 374참조.
24. Ibid., p. 328.
25. Ibid., p. 380.
26. Ibid., pp. 439-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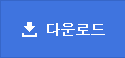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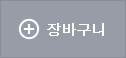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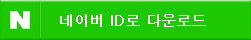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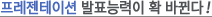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