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본문내용
-------------사진설명 :건원중보 앞면(사진 위)과 뒷면.
----------------------------------------------------------------------
유럽에서는 1661년 스웨덴의 한 상업은행에서 최초의 지폐(은행권)를 발행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1694에는 영국에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약속어음 형식의 잉글랜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과 기능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폐와 가장 유사해 이를 세계 최초의 지폐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02년이다. 우리 주권을 말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의 제일은행이 우리 정부의 승인도 없이 은행권 3종(1圓, 5圓, 10圓)을 발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지폐는 해방 후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이 그 해 7월 22일 피란지 대구에서 발행한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이다.
전자화폐는 지폐ㆍ주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전자화폐의 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화폐가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카드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에 화폐의 가치를 저장했다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성급한 사람들은 많은 양의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전자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향은 원래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쉽사리 현금화폐의 매력을 포기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구나 할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두둑한 세뱃돈의 맛(?)을 어찌 전자화폐가 대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현금화폐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화폐 사용법
일반적으로 지폐는 종이(펄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내의 등 옷감의 원료로 쓰이는 면(綿)으로 만든다. 물론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적당히 빳빳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게, 그 나라 화폐 제조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비법을 사용해 제조한다.
우리 나라 돈의 질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예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횟수가 6000회에 달해 미국 달러화보다도 오히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의 수명은 외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의 수명이 9년 정도인 데 반해 우리 나라 1만 원권의 수명은 4년 정도이고, 1000원권은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을 험하게 다룬다는 얘기다.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폐기되는 지폐는 연간 약 3조 6000억 원, 물량 기준으로는 약 7억 6000만 장에 이른다. 이는 5톤 트럭 160대 분에 해당하는 양이고, 한 장씩 세로로 모두 이을 경우 그 연장 길이는 11만 8000km로 경부고속도로로 서울-부산(428㎞)을 138회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폐기되는 돈을 보충하기 위해 새 돈을 만드는 데는 매년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모든 국민이 지폐를 지갑이나 전대에 보관,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경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화폐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돈의 깨끗함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나타낸다고 한다. 올바른 돈 사용습관을 실천하면 국민의 부담인 화폐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에밀레종은 유구한데 기술은 간데없고...
종의 무게 지탱하는 핵심 포뇌 기술 6세기 때 완성했으나 이젠 역사 속으로
향로는 대부분 놋쇠로 만들어졌다.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선로(宣爐)를 명품으로 꼽는다. 선로는 다른 향로와는 달리 드문드믄 박힌 순금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선로는 중국의 주물 공예품으로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선로는 애초부터 주물장인(匠人)들이 작정하고 만든 공예품은 아니었다. 화재로 인한 우연한 발견이었다. 중국 명나라 때 금은보화를 쌓아 뒀던 황궁의 창고에 불이 났다. 불을 끄고 보니 금, 은, 구리, 주석 등이 뒤섞여 녹아 버린 것이다.
겁이 난 관리들은 이 금은보화를 어찌 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일단 도가니에 넣어 녹이기로 했다.
녹은 쇳물로 궁중 의례용 향로를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보니 그 빛깔이 기막혔던 것이다.
옛 중국인들이 주물로 탄생시킨 또 하나의 명품은 바로 동전이다. ‘00통보’라고 쓰여진 옛 동전들은 주로 구리로 주조했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생철을 소재로 했으며, 심지어는 납으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통용된 동전 중 가장 귀한 것은 황전(黃錢)과 청전(靑錢)이다.
철전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진보통감)다. ‘안사의 난’ 이후 당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철전이 유통됐는데 이 때문에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등 경제혼란이 야기됐다고 한다. 종 역시 주물로 제작하는 예술품이다. 중국종은 종을 매다는 윗고리 부분 즉, 포뇌(蒲牢)를 용 두 마리로 제작했다. 한국종은 용이 한 마리다. 포뇌는 해변에 사는 중국의 전설적인 짐승이며, 울부짖으면 그 소리가 맑고 주위를 압도했다고 해서 종의 윗고리 부분을 포뇌라고 불렀다.
수년 전 국내에서는 에밀레종과 흡사한 종을 만들어 매달았는데, 에밀레종의 포뇌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끄떡 없으나, 20세기에 만든 종은 포뇌가 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 거의 1톤에 육박하는 큰 종의 무게를 견고하게 붙잡아 두는 포뇌의 기술이 이미 6세기경에 완성됐으나 그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물산업은 대기업들이 회피하는 업종이다. 3D 업종으로 취급되면서 어지간하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중국 등지에 생산을 의뢰하고 있다. 물론 가격경쟁력이 주요인이지만 핵심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은 우리 것으로 남겨야 한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입시생들이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많이 지망하고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
유럽에서는 1661년 스웨덴의 한 상업은행에서 최초의 지폐(은행권)를 발행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1694에는 영국에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약속어음 형식의 잉글랜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과 기능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폐와 가장 유사해 이를 세계 최초의 지폐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02년이다. 우리 주권을 말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의 제일은행이 우리 정부의 승인도 없이 은행권 3종(1圓, 5圓, 10圓)을 발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지폐는 해방 후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이 그 해 7월 22일 피란지 대구에서 발행한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이다.
전자화폐는 지폐ㆍ주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전자화폐의 등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화폐가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카드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에 화폐의 가치를 저장했다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성급한 사람들은 많은 양의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전자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향은 원래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쉽사리 현금화폐의 매력을 포기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구나 할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두둑한 세뱃돈의 맛(?)을 어찌 전자화폐가 대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현금화폐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화폐 사용법
일반적으로 지폐는 종이(펄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내의 등 옷감의 원료로 쓰이는 면(綿)으로 만든다. 물론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적당히 빳빳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게, 그 나라 화폐 제조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비법을 사용해 제조한다.
우리 나라 돈의 질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예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횟수가 6000회에 달해 미국 달러화보다도 오히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의 수명은 외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의 수명이 9년 정도인 데 반해 우리 나라 1만 원권의 수명은 4년 정도이고, 1000원권은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을 험하게 다룬다는 얘기다.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폐기되는 지폐는 연간 약 3조 6000억 원, 물량 기준으로는 약 7억 6000만 장에 이른다. 이는 5톤 트럭 160대 분에 해당하는 양이고, 한 장씩 세로로 모두 이을 경우 그 연장 길이는 11만 8000km로 경부고속도로로 서울-부산(428㎞)을 138회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폐기되는 돈을 보충하기 위해 새 돈을 만드는 데는 매년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모든 국민이 지폐를 지갑이나 전대에 보관,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경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화폐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돈의 깨끗함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나타낸다고 한다. 올바른 돈 사용습관을 실천하면 국민의 부담인 화폐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에밀레종은 유구한데 기술은 간데없고...
종의 무게 지탱하는 핵심 포뇌 기술 6세기 때 완성했으나 이젠 역사 속으로
향로는 대부분 놋쇠로 만들어졌다.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선로(宣爐)를 명품으로 꼽는다. 선로는 다른 향로와는 달리 드문드믄 박힌 순금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선로는 중국의 주물 공예품으로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선로는 애초부터 주물장인(匠人)들이 작정하고 만든 공예품은 아니었다. 화재로 인한 우연한 발견이었다. 중국 명나라 때 금은보화를 쌓아 뒀던 황궁의 창고에 불이 났다. 불을 끄고 보니 금, 은, 구리, 주석 등이 뒤섞여 녹아 버린 것이다.
겁이 난 관리들은 이 금은보화를 어찌 할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일단 도가니에 넣어 녹이기로 했다.
녹은 쇳물로 궁중 의례용 향로를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보니 그 빛깔이 기막혔던 것이다.
옛 중국인들이 주물로 탄생시킨 또 하나의 명품은 바로 동전이다. ‘00통보’라고 쓰여진 옛 동전들은 주로 구리로 주조했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생철을 소재로 했으며, 심지어는 납으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통용된 동전 중 가장 귀한 것은 황전(黃錢)과 청전(靑錢)이다.
철전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진보통감)다. ‘안사의 난’ 이후 당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철전이 유통됐는데 이 때문에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등 경제혼란이 야기됐다고 한다. 종 역시 주물로 제작하는 예술품이다. 중국종은 종을 매다는 윗고리 부분 즉, 포뇌(蒲牢)를 용 두 마리로 제작했다. 한국종은 용이 한 마리다. 포뇌는 해변에 사는 중국의 전설적인 짐승이며, 울부짖으면 그 소리가 맑고 주위를 압도했다고 해서 종의 윗고리 부분을 포뇌라고 불렀다.
수년 전 국내에서는 에밀레종과 흡사한 종을 만들어 매달았는데, 에밀레종의 포뇌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끄떡 없으나, 20세기에 만든 종은 포뇌가 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 거의 1톤에 육박하는 큰 종의 무게를 견고하게 붙잡아 두는 포뇌의 기술이 이미 6세기경에 완성됐으나 그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물산업은 대기업들이 회피하는 업종이다. 3D 업종으로 취급되면서 어지간하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중국 등지에 생산을 의뢰하고 있다. 물론 가격경쟁력이 주요인이지만 핵심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은 우리 것으로 남겨야 한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입시생들이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많이 지망하고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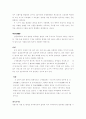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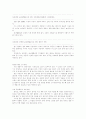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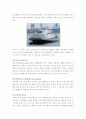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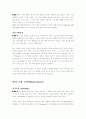






















소개글